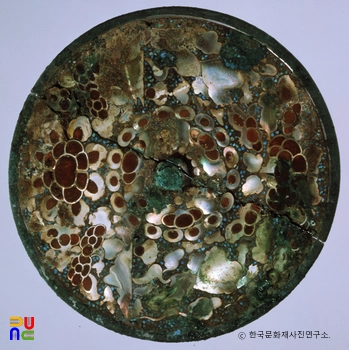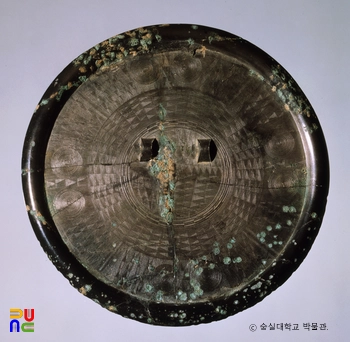단청장 ()
단청장(丹靑匠)은 궁궐이나 사찰 건축의 천장, 기둥, 벽과 같은 건축 부재 위에 채색을 하고 문양을 그리는 전통 기술을 보유한 기능인이다. 국가에서는 단청장을 1972년 국가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유산)로 지정하여 보호 및 육성하고 있다.
단청(丹靑)은 목재의 단점을 해결하여 오래 보존하기 위해 목조 건축물에 채색을 하고 문양을 그리는 것을 말한다. 옛 문헌에서는 단벽(丹碧), 단확(丹雘) 등으로도 기록하였다. 우리나라 단청은 고구려 벽화를 통해 처음 볼 수 있으며, 이후 고려 · 조선시대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전통의 맥을 이어 가고 있다. 원래 단청 일은 조선시대 도화서의 화원이나, 불교 사찰의 승려 화원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동시에 병행하였다. 이로 인해 단청을 회화로 이해하려는 오랜 관습이 있다. 오늘날에는 국가 및 시도 무형유산으로 단청장을 지정하여 단청의 오랜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1970년 이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단청장은 단청과 사찰 불화 두 분야에 걸쳐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장인들이 주를 이루었다. 대표적인 예가 만봉(萬奉)선사 이치호(李致虎), 석정(石鼎)선사 임석정(林石鼎)이다. 조선시대 사찰 화원의 맥을 계승한 스님들로, 불화를 중심으로 단청 기술까지 두루 섭렵한 분들이다. 오늘날 단청장 수업 과정에서 맨 먼저 시왕초(十王草)부터 따라 그리는 연습을 하고, 갑옷을 입은 천왕초(天王草)를 익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어느 정도의 실력이 쌓이면 상단 탱화의 불 · 보살을 그리면서 단청장이 된다. 최고 경지에 이르려면 여러 가지 무늬를 초할 수 있어야 하고, 별화(別畫)와 탱화 등을 두루 출초(出草: 단청의 초안도를 두꺼운 초지에 옮겨 도안하는 것)하고 설채(設彩)하는 것까지도 지휘해야만 한다.
오늘날의 단청장들은 일반 건물과 국가유산 건물로 크게 나누어 단청 작업을 하고 있다.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건물의 경우, 복원 단청을 시공하며 문화유산전문위원의 심의를 통해 전통 단청을 충실히 모사할 수 있도록 자세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한다. 단청을 하는 과정은 각 건축 부재의 크기를 측정하고, 그에 맞게 단청 문양의 초안을 도안하는 작업에서부터 출발한다. 이후 출초와 천초(穿草: 문양의 윤곽선을 따라 대바늘로 구멍을 내는 작업) 작업을 거친다. 그리고 건축 부재의 표면에 특정한 색을 칠하고, 완전히 건조되면 도본(圖本)을 해당 면에 대고 분주머니를 두드린다. 이러한 과정을 타분 작업(打粉作業)이라 하는데 구멍을 통과한 백분이 점선으로 나와 문양의 윤곽이 그려진다. 이 과정이 끝나면 본에 따라 광물성 안료로 오색을 입히고, 중요 부분에 금박을 붙여 완성한다.
2017년 현재 국가중요무형문화재 단청장으로는 2011년에 명예보유자로 지정된 홍점석(洪點錫), 2009년에 보유자로 지정된 유병순(庾炳淳), 홍창원(洪昌源)이 있다. 각 지역에서도 충청북도(2001년 지정), 대전광역시(2000년 지정), 대구광역시(1999년 지정), 인천광역시(2004년 지정), 전북특별자치도(2007년 지정), 경기도(1999년 지정), 서울특별시(2003년 지정) 등과 같이 시도지정 무형유산으로 지정하여 기능 보유자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의 전통 건축물에는 단청의 역사와 기능, 기술이 보존 및 전승되고 있다. 한자 문화권에서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그 전통이 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청장의 역할과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