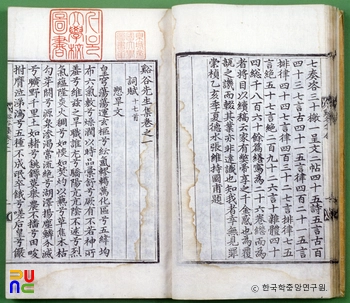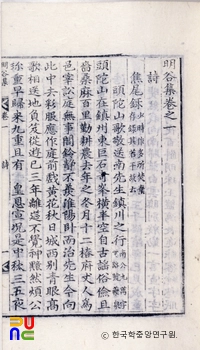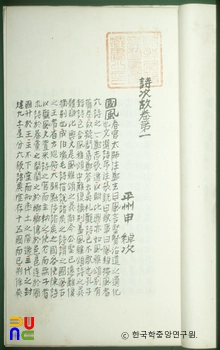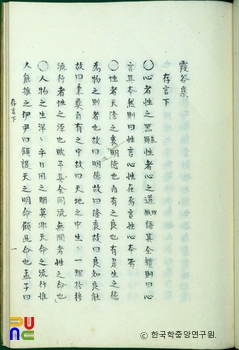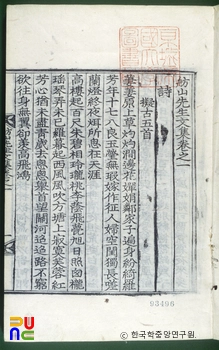남언경 ()
학행으로 천거되어 헌릉참봉이 되고, 1566년(명종 21) 조식(曺植) · 이항(李恒) 등과 함께 발탁되어 지평현감(砥平縣監)이 되었다. 1573년(선조 6) 양주목사가 되고, 이듬해 지평(持平)에 임명되었으나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그대로 머물 것을 요청하여 허락을 받았다. 1575년 지평을 거쳐 장령이 되고, 이어서 집의를 거쳐 전주부윤이 되었으나, 1589년 정여립(鄭汝立)의 모반사건이 일어나자 사헌부의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다.
1592년 다시 여주목사로 기용되었고, 이듬 해 공조참의가 되었으나 이요(李瑤)와 함께 이황(李滉)을 비판하다가 양명학을 숭상한다는 빌미로 탄핵을 받고 사직하여 양근(楊根)의 영천동(靈川洞)에 물러나 한거하다 67세로 별세하였다.
『퇴계전서』에 이황이 1556년(명종 11) 이후 남언경에게 보낸 답서(答書) 9통이 있고, 별지 「정재기(靜齋記)」에는 남언경의 편지가 수록되어 있어 남언경의 학문과 사상을 살펴볼 수 있다.
남언경은 우주의 본질과 현상작용을 모두 기(氣)로써 설명하고 기의 영원성을 주장하였으며, 그 선천성과 후천성을 구별하면서도 그 저변에 일기(一氣)의 연속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理)란 기(氣)의 동정취산(動靜聚散)에 따른 법칙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이는 기를 초월할 수도 없고 초월적 실재성(實在性)도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기는 유한하고 이는 무한하다는 이황의 주장을 반박하고 스승 서경덕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남언경의 논설 중에서 “맑고 유일(唯一)하며 밝은 본체는 위 · 아래, 하늘 · 땅과 함께 흐른다.”라고 한 주장은 곧 “양지(良知)의 묘용(妙容)이 발생할 때 인심(人心) · 하늘 · 땅이 모두 일체임을 알 것이다.”라고 한 주1의 설과 일치하며, 서경덕의 기불멸설(氣不滅說)과도 상통한다.
인간의 심성(心性)에 대한 해석에서는 이황이 이(理), 즉 본연의 성(性)은 순선무악(純善無惡)한 것이라 하여 이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데 반해, 그는 우주는 기이며 마음도 기이므로 도덕적으로 선과 악이 함께 있음을 주장하였다.
남언경은 진백사(陳白沙)와 왕양명의 주2을 탐독하였고, 그 영향을 받아 조선시대 최초의 양명학자가 되었다. 후에 이를 전승한 정제두(鄭齊斗)는 “선과 악을 논하지 않고서 고요할 때는 모두 이가 되고, 움직일 때는 모두 기가 된다고 한다면 기를 어찌 동(動)과 정(靜)으로써 한정할 것이며 움직일 때는 인욕(人欲), 고요할 때는 천리(天理)라고 할 것인가.”라고 하여 이황의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을 반박하고 양명학의 사상적 체계를 완성시켰다. 문하로는 이요 등이 있다.
양평의 미원서원(迷源書院)에 제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