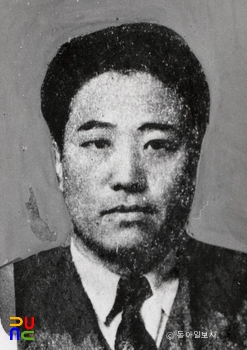나는 왕이로소이다 (나는 이로소이다)
「나는 왕이로소이다」에서 ‘왕’은 어머니의 가장 어여쁜 아들이며, 가장 가난한 농군의 아들로서 ‘시왕전(十王殿)’에서도 쫓겨난 ‘눈물의 왕’이다. 어머니의 가장 어여쁜 아들은 비록 농군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동심의 세계에서는 절대적인 주1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자전적 서술로 운행되고 있다.
전반부에서는 ‘눈물의 왕’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 울부짖는 ‘으아’ 하는 소리로부터 차츰 인생에 대한 허무를 의식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이때 ‘어머니를 따라서 흘리는 눈물’은 인생의 죽음이나 허무를 의식한 눈물이 아니라, 아무 것도 모르고 철없이 흘리는 눈물이다.
‘눈물의 왕’은 열한 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이 우는 ‘눈물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 나무꾼의 산타령을 따라가다가 그 앞을 지나는 상두꾼의 구슬픈 노랫소리와, 할머니의 산소를 찾던 날 어머니께서 흰옷을 입히시던 일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회의와 비극의식은 점차로 심화되어간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내리신 울음의 금지령 때문에 ‘눈물의 왕’은 남모르게 속 깊이 소리 없이 혼자 우는 버릇이 생겼다는 것이 이 시의 간추린 내용이다.
‘눈물의 왕’인 주2가 비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의 내면으로 향한 죽음이나 허무의식 때문만이 아니었다. 여기에는 그 시대 우리 민족이 처하였던 암담한 현실과 주3의 한이 깔려 있다. 3·1운동 당시 홍사용은 학생운동의 선두에 섰다가 잡힌 적이 있었다. 그것으로 인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봉화(烽火)○’을 거닐며 ‘○기인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다. ‘바위 미테 돌부처’도 모른 체 ‘감중련’ 하고만 있는 버려진 이 땅에 많은 ‘왕의 눈물’을 싣고 간 뜬구름을 ‘장군바위’에서 바라다보는 시인의 내면에는 강한 민족의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족적 정한(民族的情恨)과 허무의식을 기조로 한 비애와 서정은 이 시의 특색일 뿐만 아니라 주4 동인들의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경향을 대표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