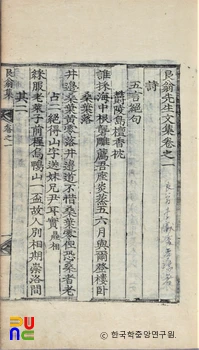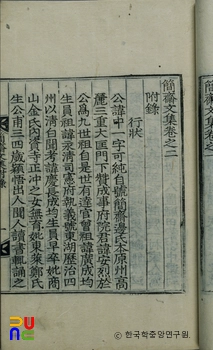등단수지 ()
불분권 1책. 필사본.
저자와 간행여부는 알 수 없으나 정조 때 이정집(李廷𪹯)이 지은 ≪무신수지 武臣須知≫와 내용이 비슷한 점으로 보아 정조 이후에 ≪무신수지≫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골라 초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장재(將才) · 경권(經權) · 진법(陣法)의 3항으로 구분되어 있다. ‘장재’에는 습궁마(習弓馬) · 중문묵(重文墨) · 양기력(養氣力) · 심취사(審取舍) · 명기우(明奇偶) · 도산천(圖山川) · 치기구(治器具) · 계주색(誡酒色) · 선인보(善人譜) · 장재차제도(將才次第圖) · 장가총론(將家摠論) 등 전략적인 면과 군정에 관한 내용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장재를 좌우로 구분하여 중앙에 자기(自期) · 재용(財用) · 사기(事機) · 지(智)를 열기하고, 우측에 정심독서(正心讀書) · 갈성(竭誠) · 이목(耳目) · 합벽(闔闢), 좌측에 박학무방(博學無方) · 명신(明信) · 복심(腹心) · 사위(思威) 등을 나열하여 장수로서 알아야 할 사항과 실천할 사항을 제시한 뒤 설명을 첨부하고 있다.
‘경권’에서는 보국(報國) · 임세(任勢) · 금령(禁令) · 행군(行軍) · 요적(料敵) · 망기(望氣) · 수성(守城) · 공성(攻城) 등의 전술적인 사항을 다루고 그 시행하는 방법과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진법’에서는 백병전이 전쟁의 주축을 이룬 고대에서는 진형이 승패를 판가름한다고 지적하고 예로부터 전해 오던 중국과 우리 나라의 진형을 총망라하여 수록하였다.
그 중에서도 팔문반사진(八門蟠蛇陣) · 권지진(捲地陣) 등이 대표적이며, 이어서 전투에 필요한 사항으로 선사(選士) · 권변(權變) · 지적(知敵) · 복병(伏兵) · 수화(水火) · 심기(心氣) · 형병(形兵) · 결의(決疑) · 궁구(寇寇) · 기계(奇計) · 형상(刑賞) · 선찰(先察) · 반간(反間) 등을 열거하고 설명하였다.
시대의 변천으로 전투와 전술면에서는 이제 효용가치가 없을지 모르나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그 진리가 적용될 뿐 아니라, 고대 장수들의 자질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