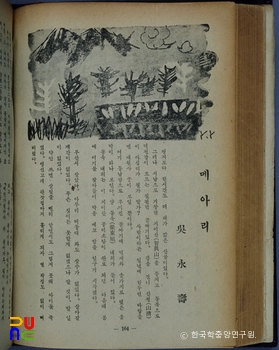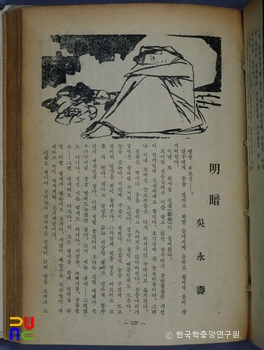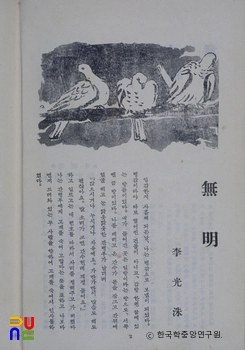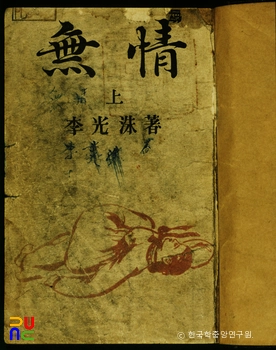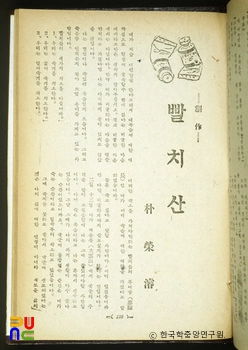메아리
1959년 『현대문학(現代文學)』 4월호(통권 52호)에 발표되었다. 이듬해 백수사(白水社)에서 단행본으로 출간하였으며, 1968년 현대서적(現代書籍)에서 간행한 『오영수전집(吳永壽全集)』 제3권에 게재되기도 하였다. 작자는 예술성 지향과 인간애에 근거한 작가관찰자시점의 작품을 써왔으며, 자연과 농촌 · 어촌 · 산촌을 배경으로 하여 인간성의 고양에 역점을 두었다.
이 작품도 그러한 연계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전쟁 중 부산에서 힘든 피난살이를 하던 양동욱(梁東旭) 내외는 지리산 속으로 들어가 화전을 일구며 살기로 한다. 가재 도구를 팔고난 그들은 산청(山淸)에서 이십여 리 들어가는 지리산 골짜기에 움막을 친다. 그리고 화전을 일구어 감자씨를 뿌린다. 또, 산나물과 더덕 등을 캐어내 장에 내다 팔아서 여러 씨앗과 일용품을 장만해 나간다.
열심히 땅에 매달린 결과, 가을에는 제법 월동을 할 수 있는 식량 준비를 하고, 닭과 강아지도 기르게 된다. 겨울날 일을 걱정하던 그들은 산막에서 혼자 산다는 목수 박노인을 청해서 집을 짓기로 한다. 사람을 믿지 못하여 산 속에서 살아간다는 박노인은 흔쾌히 집 짓는 일을 거들어 준다. 원래 박노인은 경상북도 청송에서 목수 일을 했으나, 이십여 년 전 아내가 자기 조수였던 윤방구와 사통하는 사실을 알고나서부터 산 속에 들어와 혼자 살아간다고 하였다.
달포 만에 집이 완성되자, 동욱 내외는 박노인에게 같이 지내자고 권했으나 박노인은 사양한다. 겨울이 되자 동욱 내외는 내년의 농사 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산골에 와서 함께 살지 못하고 지금도 부산 시장 바닥에서 고달픈 삶을 살고 있을 명숙이 엄마를 안타까워한다. 겨울이 깊어진 어느 날 밤, 산막에 있던 박노인이 윤생원이라는 중년 사내를 데리고 찾아온다. 윤생원은 바로 이십년 전 박노인이 데리고 있던 조수 윤방구이다.
그 일이 있은 뒤 마을에게 쫓겨나 온갖 고초를 겪다가 나중에는 빨치산까지 되었던 그는 박노인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기는 했으나 이미 반쯤 정신이 나가 있다. 인적이 그리운 동욱 내외는 함께 살기로 한다. 윤생원은 사람이 모여 있는 읍내장에는 절대로 가지 않으려 하지만 그밖에는 무슨 일이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한다. 이듬해 봄이 되자 동욱의 아내는 명숙이 엄마를 데려와 윤생원과 같이 살게 해보겠다고 말하고 부산으로 떠난다.
이 작품은 비참한 전쟁으로 인하여 초토화되다시피 했던 외진 산골에 다시 인적이 생겨나는 모습을 풋풋한 인정과 따스한 시선으로 묘사하고 있다. 삶에 지치고 상처를 지닌 등장인물들이 하나같이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 새로운 발돋움을 시작해나간다. 이러한 전개는 인정과 자연의 화합, 노력한 만큼 이루는 땅의 섭리,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도 감싸주는 작가의 뜨거운 인간 정신의 발로이다.
작품 곳곳에 서정적이고 토속적인 묘사를 통해 예술성이 가미되어 있는 작품이다. 작품 활동의 초창기부터 작자는 서정성을 중심으로 한 작품세계를 보여주었다. 이후 『현대문학』을 창간하면서 시작한 서울살이로 인해 도시 하층민의 삶이나 전후 피난지의 모습을 그리던 작가가 다시 자연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창작하게 되는데 그 재변화의 기점이 되는 작품이다. 이때의 서정성은 단순히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것과는 다르게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과 자연과의 합을 통해 치유를 받는 반문명적인 의미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