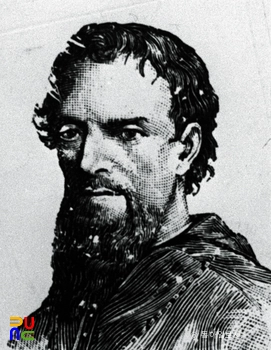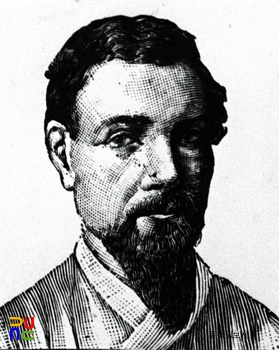선교사 ()
서구 기독교 국가에서 비기독교 세계에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 18세기 이후 많은 선교사를 파견하였다. 일반적으로 신부나 목사와 같은 성직자이지만, 의사, 기술자, 교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평신도가 선교사로 주1 한다.
한국 가톨릭의 역사는 선교사의 파송 이전에 천주교 서적을 탐독한 양반들의 자발적인 신앙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 신자 윤유일(尹有一)이 북경을 방문하여 구베아 주교에게 신부(神父)를 요청하여 1794년 중국인 주문모(周文謨)가 입국하였다. 1827년에 조선 선교를 파리외방전교회에서 담당하였고, 1836년에 모방(P. P. Maubant)이 입국한 것을 시작으로 1866년까지 총 21명의 프랑스인 선교사가 박해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 활동하였다. 이들 중 12명이 조선 정부에 체포되어 참수형을 당했다.
개신교 선교의 경우 독일인 선교사 귀츨라프(Karl Gützlaff)가 1832년 충청도 고대도에 머물며 주민과 접촉한 적이 있으나, 본격적인 시작은 주2이 체결된 이후였다. 공식적인 선교 개시는 감리교와 장로교에 의해 진행되었다. 감리교회에서는 일본에 주재하고 있던 선교사 매클레이(R.S. Maclay)가 1884년에 한국을 방문하여 고종으로부터 교육 · 의료 활동에 대한 주3를 받았고, 스크랜턴(Wm. B. Scranton)과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등을 한국 선교사로 임명하였다. 장로교회에서는 1884년에 헤론(John W. Heron)과 언더우드(Hrace G, Underwood)를 한국 선교사로 임명하였다.
한국에 입국하여 활동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는 1883년 중국에 파송되었던 알렌(Horace N. Allen)이다. 그는 중국에 머물다가 미국공사관 담당 의사의 신분으로 1884년 서울에 들어왔다. 그다음 해인 1885년 4월에 북감리교 아펜젤러 부부와 북장로교 언더우드, 5월에 북감리교 스크랜턴과 그의 모친이 교단 파송 선교사로 입국하여 선교의 기초를 세웠다. 다른 교단들의 입국도 이어졌다. 1889년 코프(C.J. Corfe) 주교가 이끄는 성공회 선교단이 입국했고, 1889년 호주장로교회, 1892년 남장로교회, 1895년 남감리교회, 1898년 캐나다장로교회의 선교가 시작되었다. 1905년에 재림교회, 1908년에 구세군 선교사가 입국하여 선교가 시작되었다. 한편 1899년 니콜라이 알렉세예프(Nikolay Alekseyev)의 입국 이후 러시아정교회 선교도 시작되었다.
초기 개신교 선교는 직접적인 복음 전도보다는 학교와 병원 설립을 통한 간접 주4의 방식을 취했다. 조선 정부가 설립한 근대 병원 광혜원에서 알렌, 헤론, 에비슨 등이 활동하였고, 후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발전하게 된다. 기독교계 학교 설립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아펜젤러의 배제학당, 메리 스크랜튼의 이화학당, 언더우드의 경신학당과 연희전문학교, 베어드의 숭실학당 등이 유명하다. 선교사가 설립한 학교는 근대 학문을 제공하여 한국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요람 역할을 하였다.
여러 교파의 선교회가 동시에 활동하면서 생기는 비효율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선교 지역 분할 협정이 맺어졌다. 1909년까지 장로교와 감리교 사이에 맺어진 협정에 따르면, 서울 · 평양 · 원산과 같은 대도시는 공동으로 점유하며, 서울 · 경기 · 충청 · 강원 등 중부 지역은 미감리회, 남감리회, 북장로교, 남장로교가 중복되지 않게 나누었다. 평안도 · 황해도는 북장로회와 남장로회, 함경도는 캐나다장로회, 경북은 북장로회, 경남은 호주장로회, 전라도는 남장로회가 각각 관할하였다. 분할 협정은 1936년에 폐기되었지만, 각 지역의 교회 특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쳤고, 훗날 교단 분열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초창기에 선교사들은 성경 번역과 같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교단의 차이를 넘어 협력하였다. 협력의 분위기는 1905년 한국복음주의선교회연합공의회 결성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정기간행물 『코리아 미션 필드(The Korea Mission Field)』, 『기독신보(基督申報)』와 『찬송가』를 공동 발행하였다. 병원과 학교의 공동 운영도 시도되었다.
개신교 선교사는 조선 왕실과의 협력 속에서 선교를 시작했으나, 1907년 주5의 체결 이후 일본 통치자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호머 헐버트(Homer B. Hulbert), 필립 질레트(Philip Gillett)처럼 한국의 독립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분명히 낸 선교사들은 한국을 떠나게 되었고, 다수의 선교사는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유지하였다. 삼일운동 때 제암리 사건을 세계에 알린 프랭크 스코필드(Frank Schofield)처럼 적극적으로 한국인을 도운 이들도 있으나, 대체로 정치적인 사안에 침묵하는 방식으로 일제 지배를 묵인하였다.
1920년대부터는 교회 안팎으로 선교사들에 대한 불만이 나타났다. 사회적으로는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교회와 선교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고, 교회 내부에서는 선교사로부터 자치권을 확보하려는 한국 교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재림교회 선교사가 한국 아이를 심하게 징벌한 허시모(許時謨) 사건으로 선교사가 사회적으로 크게 비판받았고, 구세군과 장로교에서는 선교사에게 교회 자치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왔다. 1937년 이후 일제가 주6를 강요하자 보수적인 선교사들은 이를 거부하고 학교를 폐쇄하였다. 1940년에 대부분의 선교사가 한국에서 철수하였고, 남은 선교사도 1941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체포되어 강제 송환되었다.
선교사들은 해방 이후 선교 사업을 재개하였고, 특히 한국전쟁 이후 구호와 재건을 위해 노력했다. 선교사는 이전과는 달리 한국인과 동등한 주7로서 협력하는 관계로 역할이 재정립되었다. 한편 1956년에 후기성도교회, 1958년에 루터교회가 한국에 진출하여 선교사 입국이 시작되었다.
현재 한국에서 일부 교단을 제외하고는 선교사의 수가 과거에 비해 축소되고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미국에 이어 많은 수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기독교 국가로 성장하였다. 해외에 파송된 한국 선교사의 수는 1990년대 이후 급증하여, 2022년 기준으로 169개국에 22,000명 이상에 이른다.
선교사의 활동이 제국주의 시기에 이루어졌기에 이들에 대한 평가는 양면적이다. 한편으로는 선교사가 제국주의 침략의 주8이라고 비판받는데, 한국의 경우 선교 국가와 제국주의 지배가 일치한 것은 아니지만 선교사들은 주9를 내세우며 사회적 의제에 침묵하는 방식으로 일제에 협조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선교사가 전파한 기독교가 한국에 정착하고 성장하였다는 점에서 신앙의 아버지로서 교계에서 높이 평가받는다. 또 선교사는 일본과는 다른 근대화의 통로를 제공하여 교육과 의료 분야의 근대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선교사는 일반적으로 한국 문화에 배타적인 태도를 가져 비판받기도 하지만, 애정을 지니고 연구하여 해외 한국학에 공헌한 이들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