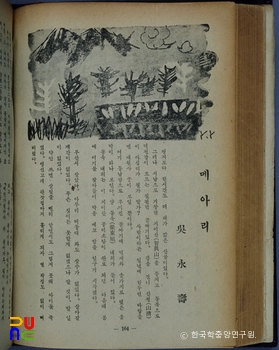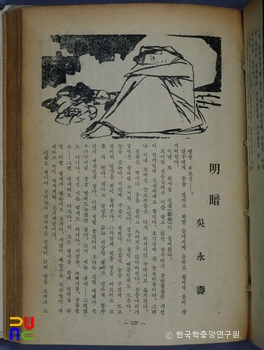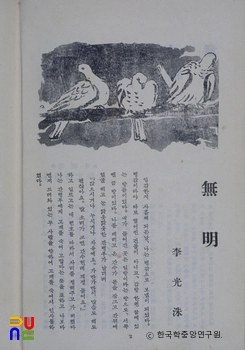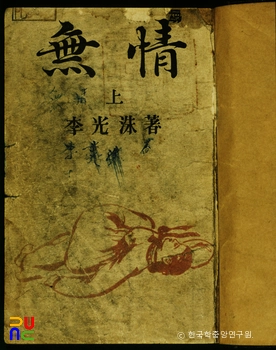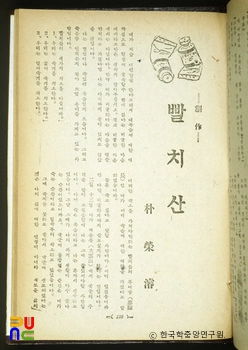증인 ()
1956년『현대문학』 2월호(통권 14호)에 발표되었으며, 이후 1969년삼성출판사(三省出版社)에서 간행한 『한국단편문학대계(韓國短篇文學大系)』 7권에 수록되기도 하였다. 권력체제의 무자비한 횡포 아래에서 저항할 길 없이 수난을 당하는 인간상을 여실히 그려놓은 작품이다. 사회악과 정치악에 끊임없이 저항해온 작가의 문학적 의지가 잘 드러난 작품이라 하겠다.
자유당 말기 사사오입 개헌에 반대하여 야당에 유리한 기사를 썼던 ‘준’은 신문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다. 근무하던 신문사가 여당지였기 때문이다. 준은 양심과 언론의 책임을 들어 항변하였지만 비인간적인 권력체제의 무자비한 속성 앞에서 무기력할 뿐인 자신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준은 사직서를 내고 가끔 쓰는 잡문의 수입으로 기원에 가서 바둑이나 두는 생활을 이어간다. 준의 아내는 쪼들리는 살림살이 때문에 현일우라는 학생을 하숙생으로 들인다. 현은 S대 철학과에 다닌다고 말하지만 실은 좌경사상을 지닌 학생이다. 처음 한두 달은 현을 믿던 준의 아내도 차츰 현의 행동이 의심스럽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준은 철학과 학생이니까 그런 서적을 읽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지나친다.
어느 날 갑자기 현은 부산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종적을 감춘다. 준은 뒤이어 들이닥친 형사들에게 체포·연행되어 간첩과의 접선혐의로 추궁을 당한다. 독방에 갇혀 심문을 받던 준은 신문사를 그만두게 된 경위까지 밝혀져 더욱 곤욕을 치른다. 그러나 죄 없는 준은 끝까지 자신을 변호한다.
폐병이 악화되어 각혈을 하던 준은 병보석으로 풀려난다. 앓아누운 준에게 중학 동창이자 군의관인 ‘강’이 와서 치료를 해준다. 그것도 일종의 감시 역할이라고 생각한 준은 강이 치료를 마치고 돌아간 뒤 눈을 감고 때마침 들려오는 성당의 종소리를 오랫동안 듣는다.
이 작품은 진실과 양심을 억압하는 권력의 횡포와, 그런 비인간적인 압력으로 핍박받는 인간상을 통하여 당대 사회의 부조리와 위선적 허구성을 폭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당대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삶 자체의 보편적 의미망까지 연결시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하겠다.
부언하자면 작가는 사회를 지키는 파수병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깨어 있는 시각을 견지해야 한다는 의미와 같은 것이다. ‘탄광 속의 카나리아’나 ‘잠수함 속의 토끼’와 같은 역할, 그것이 작가의 시선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작품의 의미는 이러한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