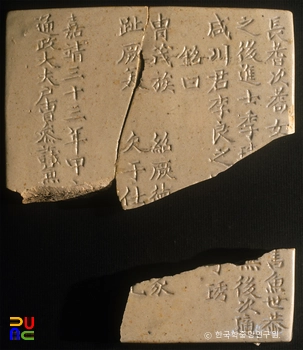푼주
음식을 담는 식소라(食所羅)와 그 형태가 비슷하다. 제조과정은 도토(陶土)·장석(長石)·규석(硅石)·백토(白土)를 원료로 하여 섭씨 600∼900°의 고온에서 초벌구이를 한 다음 유약(釉藥)을 발라 섭씨 1100∼1450°의 고온에서 다시 구워 만든다.
이 때 바르는 유약은 연단(鉛丹)과 석영(石英)을 3:1의 비율로 섞은 것으로, 이러한 인공유약이 식기에 쓰여지기 시작한 것은 8세기를 전후한 통일신라시대이다.
그러나 이 때의 유약은 주로 질그릇의 표면에 쓰여졌고, 본격적으로 사기에 유약이 쓰여진 것은 고려시대이다. 따라서 푼주는 그 유명한 고려청자가 절정을 이룬 13세기 초엽에나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푼주는 그 형태상 아구리가 넓고 바닥이 좁아 물건을 으깨어서 조금만 기울이면 흘러내리게 되어 있다. 따라서 떡류를 만들어 기름을 빼는 데 이용되어 왔다.
또한 약식이나 떡을 담는 데도 쓰였다. 질그릇이나 오지그릇이 서민들의 식기였다면, 이 푼주는 궁중을 비롯한 양반가의 식기로 쓰여왔다. 푼주가 궁중의 식기였음은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일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숙종 때의 일이다. 왕이 밤에 미행으로 남산골을 순시할 때 어디선가 글 읽는 소리가 나기에 쫓아가 방안을 엿보니, 젊은 선비는 글을 읽고, 새댁은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얼마 후 남편이 출출하다고 하자 새댁은 주발뚜껑에 담긴 송편 두 개를 내놓으며 드시라고 권했다. 선비는 반가운 듯 얼른 한 개를 집어 먹더니 나머지 한 개를 들어 새댁의 입에 넣어 주는데, 서로 사양해 마지 않으며 즐기는 것이었다. 왕은 인간의 삶과 부부의 애정에 대한 오붓한 재미에 감동하여 흐뭇한 마음으로 궁으로 돌아왔다.
이튿날 왕은 그 생각을 못 잊어 송편이 먹고 싶다고 왕비에게 전갈하라고 했다. 그러나 잠시 후 큰 수라상과 함께 커다란 푼주에 송편이 높다랗게 괴어져 나왔다.
이를 본 왕은 전날밤의 환상이 한순간에 깨져버리고 울컥 화가 치밀어, “송편 한 푼주를 먹으라니 내가 돼지냐!” 하며 송편이 든 푼주를 내동댕이쳤다. 그래서 ‘푼주의 송편맛이 주발뚜껑의 송편 맛만 못하다.’는 말이 생겨났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