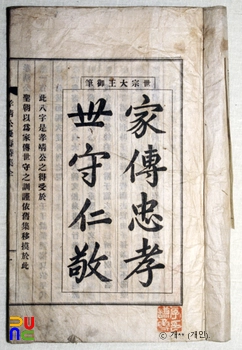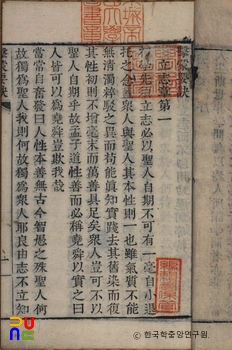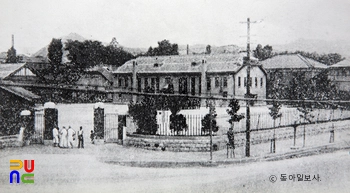학교절목 ()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요건에 관하여 기존의 조항을 보완하고 강조사항을 명시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의 4학(四學)과 지방의 선비를 모두 조사하여 이름과 나이를 기록하고 신입자는 첨가 기록한다. 신입생에게는 『소학』을 강(講)하여 그 성적이 조(粗) 이상을 받은 자에게 입학을 허가한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에게는 생원 · 진사 시험에 응하지 못하게 한다.
서울과 지방의 선비가 35세 이하인 자는 모두 『소학』을 읽어야 한다. 서울에서는 각 학관이 매달 초순에 유생을 모아 『소학』을 통독시켜야 하며, 서울에 있으면서 여러 달 불참한 자는 제적한다. 각 관은 자기 경내에서 독서에 문리(文理)가 있는 자를 가려 한 읍의 선비를 가르치게 한다.
수령은 때때로 고강(考講:講經을 考試하는 일)하고 그 고강한 바를 기록하여 태학(太學)과 본관(本館)에 보관한다. 지방에서는 봄과 가을에 고강한다. 도회관(都會官)을 정하고 3명의 시관(試官)을 보내어 고강하고, 강한 바를 기록하여 도회관과 본도(本道)에 보관한다.
과거가 있는 해[式年]마다 3년간 강한 바를 통하여 성적을 계산하고, 매학(每學)과 각 도에 정원을 정하여 감시(監試)를 준다. 초시(初試)에 3년을 계속 통과하지 못한 자는 제명한다.
관관(館官)은 매일 재관(在館:성균관에 거처하고 있는) 유생들과 더불어 『근사록』을 비롯, 사서오경 등을 통독하되 여러 번 반복하여 익히게 하고, 늘 권장하여 재관자로서 읽지 않은 자가 없도록 한다.
한편 계삭(季朔)마다 강한 바의 고하를 고사(考査 : 자세히 생각하고 조사함)하여 기록해두고, 연말에 그 점수를 통계하여 인원을 정하여 보고하여 초시급제를 주며, 희망에 따라 복시(覆試:초시에 합격한 사람이 다시 보는 과거)에 응할 자격을 준다. 초시에 합격한 자가 급제하지 못하였더라도 이조에 옮겨 초사(初仕:첫 벼슬길에 오르는 것)의 망(望:벼슬길에 천거하는 것)에 붙인다.
이 절목의 교육사적 의의는 당시 괴리현상을 보이던 학교제도와 과거제도를 상호연계시키고자 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유능한 인재의 선발을 학교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꾀하고자 한 것이 그 의도인 것이다.
또한, 『소학』의 교육을 사풍진작(士風振作:선비의 기풍 북돋움) 및 향촌교화의 요체로 파악하였던 당시 사림세력의 학문적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