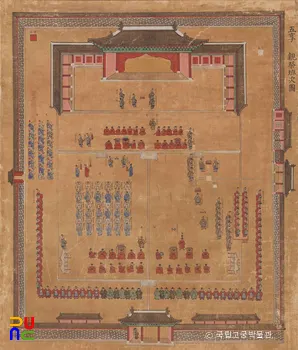집녕 ()
<집녕>은 회례용으로 만든 『세종실록』 《보태평지무악(保太平之舞樂》의 다섯 번째 곡 <보예(保乂)〉의 선율을 제1행부터 8행까지 발췌하고, 가사를 축소, 수정하여 1493년(세조 9)에 종묘제례악으로 채택한 음악과 일무이다. 『세조실록』에 수록되어 있는 종묘제례악 <집녕>은 16정간 1행, 8행 1곡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덟 박이 한 곡을 이루고 있으나[八拍一聲], 현재는 정간수, 행수, 박수 등이 변화되어 전승되고 있다. <집녕>은 중종(재위: 1506~1544) 때까지 연례용으로도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전승이 단절되었다. 정재 < 정명>에 관한 기록은 『악학궤범』에 전하고, 일무 <집녕>은 『시용무보』에 전한다.
<집녕>은 종묘제례의 주1 절차에 연주하는 《보태평》의 다섯 번째 곡이며, 악장은 《용비어천가》 제24장의 환조(桓祖, 주2가 쌍성을 회복한 내용과 관련이 있다. <집녕>이라는 악곡 명은 악장 중 ‘성환집녕(聖桓輯寧)’에서 따온 것이다. 『세조실록』의 <집녕>은 16정간 1행, 8행(총 128정간) 1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악전집 18집 『종묘제례악』(국립국악원, 2006)에는 20정간 1행, 4행(총 69정간) 1곡으로 변화되었다. 악조는 황(黃:C4) · 태(太:D4) · 중(仲:F4) · 임(林:G4) · 남(南:A4)의 황종 평조이고, 네 글자마다 박을 한 번 친다[四字一拍]. 현행 종묘제례악의 장구점은 『세조실록』 악보의 장구점을 현행 리듬에 적용한 것인데, 국악전집 제18집 『종묘제례악』에 수록된 집녕의 장구점은 『세조실록』 악보에 비해 장고점 고(鼓)와 편(鞭)이 각각 한 번씩 사라진 변화가 있다. 『세조실록』의 장구는 고고편쌍 고편고편쌍 고쌍고편쌍 고편편고쌍(1행 단위)을 두 번 반복한다.
알무악 <집녕>은 약과 적을 들고 추고, 일무 술어는 다음과 같다.
합흉(合胸) 하수우(下垂右) 외거우(外擧右) 거견우(擧肩右) 수복우(垂腹右) 환거우(還擧右) 외휘우(外揮右) 하수우(下垂右) 점유좌(點乳左) 하수좌(下垂左) 외거좌(外擧左) 거견좌(擧肩左) 수복좌(垂腹左) 환거좌(還擧左) 외휘좌(外揮左) 하수좌(下垂左) 양수거(兩手據) 견좌(肩左) 인흉(引胷) 양수하수좌(兩手下垂左) 양수환거좌(兩手還擧左) 인흉(引胷) 양수하수좌(兩手下垂左) 복파(腹把) 거견(擧肩) 절견(折肩) 하견(荷肩) 추전(推前) 추후(推後) 추전(推前) 견파(肩把) 합흉(합흉)
(출처: 장사훈, 『국악논고』(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집녕>은 환조가 쌍성을 토벌, 주3 백성들이 돌아왔다는 내용이다.
쌍성단만(雙城澶漫) 쌍성이 멀고머니,
왈유천부(曰維天府) 모두들 하늘나라[天府]라 하도다.
이지부직(吏之不職) 관리가 직분을 지키지 않아,
민미안도(民未按堵) 백성들이 편안하지 못하였도다.
성환집녕(聖桓輯寧) 성스러운 환조께서 편안케 하시니,
유리졸복(遊離卒復)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 마침내 돌아오도다.
총명시하(寵命是荷) 〈하늘의〉 총애하는 명을 받으셨으니,
봉건궐복(封建厥福) 봉해 받아 그 복을 세우셨도다.
(출처: 이세필 편저, 윤호진 역주, 『역주악원고사』, 국립국악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