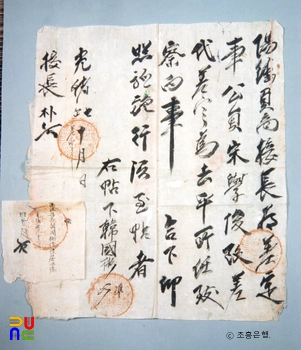가속둔전법 ()
조선시대에 농지의 소유를 둘러싼 소송이 계류되면 대개 땅을 빼앗긴 사람이 원고로 되는데, 피고가 소송을 지연시키면서 계속 농지를 경작하므로 원고는 원통하고 억울하나 판결이 날 때까지 그 농지가 원고의 것인지 혹은 피고의 것인지 미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원고에게 경작하게 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타당한 방법을 강구한 나머지 15세기 말인 성종 초에, 계쟁 농지를 춘분이 되면 판결로 소유자가 결정될 때까지 둔전(屯田 : 군량이나 관청 경비를 위해 경작하는 땅)으로 귀속시켜서 군수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자 원한이 있거나 못마땅하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보복하기 위하여 문기의 위조·변조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해 소송을 제기하고 기술적으로 소송을 지연시켜 계쟁 농지를 둔전으로 귀속, 원고가 농지를 경작할 수 없게 만드는 폐단이 생겼다.
즉,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도리어 더욱 곤경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리하여 1479년(성종 10)에 이 법의 당부를 검토했는데 다수 의견이 이 법을 폐지하고 억울한 원고가 이를 경작하도록 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결국 이 법은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농지가 없는 빈민을 돕자는 의견이 채택되었다.
즉, 소송이 미결인 동안에 춘분이 되면 농지를 둔전으로 귀속시키고 수령은 관찰사에게, 관찰사는 호조에 보고하게 하여 호조에서 둔전 귀속의 당부를 심사하였다.
이에 만약 부당하게 된 것이면 수령을 문책하고 일단 귀속된 농지는 빈민에게 병작(倂作)의 형식으로 빌려주어 수확의 절반은 경작자가 차지하고 절반은 군자(軍資)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은 강한 이를 억누르고 약한 이를 도울 목적으로 하는 특이한 입법이었는데, 성종 대가 지난 뒤에 흐지부지되고 말았으며 언제 폐지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