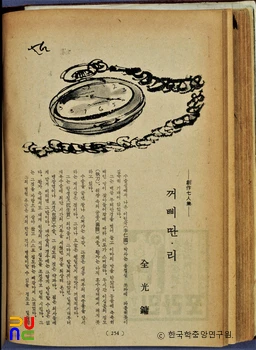꺼삐딴 리
1962년 『사상계(思想界)』 7월호에 발표되었고, 같은 해에 제7회 동인문학상(東仁文學賞)을 수상하였다. 심리주의적 경향을 보인 대표작 「사수(射手)」나 토속적 정서를 그린 「흑산도(黑山島)」 등의 작품과는 달리, 특히 사회적 존재로서의 한 개인의 이기적 · 속물적 근성의 일부를 표현한 소설이다.
주인공 이인국(李仁國)은 의사로서 친일 · 친소 · 친미로 이어지는 변절의 과정에서 도덕적 기준이나 인간적 신념에 관계없이 자신을 잘 적응시켜나가는 전형적인 소시민 의식의 소유자로 그려져 있다. 일제강점기에 잠꼬대까지 일본말로 한 덕분에 ‘국어상용가(國語常用家)’라는 액자까지 달았던 그는, 독립운동가의 입원을 거절할 정도로 주위의 정세 변화에 민감하다.
이인국은 “식민지백성이 별 수 있었어? 날구 뛴들 소용이 있었느냐 말이야. 어느 놈은 일본놈한테 아첨을 안 했어?”라고 변명하였고, 현재는 미국에 유학중인 딸이 미국인과의 결혼을 요구하여오자 아예 아들까지 미국에 유학 보낼 궁리로 들뜨기도 한다. 일제강점기에는 내선일체(內鮮一體)에 앞장서고, 다시 모스크바 유학에 열을 올린다. 이제는 미국 유학에 조바심을 치는 식민지 근성의 한 표본적인 인물인 이인국은 일요일이면 비무장지대에 가서 사냥을 즐기며 물질적 풍요를 누린다.
“흥 그 사마귀 같은 일본놈들 틈에서 살았고 닥싸귀 같은 로스케 속에서도 살아났는데 양키라고 다를까…… 혁명이 일겠으면 일구, 나라가 바뀌겠으면 바뀌구. 아직 이인국이 살 구멍은 막히지 않았다. 나보다 얼마든지 날뛰던 놈들도 있는데, 나쯤이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치는 이인국의 다짐 속에서 작중인물의 왜곡된 현실 인식의 한 단면을 보게 되며, 이는 곧 당시의 사회 구석구석에 가득 차 있던 소시민 내지 식민 근성의 단적인 표현이 되고 있다.
이 작품은 현대 자본주의사회가 안고 있는, 이기적 욕망에 의하여 개인의 행위가 세속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인 것이다. 한편으로는 급변하는 사회변동에 대응하여 가는 주체성을 상실하여버린 근대 우리나라 지식인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담고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