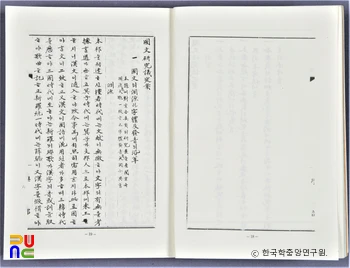단어 ()
단어는 문법 단위 중 매우 일반화된 기본단위이면서도 그 정의는 쉽지 않으며, 아직까지 그 완벽한 정의가 나와 있지 않다. 의미에 기준을 두고 ‘단일한 의미를 가지는 음의 결합체’라 하여 의미를 기준으로 삼은 단위를 단어라고 하는 정의가 한때 통용되었다.
그러나 ‘야생화’와 ‘들에 피는 꽃’의 비교에서 ‘야생화’는 단일한 의미를 가지므로 단어이고, ‘들에 피는 꽃’은 그렇지 못하므로 단어가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미만을 기준으로 단어를 정의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이러한 불충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복합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단어를 정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일차적으로 단어는 ‘최소의 자립형식(minimal free form)’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최소의 자립형식’이란 의미를 유지하는 가장 작은 단위로서 자립해서 쓰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앞의 ‘야생화’는 최소의 자립형식이므로 단어로 볼 수 있으며, ‘들에 피는 꽃’은 의미적으로는 완결된 자립적 단위이지만, 더 작은 자립형식인 ‘들, 피는, 꽃’으로 쪼갤 수 있으므로 단어가 될 수 없다.
또한, ‘먹는다’에서는 ‘먹-’만으로서는 자립형식일 수 없으므로 단어일 수 없고, ‘-는다’ 역시 자립형식이 아니므로 각각 단어일 수가 없다. 이들이 결합된 ‘먹는다’가 자립성을 갖는 하나의 단어가 된다.
이 정의에 따르면, 국어의 명사, 부사는 하나의 자립형태소로서 단어를 이룰 수 있지만, 동사나 형용사는 반드시 어간과 어미가 결합되어야만 단어가 된다. 그런데 하나의 단어로 보는 ‘눈물, 벼락공부, 손목’ 등은 ‘눈’과 ‘물’, ‘벼락’과 ‘공부’, ‘손’과 ‘목’과 같이 더 작은 자립형식으로 분리될 수 있다. 이들 단어는 그 자체로 최소의 자립형식이 아니라, 두 개의 최소 자립형식이 결합된 구조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최소의 자립형식이라는 정의로는 모든 단어를 포괄할 수 없고, 부분적으로만 충족될 따름이다.
단어 정의에 있어서 이러한 불충분한 점을 보완해 주는 것이 휴지(休止, pause)와 분리성(分離性, isolability)의 기준이다. 즉, 단어는 그 내부에 휴지나 분리성이 없다는 것이다. 단어에 분리성이 없다는 말은 단어 내부에 다른 단어를 끼워 넣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나는’에서 ‘나’와 ‘는’ 사이에 ‘만’을 끼워 넣어 ‘나만은’과 같이 대명사 ‘나’와 조사 ‘는’을 분리할 수 있다.
단어는 그 내부에 휴지(休止)를 둘 수 없으나, 그 앞과 뒤에는 휴지를 두는 언어 단위이다. 단어 내부에는 폐쇄 연접(閉鎖連接, close juncture)이 오지만, 단어와 단어 사이에는 개방 연접(開放連接, open juncture)이 온다. ‘먹는다’ 앞과 뒤에는 휴지를 둘 수 있다. 즉, ‘먹는다’의 전후에는 개방 연접이 온다. 그런데, ‘먹-’과 ‘-는-’ 사이나, ‘-는-’과 ‘-다’ 사이에는 휴지를 둘 수 없다. 즉, 그것들 사이에는 폐쇄 연접이 온다. 이와 같이 단어의 내부에는 휴지를 둘 수 없지만, 단어의 앞과 뒤에는 휴지를 둘 수 있는 것이다.
대체로 단어 내부에 휴지가 없으면, 분리성 또한 없다. ‘작은아버지(아버지의 동생)’는 ‘작은’과 ‘아버지’ 사이에 휴지가 없고, 분리성 또한 없으므로 이는 하나의 단어가 된다. 만약 ‘작은’과 ‘아버지’ 사이에 휴지를 둔다면 ‘작은 # 아버지’가 될 것이고, 분리성을 둔다면 ‘(키가) 작은 나의 아버지’가 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는 아버지의 동생이라는 뜻의 한 단어가 아니라 구(句)가 될 것이다. 또한 단어 내부에 분리성이 없다는 것은 둘 이상의 자립형식이 하나의 단어를 이룰 경우에도 두 성분 사이에 다른 성분 요소가 끼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정의를 요약하면 단어는 최소의 자립형식이되, 그 내부에 휴지나 분리성을 갖지 않는 문법 단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로도 모든 단어를 엄격하게 판별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또한 현실이다.
예를 들면 ‘것, 바, 줄, 수’ 등 한국어의 많은 의존명사들은 그것이 최소 자립형식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분리성 기준 역시 정확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가령, ‘그가 가는 줄 알았다’의 ‘줄’은 다른 성분의 수식을 받지 않고는 문장에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자립형식이라고 할 수 없다. ‘가는’과 ‘줄’ 사이에 다른 요소가 끼어들기도 어려워서 두 성분 사이에 분리성이 있다고 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가는 줄’이 하나의 단어라고 할 수는 없다. ‘가는 방법, 가는 기차’ 등과 같은 표현을 하나의 단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와 같다. 이들 의존명사가 비록 자립성이 없고 분리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단어와 동일한 통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의존명사는 수식하는 앞 성분과의 사이에 분리성은 인정하기 어려워도 어느 정도 휴지는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의존명사는 선행하는 수식 성분과의 사이에 휴지를 가진 준자립형식(準自立形式)으로 보아 단어로 인정할 수 있다.
조사(助詞)의 경우도 앞에서의 단어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학교가, 학교를’에서 ‘학교’는 최소 자립형식이므로 단어 정의에 부합하지만, ‘가, 를’은 각각 최소 자립형식이 아니고 또한 앞의 명사와 쉽게 분리되거나 휴지를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 물론 조사가 분리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학교만이, 학교만을’ 등에서 보듯이 특수조사 ‘만’이 체언과 격조사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부분적인 분리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사는 ‘누가 가느냐가 문제이다’에서와 같이 문장을 지배하기도 한다고 볼 수 있고, 때로는 생략도 가능하다. 또 동사나 형용사에서 어미를 분리하면 어간도 자립성을 잃지만, 명사는 조사를 떼어내도 자립성이 있으므로 조사는 어미보다 단어에 가까운 성질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곧, 조사는 최소의 자립형식이나 휴지라는 단어 정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부분적인 분리성을 인정한다면 조사는 단어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어가 문장 성분의 한 단위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나, 통사론적 측면에서 어떤 구성의 핵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 단어 자격에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단어는 어떻든 형태소보다 더 작은 단위는 아니다. ‘별’이나 ‘허리’, 또는 ‘어느’, ‘벌써’처럼 형태소 하나가 단독으로 단어가 되는 수도 있지만, 많은 단어는 ‘춥다, 웃는다, 잠보, 덮개, 맏형, 새빨갛다, 손목, 눈물, 작은아버지’처럼 형태소 몇 개가 모여 이루지기 때문이다. 또 단어이면서 형태소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단어란 없기 때문이다.
단어는 그 조어 방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즉, 단어의 어기부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것이 하나의 형태소로 구성되었으면 단일어(單一語),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되었으면 복합어(複合語)라고 한다. 복합어는 다시 어떤 유형의 형태소로 구성되었느냐에 따라 합성어와 파생어로 분류한다. 합성어(合成語)는 어기가 실질 형태소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말하고 파생어(派生語)는 어기에 파생 접사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단어를 말한다.
굴절하는 형태의 특성에 근거하여 가변어(可變語)와 불변어로 나누고, 그 어원에 따라 고유어·외래어·혼종어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의미관계에 따라 단의어·다의어· 동음이의어·이음동의어·반의어·상위어·하위어 등으로 나눈다.
단어는 형태소보다 더 큰 단위이기도 하지만, 더 기본적인 언어 단위이기도 하다. 우리가 태어나서 말을 배울 때 단어를 배우는 일부터 시작한다. 그것도 처음에는 ‘맘마’, ‘쉬’ 등 한 단어씩 말하다가 다음 단계로 ‘밥 줘, 눈 와’처럼 두 단어를 이어 말하며 이른바 ‘한 단어 단계’(one-word stage)에서 ‘두 단어 단계’(two-word stage)로 발전하는 과정을 밟는다. 여기에서 단어가 얼마나 기본적인 단위인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새 개념이 생겨 새로 말을 만들 때나 외래어를 받아들일 때도 단어 단위로 만들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도 단어의 그러한 성격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 국어사전이란 달리 말하면 단어집이라는 사실에서 이 점을 더욱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