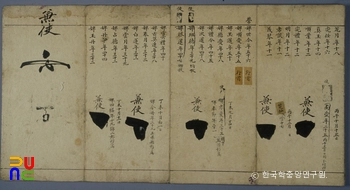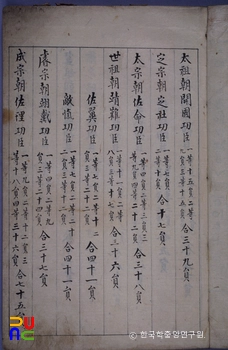성상소 ()
양사(兩司)에 관련된 공무를 전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양사성상소라고도 불렸다. 설치 연대는 정확하지 않으나 경복궁 내에만 설치되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1394년(태조 3) 이후에 설행된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 초기에는 기록상으로 거의 나타나지 않고 중종대에 오면 특히 활발한 것으로 보아 대관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시기와 병행해 임무가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1507년(중종 2)에는 승정원의 승지를 통해 전계(傳啓)된 사실이 양사에 잘못 전달된 사례로 성상소의 관원이 체직의 명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1519년 대간성상소에 친히 왕이 와서 직무를 보고 받고 또한 하교를 직접 내리기도 했으며, 밖에 있는 여러 대간들은 바로 이 성상소에서 공사의 출납에 대해 연명(聯名)하였다. 이 성상소에 대간의 공사가 하달되기 때문에 대간의 관원들도 매일 이곳을 들르는 것이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성상소의 책임 관원은 업무가 막중하였다.
이곳의 책임 관원은 양사에서 각각 1인씩 2인이 당직을 하면서 왕명을 받은 색승지(色承旨)가 주서(注書)를 통해 전달한 공사를 접수받아 대간들에게 알리는 임무를 맡았다. 한편 양사초계(兩司草啓)도 성상소의 한 담당관이 궐에 나아가 진계했는데 심야에 궐문을 닫아도 진계자(進啓者)는 성상에서 비답을 기다릴 때가 많았다.
이러한 일로 성상소의 담당 관원은 유문(留門 : 궐문을 닫을 시간을 넘겨서도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것)하는 사례가 가끔 있었다. 이와 같이 유문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자 중종은 유문의 남용을 막기 위해 한 때 성상소에 그 책임을 물어 자주 유문한 관원의 체직을 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간들은 오히려 성상소에 전계되는 일의 중요성의 완급에 따라 일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유문의 사례가 잘못이 아님을 강력히 주장하기도 하였다.
성상소는 1592년(선조 25)에 불타 버린 경복궁과 함께 그 운명을 같이한 것으로 여겨진다. 임진왜란 후 창덕궁에서의 국무가 시작됨에 따라 성상소 대신에 조방(朝房)이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성상소는 대간으로 하여금 성상의 뜻에 맞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은 자못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