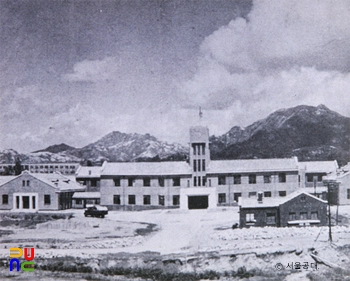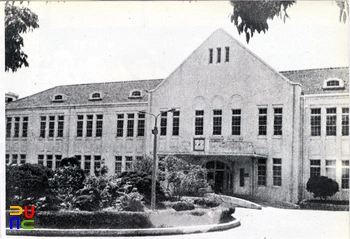재 ()
주로 성균관(成均館)·사학(四學)·향교(鄕校)·서원(書院)·정사(精舍) 등의 주요 건물 중 하나로 소속되어 있다. 고려 숙종 말에서 예종대에 걸쳐 국자감 학생들의 교육성과에 따라 상급 재사(齋舍)로 승보(陞補)시켜 관직에 반영시킨 삼사재(三舍齋)가 운영되었다.
또한 예종 때 국자감을 국학(國學)으로 개편하면서 칠재(七齋)를 설치, 강좌 내용에 따라 ≪주역≫을 공부하는 곳을 이택재(麗擇齋), ≪서경≫을 공부하는 곳을 대빙재(待聘齋), ≪모시 毛詩≫를 공부하는 곳을 경덕재(經德齋), 주례(周禮)를 공부하는 곳을 구인재(求仁齋), 대례(戴禮)를 공부하는 곳을 복응재(服膺齋), ≪춘추 春秋≫를 공부하는 곳을 양정재(養正齋), 무학(武學)을 공부하는 곳을 강예재(講藝齋)라 하였다.
조선시대에 오면서 성균관·사학·향교·서원에 딸린 기숙사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당시 이러한 학교 건물의 배치는 강당인 명륜당을 중심으로 앞쪽 좌우에 동재(東齋)와 서재(西齋)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학생들이 이 재에 들어와 공부하는 것을 거재(居齋)라 하였으며, 이들 학생을 거재생·거재유생(居齋儒生)·재유(齋儒) 등으로 일컬었다.
특히 성균관의 경우는 상재(上齋)·하재(下齋)의 구분이 있어 상재에는 생원·진사들이 거처하고 하재에는 경향 각지에서 뽑혀 온 유학(幼學)들이 거처하였다. 이들 기숙 학생수는 1429년(세종 11)에 200명 정원으로 책정되었다. 이 중 사학에서 진학한 자는 승보기재(陞補寄齋), 공신 자손으로서 특별 입학한 자는 문음기재(門蔭寄齋), 국가가 지급하는 급식을 받지 못하고 식량을 가지고 와서 기숙하는 자는 사량기재(私粮寄齋)라 하였다.
향교와 서원에서는 정규 학생인 내사생(內舍生)과 청강생 격인 외사생(外舍生)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또한 향교의 적폐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서재유생들이 앞장섰다는 <서재거폐기 西齋祛弊記>를 보면 서재유생이 동재유생보다 상급생이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