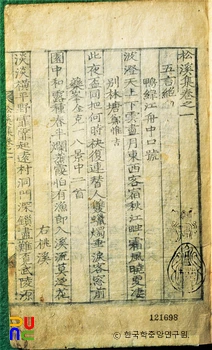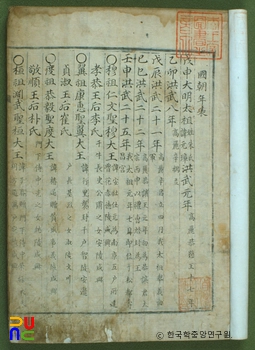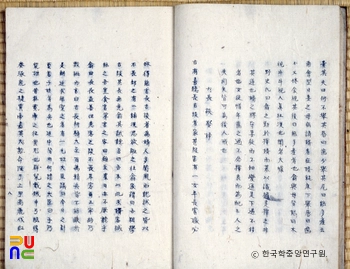풍유설화 ()
표면적으로는 인물과 행위와 배경 등 통상적인 이야기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 동시에, 그 배후에 정신적 · 도덕적 ·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는, 이중적 구조를 가진 이야기 형식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심상의 전개와 함께 추상적 의미의 층이 그 배후에 동반되므로, 풍유담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표면적 의미와 병행되는 숨은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 대체적으로 표면적 이야기의 차원(스토리)이 청자(聽者)에게 즐거움을 제공한다면, 내면적 풍유의 차원(의미)은 도덕적 교훈을 주게 된다.
풍유담의 종류는 현실풍유담과 관념풍유담의 두 가지가 있는데, 현실풍유담이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풍유한다면, 관념풍유담은 덕 · 악덕 · 심성(心性) · 성격 유형 따위의 추상물을 의인화한다. 따라서, 역사와 관련된 주1들은 현실풍유담에 속할 것이며, 『삼국사기』 권46 열전6 설총조에 보이는 「화왕설화(花王說話)」와 같은 것은 관념풍유담에 속할 것이다. 그 밖에 설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서사적 문학 형식에 속하는 고전소설에도 풍유담이 종종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령 숙종이 계비 인현왕후(仁顯王后)를 폐출하고 장희빈(張禧嬪)을 왕비로 맞아들인 데 대한 성심(聖心)을 깨우치기 위하여 김만중(金萬重)이 지었다는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는 넓은 의미의 현실풍유담에 속할 것이요, 심성을 의인화하였다는 이른바 ' 천군계(天君系) 소설'들( 「수성지」, 「천군연의」, 「천군본기」)은 관념풍유담에 속할 것이다.
그리고 관념적 풍유담은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이므로, 일반적으로 관념 그대로를 작중인물의 이름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고려 때의 가전 작품으로 ‘술’을 의인화하고 있는 「국순전(麴醇傳)」에는 국씨(麴氏 : 누룩) · 모(牟 : 보리) · 주(酎 : 술) · 순(醇 : 술) · 청(淸)이 작중인물로 되어 있다.
풍유담은 이야기 전체가 풍유적인 것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이야기 속의 한 부분만이 풍유로서 된 것도 있는데, 이러한 것은 삽화적 풍유담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화(寓話) · 비유담(比喩譚) · 종교적 강담(宗敎的講談)들은 모두 풍유담의 특별한 형태로 넓은 의미에서의 풍유담 속에 포괄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