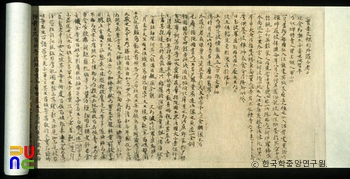탄항 관문 ( )
발해가 무왕대에 팽창을 지속하자 신라는 성덕왕대에 그에 대비하고자 국경지대에 장성을 축조하였다. 이후 경덕왕대에 이르러 이곳에 관문을 설치함으로써 적대적 관계로 일관하던 양국이 교류 관계로 전환됐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관문은 국경이나 요충지에 설치되는 군사방어시설이다. 그런 의미에서 탄항관문 역시 '탄항'이라는 지리적 요충지에 설치되어 이름붙은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원산 지역은 강원도 동해안로와 철원을 통과하는 내륙으로 갈라지는 분기점이므로 이 지역이 국경에 더하여 교류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는 성덕왕 20년(721)에 "하슬라 지역의 장정 2천명을 징발하여 북쪽 국경에 장성을 쌓았다"고 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강원도 고성군에도 "신라 성덕왕 3년에 하슬라도 장정들을 징발하여 북계에 장성을 쌓았다"고 되어 있다. 두 기록에 약간의 시간 차이는 성덕왕대라는 공통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장성 축조는 사실로 보인다.
장성의 축조는 당시 발해의 팽창에 대비한 것으로 경덕왕대 관문을 설치함으로써 양국간 군사적 대치관계에서 평화적 교류의 움직임도 있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발해의 5개 주요 교통로 가운데 '신라도(新羅道)'가 남경남해부에서 신라의 정천군까지 39개역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원성왕 6년(791)에 일길찬 백어, 헌덕왕 4년(812)에 급찬 숭정이 사신으로 파견되었다는 기록이 있어 이들이 이를 통해 왕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 유적이 발굴되거나 확인된 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