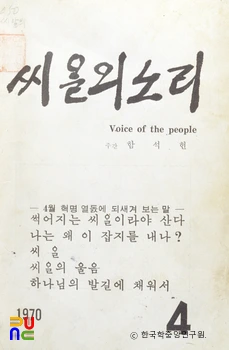신문사 ()
신문지를 사용하여 정기적·공식적·공개적으로 정보와 지식, 의견과 사상을 수집, 표현하여 사회적으로 전달하는 조직체를 말하는데, 현대사회에 와서는 언론활동의 주도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다.
현대의 신문사는 언론 행위의 물리적 대량화와 사회적 대중화를 위하여 굳건한 경제적 토대와 운영기구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메시지의 전달량과 유통 범위를 늘리기 위하여 고도의 기계장치가 도입될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매개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체가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광의의 신문사 조직은 언론 취재와 집필 및 지면 구성을 담당하는 편집 부문과 메시지의 증폭을 기술적으로 전담하는 공무 부문, 그리고 내외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영 부문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3대 부문은 기능적 분화를 바탕으로 각 부문간의 계약에 의해 분업이나 협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협의의 신문사는 편집 부문과 관리 부문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하다.
신문사의 소유형태와 통제양식은 경제체제에 따라 크게 다르고 정치적 정책 결정이나 법제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다. 즉, 신문사의 성격은 국영 또는 공영을 통한 비영리사업체일 수도 있고, 상업 이윤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사업체일 수도 있으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형태의 변이(變異)가 있을 수 있다.
신문사의 내부 편제는 그 기능에 따라 대체로 편집·공무·광고·판매·관리의 5대 하위체계로 구성된다.
편집 부문은 정신적 창작업무를 맡아 정보와 의견을 수집, 가공하여 신문제품을 차별화하며, 궁극적으로 독자관계의 특수형태를 설정하는 등 평생에 걸친 전문적 수련을 필요로 하는 고도의 지능적·전문가적 성원의 집합체가 되고, 그 중핵은 기자들이다. 이들은 기사의 취재와 작성, 작성된 기사의 취사 선택, 지면 구성과 협의의 편집업무 등을 담당한다.
공무 부문은 신문의 물리적 생산을 담당하며 인쇄 공정 일체를 책임진다. 역사적으로 신문사의 제품생산은 화폐의 중계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부문에 대한 통제가 우회적으로 신문기자의 양심적 자유를 통제하는 데 이용되어 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부문은 인쇄산업의 대형화와 고도기술화에 의해 신문사로부터 분화되어 별도의 사업체가 될 수도 있다.
광고 부문과 판매 부문은 신문사의 수입원으로서 자금 조달의 창구가 된다. 광고는 신문지면의 주요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지면판매 영업과 광고지면 구성을 맡은 광고 부문의 자금조달은 과거보다 현대에 이를수록 점점 중요한 의미를 띠어 가고 있다. 그러나 광고시장의 규모와 광고발주시장의 수요 및 기능의 전문화에 따라 최근에는 광고대리점업이 성업 중이어서 이 부문 역할 중 상당량이 분화되고 있다.
한편, 판매 부문은 지적·정신적 창작품을 독자에게 유통시키는 광범한 배포망을 맡고 판매로의 확충, 수금 방법의 개선 및 수금률의 향상을 통해 신문사의 재정적 기반을 다진다.
신문 판매는 점두(店頭) 판매방식과 배달 판매방식이 있고, 배달 판매방식도 위탁 배달과 직접 배달로 나눌 수 있다. 판매방식별 부수의 할당은 주로 판매 부문의 의사결정에 의한다. 직접 배달의 보조 경로로는 보급소 또는 지사·지국 등이 있으며, 이들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주재기자·주재통신원의 역할도 했기 때문에 판매 부수를 늘리기 위해, 또는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신문사의 배달 통로를 이용하여 주민들의 빈축을 사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사는 조선시대 정부기관인 통리기무아문 박문국(博文局)이라고 할 수 있다. 박문국은 최초의 근대 신문인 『한성순보(漢城旬報)』와 『한성주보(漢城周報)』의 제작 및 배포와 그 관리를 담당하였다. 통리기무아문은 1882년(고종 19) 청나라의 제도를 모방하여 만든 일종의 내각형태 통치기구였는데, 그 산하 부속기관으로 박영효(朴泳孝)의 건의에 따라 인쇄 출판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박문국을 설치하였다.
박문국에는 당상관으로 민영목(閔泳穆)·김만식(金晩植), 고문으로 일본인 이노우에(井上角五郎)가 취임하여 1883년 10월 1일 『한성순보』를 발간하였다. 그러나 이 신문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사이긴 하나 종사자가 관원이고 정부기관의 하나였다는 점에서 현대식 개념으로 따지면 일종의 관영신문사이다.
박문국은 그 뒤 곧 폐지되었으나, 1885년 통리교섭통상아문의 건의에 의해 부활되었다. 당시의 기자는 주사(主事) 또는 사사(司事)라는 중급의 관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대표적 인물로 강위(姜瑋)와 오세창(吳世昌)을 들 수 있다.
이 기관은 신문의 정신적 창작작업인 취재·기사작성·편집은 물론, 인쇄 출판 등의 기능작업도 함께 맡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신문사라고 할 수 있다. 이 관영신문사는 『한성주보』의 발간을 위해 재건되었으나, 1888년 6월 6일 『한성주보』 폐간을 전후하여 문을 닫았다.
한편, 『독립신문(獨立新聞)』은 고종의 정치자금을 은밀하게 지원받은 독립협회의 기관지로, 신문사의 역할을 맡은 독립협회는 일종의 정부출자기관이었다. 순수 민간신문사는 배재학당 학생회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 학생회가 『협성회회보(協成會會報)』의 발행 주체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민간신문사는 ᄆᆡ일신문사이다. 『ᄆᆡ일신문』은 일간신문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협성회회보』가 발전적으로 폐간되면서 발간된 우리나라 최초의 일간신문일 뿐만 아니라 자본과 경영을 분리시키려는 주식회사의 원시적 형태인 고금제(股金制)로 조직된 신문사이다.
이 신문사의 자금도 그 일부는 최정식(崔正植) 등이 정부기관인 내부에서 지원받은 것이었으나 후일 알선자인 최정식이 알선 대가를 요구하면서 이승만(李承晩)·유영석(柳永錫)·양홍묵(梁弘默)과의 사이에 분규가 발생함으로써 경영 위기를 맞았다.
보다 완전한 형태의 고금제 신문사는 1898년 『경성신문(京城新聞)』(판권 윤치소·윤치호 등)을 인수하여 장지연(張志淵)·남궁억(南宮億)·나수연(羅壽淵)·유근(柳瑾) 등이 조직했던 황성신문사였다. 이 당시의 신문사들은 1899년 고종이 내부에 지시하여 제정한 「신문조례」의 시행에 반대하여 ‘신문사친목회’를 발족시켜 신문의 폐간·정간·언론인 구속 등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행할 수 없도록 저지하여 신문산업의 우월적 지위를 과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07년 이완용(李完用) 내각은 민족언론을 탄압하고 친일 어용언론기관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광무신문지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때부터 신문사는 신문발행 보증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따라서 신문사가 자본과 권력에 의존하게 된 역사는 상당한 뿌리가 있다고 하겠다.
일제의 국권 강탈 뒤 신문사의 기능은 정신적 창작업무인 취재·보도 부문, 기능적 반복작업인 인쇄·공무 부문, 상업 이윤의 유지·확대를 담당하는 영업 부문으로 급속도로 분화된다. 각 기능의 전문화와 분업화가 진전되면서부터 각 기능간에는 많은 갈등이 표출되었다. 특히 경영과 자본이 어느 정도 분리되면서 신문 자본의 주식회사 전환이 늘어갔다.
국권 강탈 직전 이장훈(李章薰)으로 하여금 『대한매일신보』를 인수하게 한 총독부는 국권 강탈 직후 신문의 제호를 『매일신보』로 바꾸고, 그 해 10월 발행인·편집인에 변일(卞一), 인쇄인에 이창(李蒼)을 내세워 『매일신보』를 기관지화했으며, 1913년에는 매일신보사를 경성일보사에 합병시키면서 일문판 신문인 『경성일보』의 자매지로 만들었다. 당시 경성일보사는 자본금 7만 원의 합자회사였다.
『조선일보』·『동아일보』 등 한국인이 발행하는 민간신문의 주식회사화가 늘어나면서, 매일신보사는 1938년 자본금 100만 원의 주식회사가 되어 경성일보사로부터 독립했으나, 주식의 45%는 여전히 경성일보사가 가지고 있었다. 그 밖에 총독부가 10∼20%, 식산은행이 10%, 윤치호(尹致昊)·최창학(崔昌學) 등 민간인 유지와 각 도가 나머지 주식 지분을 가졌다.
『매일신보』의 발행 부수는 국권 강탈 초기 약 3만 부에서 『동아일보』·『조선일보』가 폐간한 1940년대에 약 10만 부 정도였던 것으로 미루어 신문 보급률은 아주 낮은 셈이다. 이것은 일제하 한국인의 경제상태가 빈곤하여 신문이 생활필수품이라는 인식이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신문 구독료조차 마련할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일제하의 신문사 경영은 높은 이상을 음지에서 지원하려는 독지가나 외부의 원조 없이는 자립을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신문 운영의 위험 분산을 위한 주식회사제 채택이 비교적 순조로웠다. 즉, 전통적인 숭문사상과 신문 창작물이 결합하였고, 지주를 중심으로 한 민족자본이 일제의 탄압 속에서 각각의 책임을 스스로 분할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제하의 기자를 비롯한 편집진은 지식 노동자로서의 투철한 계급의식을 개발하지는 않았으나 실무상의 편의와 대일 적개심에 근거하여 몇몇 기자단체들을 만들었고, 이 단체를 중심으로 기자운동을 벌이고 편집권의 독립을 확보해 나갔다.
1920년대의 대표적인 기자단체인 무명회(無名會)·전위기자동맹·철필구락부 등은 1925년 서울천도교기념관에서 전국의 신문기자 약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언론 권익의 신장과 대중운동의 발전을 추구한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기자대회를 가졌다.
이에 『동아일보』는 신문기자의 고결한 인격이 시류에 편승한다는 비난을 퍼부었으나, 기자들이 직업적 연대감을 가지고 언론문화운동을 통한 식민지의 현상 타파와 언론환경의 변혁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다.
광복 이후 신문사의 회사화는 급속히 늘어났으나 일제 언론 유산의 완전한 청산이 없이 대부분의 언론인이 좌우 이데올로기로 갈라지고 신문사가 편가르기에 가담하게 되면서부터 신문사주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는 국면을 맞는다.
신문사주는 광복 이후 줄곧 동반자를 바꿔 가면서 권력과의 야합을 계속하며 앞장서 시류에 편승하여 각종 이권을 선취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고, 신문 메시지 창작에 종사하는 기자집단과의 알력은 점차 심화되어 급기야는 1975년 신문사주가 권력의 조종을 받아 폭력적인 방법으로 조선일보사와 동아일보사의 양심적인 기자들을 거리로 내몰아 대량 해고와 생존권 박탈을 서슴지 않았다.
이 사건 이후 신문사의 취재 부문 기자들은 길들여지거나 침잠되어 평범한 봉급생활자로 전락했으며, 1980년대 들어 신문사간의 경쟁체제를 완화하고 기존 언론기관들을 독과점화하는 이른바 ‘언론통폐합조치’를 통해 신문시장에 대한 높은 시장 진입 장벽을 쌓음으로써 신문사업에의 신규 참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신문사업체와 권력의 야합은 길지 않았으며, 권·언 복합체가 군·관·자 지배연합의 통치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지원하는 이데올로기적 도구라는 인식이 폭넓게 확산되면서 취재보도 부문에 대한 각성을 불러일으켰다. 오늘에 이르러 우리나라 신문사 내의 경영조직과 언론전문조직·인쇄공무조직은 각 조직의 개별성을 더욱 살리고 그 직업적 특수성에 입각하여 신문사와 독자 간의 보편적 이익을 찾아야 할 선진 미디어로의 기로에 처해 있다.
신문사가 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천은 정신적 창작물과 그 복제물로 메워진 신문지 자체이다. 신문지의 대부분은 취재·보도 부문에 의해 수행되고 신문사의 고객인 독자 쪽에서 볼 때 신문지의 사용 가치는 취재보도 및 해설기사가 광고 설득적 정보나 의견보다 앞선다.
취재보도조직은 주로 편집국을 중심으로 신문제작행위 일체를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이 조직의 수장은 편집인·주필·편집국장 등으로 불리며, 편집계획의 입안, 취재와 기사 작성 및 검토는 물론 순수한 공무작업을 제외한 조판과 인쇄의 모든 과정을 지휘, 감독한다. 지면의 배치 및 처리는 편집국 고유의 권한이다.
이 권한에 근거하여 정신적 근로자를 자처하는 기자들은 신문 제작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것을 주장하고 신문사주측에 이를 요구한다. 이 요구가 곧 편집방침결정권·개별기사취급결정권·광고취급결정권 등으로 구체화된다.
현재 우리나라 신문사의 편집방침은 현행 법규나 사시 등에 의해 미리 결정되기 때문에 특정 신문사에 입사하는 것이 이러한 편집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신문사주 측과 추상적 원칙선언에 대한 구체적 해석의 차이를 내세우는 기자들 간의 대립이 편집권의 독립 요구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특히 개별기사취급결정권의 경우, 이 권한이 신문사 내부의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에 따라 신문제품의 차별화를 엮어내기 때문에 신문사주와 기자들 간의 대립은 더욱 첨예화된다.
그러나 광고취급결정권은 기업체의 광고에 신문사 경영의 주요 부분을 의지하는 것이 시장경제사회의 언론매체가 갖는 공통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편집국과 광고국 간에는 이 권능을 둘러싸고 그리 심각한 갈등은 표출되지 않고 있다.
현재 신문을 발행하는 자는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간신문은 B4 1배판 4면 기준의 신문지를 시간당 2만 부 이상 인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윤전기와 조판시설 및 제판시설을 갖추도록 되었기 때문에 신문사의 설치에는 일정한 시설능력과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자본력이 필요하다.
1988년 5월, 전국민이 성금을 모아 1975년에 해직된 언론인의 주도로 창간된 『한겨레신문』은 이 신문사가 국민주라는 형태의 새로운 신문사 소유양식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갖지만, 이 신문의 발간을 가로막았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법정 인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명제 때문이었다.
이 점은 신문사의 정신적 창작업무를 제약하고 자유시장경제제도하에서 고속 윤전시설을 갖춘 대형 인쇄전문사업체의 출현을 막을 뿐만 아니라 계약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많다. 따라서 신문사는 지면 제작과 배포,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체로서 독립성을 유지할 때 언론활동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
신문사의 소유구조는 신문 존재 제일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공익성 추구 및 실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공익성은 공공성과 공정성을 반드시 수반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어 왔고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신문(언론)의 공익성 달성을 위해서는 아마도 그 소유구조가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데 의견 접근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신문사의 개방적 소유구조를 위해 신문사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노력과 시도가 최선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사실이다. 개방적 소유구조는 경영과 제작, 광고와 편집의 분리·독립을 보장하는 최신의 현실적 선택이라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고급지(高級誌)들은 스스로 폐쇄적인 사적 소유구조를 개방적인 공익구조로 바꾸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영국의 『더 타임즈(THE TIMES)』는 주식신탁제도를 통해 소유주로부터 경영과 편집의 분리·독립을 유지한다. 1785년에 창간된 이 신문은 그 동안 여러 소유주가 거쳐 간 뒤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신문 재벌 머독에게 넘어갔지만, 경영에 관한 일은 지역법원장·대학 총장·은행장·왕립협회 이사장 등 중립적이고 신망 있는 인사 12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일본의 대표적인 권위지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1991년 말 현재 총 주식 320만 주를 734명이 분산 소유하고 있으며,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은 총 주식 6만1320주를 598명이 나누어 갖고 있고,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経濟新聞)』 역시 1,500만 주를 3,343명이 분산 소유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르 몽드(Le Monde)』를 필두로 사원지주제를 도입해 1990년대에는 전체 프랑스 신문의 35∼40%가 사원지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독일의 세계적인 고급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비영리 재단법인인 파치드(FAZIT)재단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 재단은 영업 이익을 전액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업 또는 사적 이익이 개입할 여지가 없도록 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밖에 덴마크의 『폴리티켄』, 인도의 『더 스테이츠먼트』 등 많은 세계적인 권위지들이 객관적이고 공익 위주의 공정·공평한 보도·논평을 위해 소유주의 사적 이익 추구로부터 편집권을 격리·독립시키기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는 달리 한국은 폐쇄적인 신문 소유구조를 유지, 많은 문제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유구조로 보면, 한국 신문은 재벌이 소유·경영하는 재벌신문과 집안이 소유·경영하는 족벌신문으로 독과점되어 있다는 것이다.
족벌신문은 신문으로 억만의 부를 쌓아 신문 재벌로도 불린다. 대표적인 족벌신문은 동아일보(김병관 회장 일가와 그들 소유의 인촌기념회·일민문화재단이 76.69%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와 조선일보(방우영 회장 일가의 지분 90.93%), 그리고 한국일보(장재구 회장 일가의 지분 99.0%)이며, 재벌신문은 중앙일보(삼성재벌)·문화일보(현대재벌)·경향신문(한화재벌) 등이다.
한국의 신문은 이들 3개 집안과 3개 재벌이 지배하는 구조여서 자연히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가 매우 거세게 일어나면서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소유구조를 민주적인 개방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요구가 드높다. 이런 가운데 재벌신문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겹쳐 1998년에서 1999년 사이에 이른바 ‘독립언론’이라는 이름으로 재벌 계열기업에서 분리해 나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