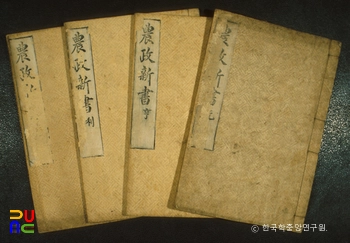안동풍산소작인회 ()
1923년 11월권오설(權五卨)·이용만(李用萬)·이회승(李會昇) 등이 소작인의 권익옹호를 목적으로 조직하였다. 조직으로는 총회에서 선출된 2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가 있고, 이들이 호선하여 9인으로 이루어진 상무집행위원회가 있었다.
상무집행위원들은 서무부·재무부·조사부 등 3개부로 나뉘어 회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회에는 소작인만이 아니라 지식인·자작농, 그리고 중소지주까지도 참여하였다. 소작인회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작쟁의를 벌여 소작료 감하와 소작권 안정을 주장하였다.
1924년 봄 총회를 열고 춘계작물 소작료를 2할로 감해줄 것을 지주에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지주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농무회(農務會)를 조직했으며, 소작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는 커녕 같은 해 6월 소작인의 소작권마저 박탈하였다.
그리고 1926년에도 지주들이 소작인회 회원들의 소작지를 박탈해 소작회원이 아닌 농민에게로 소작권을 이전시키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같은 지주들의 횡포에 맞서 소작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싸우는 과정에서 소작인회 간부 및 소작인들이 구속되어 복역하거나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다.
소작인회는 소작쟁의만이 아니라 봉건적 신분질서철폐운동을 동시에 벌이기도 하였다. 안동의 도산서원에서 소작료를 늦게 납부했다고 소작인을 매를 때린 사건이 계기가 되어 마침내 안동의 모든 사회단체와 연계해 서원철폐운동으로까지 진전되었다. 당시까지도 향촌사회에 관념적으로 남아 있던 봉건적 신분질서를 혁파하겠다는 의지가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1926년조선공산당 안동군조직의 세포조직이 소작인회 내부에서 성립되면서 소작인회는 사회주의운동 변화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으며, 1930년 초 간부들이 조선공산당 지방조직 관계로 붙잡히면서 소작인회는 지하조직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