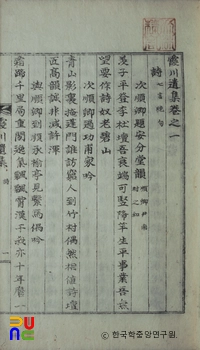우도 ()
종이바탕에 담채. 세로 98.5㎝, 가로 57.6㎝. 1977년 국립중앙박물관이 주최한 ‘미공개회화특별전’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이 「우도」는 관서(款署)나 도인(圖印) 등이 없어 전칭되는 형편이지만, 화격이나 화풍으로 보아 김식의 진필로 판단된다.
나무 밑에 서 있는 어미소와 새끼소를 다루었다. 이 그림에 등장하는 소는 선종화(禪宗畫)의 「십우도(十牛圖)」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 중국 강남지방의 물소를 소재로 삼았지만 구도나 필치 등의 표현방식은 한국적인 특색으로 넘쳐 있다.
선염(渲染)의 음영으로만 간결하게 묘사한 퉁퉁하고 매끈한 몸매라든지 하얀 테두리가 남겨진 눈매, 그리고 뿔과 귓등과 꼬리털, 발굽 등 신체 각 부분의 끝을 농묵(濃墨)으로 악센트를 주어 소의 특징과 생동감을 살린 묘사법이 그 특징을 이룬다.
이러한 화풍은 그의 증조부 김시(金禔)의 우화법(牛畫法)에 토대를 두고 형성된 것으로, 그에 비하여 중묵(中墨)의 선염으로 처리된 음영부분이 더욱 강조되어 무릎 아래는 마치 검은 스타킹을 신고 있는듯한 느낌을 자아내는 등 양식화의 경향을 현저히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의 모습은 흑백대비를 특징으로 하는 절파풍(浙派風)의 간일한 배경산수와 한층 더 어우러져 우리나라 특유의 서정세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 「우도」는 그의 다른 소그림들뿐만 아니라 이 분야의 대표적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조선 중기 한국적 동물화풍의 특색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