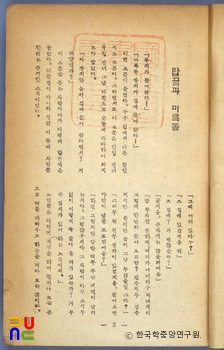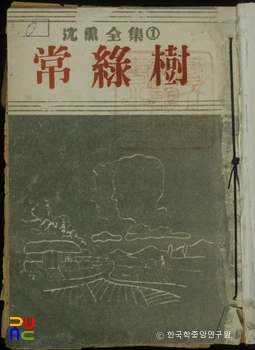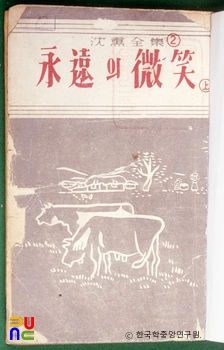봄
「봄」은 일제강점기 말기 이기영이 창작한 장편소설이다. 1940년 6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되던 중 신문 폐간으로 중단되고, 1940년 10월부터 1941년 2월까지 『인문평론』에 연재가 재개된다. 그러나 총독부의 검열에 저촉되어 다시 중단된다. 이기영이 월북한 후 1942년 대동출판사에서 『봄』이 간행되고, 1957년 북한의 조선작가동맹출판사에서 보완·수정되어 재출판된다. 국내에서는 1989년 풀빛 출판사에서 1942년판(대동출판사)을 저본으로 한 『봄』이 간행된다.
작가 이기영의 유년 기억을 바탕으로 개화기 농촌 사회의 변모 양상과 풍속을 묘사한 가족사소설로, 연대기적 구성이 특징이다.
작가의 유년 시절 생활 공간인 방깨울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러일전쟁(1904~1905) 직후부터 한일합방 이전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여, 양반 계급 출신인 유 선달(유춘화) 일가가 몰락하는 과정을 통해 개화기의 시대적 현안인 ‘반봉건주의’를 주창하고자 하였다. 개화기에 반봉건 의식은 있으나 식민지 근대화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여 몰락하게 되는 부친 유 선달과 이에 비해 개화기 세대를 대표하는 아들 석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관립 무관학교에 입학한 유 선달은 아내의 부고로 고향 방깨울에 귀향하고 정착한다. 그는 마을의 지도자 역할을 맡게 되지만 각시난봉으로 소문난 여인과 다시 결혼한다. 한편 아버지 유 선달과 오래 떨어져 있던 유석림은 집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아버지의 강요로 조혼을 하게 된다. 그는 학교에 입학하면서 점차 개화사상을 받아들이게 된다.
어느 날 방깨울에 주2이 터지게 되면서 마을의 분위기가 변화하고, 마을의 청년이 노름을 하다 살해되는 일이 벌어진다. 유 선달은 그 장례를 성대히 치러주고 금전꾼들을 나무라지만, 유석림의 혼사 비용, 사립광명학교 기부금, 금점판 투기 등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그 스스로 주1에 손을 대다 파산한다. 이로 인해 유석림은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장궁을 통해 도쿄 유학의 꿈을 품게 된다.
유 선달은 양반 계급이지만 마름이라는 신분으로 설정되어 과도기적 근대인을 표상한다. 계급적인 모순과 갈등은 아들 석림의 의식을 통해 표현되는데, 석림은 조혼을 비판하고 개화 문물과 학교 교육을 통해 개화사상을 형성하게 된다. 개화기의 과제인 반봉건주의 사상 역시 새 시대를 상징하는 석림의 시선을 통해 암시적으로 형상화된다.
일제 말 암흑기에 민족 정체성 회복을 내면적 주제로 하면서, 연대기적 가족사 서술을 통해 개화기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족사소설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구시대적 봉건 세대의 모순을 드러내고 근대적인 세계관을 추구하며, 개화기에 근대화가 가져온 풍속과 의식의 변화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가족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사회 현실을 그리다 보니, 사건들이 구체성을 띠지 못하고 암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되는 한계를 드러낸다. 일제의 검열이 심화되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연재되어 친일적 요소가 개입되었다는 부정적 측면도 지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