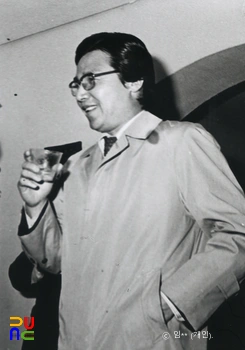자음송 ()
A5판형. 115면. 형설출판사에서 1973년 7월 5일에 발행하였다.
시집의 앞에 표제를 쓴 김구용(金丘庸)의 글씨가 있고, 시인의 연보, 조연현(趙演鉉) ‘서’, 목차, Ⅰ부∼Ⅲ부에 총44편의 작품, 문덕수(文德守)의 해설이 실려 있다.
Ⅰ부에 실린 19편의 시는 주로 일상의 체험들을 잔잔한 산문적 문체로 그려내고 있다. 그 중 「봉곡사행(鳳谷寺行)」은 어린 시절 어머니 등에 업혀 봉곡사에 갔던 회상을 다루고 있으며, 「내탑행(內塔行)」은 박두진 시인과 수석을 찾으러 갔던 일을 그리고 있다.
Ⅱ부에는 열 다섯 개의 자음을 내세운 연작시 「자음송」과 「모음송」 등이 배열되어 있다. 「자음송」은 한글 자음의 형상에서 유추되는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다. 예를 들면, ‘ㄱ’은 “으뜸가는 나무/머리를 굽히고 생각하고 있다”로, ‘ㄴ’은 “넉넉하고 너끈하다/받아들이는 모습의 여인”으로 형상화한다. 또 ‘ㄷ’은 “빈 삼태기”로, ‘ㄹ’은 “이리 틀리고/저리 틀리는/불안정”으로 그린다.
Ⅲ부에 실린 7편의 시는 자연물을 통해 자아의 시정을 읊고 있다. 특히, 자연물 중에서도 유독 ‘나무’에 대한 묘사가 집중되는데, “그를 만난 것은 산에서였다/그는 늘 울부짖고 있었다/이제 오십이 지났단 말이요/나도 이제 질질 끌려갈 수 없단 말이요”(「나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물에 자아를 투사하여 삶의 여러 주제를 형상화하는 기법이 사용된다.
최원규는 1961년 첫 시집 『금채적(金彩赤)』을 발간한 이후 1973년의 『자음송」에 이르기까지 4권의 시집을 상재한 다작의 시인으로 언급되며, 서정시의 울타리에 일상적 삶의 애환과 현대적 감각을 불어 넣으려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음송」 연작의 경우 한글의 자음을 사물화하여 그 이미지를 개성적으로 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