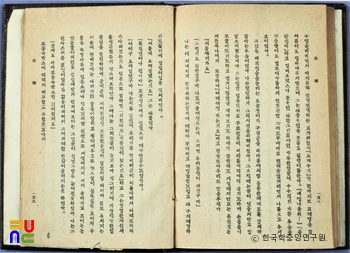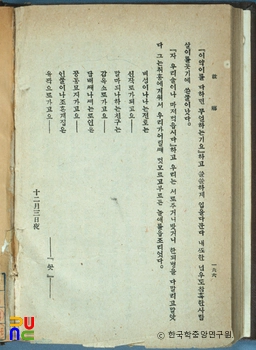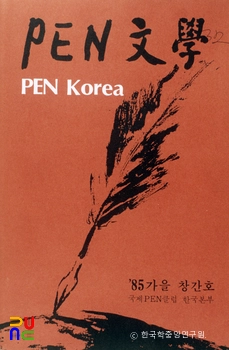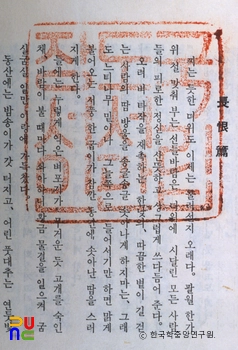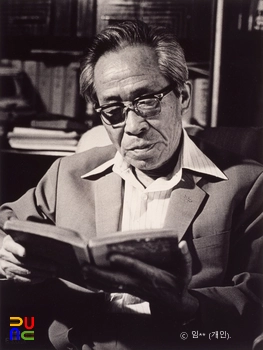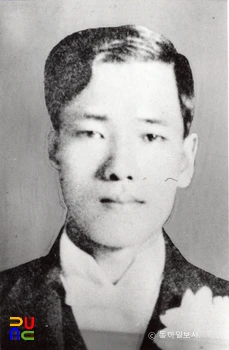고향 ()
1926년 글벗집에서 발행한 단편집 『조선의 얼굴』에 수록되었다. 이 작품은 30, 40매 정도의 주1으로서 액자소설(額字小說)의 형태를 보여준다. 비록 소품이지만 1920년대 민족항일기의 시대상을 집약적으로 조명하고, 일제의 식민지 수탈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한 작품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 ‘나’는 서울행 기차간에서 기이한 얼굴의 ‘그’와 자리를 이웃해서 앉게 되었다. 이 좌석에는 각기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다.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짜르게 끊은 꼿꼿한 윗수염을 비비면서’ 마지못해 고개를 까딱거리는 일본인과, ‘기름진, 뚜우한 얼굴에 수수께끼 같은 웃음을 띠운’ 중국인 사이에 한국인 ‘그’와 ‘내’가 합석하고 있다. 즉, 세 나라 사람이 모이게 된 것이다.
‘그’라는 사나이에 대하여 ‘나’는 처음에 남다른 흥미를 느끼고 바라보다가 이내 싫증을 느껴 애써 그를 외면하려 하였지만, 그의 딱한 신세타령을 듣게 되자 차차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된다. 마침내 술까지 함께 마시게 된 ‘그’의 얼굴에서 ‘나’는 ‘조선의 얼굴’을 읽게 되는데, ‘그’가 정처 없이 주2하는 실향민임을 알게 된다. ‘내’가 ‘그’의 유랑의 동기와 내력을 듣는 대목이 바로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셈이다.
즉, 대구 근교의 평화로운 농촌의 농민이었던 ‘그’는 경술국치로 동양척식주식회사에 의하여 농토를 빼앗겼다. 떠돌이가 되어 간도로 떠났으나 거기서 부모는 굶어죽고, 또다시 구주(九州) 탄광을 거쳐 다시 주3의 고향에 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무덤과 해골을 연상하게 하는 고향에서 '그'는 돈 때문에 유곽에 팔려간 뒤 10년이 지난 뒤에야 병이 든 몸으로 고향에 돌아온 예전에 혼인 말이 있었던 여인만을 만나게 된다. 괴로운 심정으로 다시 고향을 떠난 그는 일자리를 찾아 경성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이 작품에서는 작가의 사회고발의 투지가 크게 부각되고, 주4과 주5의 상징인 동양척식주식회사에 의하여 농토의 모든 것을 빼앗긴 농민의 주6을 사실적으로 그렸다. 또한, 당대 현실의 주7 내지 비판자로서의 현진건의 치열한 작가적 자세를 인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