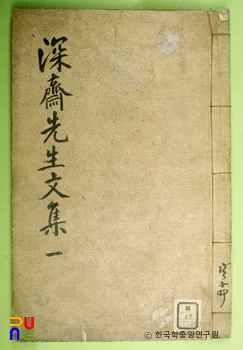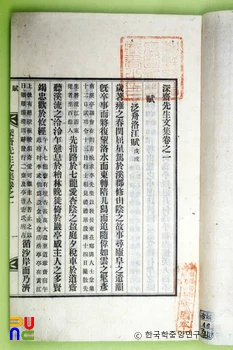심재집 ()
저자인 조긍섭(曺兢燮, 1873~1933)의 자는 중근(仲謹), 호는 심재(深齋)이다. 조선 후기에 태어나 구한말을 거쳐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학자이다. 어려서부터 글재주로 이름이 났고, 17세 때에는 당시 영남의 거유(巨儒)였던 면우(俛宇) 곽종석(郭鍾錫)을 찾아가 학문을 배웠다. 또한 20세를 전후로 장복추(張福樞) · 김흥락(金興洛) 등을 찾아가 학문에 대해 문답했다. 그러나 1910년 국권 피탈 이후로는 두문불출하며 학술에만 전념하였다. 정산서당(鼎山書堂) · 구계서당(龜溪書堂)을 지어 학문과 후학 양성에만 힘을 쏟았다. 비슷한 시기의 지식인 가운데 황현(黃玹) · 김택영(金澤榮) · 이건창(李建昌) 등과 교유하였다. 이러한 활동과 학문 성취로 인해 조긍섭은 영남 사림의 거목으로 지목되었으며, 중앙 학자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았다.
조긍섭의 시문집인 『심재집(深齋集)』의 편집에는 저자의 아들인 조정흠(曺廷欽)과 문인들이 참여하였다. 연활자본 간행본의 판권지에는 조정흠이 ‘저작 겸 발행자’로 명기되어 있다.
『심재집』은 저자의 시문집 가운데 가장 먼저 간행된 책이다. 아들 조정흠과 문인들이 함께 편집하여 1935년 대구의 오성인쇄소(五星印刷所)에서 31권 15책의 연활자로 간행하였다. 여기에는 저자가 남긴 시문 가운데 절반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하였다. 이후 『심재집』의 골자를 바탕으로 내용을 더하거나 빼서 37권 17책의 『암서선생문집(巖棲先生文集)』을 연활자본으로 간행하였다. 『암서선생문집』의 간행 경위와 시기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다시 시간이 흘러 1966년에는 『심재집』에서 누락된 원고를 수합하고, 가전(家傳) · 묘표(墓表) 등 저자 조긍섭에 관한 여러 글을 부록으로 더하여 10권 5책의 석판본으로 간행하였다. 이 간본이 『심재선생속집(深齋先生續集)』이다.
조긍섭의 부고를 전한 『동아일보』 기사(1933.09.01.)에 따르면 조긍섭은 1933년 7월 26일 중풍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다고 하였다. 이어지는 기사에서 그의 문도(門徒)가 200여 명에 달하고, 50여 권의 저서가 있다고 하였다. 『심재집』이 1935년 4월 4일에 발행되었으므로, 저자 사후 아들과 문인들을 중심으로 가장(家藏) 시문을 추려 편찬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짐작된다.
권1부터 권31까지 문체별로 나누어 저자의 글을 수록하였다. 편차는 다음과 같다. 권1에 부 2편, 권24에 시 495수, 권512에 서(書) 254편, 권1315에 잡저 36편, 권1617에 서(序) 57편, 권1820에 기(記) 76편, 권21에 발 23편, 서후(書後) 11편, 권22에 잠 1편, 명 9편, 자사(字辭) 5편, 상량문 6편, 뇌사(誄詞) 1편, 애사 6편, 축문 1편, 제문 22편, 권23에 비 9편, 권24에 묘지명 26편, 권25에 묘갈명 25편, 권2627에 묘갈 42편, 권28에 묘표 23편, 권29에 행장 7편, 행록 2편, 권30에 전 3편, 유사 2편, 권31은 잡지이다.
『심재집』에 수록된 시는 독서와 학문 등 유자의 삶을 형상화한 작품이 많다. 또한 선현의 유적을 찾아 기행하며 지은 시들도 많다.
편지의 경우 성리학 · 문학에 대해 당시 대가들과 의견을 주고받은 것이다. 장복추(張福樞) · 김흥락(金興洛) · 이만구(李種杞)에게는 어른을 대하는 예로써 안부를 물었으며, 정재규(鄭載圭) · 허유(許愈) 등과는 학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였다. 또한 곽종석과 주고받은 몇 차례의 왕복 서한에서는 성리에 대해 논하였다. 김택영(金澤榮)에게 보낸 14편의 편지 속에는 주로 문학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밖에 사단칠정에 관한 논설, 김택영의 『삼국사기』 교정에 관한 의견, 김부식(金富軾)으로부터 이제현(李齊賢) · 김창협(金昌協) 등에 이르는 우리나라 문학사상의 인물을 논한 내용, 김택영의 『한사경(韓史綮)』에 대한 견해 등이 보인다.
이 밖에도 전통적인 한문 산문의 문체로 작성한 다양한 주제의 글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저자의 학문 · 사상 · 문학에 대한 견해를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조긍섭은 구한말, 일제강점기를 살아간 유학자이다. 특히 영남 지역에서 활동하며 학문 · 문학 · 사상의 여러 영역에 걸쳐 일가를 구축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심재집』은 20세기 전반에 우리나라 유학 사상의 명맥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리고 당시 한문학의 진면이 어떠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