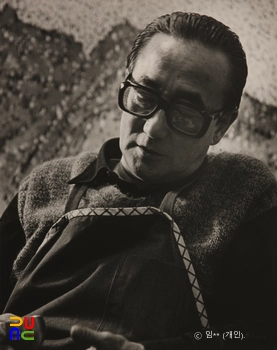향토색 ()
향토색은 시골 및 고향의 경관과 풍물에 담긴 정서이다. 도시적 정서와 대칭을 이루는 향촌의 경관·풍물에 담긴 고유의 정서나 특색을 일컫는다. 일제강점기의 문예계 전반에 크게 유행하였다. 미술 분야에서 향토색은 1920년대 초부터 권장되었다. 193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조선 향토색 발현에 대한 논쟁이 일었다. 대표적으로 윤희순은 황폐한 산과 들의 절망적 정조 대신 약동하는 향토색 창출을 촉구했다. 광복 후 활동한 향토색 화가는 박수근, 양달석 등이다. 향토색 담론은 한국 근대미술의 역동적인 전개사를 대변한다.
향토색은 도시적 정서와 대칭을 이루는 시골, 혹은 향촌의 경관과 풍물에 담긴 고유의 정서나 특색을 일컬으며 일제 강점기의 문예계 전반에 크게 유행하였다.
미술분야에서 향토색은 ‘지방색(地方色, local color)’ 혹은 ‘반도색(半島色)’이라는 용어로 조선미술전람회(朝鮮美術展覽會, 이하 조선미전) 심사위원을 통해서 1920년대 초부터 적극 권장되었다.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인 평자들 사이에서 조선미전의 지방색에 대한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향토색을 둘러싼 논쟁적 담론을 수용한 화가들 중에서 윤희순(尹喜淳), 김종태(金鐘泰), 이인성(李仁星), 오지호(吳之湖), 김중현(金重鉉) 등 뛰어난 향토색 작가가 출현하였고, 광복 후에는 박수근(朴壽根), 양달석(梁澾錫), 최영림(崔榮林), 장리석(張利錫) 등으로 이어졌다.
‘향토(鄕土)’란 근대 이전에 존재했던 고유어가 아니라 독일어 ‘Himartkunst’를 일본에서 번역한 용어로, 1920년에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조선어사전(朝鮮語辭典)』에 ‘향토(鄕土)’가 등장하는 것으로 미루어 1920년 이전에 한국에서도 통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38년에 간행된 『조선어사전(朝鮮語辭典)』에는 ‘향토(鄕土)’ 외에 ‘향토색(鄕土色)’과 ‘향토예술(鄕土藝術)’이라는 별도의 항목이 추가되었다. ‘향토색(鄕土色)’은 ‘지방색(地方色)’과 같은 의미로, ‘향토예술(鄕土藝術)’은 '향토(鄕土)의 전원(田園)을 제재(題材)로 한 예술(藝術)'로 정의되었다.
향토적 정서는 애절한 실향민의 향수와 결합하여 일제시대 문예계만이 아니라 한국인 전 계층의 내면을 사로잡은 조류였다. 그 이유의 일단은 일제에 의한 국권 상실과 수많은 유랑민과 실향민의 발생에서 찾을 수 있으며, 대체로 향토(고향)는 근대(일제)에 의해 훼손되지 않은, 이상화되고 심미적인 공간으로 상상되었다.
그러한 민족적 정서와는 별개로 1922년부터 매년 개최된 조선미전의 일본인 심사위원들은 심사의 요건으로 ‘지방색(地方色)’을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 초가집, 장독대, 흰 옷, 빨래하는 여자, 아이 업은 여자, 담뱃대를 문 노인 등 민속적이고 풍속적인 소재들이 크게 유행하였다.
1930년대에 접어들어 윤희순, 김용준(金瑢俊), 김복진(金復鎭) 같은 한국인 평자들이 원시적 색감(노랑저고리, 단청의 고궁)과 소재주의에 고착된 조선미전의 “병적 향토취”를 비판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조선 향토색의 발현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향토색은 조선인이 주체가 되고 조선인에 의해 추동되는 이념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윤희순은 황폐한 산과 쓸쓸한 들판이 등장하는 절망적 정조를 퇴출시키고 에너지가 약동하며 자유 발랄한 향토색의 창출을 촉구하였다. 윤희순이 제시한 향토적 소재로서 ‘인왕산의 철벽같은 암괴', '청명한 대공과 태양을 집어 삼킬 듯한 적토’는 곧바로 이인성의 「가을 어느 날」(1934)과 「경주의 산곡에서」(1935) 같은 작품으로 실현되었다.
김용준은 조선의 정조란 홍녹황남(紅綠黃藍)의 원시색이나 풍물을 중심으로 한 소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담⋅청아⋅단아한 미적 특질에 있다는 관점을 피력하였으며, 그에 입각한 제작활동을 통해 조선 향토색의 품격을 고양시켰다.
일제 강점기의 화단을 풍미했던 ‘향토색’은 소재주의로 흘러 폐쇄적이고 퇴영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담론과 실천이 활발하게 진행됨으로써 식민성을 극복하고 근대성을 성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향토색(지방색) 담론과 그 실천의 과정은 곧 한국 근대미술의 역동적인 전개사를 대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