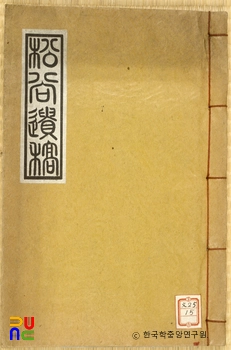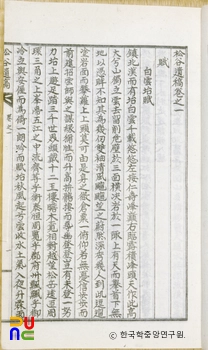송곡유고 ()
저자 박주현(朴周鉉, 1844~1910)의 초명은 일현(一鉉), 자는 내수(內壽), 호는 송곡(松谷), 본관은 죽산(竹山)이다. 김병학(金炳學)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1883년(고종 20) 문과 급제 후, 청요직을 두루 거쳐 대한제국기에는 홍문관시독(弘文館侍讀), 비서원승(祕書院丞) 등을 역임하였으며,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랐으나, 러일전쟁 직후 낙향했다. 그 후 일제를 몰아내기 위한 민회(民會)를 조직한 회장으로서 배일 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되어 고문 끝에 풀려났으나,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편자는 저자의 장남 박창해(朴昌海)이다.
저자의 장남 박창해가 수습한 작품들을 1964년 저자의 손자 박정식(朴政植) · 박천식(朴天植)이 간행했다. 권두에 이상영(李商永) · 윤희구(尹喜求)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 저자의 외손 정순문(鄭淳文)의 발문이 있다. 1999년 경인문화사에서 한국역대문집총서 No.2784 『송곡선생문집』으로 재간행했다.
권1·2에 부(賦) 1편, 시 188수, 소(疏) 2편, 강의(講義) 1편, 기주(記註) 2편, 서(書) 32편, 잡저(雜著) 8편, 혼서(婚書) 1편, 상량문(上樑文) 1편, 묘갈명 2편, 행장(行狀) 6편, 제문(祭文) 6편, 유사 1편, 권3은 부록으로 만사(輓詞) 7편, 뇌문(誄文) 3편, 제문 3편, 가장(家狀) · 행장 · 묘지명 · 묘갈명 각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부에는 북한산 최고봉인 백운대에서 목멱산(木覓山) 등의 정경을 바라보며 읊은 「백운대부(白雲坮賦)」가 있다.
시에는 영물(詠物)이 많은데, 「설송(雪松)」 · 「영매(詠梅)」 · 「송죽(松竹)」 등은 대개 소재의 이미지를 살려 자신의 우국충정을 은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위안스카이(袁世凱)에게 지어 준 「증청사마원세개(贈淸司馬袁世凱)」와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에게 지어 준 「증일본공사(贈日本公使)」 등은 당시 저자가 취하였던 정치적 처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명승지를 유람하며 읊은 「세검정(洗劍亭)」, 「광한루(廣寒樓)」 등의 기행시가 다수 있는데, 그중 「욕천팔경(浴川八景)」은 전라도 곡성(谷城)의 별호인 욕천의 8가지 경치를 읊은 것이다. 그밖에 「권학(勸學)」, 「계아독소학(戒兒讀小學)」 등 학문을 권장하거나 「석동강회(石洞講會)」 등 강회 때 읊은 것들이 있다.
소의 「변의제소(辨衣制疏)」는 양복을 착용하도록 의제를 개혁한 데 대하여 반대하는 내용의 상소문으로, 저자가 사간원에 있을 때 올린 것이다. 「경연강의(經筵講義)」는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을 강의한 내용으로, 궁실의 사치를 금할 것을 한나라 소하(蕭何)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치국(治國)의 길은 인재의 등용에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기주 가운데 1편은 1884년(고종 21) 5월 15일 춘당대 응제 때를 기록한 「춘당대응제기주(春塘臺應製記註)」이고, 다른 1편은 같은 해 12월 10일 대신들이 입시했을 때를 기록한 「대신입시기주(大臣入侍記註)」이다.
서는 대부분 동생과 아들에게 학문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보낸 것이다. 그밖에 참판 김병필(金炳弼), 판서 이건하(李乾夏) 등에게 안부를 묻는 편지가 있다. 특히 저자가 조직한 민회의 이름으로 보낸 「민회소고유(民會所告諭)」와 「재회고유(再會告諭)」가 주목되는데, 첫 번째 편지는 단군(檀君)이 기초를 닦아 놓은 후 잘 유지해 오던 나라가 외세 열강에 의해 불안하게 되었기에 이를 극복해 보고자 민회를 조직하게 되었다는 사유와 함께 저자는 현재 자신에게 맡긴 직책이 어울리지 않으므로 고사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편지는 저자가 자신의 직책 고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과 함께 대동단결할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다.
잡저 가운데 「시서사(示書社)」는 서당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문의 근원은 삼강오상(三綱五常)과 효제충신(孝悌忠信)에 있음을 강조하며 충성심을 일깨우는 내용이다. 그밖에 백운대를 유람하고 쓴 「유백운대기(遊白雲臺記)」와 자손들에게 학문에 힘쓸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입지(立志)」, 「교아독용학(敎兒讀庸學)」, 「서숙계자질(書塾戒子姪)」 등이 있다.
개항기 춘당대 응제 때의 모습과 대신들이 입시했을 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과 대한제국기 때 임금을 위하고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정성과 국가의 어려움에 임해 불굴의 절개를 드러낸 문신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