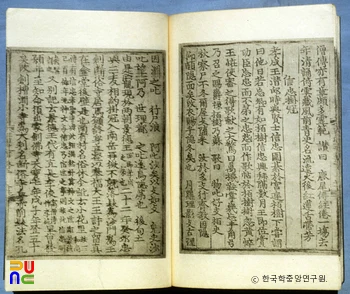억양 ()
억양은 문장이나 문장의 일부에 나타나 의미 결정에 관여하거나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드는 소리의 높낮이이다. 문장이나 단어에서 나타나는 고저도와 문장의 끝에 나타나는 문말조로 나뉜다. 국어에서는 ‘수식어+피수식어’의 구성에서 수식어에 고조가 놓인다. ‘누구, 언제, 어디, 무엇’ 등으로 시작되는 의문문은 억양이 의미를 결정하는 전형적인 예이다. 의문사 쪽을 높이느냐 서술어 쪽을 높이느냐에 따라, 또 문말조가 상승조인가 하강조인가에 따라 두 문장의 뜻이 달라진다. 억양은 단어 고유의 악센트나 음장(音長)과 달라서 같은 단어라도 문장의 어느 자리에 놓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가령, '(형) 어떻게 됐니? (동생) 틀렸어. (형) 틀렸어?'와 같은 대화에서 첫 번째의 ‘틀렸어’와 두 번째의 ‘틀렸어’에는 그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자음과 모음 이외에 거기에 얹혀 나타나는 소리의 높낮이, 다시 말하면 말의 멜로디(speech melody)가 있다. 이를 표시하면 각각 다음과 같다.
{{T17009_00.gif}}
즉, ‘틀렸어’에서는 ‘틀’이 높게 발음되고 나머지는 낮게 발음되며, 또 같은 ‘틀렸어’로 끝나는 문장이더라도 그것이 대답하는 말일 때는 문장 끝에서 소리가 떨어지고, 묻는 말일 때는 문장 끝이 올라간다. 이와 같이 문장, 또는 문장의 일부에 나타나는 변별적(辨別的)인 소리의 높낮이를 억양이라 한다.
억양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위의 ‘틀렸어’ 안에서 나타나는 {{#193}}로 표시된 소리의 높낮이요, 다른 하나는 그 말 끝에 나타나는 소리의 상승(上昇)과 하강(下降) 부분 즉, ↑와 ↓로 표시된 부분이다. 앞의 것을 흔히 고저조(高低調, pitch level)라 하고, 문장 끝의 상승과 하강부분을 문말조(文末調, terminal contour)라 부른다.
(1) 문말조
문말조는 구두점(句讀點)에 의해서 얼마간 짐작이 되지만 그것도 같은 구두점이 다른 문말조로 나타나는 일도 있어 충분하지 못하며, 고저조는 아예 글을 쓸 때는 표시되지 않으므로 억양은 전체적으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어떤 시각적인 부호로 표시되는 일이 드물다.
억양은 또 문장에서 나타나므로 단어가 단독으로 있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전(辭典)에서도 표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억양은 문장을 이루는 어떠한 다른 요소보다도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언어마다 독특한 자음체계와 모음체계가 있듯이 억양도 언어마다 그들대로의 체계를 갖추고 문장의 의미를 결정하는 일에 한몫을 한다. 앞에서 ‘틀렸어’의 문말조가 다름에 따라 대답하는 말이 되기도 하고 묻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이 그 한 예다.
말이 병렬(竝列)될 때, 가령 “사과 · 배 · 감 · 대추 무엇 하나 없는 것이 없다.”라고 말할 때, ‘사과↑ 배↑ 감↑ 대추↓’처럼 병렬되는 앞의 말 다음에는 상승조가 나타나고 마지막 말 다음에는 하강조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상승조는 뒤에 다른 말이 이어진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하강조는 이제 그 병렬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2) 고저조
문장 안에 나타나는 고저조도 일정한 체계가 있어 이를 잘못 지키면 말의 뜻이 달라지거나 적어도 부자연스럽게 들린다. 국어 억양의 한 규칙으로 ‘수식어+피수식어’의 구성에서 수식어에 고조가 놓인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가령 ‘{{T17009_01.gif}}을 예로 보면, ‘하늘’이 수식어 자리에 놓일 때는 ‘하’가 고조를 가지는데, 피수식어 자리에 놓일 때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므로 ‘{{T17009_02.gif}}’을 우리의 억양규칙을 어기고 발음하면 말의 뜻까지는 달라지지 않더라도 매우 부자연스럽게 들린다.
국어의 억양 중 의미의 분화에 관여하는 가장 전형적인 예는 ‘누구 · 언제 · 어디 · 무엇’ 등으로 시작되는 의문문에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T17009_02.gif}}’과 같이 앞의 것은 어떤 사람이 온 것은 알겠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를 묻는 설명의문이며, 뒤의 것은 누가 온 것 같기도 하고 안 온 것 같기도 한데, 과연 왔느냐, 안왔느냐를 묻는 판정의문이다. 의문사(疑問辭)인 ‘누가’쪽을 높이느냐 서술어인 ‘왔니’쪽을 높이느냐에 따라, 또 문말조가 상승조인가 하강조인가에 따라 두 문장의 뜻이 달라진 것이다.
억양은 이상에서처럼 문장의 의미결정에 관여하거나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드는 일에 기여하는 변별적이고 상대적인 소리이다. 화가 났을 때라든가 비명을 지를 때 소리를 더 높여 말하는 따위는 억양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해서 단어들간의 상대적인 높이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억양은 단어 고유의 악센트나 음장(音長)과 달라 같은 단어라도 문장의 어느 자리에 놓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성질을 가진다. ‘{{T17009_04.gif}}’와 ‘{{T17009_05.gif}}’ 에서 ‘하늘’에 나타나는 억양이 다름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억양은 단어 고유의 악센트와 무관하지 않다. 이는 ‘수식어+피수식어’의 구성에서 고조는 늘 수식어에 놓이면서도 그 수식어의 어느 음절에 고조가 놓이느냐는 단어마다 다르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하늘 나라’나 ‘푸른 하늘’에서는 첫 음절에 고조가 놓였다. 그러나 ‘{{T17009_06.gif}}’에서는 수식어에 고조가 놓이기는 하였으나, 그것의 둘째 음절에 고조가 놓인다. 이는 ‘하늘’, ‘푸르다’는 이들 단어 고유의 것으로서의 고저악센트를 ‘하’와 ‘푸’에 가지고 있으며, ‘저녁’과 ‘빠르다’는 ‘녁’과 ‘르’에 가지고 있는 데 말미암은 것으로 풀이된다.
고저악센트는 중세국어에서는 성조(聲調)라 하여 단어의 의미를 변별시켜주는 기능을 가진 음소(音素)였으나, 오늘날은 함경도 · 강원도 동남부일부 · 경상도 등의 방언에만 남아 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다 없어졌다. 그러나 음소로서의 고저악센트는 없어졌다 하더라도 단어마다 고유한 악센트가 아직도 남아 있어 그것이 억양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