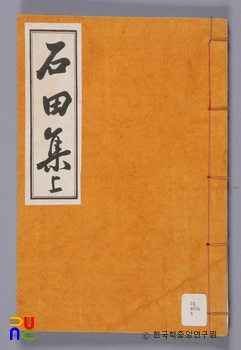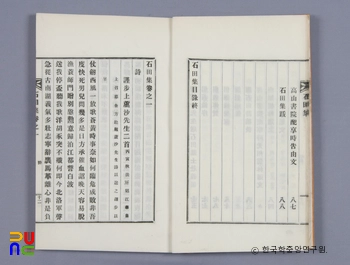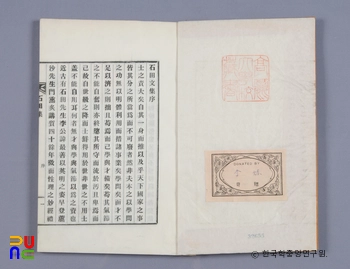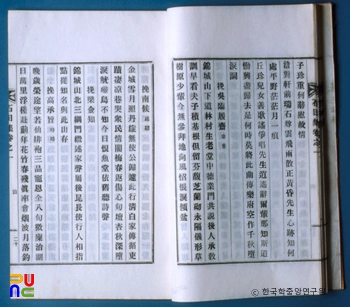석전문집 ()
이최선의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낙유(樂裕), 호는 석전경인(石田耕人)이다.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 1798~1876)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874년(고종 11) 증광시 문과에 응시하였으나 과거(科擧)의 폐단을 보고 출사(出仕)를 단념하였다. 기정진의 주리설(主理說)을 계승하여 척사위정(斥邪爲政)의 정신에 투철하였으며, 조선왕조의 정통성을 옹호하고 외세를 철저하게 배격하였다.
저자의 사후에 문집 간행을 위해 아들 이승학(李承鶴)이 유고를 수습하여 이건창(李建昌, 1852~1898)에게 교정과 발문을 부탁하였으나 간행되지 못하였다. 이후 1930년대 초에 저자의 손자 이광수(李光秀)가 간행을 위해 4권 2책으로 편찬하였으나 1963년에 이르러서야 증손자 이혁(李焃)에 의해 간행되었다.
권두에 권재규(權載奎)가 쓴 서문이 있으며 권말에는 이건창과 정기(鄭琦)가 쓴 발문이 있다.
권1에는 시 123수, 권2에는 책(策) 1편, 서(書) 13편, 논(論) 1편, 서(序) 3편, 발(跋) 1편, 권3에는 격(檄) 2편, 제문(祭文) 8편, 천표(阡表) 1편이 수록되어 있다. 권4는 부록으로 서(序) 3편, 수묵(水墨) 1편, 만사(輓詞) 11수, 제문 11편, 행장(行狀) · 묘갈명 · 서장갈후(書狀碣後) · 묘지명 · 묘표 · 전(傳) · 시 · 발 각 1편, 통문(通文) 3편, 고유문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대부분 조성가(趙性家, 18241904) 등과 주고 받은 수창시(酬唱詩)로, 저자의 교유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이밖에 기정진과 최익현(崔益鉉, 18331906)에게 준 시가 있으며, 가혹한 정치에 시달리는 시골 노파의 고달픔을 노래한 「청촌파(聽村婆)」와 「위촌파(慰村婆)」 등의 작품이 있다.
「삼정책(三政策)」은 1862년(철종 13) 진주농민항쟁이 끝난 이후에 철종이 삼정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내린 책문(策問)에 대한 대책(對策)이다. 당시 관리들과 삼정으로 인한 향촌 사회의 폐해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어진 관리를 선발하고 언로(言路)를 개방하며 성리학을 장려해야함을 제시하였다.
「통고인읍제종문(通告隣邑諸宗文)」과 「격본도오십삼주제종문(檄本道五十三州諸宗文)」 등 2편의 격문은 모두 친척들에게 보낸 글이다. 서양의 침공은 국가 존망이 달린 중대사이므로 종인(宗人)들이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서양 세력을 물리칠 것을 촉구하였다.
서(書)에는 기정진 · 최익현 · 기우만(奇宇萬) · 이건창과 주고받은 서간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대부분 시사(時事)와 예절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우만에게 답한 별지는 주1에 관한 내용이며, 기정진에게 보낸 「상례차의(喪禮箚疑)」는 상례(喪禮)에 관한 내용이다.
서(序)의 「동의계안서(同義契案序)」는 1866년(고종 3) 프랑스인이 강화도를 침범했을 때 여러 고을에 통문을 보내 의병을 모집하고 계(契)를 조직하면서 쓴 글이다.
부록에는 이희석(李煕奭) 외 10명이 지은 만사와 조성가 외 10명이 지은 제문을 비롯해 저자의 사후 7년만에 기우만이 이승학의 부탁을 받고 쓴 행장, 이건창이 쓴 묘갈명, 정재규(鄭載圭, 18431911)의 문인 이교우(李敎宇, 18811950)의 「서장갈후(書狀碣後)」, 조성가의 묘지명 등이 수록되어 있다.
『석전집』에 수록된 「삼정책」은 조선후기 현실에 대한 저자의 개혁 의식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 조선 후기의 국내 정세를 살피는 데에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