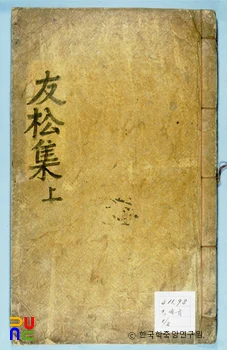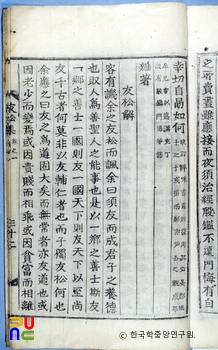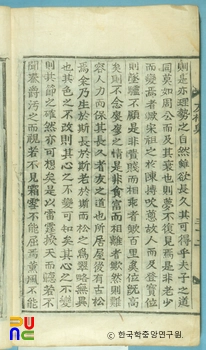우송집 ()
『우송집』은 조선 시대 학자 김세규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18년에 간행한 시문집이다. 『우송집』은 그의 학문에 관한 비중이 높다. 시에서는 학문을 밭갈이에 비유한 「독우교경행시아배(犢牛敎耕行試兒輩)」가 대표적이다. 권2의 잡저에는 그의 학문적 성과를 집약하여 논학(論學), 논리(論理), 석의(釋義), 설교(設敎)의 4부분으로 분류하여 수록하였다. 그중 논학(論學)은 유학의 공부 방법에 대해 송유(宋儒)의 격언들을 수록하였고 논리(論理)에는 그의 경학가적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저자 사후 후손 김용환(金容煥)·김태현(金泰鉉) 등이 간행하였다.
우송(友松) 김세규(金世奎)는 순천 지역 유학자로서, 자는 경소(景昭), 본관은 부평(富平)이다. 부친은 어모장군 김환(金丸)이다. 곤재(困齋) 정개청(鄭介淸)을 사사(師事)하였으며, 1582년(선조 15) 식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훈도(訓導)를 역임하였다. 지봉(芝峯) 이수광(李睟光) 및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 등과 교유하였다. 그가 성균관에 있을 때 그의 형이 죄를 지어 어영청 군졸로 충군되었는데, 밤마다 성균관을 나가 형이 지내는 곳에서 함께 잤다. 그 우애가 널리 알려져 그림으로 남겼다고 전해진다. 나중에 4번 교수를 맡아 『심경(心經)』과 『근사록(近思錄)』을 관문으로 삼아 사서, 육경을 순차적으로 점진하는 과정을 만들어 인근의 문인들을 가르쳐 문헌의 고을이 되는 데 공헌하였다.
『우송집』은 1918년 후손 김용환(金容煥) · 김태현(金泰鉉) 등이 간행하였다. 권두에 정약용(丁若鏞) · 조익현(曺翊鉉)의 서문과 나경(羅炅)의 후서가 있고, 권말에 김용환과 김태현의 발문이 있다.
4권 2책의 목활자본이다. 저자의 권두에 김굉(金㙆)의 서가 있다. 권1에 시 39수, 부(賦) 3편, 여문(儷文) 1편, 제문(祭文) 4편, 서(書) 7편, 잡저(雜著) 3편, 권2에 잡저 36편, 부록으로 유적 · 통장(通章)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체제별로 분류하였다. 시의 「서회(書懷)」는 단표누항(簞瓢陋巷)의 선비 정신을 읊었다. 「남송정제영(南松亭題詠)」에는 시회(詩會)를 주관한 최재홍(崔弘載) 및 임발(林墢), 정운희(丁運熙), 이수광(李睟光) 등 참여한 제현(諸賢)들의 시를 수록하여 교유 관계를 알 수 있다. 「독우교경행시아배(犢牛敎耕行試兒輩)」는 학문을 밭갈이에 비유하여 자손들에게 면려를 가르친 장편의 교훈시이다. 부의 「근사록부(近思錄賦)」는 『근사록』에서 주돈이(周敦頤), 정호(程顥), 정이(程頤), 장재(張載)의 어록을 통해 공부하는 방법, 나와 남을 다스리는 방법 등을 배우는 데 요긴하다고 밝혔다. 「흡화로(吸花露)」는 진사시에 입격한 부로, 태평성대가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기원하는 내용이다. 「송도부(松濤賦)」는 달 밝은 밤 들려오는 솔바람 소리의 주제로 지었다.
제문 중 「제곤재선생문(祭困齋先生文)」은 스승 정개청에 대해 쓴 것이다. 애사(哀詞) · 비원(悲寃) · 조원(弔寃) · 위원(慰寃) · 강신(降神) · 초헌(初獻) · 아헌(亞獻) · 종헌(終獻) · 사신(辭神) 등의 소제목을 달고 있어 형식이 특이하다.
편지는 정개청, 정경세, 이수광, 박경신 등과 주고받았다. 정개청에게는 벼슬살이에 매인 고달픔을, 정경세, 이수광, 박경신에게는 선물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는 내용이다. 「우송해(友松解)」는 시비, 빈부, 노소에 따라 우정이 변하고 심지어 상우천고(尙友千古)마저 영원하지 않지만 소나무는 변하지 않으므로 벗으로 삼는다는 자호(自號)에 대한 논변이다.
권2의 잡저는 그의 학문적 성과를 살펴볼 수 있는 내용으로, 논학(論學), 논리(論理), 석의(釋義), 설교(設敎)로 나누어져 있다. 논학은 성(誠) · 자기(自欺) · 정심(正心) · 수방심(收放心) · 동심(動心) · 회심(悔心) · 개과(改過) · 천선(遷善) · 사위(思爲) · 경(敬) · 조망(躁妄) · 비형(否亨) · 석씨(釋氏) · 심성정설(心性情說) · 기질(氣質) · 선악(善惡) · 공사(公私) · 교양(敎養) · 위정(爲政)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에 대한 송유(宋儒)의 격언들을 수록하였다.
논리는 음양합변도(陰陽合變圖) · 변화(變化)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양오행의 이치를 논하였다.
석의는 관성론(貫誠論) · 대학약언(大學約言) · 의례집록(儀禮集錄) · 대소종지도(大小宗之圖) · 감흥시서의(感興詩序義)로 구성되어 있다. 관성론은 『중용』에 대한 내용이고, 대학약언(大學約言)은 제사(題辭), 서의(序義), 전표(箋表) 세 단락으로 이루어졌는데, 지본(知本)과 격물치지(格物致知) 조목은 왕양명의 설을 따랐다는 점이 흥미롭다. 감흥시서의(感興詩序義)에서는 주희의 「재거감흥(齋居感興)」 20편을 읽고 각 편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설교는 의궤(儀軌) · 제기(祭器) · 숙상서도(塾庠序圖) · 재중입의(齋中立議) · 충곡재입의(忠告齋立議) · 이학지일언시문인(以學之一言示門人)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제기(祭器), 숙상서도(塾庠序圖), 재중입의(齋中立議)는 임란 이후 향교의 의례 제도가 소실되자 그가 외웠던 것을 기록한 내용이다.
부록은 유적(遺蹟)과 통장(通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적에는 서석산중양승회지도(瑞石山重陽勝會之圖), 소지록(所知錄), 제우송선생문(祭友松先生文), 우송선생실록(友松先生實錄), 고훈도우송김공행장(故訓導友松金公行狀)이 있다. 통장은 유학 최익동(崔翊東) 및 29인이 지은 나주통문(羅州通文), 유학 이훤(李烜) 및 11인이 지은 광주통문(光州通文) 등이 있다.
<서석산중양승회지도(瑞石山重陽勝會之圖)>는 1601년(선조 34) 9월 9일 김세규 및 제현들이 서석산에 올라 연회를 즐기고 잔치 모습과 시를 갈포 족자에 남긴 작품이다. 그림 실물은 현전하지 않는다. 연회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다. 이경(而敬) 김정목(金庭睦)과 그의 부친 김건(金鍵), 사우(士祐) 이상길(李尙吉)과 그의 부친 이희선(李喜善), 영백(榮伯) 안극인(安克仁)과 그의 부친 안혼(安混), 경승(敬承) 조계한(趙繼韓)과 그의 부친 조양정(趙楊庭), 자술(子述) 김업남(金業男)과 그의 부친 김표(金彪), 행원(行源) 김효남(金孝男)과 그의 부친 김오(金{示吳}), 경소 김세규와 그의 부친 김환(金丸), 영휘(永暉) 김국서(金國舒)와 그의 부친 김진추(金震秋)이다.
소지록(所知錄)은 김세규가 성균관에 있을 때 교유했던 인물 6인의 성명과 그들의 자질에 대한 품평을 기록한 편이다. 교유한 인물들은 송방(宋芳), 권이중(權以中), 이일민(李逸民), 우사순(禹嗣舜), 송승경(宋承慶), 송홍경(宋弘慶)이다. 문인록(門人錄)에는 유함(柳涵), 이정무(李廷武), 조수천(曺守天), 조후겸(曺厚謙) 외 28인의 성명을 기록하였다.
통문은 대체로 김세규 사후 그를 제향하는 문제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