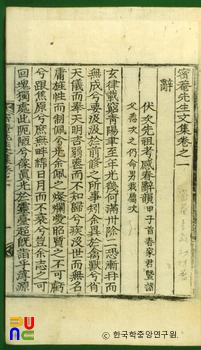밀암집 ()
저자 이재(李栽, 16571730)의 본관은 재령(載寧), 자(字)는 유재(幼材), 호(號)는 밀암(密菴)이다. 조선 후기 퇴계학파의 핵심 인물인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 16271704)의 아들이다. 부친 이현일과 큰아버지 이휘일(李徽逸, 16191672), 작은아버지 이숭일(李嵩逸, 16311698)에게 수학하여 퇴계학파의 전통을 이었다. 청년기에는 부친의 유배지를 따라다니며 봉양하고, 이후로는 유람과 강학(講學)으로 생을 마쳤다. 노년에 장악원주부에 제수되었으나 응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제자로 외손자인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 17111781), 소산(小山) 이광정(李光靖, 17141789) 형제가 있어, 퇴계학파의 가학을 이루었다.
『밀암집』의 편찬자인 이인환(李寅煥, 1686~1732)은 이재의 3남이다. 초명(初名)은 이지휘(李之煇)이고, 자는 도중(韜仲), 호는 농와(聾窩)이다. 형제자매들이 요절하여 가난 속에 부친 이재를 봉양하고 친족들을 부양하는 책임을 모두 짊어졌다. 평생 벼슬하지 않고 학문에 힘썼다.
『밀암집』에는 간행 경위를 서술한 서발문(序跋文)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상정이 정리한 이재의 연보(年譜), 이상정이 지은 이인환의 행장 「농와처사이공행장(聾窩處士李公行狀)」 등에 문집 간행 관련 기록들이 산재한다. 본래 이재는 자신의 저술을 정리하여 원고로 만들어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밀암집』에 합본되어 있는 『밀암부여(密菴瓿餘)』 등이 그러하다. 1732년(영조 8)에 유일하게 생존한 아들인 이인환이 가장 자편(自編) 원고들을 편집하여, 원집 12책, 부록 1책의 체재를 완성했다. 이 체재는 현전하는 목판본 『밀암집』으로 이어진 듯하다. 이인환 사후에 이인환의 친구인 김성탁(金聖鐸, 16841747), 이현일의 제자로서 『갈암집(葛庵集)』 편찬에도 참여한 이광정(李光庭, 16741756) 등이 교정을 가했다. 그러나 간행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이현일의 『갈암집』이 1811년(순조 11)에 간행되었으나 이현일이 1694년(숙종 20) 갑술옥사의 주1에 올라가 있는 탓에 판목(板木)이 회수되고 간행에 관련된 후손들이 유배되는 등, 이현일 가에 대한 탄압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밀암집』의 간행 연대는 미상이나, 이숭일의 문집 『항재집(恒齋集)』(1808년), 이현일의 『갈암집』 간행과 비슷한 시기인 1800년대에 간행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1986년에는 이재의 저술들을 집성한 『밀암전집(密菴全集)』이 여강출판사(驪江出版社)에서 간행되었다.
원집(原集) 25권 13책의 구성이다. 『밀암부여(密菴瓿餘)』 불분권(不分卷) 2책이 합철되어 있다. 10행 20자, 상하내향2엽화문어미(上下內向2葉花紋魚尾)의 목판본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계명대학교 등에 소장되어 있다.
권1·2에는 사(辭)와 시가 수록되어 있다. 시는 모두 356수인데 그 중 만사 51수를 빼면 305수이다. 이 가운데 부친 이현일이 영달해 서울을 오르내릴 때 그를 수행하면서 감회를 읊은 시도 적지 않다. 또한, 이현일이 관직에서 쫓겨나 홍원(洪原)·종성(鍾城)·광양(光陽) 등지로 유배를 당하게 됨에 이재가 아버지를 수행하면서 쓴 많은 시는 주2에 찌든 심정을 잘 나타낸다. 권세가의 몰락을 함정에 빠진 호랑이에 비유한 「맹호행(猛虎行)」, 잣의 공납(貢納)을 비판한 「오엽송가(五鬣松歌)」 등의 현실 비판적인 작품도 있다. 친구인 권두경(權斗經, 1654~1725), 외손자 이상정 등과의 차운시도 있다.
권3∼9에는 서(書)가 수록되어 있다. 서는 100여 명에게 보낸 223편이다. 영남지방에서 구제밀찰(九祭密札: 구사당 김낙행(金樂行)의 제문과 밀암 이재의 편지라는 뜻)이라는 명성을 얻은 이재의 서찰을 볼 수 있다. 서찰을 주고받은 인물 가운데는 정시한(丁時翰)· 이만부(李萬敷)· 권상일(權相一) 등의 저명한 학자, 후에 『밀암집』을 교정한 이현일의 제자 김성탁, 외손자 이상정 등이 있다. 이들 서찰에는 이기설(理氣說)·사칠설(四七說)·예설·경의(經義) 등에 관한 문답이 많아 이재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권두경에게 보낸 서찰들에는 『갈암집』의 교정을 논의한 내용이 많다. 권9에는 가족들에게 보낸 서찰들을 모아두었다.
권10·11에는 잡저(雜著)로서 금수기문(錦水記聞)이 수록되어 있다. 이재의 학문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다. 이재가 부친 이현일, 숙부 이숭일 등의 스승에게 들은 말들, 주희(朱熹)를 비롯한 선현들의 어록, 태극설·이기설·수양론·인심도심설 등 순수한 학문적인 문제들에 관해 그가 읽고, 듣고, 느낀 바 등을 수집, 기록한 것이다.
권12에는 잡저 11편과 서(序) 10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상정에게 주경궁리(主敬窮理)의 중요성을 말한 「증외손이상정(贈外孫李象靖)」, 권두경의 문집 『창설재집(蒼雪齋集)』의 서문인 「설옹유권서(雪翁遺卷序)」 등의 다양한 글들이다.
권13에는 기(記) 16편이 수록되어 있다. 학봉(鶴峰) 김성일(金誠一, 1538~1593)이 강학했던 석문정사에 대한 「석문정사중수기(石門精舍重修記)」 등, 퇴계학파 관련인들의 재당(齋堂)에 대한 기문들이 주를 이룬다.
권14에는 발(跋) 23편· 잠(箴) 1편· 명(銘) 4편· 상량문(上樑文) 3편이 수록되어 있다. 김성일의 연보인 『학봉선생연보(鶴峯先生年譜)』의 발문, 스스로를 경계하는 「자경잠(自警箴)」, 「자명(自銘)」, 안동의 묵계정사(默溪精舍) 상량문 등이다.
권15에는 애사(哀詞) 5편· 축문(祝文) 18편· 제문(祭文) 19편이 수록되어 있다. 묵계정사(묵계서원)의 제문, 수신(水神)에 대한 제문, 권두경 등의 벗과 가족들을 위한 제문들이다. 합철된 『밀암부여』의 수록 작품과 중복된다.
권16에는 전(傳) 6편· 비(碑) 1편이 수록되어 있다. 사르후 전투(1619년)에서 전사한 김응하(金應河), 병자호란의 삼학사(三學士) 등에 대한 기록들이다.
권17~23에는 묘표(墓表) 4편·묘갈명 11편·묘지명 21편· 행장(行狀) 22편이 수록되어 있다. 권두경 등의 지인들과 부친, 여동생, 아들들을 비롯한 가족들의 묘도문자들이다. 그 외에 아버지와 어머니 등 가족들의 유사(遺事)를 기록한 가전(家傳)·실기(實記), 선조들의 고사인 가세고사(家世故事), 자신의 생애를 술회한 밀암자서(密菴自序)도 있다.
권24·25는 부록으로, 이상정이 지은 연보·김성탁이 지은 행장·이광정이 지은 묘지명·여러 학자들이 지은 만사·애사·제문 등 이재를 위한 묘도문자들이 수록되어 있다.
조선 후기 퇴계학파의 학문과 사승 및 교유관계를 보여 주는 핵심 문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