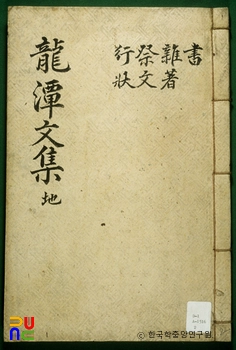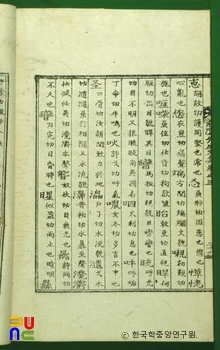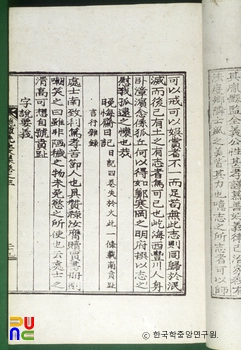용담문집 ()
『용담집』은 조선 중기 영남 유학자인 임흘의 시문을 편집한 문집이다. 시는 대체로 충담소산(沖澹蕭散)한 풍격이 체현된 작품들이 많다. 정구, 조호익과 주고받은 편지를 통해 임흘의 경학가적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자설요의(字說要義)」라는 자전을 남겼는데, 자학(字學)을 연구하는 이들이 주목할 만한 자료이다. 1920년 후손 임시호가 석인본으로 출간했다가 1976년 『가례부해(家禮附解)』가 발견되어, 1993년 구본과 합집하여 중간(重刊)하였다. 이 책은 『주자가례』에 퇴계와 한강의 예설(禮說)을 첨부한 책이다.
용담(龍潭) 임흘(任屹)의 자는 탁이(卓爾), 호는 용담 외에 만회재(晩悔齋), 나부산인(羅浮山人), 구방재(求放齋), 양심재(養心齋), 주일헌(主一軒) 등이고, 본관은 풍천(豊川)이다. 고조부는 수안군수를 지낸 임한(任漢), 증조부는 소간공 임유겸(任由謙), 조부는 함양군수를 지낸 임건(任楗), 부친은 선무랑 임태신(任泰臣), 어머니는 현감을 지낸 금응종(琴應鍾)의 딸 봉화 금씨이며, 부인은 이우(李堣)의 증손녀이자, 첨정 이빙(李憑)의 딸이다.
1582년(선조 15) 생원시에 합격했으나 벼슬길에 뜻을 버리고, 1587년 경상도 안동부 내성현 용담리로 이주하였다. 또한 영천군(榮川郡) 적덕 냇가에 취교정(翠蛟亭)을 짓고 소요하였다. 임흘은 퇴계의 고제(高第) 박승임(朴承任)에게 학문을 배우고, 이후에는 정구(鄭逑)의 문인이 되어 예학 연구에 몰두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유종개(柳宗介), 윤흠신(尹欽信), 윤흠도(尹欽道), 김중청(金中淸) 등과 상의하여 의병을 일으켜 살부령(薩扶嶺)에 복병하여 군기(軍旗)와 우마(牛馬)를 노획하였다. 유종개가 전사하자 병졸들을 모아 김해(金垓), 곽재우(郭再祐)의 막하로 들어가 활동하였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부친상을 당하여 귀향하였다. 의병 활동의 공으로 전옥서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당쟁이 격화되자 이를 규탄하는 상소문을 올리고 사직하였다. 광해군 연간 동몽 교관에 제수되었지만, 사직하고 향리로 돌아와 학문에 전념하였다. 만년에는 거처를 예안현 온계리로 이주하였다. 이즈음 퇴계의 급문제현들 중 오직 조목(趙穆)만 생존하였기 때문에, 만년에 임흘은 그에게 사사하여 퇴계를 사숙하고자 하였다. 조목 사후에는 두문불출하며 독서로 소일하다가 1620년 64세의 나이로 졸서하였다.
임흘은 시문(詩文)과 사부(詞賦) 또 사제 간에 강론한 서찰과 예설(禮說) 등 적지 않은 저술이 있었지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중에 일실되었고, 나머지를 매계(梅溪) 임세번(任世翻)이 수습하였지만, 그가 강학하였던 침간정(枕澗亭)에 화재가 나서 또 한 번 일실되었다. 이후 지암(芝巖) 임상두(任象斗)가 잔여 문적들을 수집하고, 임흘이 교유했던 제현(諸賢)들의 문집에서 광범위하게 취합하였다. 1920년 경 낙포(洛浦) 임시호(任時鎬)가 석인본으로 간행하였고, 이후 1976년 대구 임계순(任桂淳)의 집안에서 『가례부해(家禮附解)』 6권 4책이 발견되어, 1993년 석인본 구본과 합집하여 중간(重刊)하였다. 이것이 『용담전집(龍潭全集)』이다. 또한 『용담전집』에는 임흘의 유묵(遺墨)과 예안 용수사(龍壽寺)에서 주석하던 사명당(四溟堂, 俗名:任惟政)이 족의(族誼)로 증서한 유묵을 함께 영인하였다.
권1에는 시(詩) 143수가 있는데, 대체로 충담소산(沖澹蕭散)한 풍격이 체현된 작품들이 많다. 또한 절반 정도가 연작시인데, 「용담쾌각제영3수(龍潭快閣題詠三首)」과 「용담잡영41절(龍潭雜詠四十一絶)」을 비롯하여 「용담10경(龍潭十景)」, 「한거20영(閑居二十詠)」, 「나부잡영28수(羅浮雜詠二十八首)」가 대표적인 작품이다.
권2에는 한강 정구에게 보내는 2편의 편지와 문목(問目)이 실려 있다. 정구는 『심경(心經)』과 예학에 조예가 깊었는데, 임흘이 보낸 문목도 『심경』과 관례(冠禮), 국휼(國恤) 중 제사, 상례와 제례, 오례의(五禮儀) 등 예학에 집중되어 있다. 비록 2편의 편지와 문목이지만 저자의 학문적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며, 특히 예학에 관한 학문적 관심이나 실용적 예에 대한 생각들을 알 수 있다.
권3에는 편지 13편과 잡저 5편이 수록되어 있다. 편지를 주고받은 인물은 조호익(曺好益), 김령(金坽), 곽진(郭瑨) 등이다. 그중 조호익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학문적 교류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퇴계 이황 『성학십도』의 ‘무극(無極)’의 해석, 「경재잠」에서 ‘주선중규(周旋中規)’와 ‘승마절선(乘馬折旋)’의 주석에 대한 질의, 「숙흥야매잠」에서 ‘물이(勿貳)’, ‘무일석무리지지(無一席無理之地)’, ‘엄숙정제(嚴肅整齊)’ 등과 예학에 대한 질의 등이 주요한 내용들이다. 정구, 조호익과 주고받은 편지를 통해 임흘의 경학가적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잡저에는 성현의 격언을 모아 놓은 「성현격언정과항송(聖賢格言靜裹恒誦)」, 권시중(權是中)의 효성을 기록한 「양로낭설(養老囊說)」 등이 있다. 특히 「자설요의(字說要義)」는 170여 자의 상용자와 벽자, 첩어의 음훈을 풀이한 일종의 자전이다. 음은 반절어를 사용하였는데 간혹 한글음을 병기하기도 하였다. 훈은 각종 경전과 사서, 제자백가까지 인용하였다. 광범위한 독서 과정의 결과이거나 후학들의 독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기록은 동시대 안동 선비들의 문집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거니와 한국 한자학을 연구하는 이들이 주목할 만한 자료이다. 하지만 말미에 이하결(以下缺)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미완성으로 남긴 것으로 보인다.
권4에는 박승임(朴承任), 조목(趙穆), 정구(鄭逑) 세 스승과 물암(勿巖) 김륭(金隆), 면진재(勉進齋) 금응훈(琴應壎), 대암(大庵) 박성(朴惺), 명서(明瑞) 박용길(朴龍吉)을 위해 쓴 제문이 있고, 박록(朴漉)에게 청탁받았던 「소고선생행장(嘯皐先生行狀)이 실려 있다.
권5, 6은 부록이다. 권5에는 이급(李級)과 정범조(丁範祖)가 지은 행장, 안정복(安鼎福)이 지은 묘지명, 이헌경(李獻慶)이 지은 묘갈명, 또한 저자 행적을 알 수 있는 실증적 자료들을 기사별로 모은 「실적차록(實蹟摭錄)」 등이 수록되었다. 권6에는 김중청(金中淸), 김령(金坽)이 쓴 만사와 박승임, 조목, 정구 등 스승과 사우들이 임흘에게 보내준 시와 편지들이 실려 있다.
부록 『가례부해(家禮附解)』는 임흘이 왜란과 호란을 겪은 뒤 사친경장(事親敬長)의 예(禮)와 송종보본(送終報本)의 의(義)가 무너졌음을 개탄하여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대한 영남 선현들의 예설(禮說)을 첨부한 책이다. 인용된 빈도를 살펴보면 퇴계의 설이 36조, 한강의 설이 45조, 지산의 설이 11조이다. 이는 임흘이 퇴계 학맥의 예학을 전수받았다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용담 임흘은 소고 박승임, 한강 정구, 월천 조목을 두루 사사하며 퇴계의 학맥을 이었다. 『용담집』은 퇴계 학맥의 전수와 임흘의 학문적 성향 및 교유를 두루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