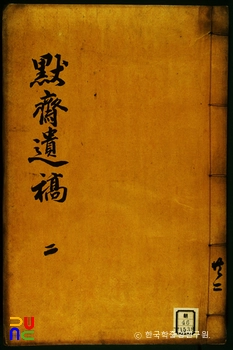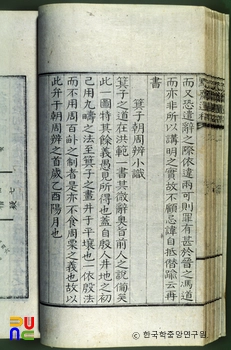묵재유고 ()
『묵재유고』는 조선 후기의 학자 한경원(韓敬源, 1817~?)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간행한 시문집이다. 1937년에 석인본으로 간행하였다. 조선 후기 대사헌, 공조판서, 한성부판윤 등을 역임한 저자의 문자 생활 및 학문적 성취와 함께 구한말 갑신정변으로 어지러웠던 당시 사회상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4권 2책. 석인본.
1937년 서상춘(徐相春)의 교열을 거쳐, 한영석(韓永錫)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1936년에 작성한 서상춘의 서문이 있다. 서문에 의하면 저자의 증손 한기영(韓耆永)이 유고를 모아 4권으로 편집하고는 간행하려 하였으나 갑자기 서세하여 출간되지 못하였는데, 그 아들 한상철(韓相喆)이 그 뜻을 이어받아 한 질을 주1 서상춘에게 교정과 함께 서문을 부탁하였다고 하였다.
권1·2에 시· 소(疏)· 서(書)· 서(序)· 기(記)· 발(跋)· 제문(祭文)·고문(告文)· 애사(哀詞), 권3·4에 묘지(墓誌)· 행장(行狀)·유사· 잡저(雜著)·유계서(遺戒書)·소장(訴狀)· 통문(通文), 부록으로 제문·행장·묘갈명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28수가 남아 전한다. 작품 수가 많지 않은 것은 작품들의 작성 연대가 듬성듬성한 것을 보아, 증손대에 문집을 편찬할 때 유고가 이미 온전히 전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시는 특별한 장소를 방문하거나 특별한 일이 있었을 때 지은 것, 주희의 시에 차운한 것, 친구에게 증여한 것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백회시(百懷詩)」는 옛 사람 중에 「백수시(百愁詩)」가 있는 것을 본떠서 지은 것으로 스스로를 경계하고 두 아들에게 보인 것이다.
서(序) 중에서 1883년(고종 20)에 거교(巨橋)에 동규(洞規)를 새로 만들면서 쓴 「거교동규서(巨橋洞規序)」, 1884년에 회인(懷仁, 현,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에 새로 학교를 세울 때 쓴 「회인학교규범서(懷仁學校規範序)」, 학문하는 계를 만들면서 작성한 「박학계서(博學契序)」 등은 각각 당시의 생활 규범과 학교 규범, 그리고 공부 방법론을 알려주는 좋은 자료가 된다.
잡저의 「호락이기변(湖洛理氣辨)」에서는 학문에서 이론의 명확함과 시비의 공평함을 취택하지 않고 편당을 가지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 겸손하고 신중한 태도로 학문에 임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 글에서 저자는 우주만물은 이(理)와 기(氣)의 이원적 요소(二元的要素)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하나라도 결핍되면 우주의 만상을 표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기의 도덕적 가치를 논하면서 이는 순선무악(純善無惡)하고, 기는 유선유악(有善有惡)해, 이는 절대적 가치를 가진 데 비해 기는 상대적 가치를 가졌다고 하였다. 또한, 인(人)과 물(物)이 태극(太極)에는 한 근원이나 오상(五常)에는 같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기자조주변(箕子朝周辨)」은 주2가 주(周)나라 주3에게 신하 노릇한 사실이 없는데, 주4이 『사기(史記)』에 잘못 기록함으로써 기자조주설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경사(經史)를 두루 인용하여 20여 절목에 걸쳐 고증한 변설이다. 또한, 기자가 지었다는 「맥수가(麥秀歌)」 역시 후인의 모의작품이라 하고, 「맥수가」 가운데 의리에 잘못된 점을 낱낱이 들어 기자가 주나라에 주5 않았음을 거듭 강조하였다.
그리고 주6은 만세의 대경대법이므로 기자가 무왕에게 전했을 뿐이며, 무왕 한 사람을 위해 지은 것이 아님을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기자가 동해로 망명와서 은나라의 문물 제도를 따라 정전법을 시행했음을 기술하면서 그 정전도를 첨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