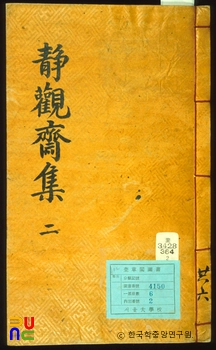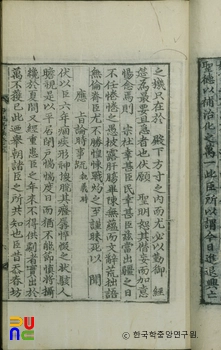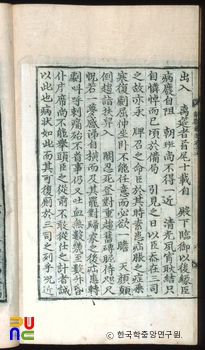정관재집 ()
『정관재집』은 조선 후기의 학자 이단상의 문집이다. 원집이 1682년, 별집이 1706년에 간행되었다. 속집의 간행 연대는 미상이다. 목판본이다. 이단상은 이정귀의 손자이자 이명한의 아들이고, 김수항, 남용익, 박세채, 송시열, 민정중 등 당대 명사들과 폭넓게 교류했다. 문하에서 김창협, 김창흡 형제 등을 배출하기도 했다. 『정관재집』은 노론, 소론이 분기되기 직전, 서인계 학맥의 핵심이었던 저자의 사상과 교유 관계를 보여 주는 문헌 자료이다.
저자 이단상(李端相, 16281669)의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유능(幼能), 호는 서호(西湖), 동강(東岡), 정관재(靜觀齋)이다. 월사(月沙) 이정귀(또는 이정구, 李廷龜, 15641635)의 손자이고, 백주(白洲) 이명한(李明漢, 15951645)의 막내아들이다. 이일상(李一相, 16121666)의 동생이다. 이정귀, 이명한, 이일상은 조선시대 최초로 3대가 주1을 잡은 것으로 명성을 얻었다. 이단상은 1641년(인조 19)의 진사시(進士試)에 입격(入格)하고 1648년(인조 26)의 진사시에 다시 장원을 차지했으며, 1649년의 문과 정시(庭試)에 급제했다. 이후 승정원 가주서, 예문관 검열, 성균관 전적, 병조 정랑, 이조 좌랑을 역임했다. 1655년(효종 6)에는 김수항(金壽恒), 남용익(南龍翼), 사촌인 이은상(李殷相) 등과 함께 선발되어 주2를 했다. 복직하여 홍문관 부수찬, 이조 정랑, 의정부 사인, 홍문관 응교, 사간원 사간, 사헌부 집의(종3품)에 이르렀으나, 1665년(현종 6)부터는 사직하여 경기도 양주(楊州)의 동강(東岡)에 거처하며 강학(講學)으로 생을 마쳤다. 정관재(靜觀齋)의 당호(堂號)를 정한 것도 이 시기이다. 사후 1680년(숙종 6)에 이조참판에 추증되었고, 1743년(영조 19)에 문정(文貞)의 시호를 받았다. 경기도 지역 노론(老論)의 대표적인 서원인 석실서원(石室書院)에 김수항과 함께 제향(1697년)되었다. 제자로 아들인 이희조(李喜朝), 김수항의 아들들인 김창협(金昌協, 16511708), 김창흡(金昌翕, 16531722), 박세채(朴世采)에게도 수학한 임영(林泳, 1649~1696) 등이 있다.
『정관재집』의 초고를 편집한 이희조(李喜朝, 16551724)의 자는 동보(同甫), 호는 지촌(芝村)이다. 이단상의 아들로, 이단상과 송시열(宋時烈, 16071689)에게 수학했다. 1680년(숙종 6)의 경신환국(庚申換局)으로 남인이 축출되고 노론이 집권하자 민유중(閔維重, 16301687) 등의 천거를 받아, 건원릉참봉, 금부도사, 공조좌랑, 인천현감, 해주목사, 청풍부사, 사헌부장령, 형조참의, 공조참판, 대사헌 등을 역임했다. 문과에 급제하지 않았음에도, 가문의 명성과 집권당 노론의 후원으로 현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희조는 회니시비(懷尼是非)를 비롯한 당대의 당파 갈등이나 중앙 조정의 환국 등, 정치적 국면에서 송시열 등을 극력 변호하는 등, 생애에 걸쳐 노론계 정치 활동의 전면에 나섰다. 결국, 17211722년(경종 1~2)의 신임사화(辛壬士禍)로 주3이 사형당할 때 일당으로 지목되어, 유배지로 가던 중 정주(定州)의 객사(客舍)에서 사망했다. 1725년(영조 1)에 곧바로 신원되어 좌찬성에 추증되고 문간(文簡)의 시호를 받았으며, 부친 이단상이 제향된 학산서원(鶴山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 『지촌선생문집(芝村先生文集)』이 있다. 1754년에 간행된 목판본이다.
『정관재집』을 교정한 박세채(朴世采, 16311695)의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화숙(和叔), 호는 남계(南溪)이다. 이단상의 외사촌이다. 김상헌(金尙憲, 15701652), 김집(金集, 1574~1656)의 제자로, 송시열과는 동문이다. 서인이 노론과 서론으로 분화될 때, 소론의 영수가 되었다. 이후로 온건한 입장에서 소론과 노론을 조율하여, 탕평책의 현실화에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성리학과 예학에 통달하여, 많은 저술을 남겼다. 정치사와 사상사의 양 쪽에서 중요한 인물이다. 시호는 문순(文純)이고, 종묘와 문묘(文廟)에 동시 제향된 6현 중의 한 명이다.
『정관재집』 원집의 간행을 주선한 윤지선(尹趾善, 16271704)의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중린(仲麟), 호는 두포(杜浦)이다. 이조판서 윤강(尹絳, 15971667)의 아들이다. 벼슬은 우의정에 이르렀다. 동생인 좌의정 윤지완(尹趾完, 1635~1718)과 함께 소론계 정승으로서 숙종대 탕평책의 시행에 역할을 했다. 이단상에게 수학한 바 있다.
『정관재집』은 원집, 별집, 속집이 순차적으로 간행되었다. 원집의 권두에 송시열, 박세채의 서문, 권말에 임영, 윤지선의 발문이 있고, 별집의 권말에 이희조의 발문이 있어, 그 간행 경위를 알 수 있다.
먼저 원집은 1682년(숙종 8)에 간행되었다. 이단상의 아들 이희조가 가장(家藏) 원고를 정리하고 주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단상의 저작을 수집하여 초고로 만든 뒤, 이단상의 외사촌 박세채와 제자 임영에게 교정을 의뢰했다. 시(詩)는 이단상의 친구인 김수항과 남용익이 교정했다. 이 교정본을 당시 함경도관찰사로 있던 제자 윤지완이 함경도감영에서 목판으로 간행했다.
별집은 1706년(숙종 32)에 청풍부사로 부임한 이희조가 주4에서 간행했다. 각종 묘도문자와 연보가 증보되었다.
속집은 간행 경위를 알려 주는 서발문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희조가 편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누판고(鏤板考)』에 원집과 별집만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누판고』가 제작된 후인 순조 연간 이후에 간행되었으리라는 분석이 있다.
본집 16권 6책, 별집 6권, 연보 2권, 총 4책, 속집 10권 3책, 도합 34권 13책의 구성이다. 원집은 10행 20자, 상하내향3엽화문어미(上下內向3葉花紋魚尾), 별집은 10행 20자(연보는 7행 18자), 상하내향잡어미(上下內向雜魚尾), 속집은 10행 20자, 상하내향2엽화문어미(上下內向2葉花紋魚尾), 모두 목판본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고려대학교 도서관,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 연세대학교학술문화처 도서관 등에 본집과 별집이 합철된 판본, 본집~속집을 모두 갖춘 판본 등, 여러 종이 소장되어 있다.
본집은 권1∼3에 시 390여수가 수록되어 있다. 시는 묘사와 표현이 정확하고 예리하다. 시체(詩體)를 구분하지 않고, 창작 시기순으로 편차했다. 청년기의 작품을 주로 수록한 권1에는 과작(課作)이라는 주석이 붙은 작품이 많다. 권2에는 김수항 등, 주변인과의 주5가 많다. 만년의 작품인 권3에는 지인들을 애도하는 만시(挽詩)가 대부분이다. 마지막 작품인 「유시(遺詩)」에는 사망하기 3일 전에 지었다는 주석이 있다.
권4∼6에는 교서 2편, 소(疏) 24편, 권7에 계(啓) 13편이 수록되어 있다. 소의 「응지논시사소(應旨論時事疏)」는 1656년(효종 7) 교리로 있을 때 왕명에 따라 시폐를 상소한 것이다. 내용은 대개 ① 의견을 구하는 왕명에 응하여 상소를 올렸다가(應旨上疏) 뜻에 거슬린다고 역률(逆律)로 장살(杖殺)한 경우도 있으니 이러한 처사를 지양할 것, ② 대신(臺臣)들의 언로를 더욱 개방할 것, ③ 주6이나 주7의 영을 풀어 주어 필부(匹夫)의 원한을 풀 것, ④ 멀리 귀양 보내(投配)는 명령을 폐기할 것 등이다. 「논정개청서원사소(論鄭介淸書院事疏)」는 1658년 응교 재직 때 올린 것으로, 정개청(鄭介淸, 1529~1590)이 「배절의론(排節義論)」을 지은 바가 있으며 또 그 스승인 박순(朴淳)을 배반하고 역적 정여립(鄭汝立)에게 아부해 사문(斯文)의 대죄를 지었으므로 서원에 제향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 논조가 강경하고 신랄하다. 두 번째의 「응지논시사소」는 임금에게 ① 그의 6대조인 이석형(李石亨)이 지은 『대학연의집략(大學衍義輯略)』을 읽어 전조(前朝)의 치란(治亂)에 대한 사실을 알도록 할 것, ② 사서(史書)보다는 역시 경서가 군주의 일심(一心)을 바로잡는(格)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 ③ 송시열 · 송준길(宋浚吉) 등 초야에 묻힌 현인들을 기용할 것 등을 건의한 것이다.
계의 「어사시계(御史時啓)」는 암행어사로 있을 때 올린 글로, 대개 전라도에서 재앙을 입은 9읍 중 만경 · 옥구 · 김제 · 용안 · 함열 · 임파 등 7읍에 관한 민정 보고서이다. 「복명후진연로문견계(復命後陳沿路聞見啓)」는 영남 지방의 대동법 시행 문제, 입암산성(笠巖山城)의 군납 문제, 소나무 벌목금지〔松禁〕의 상황, 장흥의 말 방목(放馬) 문제, 완도의 선박 재료(舶材) 문제, 각 진(鎭) 번군(番軍)의 대리복무〔代立〕 문제, 성균관 노비가 신공(身貢)을 납부할 때의 민폐 문제, 영광 파시평(波市坪)의 진상 어물(進上魚物) 문제, 관찰사 순시 문제 등 당시의 상황을 소상하게 기록해 시정(施政)의 상태를 아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권8∼13에는 서(書) 155편이 수록되어 있다. 송준길, 송시열, 조복양(趙復陽), 민정중(閔鼎重), 김수항, 남구만, 박세채 등에게 보낸 서찰들이다. 안부인사 외에, 상례(喪禮)에 대한 문답, 경의(經義)에 대한 질의 등이다.
권14에는 서(序) 4편, 발(跋) 2편, 제문(祭文) 7편, 공이(公移) 2편이 수록되어 있다. 서는 지방관으로 부임하는 동료들을 전송하는 서문들이고, 제문은 왕명으로 지은 사제문(賜祭文), 기우제문 등이다.
권15·16은 부록으로, 행장 · 신도비명 · 묘지명 · 묘표 · 제문 · 만사 등이 수록되어 있다. 행장은 박세채가, 신도비명은 송시열이, 묘지명은 김수항이 각각 지었다.
별집은 권1에 시 48수, 권2~3에 서(書) 130여 편, 권4∼6에 부록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차운시와 만시가 대부분이다. 서(書)에는 이일상(李一相), 송준길, 송시열, 홍명하(洪命夏), 김수항, 민정중, 민유중, 박세채, 임영 등에게 보낸 것이다. 가장 앞에는 송시열이 지은 「정관재기(靜觀齋記)」, 「영지동기(靈芝洞記)」, 「영지동팔영(靈芝洞八詠)」 등이 있다. 영지동은 이단상의 자택 정관재가 소재한 곳이다. 이어서 제자 임영이 1672년에 지은 「장보후서(狀譜後序)」, 김창협이 1680년에 지은 「장지후서(狀誌後序)」, 아들 이희조가 정리한 언행록과 「묘지명후기(墓誌銘後記)」 등, 이단상의 이력과 관련된 글들이 수록되었다. 후반부에는 이단상을 석실서원에 배향하기를 청하는 유생들의 상소, 서원의 상량문, 제문과 만사, 이단상의 세계도(世系圖) 등이 수록되어 있다. 별집에 이어, 이희조의 발문과 이단상의 연보 2권이 있다.
속집은 권18에 잡저(雜著), 권910에 부록이 수록되어 있다. 종묘 영녕전(永寧殿)의 제도에 관한 글들을 모은 「영녕설(永寧說)」, 청나라에 대한 보복을 논한 「복수설(復讐說)」, 이학과 예학에 관한 「물격설(物格說)」, 「오경전수설(五經傳授說)」, 「의례설(儀禮說)」 등, 다양한 주제의 저작들이다. 부록은 제문, 만시 등을 추가로 모았다.
이외에 이단상의 저서로는 『대학집람(大學集覽)』 · 『사례비요(四禮備要)』 · 『성현통기(聖賢通紀)』 등이 있다고 하나 이 시문집에는 실려 있지 않다.
서인계 학맥의 핵심 인물이 저술한 문헌 자료로, 당대 정치, 사상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