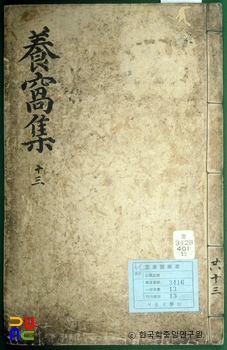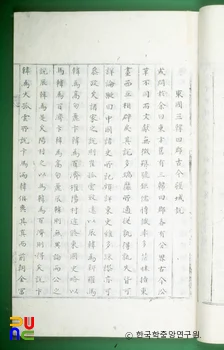양와집 ()
『양와집』은 조선 후기의 문신 이세귀(李世龜, 1646~1700)의 시·서(書)·문목·제문 등을 수록한 시문집이다. 필사본의 형태로 전한다. 이항복(李恒福)의 증손이자 박장원(朴長遠)의 문인으로서 경학과 설에 두루 밝았던 저자의 학문적 성취와 함께 일상의 문자 생활을 살펴볼 수 있다.
13책의 필사본이다.
저자 사후에 아들 이광좌(李光佐, 16741740)가 행록(行錄)과 유사(遺事)를 짓고 심육(沈錥)이 1742년경에 묘갈명을 지었다.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의 『임하필기(林下筆記)』 권27 춘명일사(春明逸史)의 「양현문집(兩賢文集)」에 홍직필(洪直弼)이 이유원의 부친 이계조(李啓朝)에게 저자와 이세필(李世弼)의 문집을 베껴 가게 해 달라고 청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고, 또 이유원의 문집 『가오고략(嘉梧藁略)』에는 저자의 행장과 문집의 서문이 수록되어 있다. 그 행장에 이세구(李世龜)의 저작에 대해 “저술한 시문 약간권, 경예설(經禮說) 3권, 상복문답(喪服問答) 2권[所著有詩文若干卷 經禮說三卷 喪服問答二卷]”이라고 하였고, 서문에는 “선생이 저술한 글 약간권을 책상자에서 얻었다[先生所著文畧干卷 得之巾衍]”라고 하고 있어, 저자의 문집은 정고본(定稿本)의 형태로 집안에 전해 내려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문집이 간행되지 못한 것은 이광좌가 1755년(영조 31)에 일어난 나주벽서사건에 연좌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제1∼3책에 시 717제 870수, 제4책에 소(疏) 6편, 서(書) 63편, 제5책에 설(說) 2편, 서(書) 20편, 기의(記疑) 1편, 논시서(論詩序) 1편, 제6·7책에 문목(問目) 31편, 제8책에 서(書)와 문목 21편, 제9책에 서(書) 29편, 제10책에 제문 27편, 묘지 9편, 묘표 3편, 가장 4편, 제11책에 가장 2편, 사적 3편, 술선록(述先錄) 2편, 어록 1편, 제12책에 발(跋) 4편, 제(題) 11편, 지(識) 3편, 전(傳) 3편, 찬(贊) 1편, 서(序) 1편, 명(銘) 3편, 잡저 4편, 일기 1편, 제13책에 잡저 2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의 「관전함(觀戰艦)」은 이순신이 만든 거북선을 보고 읊은 것으로, 당시까지 거북선이 남아 전해 왔음을 추측하게 한다. 시경(時景)과 풍속을 주제로 한 것이 많으며, 또한 두시(杜詩)의 주1이 많이 있다. 잡체시(雜體詩) 또는 배해체(排諧體)가 더러 있는 것이 특이하다. 관동 지방 여행 중 여러 명승고적을 소재로 지은 시가 돋보인다.
소는 대부분 사직소이다. 서(書)는 분량이나 내용면에서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제4책에서 제9책까지 거의 문목 형태로 학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제4책에는 윤증(尹拯) · 남구만(南九萬) · 박세채(朴世采) 등과 『가례원류(家禮源流)』 · 『근사록(近思錄)』 및 변례(變禮) · 성리설 등에 관해 문답한 내용이 있다.
제5책에는 물격(物格)을 논하고 있는데, ‘격(格)’자의 해석을 이황(李滉) · 이이(李珥)가 정주(程朱)의 학설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점에 대해 박세채 등과 문답하고 있다. 『대학』 정심장(正心章)의 해석에 대한 이황의 학설에 일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이밖에도 사서(四書)와 『서경』 중에서 의심나는 것을 뽑아 문답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제6책은 『심경석의교본(心經釋疑校本)』에 대한 자문자답의 논저와, 친구인 이정천(李挺天)과 『심경』 · 『근사록』에 관해 논의한 것 등으로, 상당히 깊이 있는 이론을 펼치고 있다. 제7책에는 『소학』의 주설(注說)에 관해 윤증에게 질정한 내용의 「소학기의(小學記疑)」가 있고, 『가례』에 관한 문목으로 「가례지두부첨(家禮紙頭付籤)」이 있다. 「가례지두부첨」에서는 『가례』가 주자의 저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송익필(宋翼弼) · 김장생(金長生)의 학설과 『당회요(唐會要)』 · 『예기』 등을 인용하여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있어 주목된다.
제8책은 상례(常禮)와 변례에 관한 박세채 등과의 문답이다. 제9책의 「답삭녕형별폭(答朔寧兄別幅)」은 당시 기해예설(己亥禮說)의 핵심 문제였던 효종(孝宗)의 정체설(正體說)에 관해 논설한 장편의 글로, 어떤 편당에 치우침이 없이 객관적인 입장으로 기술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제11책에는 권율(權慄)과 정충신(鄭忠信)의 행적 등이 소개되어 있다. 제12책의 「동유록(東游錄)」은 금강산을 유람하고 오는 길에 적은 일기로, 각 지방의 풍물과 역사가 간결하게 서술되어 있다.
제13책의 「유사군록(游四郡錄)」은 충주 · 안동 · 풍기 · 예천 일대를 여행한 기행문이다. 「동국삼한사군고금강역설(東國三韓四郡古今疆域說)」은 삼한과 한사군의 경계와 지역에 대한 최치원(崔致遠) · 김부식(金富軾) · 권근(權近) · 오운(吳澐) · 양성지(梁誠之) 등의 학설에 비판을 가하고, 한백겸(韓百謙)이 『동사찬요(東史纂要)』 후서(後敍)에서 밝힌 대로 한사군은 북쪽, 삼한은 남쪽에 있었다는 학설을 지지하였다. 이 글에서는 그에 대한 입증을 상세히 제시하여, 「북관주현연혁시말기(北關州縣沿革始末記)」와 함께 역사 연구의 좋은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