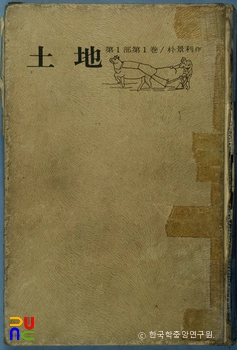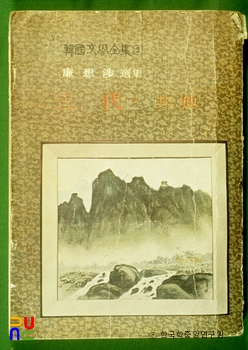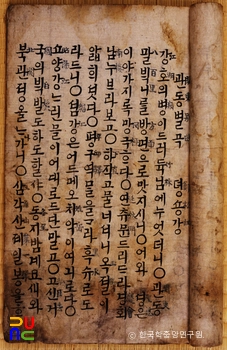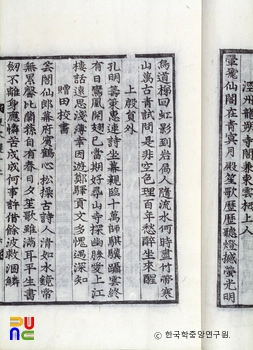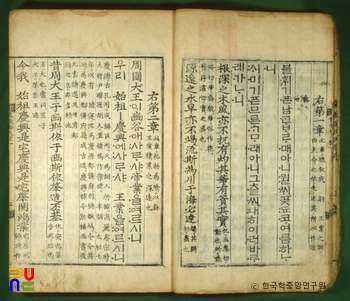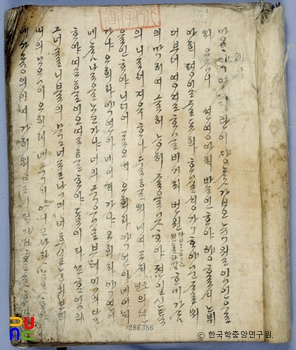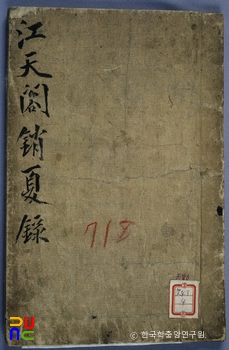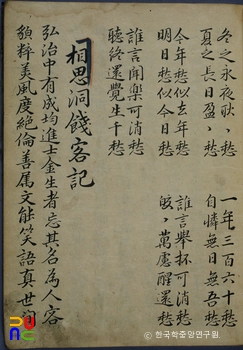문학 ()
문학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다. 말로 된 것이든 글로 적은 것이든 언어예술이면 모두 문학에 포함된다. 한국문학은 한국인의 문학이고 한국어로 된 문학으로, 고저·장단·강약의 구분이 어렵고 운이 발달하지 않은 한국어의 영향을 받았다. 처음에는 말로 이루어지고 말로 전하는 구비문학뿐이었다. 이후 동아시아의 공동 문어인 한자가 수용된 후에 생긴 한국한문학도 한민족이 쓰고 한민족의 생활을 다룬 문학이므로 한국문학에 포함된다. 그리고 한글이 창제된 후 국문으로 쓰인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포함한 국문 기록문학이 있다.
문학의 개념과 범위
문학은 언어예술이다. 언어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다른 예술과 구별되고, 예술이라는 점에서는 언어활동의 다른 영역과 차이점이 있다. ‘문학’이라는 용어의 ‘문’은 말이 아닌 글을 뜻하고, ‘학’은 예술이 아닌 학문을 지칭하는 것 같지만, 용어의 어원에 따라서 대상의 성격이 규정되지는 않는다.
말로 된 것이든 글로 적은 것이든 언어예술이면 모두 다 문학인데, 문학에 대한 비평과 연구가 오랫동안 글로 적은 문학을 특히 중요시하였던 사정이 용어에 흔적을 남겼을 따름이다.
예술과 학문이 구별되지 않던 단계에서 문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여 혼란이 생겼으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예술활동은 ‘문학’이라 하고, 학문활동은 ‘문학연구’라고 한다.
이이(李珥)는 사람이 내는 소리로 뜻을 가지고, 글로 적히고, 쾌감을 주고, 도리에 합당한 것을 문학이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렇게 규정한 데에 문학의 기본 성격과 문제점이 잘 요약되어 있다.
언어는 일정한 뜻을 지닌다는 점에서 다른 소리와는 구별된다. 뜻을 기본 요건으로 삼기에 문학을 의미예술이라고 할 수도 있다. 글로 적힌다는 것은 문학의 기본 요건일 수 없으나 오랫동안 그렇게 인식되어 왔다.
쾌감을 주고 도리에 합당한 것이 문학이라고 한 말은 언제나 논란이 되고 있는 문학의 양면성을 잘 지적하였다. 문학작품이 수용자를 즐겁게 하면서 진실을 깨우쳐 준다는 양면성은 어느 한 쪽도 부정할 수 없으나, 둘 사이의 관계와 비중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문학관이 달라진다.
즐거움과 깨우침 중에서 즐거움을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으면 문학에 포함시킬 수 있는 말이나 글이 아주 많아진다. 깨우침을 부차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문학적 표현은 실용적인 언어 사용과는 다르다는 점이 강조되고, 문학의 범위는 줄어든다. 이처럼 문학의 범위는 넓게 잡을 수도 있고 좁게 잡을 수도 있다.
원래는 문학의 범위가 넓었으나 신문학운동 이후 사정이 달라졌다. 이광수(李光洙)는 ‘문학’이라는 말을 ‘리터리처(literature)’의 번역어로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지(知) · 정(情) · 의(意)로 구분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문학은 정에 근거를 둔다고 하며, 지나 의와의 관련은 부차적일 따름이라고 하여 혼란을 일으켰다.
한용운(韓龍雲)은 광의의 문학은 ‘문학’이라 하고 협의의 문학은 ‘문예’라고 하고서, 문학은 돌보지 않고 문예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잘못이라는 반론을 폈다. 이식된 문학관과 전통적인 문학관 사이의 논란은 아직 정리되지 않고 있다.
한국 문학은 한국인의 문학이고 한국어로 된 문학이다. 이 경우의 한국인은 한민족을 말한다. 국가는 침탈되거나 분단되어도 한민족과 한국어가 지속되고 기본적인 동질성을 가진다는 이유에서 한국 문학은 단일한 민족문학이다.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해외교포의 문학이라도 자신을 한민족으로 의식한 작가가 한국어로 창작한 것이면 한국 문학에 속한다.
그런데 민족문학과 민족어로 된 문학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이다. 한국한문학은 한민족이 쓴 문학이고 한민족의 생활을 다룬 문학임에 틀림없으나 한문으로 쓰여졌다는 점이 논란이 된다.
그러나 한문은 동아시아 전체의 공동문어이었으므로 모두 다 중국의 글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한국발음으로 토까지 달아서 읽었다.
이렇게 읽는 한문은 중국어와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한국어 문어체의 극단적인 양상이라고 보아 마땅하다. 현대에 와서 한민족 출신의 작가가 일본어나 영어로 쓴 작품은 이렇게 고려할 여지가 없기에 한국 문학에서 제외됨은 물론이다.
한국 문학은 크게 보아서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구비문학이다. 말로 이루어지고 말로 전하는 문학을 구비문학이라고 한다.
문학의 요건이 말이 아니고 글이라고 할 때는 관심 밖에 머무르거나 민속의 한 분야라고만 여기던 구비문학이 이러한 관점이 수정되는 것과 함께 한국 문학의 기저로 인식되고 평가되기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구비문학뿐이었는데, 한자의 수용에 이어서 한문학이 나타나자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이 공존하는 시대로 들어섰다. 한문학은 동아시아 공동 문어문학의 규범과 수준을 이룩하는 한편, 민족적인 삶을 표현하는 데 그 나름대로 적극적인 구실을 하였기에 소홀하게 다룰 수 없다.
국문 기록문학은 처음에 한자를 이용한 차자문학(借字文學)으로 시작되었다가 훈민정음 창제 이후 구비문학을 받아들이고 한문학의 영향을 수용하면서 그 판도를 결정적으로 넓혔다.
그러다가 신문학운동이 일어난 다음 구비문학이 약화되고 한문학이 청산되어 국문 기록문학만이 현대문학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현대문학은 서구문학의 이식으로 시작되었으며 계속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한때 있었다.
그러나 그 동안 이루어진 연구와 비평의 성과는 이와는 다른 관점을 가지게 한다. 구비문학과 한문학 그리고 국문 고전문학이 현대문학과 이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전통의 현대적인 계승이 전제되어야 민족문학의 바람직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으며, 전통의 현대적인 계승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문제될 뿐이다.
문학의 갈래
문학을 표현 방법에 따라 나눈 것을 오랫동안 서구어를 차용해서 장르(genre)라고 일컬어왔고 ‘양식’이라고 하였는데, 요즈음 이러한 용어가 ‘갈래’로 대치되고 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학작품을 비슷한 것들끼리 모아서 이해하자고 하여 갈래구분이 시작되었고, 그래야 할 필요성은 지금에 이르러서도 계속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비슷한 것들끼리 모으는 작업을 편리한 대로 하고 말 수는 없다. 어느 갈래이든지 그것대로의 고유한 성격이 있기에 다른 갈래와 구별된다. 그러한 성격은 창작을 위한 규범으로 작용하기도 하였고, 또 문학연구의 체계를 수립하는 데 긴요한 구실을 하기에 중요시된다.
한국 문학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알자면 갈래를 정리하는 것으로 기초 작업을 삼지 않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이론은 현재 간단하게 요약하기 어려울 만큼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그 동안 갈래에 관한 논의는 국문 고전문학을 중심으로 삼아 진행되어왔다.
구비문학의 경우 적극적인 모색은 없었지만 갈래구분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한문학의 갈래는 일찍이 중국에서 마련된 규범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보았다.
또 현대문학은 서구에서 전래된 갈래개념으로 이해하면 그만이지 다른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였기에, 국문 고전문학에서만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국문 고전문학에서 갈래는 지난날의 비평적인 논의를 통해서 믿고 따를 만큼 정리되지 않았다. 또한 중국이나 서구의 전례를 적용하기도 어렵기에 연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줄곧 이해하고 구분하는 데 필요한 이론이나 방법을 마련하느라고 진통을 겪어야만 하였다.
그러나 국문 고전문학의 경우를 합당하게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비문학 · 한문학 · 현대문학까지를 두루 포괄한 한국 문학 전체의 갈래체계를 마련하고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갈래구분을 하는 것이 더욱 긴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갈래에는 유개념으로서의 갈래와 종개념으로서의 갈래가 있다. 유개념으로서의 갈래는 ‘큰 갈래’라고도 하는데, 문학의 갈래를 몇 가지 기본적인 성향으로 나눌 때 나타나는 것이다. 기본적인 성향에 지나지 않으므로 수가 많지 않고 어느 영역, 어느 시기에도 적용될 수 있는 포괄성을 지닌다.
종개념으로서의 갈래는 ‘작은 갈래’라고도 하는데, 기본적인 성향이 구체적인 특징을 갖추어 문학사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들이다. 서정 · 서사가 큰 갈래라면, 시조 · 소설은 작은 갈래이다.
갈래가 이 두 차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은 밝혀서 말하지 않는 가운데도 널리 인정되어왔던 바이나, 용어와 이론을 구비하기까지에는 많은 모색이 필요하였다.
처음에는 문학의 갈래를 시가와 산문으로 크게 나누는 것으로 관례를 삼았으나, 그 기준이 율격을 갖추었느냐 하는 데 있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모색을 하여야만 되었다.
그 다음 단계에는 가사(歌辭)가 형식은 시가이면서 내용은 산문과 다름없다는 데 착안하여서 시가 · 가사 · 문필로 구분하자는 견해가 제시되었으나, 다시 수정이 이루어져 다음과 같은 체계를 일단 수립하는 데 이르렀다. 그때 큰 갈래는 ‘부문’이라 하고 작은 갈래는 ‘형태문학’ 또는 ‘유형’이라고 불렀다.
가사 : 가사
이 넷을 기본적인 부문이라 하고, 부수적인 부문을 따로 인정하여서 거기다가 평론과 잡문을 소속시켰다. 이러한 견해로 커다란 진전을 이룬 것이 사실이지만, 가사와 소설은 큰 갈래 이름이면서 동시에 작은 갈래라는 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만 따로 취급한 것도 재검토를 필요로 하였다. 부수적인 부문까지 함께 처리하는 체계를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었다.
그러자 시가는 서정이고 소설은 서사이니 서정 · 서사 · 희곡으로의 삼분법을 택하여야 마땅하고, 가사는 따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성격에 따라서 서정과 서사 양쪽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수정안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견해는 서구문학에서 이미 널리 통용되고 있는 삼분법을 받아들여 국문 고전문학에 적용한 것으로 신뢰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적절한 체계를 수립하였다 하겠으나, 또한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다.
서정 : 고대가요 · 향가 · 고려가요 · 시조 · 가사(주관적 · 서정적 가사) · 잡가
서사 : 설화 · 소설 · 수필( 일기 · 내간 · 기행, 객관적 · 서사적 가사)
희곡 : 가면극 · 인형극 · 창극
문제점은 가사와 수필 양쪽에서 지적될 수 있다. 가사를 주관적 · 서정적 가사와 객관적 · 서사적 가사로 양분한다면 작품에 따라서 갈래 소속이 달라진다고 보아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객관적 · 서사적 가사는 수필이라 하고, 수필은 서사문학에 포함된다고 하였는데, 이에 관해서는 두 가지 논의가 필요하다.
가사가 수필이라는 견해는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수필이 서사문학인가는 간단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서정 · 서사 · 희곡으로의 삼분법은 수필 같은 것은 논외로 할 때 엄밀한 체계를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갈래 체계를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어서 삼분법이 아닌 사분법을 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국 문학의 독자적인 사분법을 찾고자 한 데서는 노래문학 · 이야기문학 · 놀이문학을 먼저 들고, 거기 포함되지 않는 일기 · 수필 · 비평 따위를 묶어 또 하나의 큰 갈래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해서 삼분법으로는 다루기 어려웠던 영역을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성과이나, 서정에 해당하는 노래문학, 서사에 해당하는 이야기문학, 희곡에 해당하는 놀이문학에 포함되지 않는 또 하나의 큰 갈래는 이름을 짓지 않고 특징을 적극적으로 규명하지 않았으니, 갈래 체계 수립이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큰 갈래를 교술(敎述)이라고 일컫고, 서정 · 교술 · 서사 · 희곡으로의 사분법을 수립하자는 데서는 좀더 적극적인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 이론은 네 가지 큰 갈래의 개념을 서구에서 마련한 전례에 힘입어 규정할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기준과 방법에 따라 다시 밝히자는 데서 출발점을 찾았다. 자아와 세계의 대립적 관계가 큰 갈래가 나누어지는 근거라 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서정은 작품 외적 세계의 개입이 없는 세계의 자아화이다. 교술은 작품 외적 세계의 개입에 의한 자아의 세계화이다. 서사는 작품외적 자아의 개입에 의한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다. 희곡은 작품 외적 자아의 개입이 없는 자아의 세계화라고 하였다.
교술이라는 용어가 적절한가, 전체적인 이론이 타당하며 실제의 구분에서 어느 정도 유효한가를 두고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 다른 체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이론에 의한 갈래구분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서정 : 서정민요 · 서정무가 · 한시일반 · 사(詞) · 고대가요 · 향가 · 고려속요 · 시조 · 잡가 · 신체시 · 현대시
교술 : 교술민요 · 교술무가 · 속담 · 수수께끼 · 사(辭) · 부(賦) · 한문일반 · 가전(假傳) · 몽유록(夢遊錄) · 시화(詩話) · 만록 · 경기체가 · 가사 · 창가 · 수필 · 서간 · 기행 · 일기 · 비평
서사 : 서사민요 · 서사무가 · 판소리 · 서사시 · 설화 · 소설
희곡 : 탈춤 · 꼭두각시놀음 · 무당굿놀이 · 창극 · 신파극 · 현대극
여기서는 가사뿐만 아니라 경기체가도 교술시라고 하였다. 민요나 무가는 특정 갈래가 아니라고 보아 다시 나누었다. 한문일반을 교술에다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 · 부 · 가전 · 몽유록 같은 것들도 함께 처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느 것이나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재론을 필요로 한다.
고전문학에서 현대문학으로 넘어올 때 소설은 같은 갈래의 연속이었지만, 신체시 · 현대시, 그리고 신파극 · 현대극은 다른 갈래로 등장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도 문제일 수 있다.
갈래 체계를 마련하고 갈래를 구분하는 작업은 문제점을 모두 해소하는 완벽한 것이 될 수는 없다 하겠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의 하나는 한 갈래를 이루는 작품의 성향이 한결같지 않다는 데 있다.
가령, 소설에는 극적 소설이 있고 희곡에는 서사적인 희곡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무리 없이 처리하려면 소설은 서사이어서 희곡과는 애초에 다르다는 데 집착하지 말고 문학에는 오직 서사적 성향을 가진 것과 희곡적 성향을 가진 것이 있다고 하는 편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여서는 혼란이 가중될 염려가 있다.
그 대신에 ‘서사적 희곡’이라고 할 때 관형사 쪽은 이차적인 특징을, 명사 쪽은 소속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여, 이차적인 특징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다. 이러한 근거에서 ‘서정적 가사’도 있고 ‘교술적 시조’도 있다고 보아야 작품의 실상이 갈래 개념 때문에 왜곡되지 않을 수 있다.
문학의 특질
한국 문학의 특질은 우선 시가의 율격에서 잘 나타난다. 한국 시가는 정형시의 경우에도 한 음보를 이루는 음절수가 변할 수 있고, 음보 형성에 모음의 고저 · 장단 · 강약 같은 것들이 작용하지 않으며, 운(韻)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것을 특징으로 삼는다.
고저를 갖춘 한시, 장단을 갖춘 그리스어 · 라틴어 시, 강약을 갖춘 영어나 독일어 시에 비한다면 단조롭다고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특질을 공유하고 있는 프랑스어 시나 일본어 시와는 다르게 음절수가 가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변화와 여유를 누린다.
가령, 시조가 대표적인 정형시라고 하지만, 시조의 율격은 네 음보씩 석 줄로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 줄의 앞부분은 특이한 규칙을 가져야 한다는 점만 정해져 있을 따름이다. 각 음보가 몇 음절씩으로 구성되는가는 경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작품마다 율격이 특이하게 이룩될 수 있는 진폭이 인정된다. 정형시로서의 규칙은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되고, 가능한 대로 변이의 영역이 보장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확대해서 자유시에 근접하려는 시형이 일찍부터 여러 가지로 나타났다.
시조의 제약이 불편하게 느껴져서 사설시조가 생겼고, 판소리에서는 전체적으로 고정된 격식이 없으면서 갖가지 율격 형태를 필요에 따라서 다채롭게 활용하였다. 그런가 하면, 현대시에 이르러서도 서구의 전례를 따른 자유시로만 보이는 것들 중에도 전통적인 율격을 변형시켜 계승한 예가 적지 않다.
질서가 엄격하면 그것을 파괴하자 바로 무질서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터인데, 이처럼 질서 자체가 변이나 변화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도 자연스러운 질서가 갖추어질 수 있다 하겠다. 이러한 특질은 미의식 일반으로 확대시켜 이해할 수 있다.
흔히 멋이라는 것은 이러한 미의식을 지적한 말이다. 직선으로만 뻗었거나 규칙적으로 모가 난 것은 격이 낮다고 하고, 천연스럽게 휘어진 곡선이나 자연스럽게 이지러진 모습이라야 아름답다고 하는 미의식이 바로 멋이다. 멋은 미술의 선이나 음악의 가락에서 확인될 뿐만 아니라, 문학적 표현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다.
멋과는 거리가 멀 것 같은 한문학에서도, 격식과 꾸밈새를 못내 나무라며 천진스러운 기풍인 천기(天機)를 그대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구비문학이나 국문문학에서는 시가의 율격은 물론, 수사법과 작품 전개의 방식 전반에서 애써 다듬어 무슨 기이한 효과를 내는 것을 멀리하였다.
일상 생활에서 하는 자연스러운 말을 그대로 살리고자 하였으며, 유식한 한문 문구는 웃음을 자아내도록 하고자 끌어오기 일쑤이다.
다만, 현대문학에 이르러서는 서구어 번역체가 등장하면서 사정이 달라진 국면이 있으나, 전통적인 미의식의 계승으로 한때의 어긋남이 극복될 수 있는 전망이다. 함께 일하며 노는 사람들이 누구나 같은 자격으로 어울리는 마당놀이는 한국 예술의 기저를 이룬다.
탈춤을 공연하더라도 놀이패가 하는 짓에 구경꾼이 개입하여 대방놀음을 유지하고 삶의 영역을 그대로 연장시키면서 비판적으로 다룰 따름이지 극적 환상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비극의 흔적은 찾아내기 어렵고 연극의 전통이 비판적인 희극으로 일관되어온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연극의 영역을 넘어서더라도 비장한 것을 구태여 높이 평가하지 않으며, 오히려 골계미를 통하여 깊은 진실을 드러내고자 한다.
서사문학의 자취를 살피자면, 고대의 신화가 이미 역사적인 경험을 현세의 영역에서 다룬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천상계는 지상계와의 관련에서 의미를 가지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
서사무가나 소설이 불교 또는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저승이나 천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도 이러한 특징이 달라지지 않았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한계에 부닥쳐 좌절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 인간상은 찾기 어려우며, 굳어진 관념의 한계를 깨고 삶의 발랄한 양상을 드러내는 데 더욱 힘썼음은 여러모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른 시기의 불교설화가 이미 비속한 경험에서 진실을 찾자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며, 지위에 따르는 관념에 집착하는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다루면서 후대의 서사문학도 생기를 되찾고는 하였다.
문학사적 전환의 논리도 이러한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불교문학이 교리를 풀이하는 데 힘을 기울이며 너저분한 논설을 늘어놓자, 관념을 파괴하여야 진실에 이를 수 있다는 선시(禪詩)가 나타나 아주 파격적인 표현 영역을 개척하였다.
유학에 근거를 둔 문학이 교화를 베푸는 데 우위를 두어 굳어지자, 박지원(朴趾源)같은 사람은 글로써 놀이를 일삼는다는 뜻에서 ‘이문위희(以文爲戱)’를 내세워 역설과 풍자로 가득 찬 기발한 문장을 이룩하였다.
시조에 맞서서 사설시조가 나타나고, 이상주의적 성향의 영웅소설을 밀어내고 판소리계 소설이 인기를 모은 것도 같은 방식의 전환이었다.
현대소설에서 묘사 위주의 사실주의가 뚜렷한 타개책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탈춤이나 판소리를 계승한 비판적 사실주의가 시대적 사명을 맡고 나선 데서도 전환의 논리가 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학사의 시대구분
문학사의 시대구분 방법에는 왕조 교체에 의한 방법, 사회경제사적 방법, 민족정신의 전개에 의한 방법, 문예사조에 의한 방법, 절충적 방법, 문학의 발전 단계를 설정하는 방법 등이 있어 왔다. 문학을 그 자체로서 다루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역사적이거나 사회적인 조건을 중요시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한국 문학사만의 시대구분으로 만족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세계 문학사와의 관련에서 기준을 얻거나 결과를 확인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논란이 시대구분 방법론의 저변에서 작용하고 있다.
맨 처음으로 나온 문학사인 안확(安廓)의 『조선문학사』(1922)에서는 시대를 상고시대 · 중고시대 · 근고시대 · 근세시대 · 현대로 나누었다. 이름은 시간의 원근에 의한 구분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왕조 교체에 의한 구분이다.
상고시대는 삼국 성립 이전이고, 중고시대는 삼국시대이고, 근고시대는 고려시대이고, 근세시대는 조선시대이고, 현대는 갑오경장 이후이다.
그 뒤 왕조의 이름을 표면에 내세우고 시대구분을 한 문학사가 적지 않게 나왔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김사엽(金思燁)의 『조선문학사』(1948) 및 『개고국문학사(改稿國文學史)』(1954)이다.
거기서는 문학사의 단계를 상고문학 · 삼국시대문학 · 고려문학 · 이조문학 · 현대문학으로 나누었다. 왕조 교체에 의한 시대구분은 기준에 혼란이 없고, 구분 결과가 명확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반면에, 왕조사와 문학사가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지는가 하는 점을 두고서 제기되는 의문을 해소하기 어렵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의문을 가지는 데 그치지 않고 더욱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방법을 개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왕조 교체가 문학의 변모와 연결되어 있는 양상을 애써 부정하는 것이 능사일 수도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방법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 통용되고 있으며, 다만 몇 가지 수정안이 제기되었을 따름이다.
이병기(李秉岐) · 백철(白鐵)의 『국문학전사(國文學全史)』(1957)의 제1부 고전문학사에서는 왕조 교체에 의한 구분을 택하되, 조선시대의 문학은 훈민정음 창제와 더불어 뚜렷한 특징을 드러냈다고 보아 표기 형태에 의한 시대구분을 아울러 고려하였다.
그런가 하면, 김준영(金俊榮)의 『한국고전문학사(韓國古典文學史)』(1971)에서는 조선시대의 문학을 임진왜란을 경계로 전후기로 나누어 각기 독립된 시대를 이룬다고 하였는데, 문학의 양상이 크게 달라진 점을 왕조 교체와 함께 고려한 결과이다.
이처럼 다른 기준과 절충시켜 왕조 교체에 의한 시대구분을 다소 수정해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널리 채택되고 있는 방식이다.
사회경제사적 시대구분이 문학에서는 역사의 경우만큼 진척되지 못하였으며, 이명선(李明善)의 『조선문학사』(1948)라는 단 하나의 예만 남겼다. 이명선은 세계사가 노예제사회 · 봉건사회 · 자본주의사회로 전개되어왔다는 유물사관을 따라야 한다면서, 신라통일 이후가 봉건사회이고, 갑오경장 이후가 자본주의사회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방법은 기본 전제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문학의 실상에 대한 고려나 입증 없이 시대구분을 서둘렀으므로, 그 결과가 불신되고 있다.
서구의 전례를 대입하면 세계사적 보편성을 가진 시대구분이 이루어진다는 소박한 낙관론, 무리하게 파악된 사회구조의 변화가 문학을 설명해줄 수 있다는 단순한 결정론, 봉건사회가 신라통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시대구분을 민족사의 견지에서 이룩하려는 노력이 조윤제(趙潤濟)의 『국문학사』(1949) 및 『한국 문학사』(1963)를 통해서 나타나 이와 좋은 대조를 이루었다. 조윤제는 민족사가 민족정신에 따라서 전개된다 하고서, 문학사는 민족정신의 생명체적 발전을 기준으로 삼아 이해되고 서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론에 따라서 시대구분을 한 결과는 태동시대 · 형성시대 · 위축시대 · 잠동시대 · 소생시대 · 육성시대 · 발전시대 · 반성시대 · 운동시대 · 유신시대 · 재건시대를 설정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민족정신이란 모호한 개념이고 이론이 관념에 치우쳤다는 비판은 받을 수 있으나, 실제로 시대구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문학의 실상이 달라진 과정을 다각도로 고려한 편이다.
가령, 고려 전기는 국문문학이 타격을 받아 위축시대로 들어섰다가 무신란과 더불어 사회적 여건이 달라지자 시조와 경기체가가 나타나 잠동시대가 시작되었고, 고려 후기에 이룩된 성과를 더욱 발전시킨 것이 조선 전기에 전개된 소생시대의 문학이라고 한다. 이러한 견해는 국문문학이 민족정신 구현의 핵심영역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그 타당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구비문학에 독자적인 의의를 부여하지 않았고, 한문학은 부수적인 분야로 하였으며, 현대문학은 민족정신의 내재적인 전개의 결과라기보다 서구로부터 들어온 충격의 소산이라고 한 점 등이 문제로 남았다.
민족정신은 대립을 넘어서야 온전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도 문학의 여러 영역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지속과 함께 변화를 구현하였던가는 설득력 있게 파악할 수 없었다.
다른 무엇에 의거하지 않고 문학의 실상을 포괄하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은 문예사조에 의한 시대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예사조가 서구에서 정립된 전례에 따라서 이해되고 현대문학사에 국한하여서 먼저 논의되었으므로, 이 방법은 문제를 안고 들어갔다.
백철의 『조선신문학사조사(朝鮮新文學思潮史)』(1948 · 1949)에서는 현대문학사가 서구의 문예사조를 이식한 역사라고 하면서, 낭만주의 · 퇴폐주의 · 자연주의 · 신경향파 등의 사조가 어떻게 이해되고 수용되었던가를 고찰하는 것으로 문학사 서술의 과제로 삼았다.
그 결과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단절은 의심할 바 없이 논증된 것 같고, 서구 문예사조를 표방하지 않은 작가는 고려할 여지가 없는 듯이 처리되었다.
그 결과 현대문학은 여러모로 기형적인 문학이라고 하게 되었다. 문예사조에 의한 시대구분은 이가원(李家源)의 『한국한문학사(韓國漢文學史)』(1961)에서 다시 시도되었다. 여기서는 현대문학이 아닌 한문학의 사조사를 서술하면서 문예사조를 특히 두 가지 각도에서 설정하였다. 하나는 유학사조와 불교사조의 관계를 다룬 것이고, 또 하나는 낭만주의와 사실주의의 교체를 살핀 것이다.
그렇다면 유학사조와 불교사조가 사상적인 성향에 그치지 않고 문학의 존재 양상이나 표현 방법과 밀착된 문학의 사조임을 입증하는 작업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낭만주의와 사실주의가 한국 한문학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졌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그 어느 쪽도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여증동(呂增東)의 『한국문학사』(1973)에서는 좀더 적극적인 시도를 하여서 어느 특정영역만이 아닌 한국 문학사 전체의 전개를 문예사조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감성주의 운문시대’, ‘지성 개발의 18세기’ 등으로 시대구분을 하였는데, 우선 용어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감성’이나 ‘지성’은 각기 그 시대의 사상과는 밀착되지 않으며, 서구어의 번역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으므로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한 개념으로 문학의 실상을 포괄하고자 하면 무리한 적용을 배제하기 어렵다.
문예사조에 의한 시대구분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문예사조의 개념을 추출하고 정립하는 작업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최근에 나온 문학사 몇 권은 시대구분의 방법을 중요시하면서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왕조 교체에 의한 구분을 근간으로 하면서 다른 사정까지 고려한 절충론을 택하는 것으로 특징을 삼았다.
김석하(金錫夏)의 『한국문학사』(1975)에서는 시대구분이 문학의 질적 변화가 나타난 과도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고, 사회나 사상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고려를 하면서 구체적인 근거를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게 하여 이루어진 시대구분은 원시종합예술기 · 고대문학기 · 중세문학기 · 근세문학기 · 개화문학기 · 현대문학기로 나타났다.
각 시기는 왕조와 일치하는 셈이나, 조선시대인 근세문학기는 다시 서론에서는 전기 · 중기 · 후기로, 본론에서는 전기 · 후기로 나누었다. 시대를 구분하고 설정하는 기준이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절충적 방법의 특징이므로 결과가 유동적이게 마련이다.
장덕순(張德順)의 『한국문학사』(1975)에서는 왕조 교체와 문학 갈래의 전개를 함께 고려하여서, 각 시기마다의 대표적인 갈래의 역사를 서술하고자 하였다.
먼저 구비문학을 다룬 다음에, 고대가요 · 향가문학을 각기 한 시기를 포괄하는 갈래로 내세웠다. 그 뒤에는 사정이 달라졌다고 보아서, 고려문학 또는 중세문학은 가요와 서사문학으로, 조선문학 또는 근세문학은 소설 · 가사 · 시조 등으로 나누어서 고찰하였다.
이렇게 하자, 선택된 갈래가 아닌 것들은 소홀하게 취급되지 않을 수 없으며, 여러 갈래에 걸쳐서 나타난 변화를 밝힐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 어려웠다.
김동욱(金東旭)의 『국문학사』(1976)는 비교문학적 관점을 강조하고 문화사로서의 포괄성을 가지고자 애쓰는 한편, 시대구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은 편이었다.
왕조 교체에 따라서 상대문학 · 중세문학 · 근세문학 · 근대문학을 차례로 고찰하면 문학사의 중요한 국면을 밝힐 수 있다는 태도이다.
근세문학이라고 한 조선시대 문학을 다시 나누지 않았지만, 판소리의 등장과 더불어 국민문학이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면 국민문학이라고 한 것과 근대문학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다룬 문학사에서는 근대문학 또는 현대문학이 갑오경장과 더불어 시작되었다는 데 대해서 그 어느 것도 의문을 표시하지 않았다.
한결같이 근대문학이 서구 근대문학의 이식이라는 전제를 구태여 부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작용하였다고 하겠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문학사에서 가장 큰 쟁점이다.
서구의 영향과 자극은 인정하여야 마땅하지만, 근대문학을 지향하거나 이룩한 내재적인 성과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새로운 관심사로 등장하면서 논의의 각도가 달라지지 않을 수 없었다.
한동안 비평적인 논란이 있고 난 다음에 김윤식(金允植) · 김현(金炫)의 『한국문학사』(1973)가 나오자 새로운 관점이 문학사 서술을 통해서 부각될 수 있었다.
거기서는 영 · 정조 시대인 18세기에서 4 · 19까지의 문학사를 서술하면서, 갑오경장 이전에 이미 근대의식의 성장이 문학에서 나타난 자취를 추적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되자 근대문학의 개념과 형성을 두고 만만하지 않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근대문학이 문학발전의 한 단계라면 그 앞 단계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는 것도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서구와의 접촉을 통해서 근대문학을 이해한 관점을 근본적으로 시정하자면, 고대문학 · 중세문학 · 근대문학이 각기 그것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전개되어온 양상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는데, 조동일(趙東一)의 『한국문학통사』(1982∼1988)에서는 그러한 논의에 착수하였다.
고대의 자기중심주의, 중세의 보편주의, 근대의 민족주의가 문학의 존재양상, 문학 갈래의 체계, 문학 담당층의 성향을 통해서 구현된 바를 시대구분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조선 후기 문학은 보편주의를 벗어나지 않았으면서도 민족주의를 지향하고, 한문학과 국문문학, 사대부문학과 시민문학이 공존하고 있어서 중세문학에서 근대문학으로의 이행기 문학이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서의 시대구분은 새로운 제안을 내세울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널리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은 역시 왕조 교체에 의한 구분이므로 일단 거기에 기초를 두고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는 전 · 후기로 나누어 각기 독립된 시대를 삼고자 한다.
이렇게 하여야 고려 후기와 조선 전기의 관련성이 어느 의미에서는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 또는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의 관련성보다 더 크다는 것을 드러내는 데 지장이 없게 된다.
조선 후기에서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계기는 개항도 갑오경장도 아니고 1860년에 동학이 성립된 것이라 보고, 1919년 이후의 신문학운동을 겪고 그 다음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관점을 택한다. 1945년 이후의 문학을 끝으로 다룬다.
문학사의 전개
상고시대의 문학
문학의 기원은 구석기시대까지 소급된다. 잡을 짐승을 늘리자고 모여서 춤추고 노래한 행위는 무용 · 음악 · 문학을 함께 포괄한 원시종합예술이었다. 신석기시대로 넘어와 농사가 시작되자 노래와 춤에 농사가 잘 되게 하자는 내용이 추가되며 농업노동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생겨났다.
천지만물의 유래나 자연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다룬 신화도 그 단계에서 모습을 드러내었으리라고 짐작된다. 울주 반구대와 고령 양전동의 암각화는 뜻하는 바를 아직 읽어내지 못하였으나, 조형예술과 상용되는 언어 전승을 수반하였으리라고 보아도 좋다. 그러한 것이 이른 시기의 신화이고 서사시였을 것이다.
신석기시대 이래로 몇 차례 민족이동이 있었고, 그때마다 선주민과의 동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문학의 유래도 그러한 각도에서 살필 필요가 있다.
곰을 숭상하는 것을 특징으로 삼는다든가 하는 고아시아족 계통의 선행 문화가 문학으로도 구현되어 있었는데, 건국 영웅의 위대한 행적을 찬양하는 알타이계 이주민의 신화나 서사시가 보태어져서 이른 시기 문학의 뚜렷한 내용을 이룩하지 않았던가 한다.
청동기시대에 들어서서는 국가가 형성되고 건국신화가 나타날 때 그러한 기반이 적극 이용되었을 터인데, 그 좋은 예는 고조선 건국신화이다.
환웅(桓雄)이 이 세상에 내려와 웅녀(熊女)와 혼인을 하고, 그 둘 사이에서 단군(檀君)이 태어났다고 하는 이야기는 부여 · 고구려계 건국신화에서 해모수(解慕漱)와 유화(柳花)가 관계해서 주몽(朱蒙)의 부모가 되었다는 것과 바로 대응되기에, 이른 시기 서사문학의 형태로 깊은 뿌리를 가졌다 하겠다.
어느 경우에나 여성 수난이 있고, 다음 세대의 주인공은 천상의 권위를 자랑하며 지상의 지배자가 되어 역사를 창조한다.
그런데 남쪽에서는 신라의 혁거세(赫居世) · 알지(閼智), 가락국의 수로(首露)의 경우를 통해서 보건대, 단군이나 주몽에 해당하는 인물이 하늘에서 바로 내려와 혼인을 하고 시련을 극복하기도 하였다.
건국신화는 이야기로만 전승되지 않고 국중대회에서 노래로 불렀으리라고 짐작된다. 온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에 제사지내면서,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며 자기 집단의 우월감을 보장해주는 군주의 신화적인 내력을 행동으로 구현하는 굿을 하고 한편, 길게 이어지는 노래로도 불렀을 것이다.
굿은 「가락국기(駕洛國記)」에 수로맞이의 절차를 기술해 놓은 것이 있어서 엿볼 수 있고, 길게 이어지는 노래는 후대의 서사무가를 통해서 그 모습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런데 국중대회가 중단되자 굿놀이와 서사시는 민간전승으로나 계승되고, 이야기로 하던 건국신화의 줄거리만 후대의 문헌에 단편적인 모습을 남겼다. 짧은 노래는 긴 노래와 함께 부르기도 하였을 터이나 한역된 자료가 있어서 따로 거론할 수 있고, 신화시대가 청산되고 있는 사정을 짐작하게 한다.
고조선의 어느 여인네가 지어서 불렀다는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는 그 여인의 남편 백수광부(白首狂夫)가 물에 빠져죽었다는 예사롭지 않은 사연이기에 다각적인 추측을 자아내게 한다. 그러나 몰락하고 실패한 무당의 최후를 다룬 것이 아닌가 싶다.
고구려 유리왕의 노래라고 하는 「황조가(黃鳥歌)」는 왕이 두 왕비의 싸움 때문에 파탄에 이른 사정을 나타내며, 개인적인 고독을 하소연한 서정시의 첫 예가 된다.
「구지가(龜旨歌)」는 가락국 건국신화의 한 대목에 들어 있으나 노랫말이 남아 있어서 주목된다. 이러한 노래는 어느 것이든 2음보 4행씩이었던 듯 한데, 그러한 형식은 향가로 이어진다. 신화적인 질서가 흔들리면서 전설이나 민담이 더욱 중요한 구실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초기 해명태자(解明太子)나 호동왕자(好童王子)가 자기대로 커다란 과업을 이룩하였으면서도 부왕의 부당한 처사로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는 피차 마땅한 행동 양상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념의 파탄을 나타내어 준다 하겠다.
이러한 조건에서 전설이 부각되어서, 자아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세계의 횡포를 문제삼았다. 민담도 일찍부터 긴요한 구실을 하였을 터이나,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거론할 수 없다.
삼국시대의 문학
삼국이 국가적인 체제를 정비하면서 한문을 활용하고 유학과 불교를 받아들인 것은 문학사에서도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한문은 그전에 이미 전해졌지만 국사를 편찬하고 금석문을 이룩하는 단계에 이르러서 문학적 표현에 쓰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구비문학뿐이던 시대에서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이 병존하는 시대로 들어섰다.
삼국이 각기 편찬한 국사는 남아 있지 않으나, 광개토대왕릉비(廣開土大王陵碑, 414) · 진흥왕순수비(眞興王巡狩碑, 6세기 후반) 등은 간결하면서 소박한 표현으로 넘치는 기상을 자랑한다.
을지문덕(乙支文德)이 수나라 장수에게 준 시에서도 그러한 기풍이 이어져서 중국과의 외교에 쓰인 중국을 섬기는 듯 한 문장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유학과 불교는 보편적인 이념을 구현하면서 문학의 주제를 심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통치체제를 정비하면서 새로운 노래가 필요하게 된 사정도 함께 주목된다.
신라에서는 일찍이 유리왕 때, 가엾은 백성을 구제하고 나라가 태평해지자 「도솔가(兜率歌)」(28)를 지었다 하고, 같은 시기에 길쌈노래인 「회소곡(會蘇曲)」도 궁중에서 불렀다고 한다.
이러한 것들은 건국서사시와는 다른 방식으로 상하의 단합을 꾀한 노래의 첫 예이다. 눌지왕이 가야 출신의 우륵(于勒)을 맞이하여 궁중악을 정비할 때, 지방에서 이룩된 민간의 노래가 적지 않게 채택되었던 것도 관심 있게 보아야 할 일이다.
예악(禮樂)을 이룩하는 사업은 고구려와 백제에서 신라에 못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겠으나, 고구려 고분벽화가 그 증거일 따름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 주는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한자를 이용해서 국어를 표기하는 향찰(鄕札)이 창안되면서 향가(鄕歌)가 나타났다. 그러한 것은 고구려나 백제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신라의 자료만 일부 전할 따름이다.
「서동요(薯童謠)」(6세기말) · 「풍요(風謠)」(7세기초) 같은 초기의 향가는 민요의 정착이 아닌가 하며, 4구체 형식이다. 4구체를 거듭한 것이 8구체이고, 신라 귀족문화의 발전과 더불어 사뇌가(詞腦歌)라고도 하는 10구체의 정제된 형식을 이룩하였다.
융천사(融天師)의 「혜성가(彗星歌)」(594)는 사뇌가가 화랑과 깊은 관계를 가졌음을 말하여주는 첫 예이다. 「찬기파랑가(讚耆婆郎歌)」를 지은 충담사(忠談師), 「제망매가(祭亡妹歌)」를 지은 월명사(月明師)는 숭고한 이상을 추구하는 주제로 사뇌가를 최고 경지로 끌어올렸다.
그런데 득오(得烏)의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 광덕(廣德)의 「원왕생가(願往生歌)」, 희명(希明)의 「천수대비가(千手大悲歌)」 등은 향가의 작자층이 확대되었음을 알려 준다. 「처용가」는 후대 작품이면서 굿에서 불렀던 것이다. 진성여왕 때 『삼대목(三代目)』(888)이라는 향가집이 편찬되었으나 전하지 않는다.
신라 향가는 『삼국유사』에 14수만 남아 있다. 승려들이 불경을 풀이하고 깨달음을 노래하는 데서도 삼국의 문학은 커다란 진전을 보았다. 고구려의 승랑(僧朗), 백제의 겸익(謙益)은 대단한 경지에 이른 저술을 하였다고 하나 지금은 그 자취를 더듬어볼 수 있을 따름이다.
반면, 신라에서는 고승이 잇따라 나타나 불교의 이치를 캐고 문학적 표현의 영역을 확장한 업적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편이다. 원효(元曉)는 말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말로써 진실을 깨우치자고 비유와 역설의 논리를 개척하였다.
의상(義湘)은 삼라만상의 이치를 간명한 시로 포괄하여 보였다. 혜초(慧超)의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은 시가 삽입되어 있는 기행문이다. 불교의 한시인 게송(偈頌)이 성행한 것도 아울러 주목할 만한 일이다.
설화는 당시의 문학을 더욱 광범위하게 살피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신화적인 상상은 점차 퇴색하는 한편, 김유신(金庾信) 같은 인물을 영웅으로 부각시키고, 원효처럼 높은 경지에 이른 고승이 비속한 삶을 경험하면서 헛된 관념을 파괴하였다는 이야기를 거듭한 것을 보면 설화의 양상이 아주 달라졌다.
설화에는 일반 백성의 고난과 사랑도 잘 나타나 있다. 백제의 도미(都彌)는 왕의 횡포 때문에 처참한 시련을 겪었다 하고, 신라의 지귀(志鬼)는 역졸인 처지에 여왕을 사모하다가 불귀신이 되었다고 한다.
가난한 백성들 사이의 사랑, 사람과 호랑이의 사랑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문학의 다른 갈래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일이다. 설화를 기록하는 것도 그 당시에 이미 관심거리가 되었다.
최치원(崔致遠)의 시에서 보이는 오기(五伎)는 민속극이 외래문화를 수용하면서 성장한 자취를 알려준다. 신라에서 북국이라고 하던 발해의 경우 민간전승이나 고유한 문학의 자취를 알 수 없으나 한문학은 대단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더러 남아 있다. 정혜공주묘비(貞惠公主墓碑, 774)는 귀족적인 기풍의 세련된 수식을 보여준다.
759년과 814년에 각기 일본에 사신으로 간 양태사(楊泰師) · 왕효렴(王孝廉) 같은 시인들이 일본에 남긴 작품은 문화 수준을 자랑하려는 의지와 함께 멀리 떠나서 고국을 그리워하는 정감을 잘 나타내고 있다. 당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과거에 급제하는 데서 발해와 신라의 문인들은 경쟁적인 관계에 있었다.
신라 한문학은 통일 후에 본격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성덕대왕신종비명(聖德大王神鐘碑銘, 771)의 경우, 서(序)에서 웅대한 종소리가 모든 것을 아우른다고 하고, 명(銘)에서는 통일을 이룩한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생명이 피어나고 혜택이 넘친다고 한 표현은 커다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태평성대라고 한 이면에는 모순과 고민이 있기에 문학이 계속 긴장되었다.
육두품 출신의 문인들은 유학과 문학의 의의를 주장하면서 발언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682년(신문왕 2) 국학(國學)을 설치할 때 깊이 관여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설총(薛聰)은 신문왕을 상대로 「화왕계(花王戒)」를 지어 꽃을 의인화한 풍자적인 수법을 보였다. 진성여왕 때는 정치를 비판하였다고 잡혀 들어간 왕거인(王巨仁)이 항거하는 시를 지어 하늘에 호소하였다고 한다.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가 생겼어도 육두품이 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당나라로 건너가 그곳의 과거를 통해서 재능을 발휘하고자 한 문인이 적지 않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최치원이다.
최치원은 당나라에서나 귀국하여서나 화려한 성공에 따르는 심각한 번민을 해야만 하였고, 그러한 심정을 수많은 시문에 절실하게 표현하였다. 당나라 과거에 급제한 다음 그곳에서 일생을 마친 문인도 있고, 귀국해서 후백제나 고려를 택한 인재도 있었다.
고려 전기의 문학
후삼국의 쟁패가 벌어지자 건국신화가 재현되는 것 같았다. 지배자는 신이한 능력을 타고나 고난을 이기고 나라를 이룩하였다 하였으며, 고려의 경우 왕건(王建)의 선조가 여러 대에 걸쳐서 신화적인 내력을 지닌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미 신화시대가 아니므로, 한문학에 의한 건국이념을 수립하는 데 아울러 힘쓰는 쪽이 승리를 거두게 마련이었다.
신라의 전통을 이은 문인들이 골품제를 철폐하면서 더욱 능력을 발휘한다. 한편, 통일전쟁에서 공을 세운 무장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고려 전기의 문화와 문학의 방향을 결정하였다.
신라에서 시작된 향가는 고려 전기까지 지속되었다. 그 이유는 문화구조가 기본적인 동질성을 가졌던 데서 찾을 수 있으나, 향가의 잔존 형태는 그전처럼 떨칠 수 없었다.
균여(均如)는 광종 때 지배적인 이념 수립에 깊이 관여하면서 화엄사상(華嚴思想)에 입각한 교화를 널리 펴자고 흔히 「보현십원가(普賢十願歌)」라고 총칭되는 사뇌가 11수를 지었다. 이것이 본격적인 향가로서는 마지막 작품인데, 이미 서정적인 표현은 약화되었다. 그 뒤 예종이 건국의 공신들을 추모해서 지은 「도이장가(悼二將歌)」(1120)는 8구체 향가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의종 때 정서(鄭敍)의 작품인 「정과정곡(鄭瓜亭曲)」은 후대의 국문 표기로 남아 있으나 사뇌가와 상통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고려는 불교국가임을 다짐하고 불교이념에 의존하였으나, 불교문학이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발전을 보였던 것은 아니다. 첫 단계에는 교리를 번다하게 풀이하는 쪽으로 기울어져서 창의력이 결핍된 것 같다. 균여의 화엄학 저술은 아주 방대하지만 문학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그러다가 의천(義天)이 나서서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까지 아우르려고 하자 시문이 생기를 되찾고 개인적인 감회까지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
의천의 후계자들 중에는 다른 행적은 확실하지 않으나 시를 남겨서 주목되는 승려도 있다. 한편, 변두리로 밀려난 선종에는 탄연(坦然) 같은 시인이 있어서 고려 후기에 이루어질 전환을 준비하였다.
958년(광종 9) 과거제가 실시된 것은 신라 이래의 염원을 실현하였다 하겠으며, 문학사에서도 획기적인 의의를 가진다. 그때부터 고려의 과거는 경전 이해보다는 시문 창작능력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한문학의 융성을 가져왔다.
그러나 첫 단계의 과거를 주관하던 문인들은 뚜렷한 작품을 남기지 못하였으며, 최승로(崔承老)에 이어서 최충(崔冲) · 박인량(朴寅亮) 등이 두드러진 활약을 하였다.
최승로는 성종이 즉위하자 정치의 득실을 논한 글을 바쳐 그러한 문장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최충은 사학(私學)을 일으켜 유학을 진흥하는 한편 한시에서도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다.
박인량은 송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지은 시로 국내외에 이름을 떨쳤다. 한편, 파격적인 기질을 가진 김황원(金黃元)은 과거의 격식 때문에 생기를 잃은 문학에 반발하고 참신한 표현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그 무렵 설화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저술이 이루어졌다. 문종 때 금관(金官)지방의 수령 노릇을 하던 어느 문인이 『가락국기』를 편찬하였다. 금관은 김해인데, 그곳에 전하고 있던 가락국의 사적을 모으고, 당시까지 행하여지고 있던 민속까지 수록하였으며, 서사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말미에 첨부하였다.
신라 때부터 있었던 책을 박인량이 보완하고 개작하였으리라고 하는 『수이전(殊異傳)』은 역사 기록의 이면에 버려져 있던 민간전승을 모아 신이한 설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역사보다는 설화가 중요시되는 풍조를 시정하고 유학에 입각한 통치이념을 확립하고자 김부식(金富軾)은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정통적인 역사서인 이 책에도 설화가 자료로 이용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열전에는 우수한 표현을 갖춘 작품이 적지 않게 들어 있다.
한문학은 일반적으로 귀족적인 기풍을 지녔다 하겠으나, 방황과 진통을 겪었다. 예종은 곽여(郭輿) 같은 사람과 어울려 시를 주고받는 것을 무척 즐겼는데, 유학의 구속을 버리고 도가적인 초탈을 동경하였다.
이자현(李資玄)은 명문 출신으로서의 지위와 영달이 보장된 벼슬을 버리고 자연에 은거하는 길을 택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 뒤 인종 때에 이르는 동안에 사회의 모순이 격화되는데, 국왕이나 집권층이 안일에 빠져 있을 수 있는가 하는 비판이 계속 일다가 마침내 서경천도운동으로 인한 내전을 겪었다.
천도파에 가담한 정지상(鄭知常)은 자기 고장 서경의 정서를 살리면서 절실하고도 아름다운 표현을 살리고자 해서 김부식 일문의 권위의식과 맞섰다. 김부식은 유학의 경전을 모범으로 삼는 고문을 이룩하고자 하였으며, 스스로 기발한 표현을 개척하기보다는 전거와 교훈을 존중하였다.
의종이 정치를 그르치는 것을 거침없이 간하다가 자살한 정습명(鄭襲明)은 부귀를 멀리하고 평화로운 자연을 동경하는 심정을 읊은 시를 남겼다. 고려 전기 귀족문학이 최고 수준에 이르렀을 때 무신란으로 치달을 사태가 준비되고 있었다.
고려 후기의 문학
1170년(의종 24)에 일어난 무신란과 그 뒤 한 세기 동안 계속된 무신정권은 문학에 결정적인 타격을 준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 고려 전기 귀족문학을 대신해서 새로운 문학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의의를 가진다.
김극기(金克己) 같은 사람은 그러한 시절에 크게 나서지 않으면서 100권이 넘는 문집을 완성하고, 특히 농민 생활의 실상을 담은 작품세계를 보여주었으니, 전에 없던 일이다.
오세재(吳世才)나 이인로(李仁老) 등의 구귀족은 죽림고회(竹林高會)라는 모임을 만들어 문학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 한편, 무신정권에 등용되는 길을 열고자 하였다.
최충헌(崔忠獻) 시절에 이르러서는 무신정권에 등용된 문인들이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주저하는 바 없이 재능을 발휘하였다. 이규보(李奎報)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규보는 왕성한 창작력으로 아주 다양한 작품세계를 이룩하였는데, 그 가운데 농민의 처지를 대변하고자 한 시가 특히 주목된다. 비평은 고려 후기에 본격적인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인로의 『파한집』으로 출발점을 삼는다.
이인로는 거기서 위기에 몰린 문학을 옹호하여 빈부와 귀천으로 우열을 정할 수 없는 것은 오직 아름답게 아로새긴 문장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 이규보는 문집에 남긴 수많은 글과 『백운소설』로 엮어놓은 비평집을 통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문학은 수식보다는 내용이 선행하는 것이어야 하며 독창성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하였다.
최자(崔滋)는 『보한집』을 지어 이규보의 지론을 잇고 작품 비평에서 구체화하였다. 최해(崔瀣)가 『동인지문(東人之文)』을 편찬하면서 그 취지를 밝히고, 이제현(李齊賢)이 『역옹패설(櫟翁稗說)』에서 신흥사대부의 문학관을 역설한 것은 그러한 움직임의 연장이다.
지눌(知訥)이 불교를 혁신하며 선종을 크게 일으키고, 혜심(慧諶)이 그 뒤를 잇자 불교문학의 양상이 달라진 것도 함께 주목할 일이다.
혜심은 논리적 서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겉으로 보아서는 말이 안되기에 충격을 주는 선시(禪詩)와 선문답(禪問答)을 내놓으면서 문학적 표현의 새로운 영역을 적극 개척하였다.
이와는 노선을 달리하는 쪽에서는 천책(天頙) 같은 승려시인이 나타나 일반 한시로서도 높이 평가될 수 있는 작품을 이룩하였다. 혜심의 법통을 이은 충지(冲止)는 처음부터 문학에 힘써 이 두 가지 영역을 구비하는 한편, 원나라 지배하에서 백성들이 겪고 있는 참상을 아주 실감 있게 표현하였다.
선종의 문학은 경한(景閑) · 보우(普愚) · 혜근(惠勤)에게로 이어지면서 수많은 노래를 만들어냈는데, 그 중 한시의 격식을 버린 것도 적지 않다.
『삼국사기』가 이룩한 규범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민족사를 주체적으로 재인식하자는 움직임이 문학창작을 통해서 나타난 것도 그 시대의 특징을 잘 나타내어준다. 이규보는 「동명왕편(東明王篇)」에서 고구려 건국서사시를 재현하면서 민족적 자부심의 근거로 삼고자 하였다.
각훈(覺訓)의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은 『삼국사기』에 빠져 있는 불교의 역사를 서술한 것으로서 『삼국유사』로 넘어가는 길을 열었다.
일연(一然)은 계속되는 전란으로 민족문화가 파괴되고 원나라의 지배 때문에 주체성이 손상된 시기에 『삼국유사』를 편찬하여 불교와 민간전승이 어우러진 데서 민족정신의 맥락을 찾고자 하였다. 이승휴(李承休)의 『제왕운기』는 민족사의 전개를 중국의 경우와 대비하여 노래한 또 하나의 서사시이다.
사람의 일생을 다루는 일은 이른 시기의 신화에서부터 있었으며, 『삼국사기』 열전이나 『해동고승전』도 그 방면의 좋은 전례를 남겼다.
그런데 고려 후기에 이르러서는 한문학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행장(行狀) · 묘지(墓誌) · 전(傳) 같은 것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전을 짓되 이름은 나지 않았으나 불우한 일생을 보냈기에 오히려 문제가 되는 인물을 택하는 것이 새로운 풍조였는데, 이색(李穡)의 전이 그 좋은 예이다.
이규보와 최해는 자기를 다른 어떤 인물에다 가탁을 하여서 칭송도 하고 비하도 하는 탁전(托傳)이라는 것을 개척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사물을 의인화하여서 세상 형편을 수많은 고사를 동원하여 흥미롭게 서술하는 가전(假傳)이 이루어졌다. 임춘(林椿)의 「공방전(孔方傳)」은 돈을 의인화하였고, 이규보의 「국선생전(麴先生傳)」은 술을 등장시켰다.
『고려사』 악지에 소개되어 있고 『악장가사』 같은 데서 국문으로 된 노랫말을 얻어 볼 수 있는 속악가사(俗樂歌詞)는 고려 후기에 성행하던 궁중악에 소용된 것이다.
그 중에는 「정읍사(井邑詞)」나 「처용가」처럼 삼국시대의 전통을 이은 것도 있고, 「쌍화점(雙花店)」 같은 창작물도 있지만, 대부분은 당시의 민요를 채택하여 개작한 것으로 보인다.
짧은 형식도 민요풍이려니와, 여음이 삽입되는 데 따라서 장(章)이 나누어지고 3음보가 두드러진 구실을 하는 긴 형식은 그때까지 잠재되어 있던 민요의 전통이 비로소 드러난 것이다.
「동동(動動)」은 여인이 임을 그리워하는 달거리노래인데, 서두에다 존귀한 분의 덕과 복을 기원하는 말을 덧붙여 놓았다. 「가시리」 · 「이상곡(履霜曲)」 · 「만전춘별사(滿殿春別詞)」 · 「서경별곡(西京別曲)」은 남녀의 사랑을 아주 실감나게 다룬 사연을 지니고 있다.
「청산별곡」은 여러모로 추측을 자아내게 하나, 살 길을 잃고 헤매는 유랑민의 노래가 주조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현과 민사평(閔思平)이 남긴 「소악부(小樂府)」에도 당시 민요의 모습이 남아 있어서 서로 견주어 볼만하다.
몇 가지는 서로 겹치고 소악부에는 백성의 참상을 더 잘 나타낸 것도 있다. 제주도 민요를 옮겨 놓은 것이 이제현의 「소악부」에 포함되어 있어서 주목된다. 고려 후기의 설화는 민요만큼 적극적인 구실을 할 수 없었다. 어디 모아놓은 데가 없으며, 산발적으로 확인될 따름이다.
『고려사』에서는 원나라나 왜구 때문에 참상을 겪을 때 정절을 지켜 죽음을 택하거나 효성을 온전히 하느라고 고생한 인물의 이야기를 실어서 교훈으로 삼았다.
이와 함께 해가 되는 풍습을 지적하느라고, 우왕 때 이금(伊金)이라는 인물이 미륵불로 자칭하면서 나무에서 곡식이 열리고 한 번 심어서 두 번 거두게 되며 신령을 보내어 왜구를 잡겠다고 하며 민심을 소란하게 하였던 일을 들었는데, 그러한 데서는 무가가 변형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구비문학의 더 깊은 층위는 연극이다. 연극은 충렬왕이 특히 좋아하여 궁중에서도 공연된 것 같다. 그러나 민간의 탈춤과 「꼭두각시놀이」가 주류를 이루었고, 수탈을 풍자하는 내용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경기체가(景幾體歌) · 가사(歌辭) · 시조가 나타나면서 향가가 자취를 감춘 다음 시기의 상층 시가문학이 비로소 구체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한림별곡(翰林別曲)」(1216)을 첫 작품으로 하고, 안축(安軸)의 「관동별곡(關東別曲)」 · 「죽계별곡(竹溪別曲)」으로 이어진 경기체가는 한자어구로 지칭된 사물을 열거하면서 흥취를 찾는 것을 특징으로 삼는다.
향찰로 표기된 혜근의 「승원가(僧元歌)」가 발견되면서 가사가 고려말에 발생하였다는 견해가 확인되었는데, 이 작품은 교리를 설명하면서 불교 포교를 꾀한 것이다.
시조는 심성을 노래하는 서정시여서 경기체가나 가사와 좋은 대조를 이루며, 4음보라는 점에서 가사와 같으나 3행으로 마무리되면서 긴장된 시상을 갖춘다.
우탁(禹倬) · 이조년(李兆年)의 작품부터가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고려 말의 정치적 전환에서 각자가 가지는 고민을 표현하면서 특히 중요한 갈래로 뿌리를 내렸다 하겠다.
무신정권이 무너진 다음에 권문세족과의 경쟁을 벌이며 역사의 방향을 이끌어나가고자 한 신흥사대부는 성리학을 새로운 이념으로 내세우고 현실의 문제를 깊이 다루며 문학에서도 전에 볼 수 없던 기풍을 확고하게 하였다.
최해 · 안축 · 이제현의 세대는 그 길을 열었다 하겠고, 그 뒤를 이어서 이곡(李穀)은 백성의 참상에 대하여 한층 관심을 가지고 현실 비판의 주제를 더욱 심화하였다.
이색에 이르러서는 성리학적 이념을 문학에다 구현하면서 문학을 또한 다채롭게 살릴 수 있는 방향이 정립되었다 하겠으나, 현실을 타개하는 데는 오히려 한계가 드러나 사대부문학이 분열되지 않을 수 없었다.
고려를 위해서 충절을 지키려는 쪽에서는 정몽주(鄭夢周) · 이숭인(李崇仁) 등이 이상을 그것대로 추구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운 시련 때문에 번민하였고, 새 왕조를 일으키는 쪽에서는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올바른 도리를 실현하는 길이라면서 문학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였다.
조선 전기의 문학
조선왕조가 들어서자, 새 왕조에서 포부를 실현하려는 쪽과 고려를 위하여 충절을 지키며 은거를 택한 쪽이 문학을 두고서도 서로 다른 태도를 보여주었다.
정도전(鄭道傳)과 권근(權近)은 사회개혁을 완수하고 지배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문학의 사명이라고 하였으며, 새 왕조의 위업을 빛내는 노래를 지었다.
길재(吉再)는 산중에 은거하며 절의를 표방하고 심성의 도리를 찾는 것을 문학의 주제로 삼았다. 원천석(元天錫)은 세상을 등지고 깊이 숨어 지난날을 회고하며 세태를 개탄하는 연작 역사시 「운곡시사(耘谷詩史)」에다 정열을 쏟았다. 한편, 조운흘(趙云仡) · 유방선(柳方善)은 새 왕조의 문풍이 사장(詞章)을 또한 중요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1443년(세종 25) 훈민정음을 이룩해서 국문문학이 시작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을 마련하였다. 훈민정음은 이름 그대로 한문을 모르는 백성들을 가르쳐서 통치하자는 것이 그 취지이다. 유학에 입각해서 교화를 베풀고 행실을 가다듬는 데 소용되는 책을 한동안 펴내고, 불경 번역도 아울러 추진하자 국문 문장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더욱 뚜렷한 성과는 『용비어천가』(1445)와 『월인천강지곡』(1448)이다. 이 두 작품은 국어사의 자료로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최초의 정음 문학이고 드물게 보는 서사시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건국시조들의 영웅적인 행적을 찬양한 왕조 서사시이고, 또 하나는 부처의 일생을 다룬 불교 서사시이어서 서로 대조적인 성격을 지닌다.
왕조 서사시는 여러 문신들에게 명하여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룩하였으며, 불교 서사시는 세종이 스스로 지었다. 새 왕조를 칭송하자고 지은 노래가 악장(樂章)이다. 『용비어천가』 · 『월인천강지곡』도 그 범위 안에 든다고 할 수는 있으나, 「문덕곡(文德曲)」과 「무덕곡(武德曲)」으로 분류된 정도전의 작품 몇 편이 그 기본을 이룬다.
그 전통을 이은 것들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다음에도 상진(尙震)의 「감군은(感君恩)」에 이르기까지 계속 나와서, 국문시가에 악장이라는 갈래가 하나 더 추가되었다.
경기체가는 권근의 「상대별곡(霜臺別曲)」, 변계량(卞季良)의 「화산별곡(華山別曲)」에서 볼 수 있듯이 악장 구실을 하는 것으로 이어지다가, 개인적인 관심사를 나타내는 쪽으로 선회하고 형식이 산만해지더니 조선 전기가 끝나는 것과 함께 자취를 감추었다.
한편, 가사는 정극인(丁克仁)이 지었다고 하는 「상춘곡(賞春曲)」이나 조위(曺偉)의 「만분가(萬憤歌)」 이후에 사대부문학으로 자리를 잡고 은거가사 · 유배가사 · 기행가사 등으로 다채로운 발전을 보였다. 정철(鄭澈)의 「성산별곡」 · 「관동별곡」 · 「사미인곡」 · 「속미인곡」 등이 그 절정을 이루었다.
시조는 고려에 대한 회고의 느낌을 노래하여 감명을 주더니, 맹사성(孟思誠)의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에 이르러서 새 왕조다운 조화를 이루고, 연시조(連時調)가 될 수 있는 길을 찾았다. 불우한 무장의 기개와 사육신의 충절을 나타낼 때는 비장한 기풍을 지녔으나, 시조의 본령은 역시 자연에서 한가로이 노니는 흥취를 자랑하는 것이다.
그러한 기풍이 이현보(李賢輔) 이래의 영남가단과 송순(宋純) 이래의 호남가단에서 확립되자 작품의 수준이 더욱 높아졌다. 이황(李滉)의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과 이이(李珥)의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에서는 심성의 바른 도리를 추구하는 연시조를 이룩하였다.
정철은 「훈민가(訓民歌)」 연작에서 백성에 대한 교화를 나타내고, 다른 시조에서는 다채롭고도 능란한 표현을 구사해서 시조의 판도를 더욱 넓혔다. 한편, 기녀들이 시조의 작자로 등장해서 황진이(黃眞伊)나 이매창(李梅窓)에게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애틋한 정감을 하소연하는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세종 때 집현전을 설치하여 인재를 양성한 이래 한문학이 더욱 융성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기반을 물려받은 서거정(徐居正)은 안정과 번영을 장식하는 화려한 표현으로 한 시대를 이끌며, 『동문선』을 편찬하고 『동인시화』를 지었다.
성간(成侃)과 성현(成俔) 형제는 사장파(詞章派)의 한문학이 한층 난숙해진 시기에 특권의식을 스스로 비판하기도 하고 자랑으로 삼기도 한 점에서 서로 대조적인 기풍을 보여주었다.
예민한 감수성을 지니고 성간보다도 더 불우한 생애를 보낸 박은(朴誾)은 어디서도 보람을 찾을 수 없는 심정을 시에다 쏟아 독특한 경지를 이룩하였다. 이러한 계열은 도학을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문학에 더욱 힘썼기에 사림파(士林派) 또는 도학파(道學派)와 구별되었다.
사림파의 지도자인 김종직(金宗直)은 문장을 앞세워 평가를 얻었으며, 자기 고장인 영남의 정서와 피폐상을 나타내는 작품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김일손(金馹孫)을 위시한 많은 제자가 뒤를 이었으나, 거듭되는 사화로 수난을 당해서 작품이 명성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다가 서경덕(徐敬德) · 이황의 대에 이르러서는 도학의 원리를 철저하게 탐구하면서 문학의 원리를 캐고 실제 창작에서도 사상적인 깊이를 전례 없이 갖추게 되었다.
선조 때 마침내 정권을 잡은 사림파는 박순(朴淳) · 이산해(李山海)에게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도학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문학의 품격을 높이는 데서도 널리 평가될 수 있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미천한 처지를 타고났거나 반항적인 기질을 지녀 지배체제에 불만을 품고 이단적인 정신세계를 찾는 방외인(方外人)의 한문학은 다른 길을 택하였다.
김시습(金時習)이 우선 그러한 인물이어서, 자기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농민의 참상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소설을 창안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노비 출신인 어무적(魚無迹)은 하층민의 처지를 한층 더 심각하게 나타내었다. 임제(林悌)는 불우한 처지가 아니었어도 어디에 매이기 싫어하는 기질 탓에 벼슬을 그만두고 전국을 편력하면서 기행시를 짓고 울분을 달래었다.
모계가 천하다 하여서 배척받은 이달(李達)은 생활 감정을 절실하게 표현하는 시풍을 정착시켜 백광홍(白光弘) · 최경창(崔慶昌)과 함께 삼당시인(三唐詩人)으로 일컬어졌다. 여류시인으로는 허난설헌(許蘭雪軒)이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으며, 시조와 함께 한시에서 재능을 발휘하는 기녀들도 있었다.
불경이 번역되고 불교를 대중화하고 생활화하는 데 기여하는 경전이 특히 여러 번 간행되었지만, 불교문학은 고려 때의 수준을 이을 수 없었다. 척불정책으로 타격을 입은 데다가 스스로의 생기마저 잃었다. 기화(己和)는 척불론에 맞서서 불교와 유학이 다를 바 없다고 하고, 보우(普雨)는 유 · 불 · 도 3교의 이치를 아우르겠다고 하였으나, 그러한 문장이 설득력을 가지기 어려웠다.
보우는 「왕랑반혼전(王郎返魂傳)」을 짓고 국문으로 번역하였다고 하나 확실하지 않다. 시로 이름이 난 승려도 나오지 않아 한동안 적막하더니,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나선 휴정(休靜)은 선시와 『선가귀감(禪家龜鑑)』으로 불교문학을 중흥시키는 데도 상당한 구실을 하였다. 한문학은 시와 문이 그 두 영역인데, 그 중에서 문에서는 새로운 갈래가 생겨날 수 있었다.
고려에서 물려받은 가전은 사물이 아닌 심성을 의인화하는 것으로 변모되어 도학을 흥미롭게 표현하는 한편, 갈등과 번민을 나타내는 데도 쓰였다. 김우옹(金宇顒)의 「천군전(天君傳)」과 임제의 「수성지(愁城誌)」가 그 두 계열 작품의 좋은 예이다.
몽유록(夢遊錄)은 심의(沈義)의 「대관재몽유록(大觀齋夢遊錄)」으로 처음 나타나서, 꿈에서 겪은 일을 서술한다면서 어떤 주장을 사건화하여 보였다.
이 작품은 가상의 문장왕국을 다루었는데 비하여 임제가 작자로 밝혀진 「원생몽유록(元生夢遊錄)」에서는 단종과 사육신을 만나 울분을 함께 토로한 내용이니, 몽유록은 소재를 자유롭게 택할 수 있다 하겠다. 명분과 위엄을 중요시하는 사대부가 비속한 설화에 관심을 가진 것은 흥미로운 일이었다.
서거정의 『필원잡기(筆苑雜記)』나 성현의 『용재총화(慵齋叢話)』 같은 잡록도 설화를 적지 않게 수록하였지만, 서거정의 『태평한화골계전(太平閑話滑稽傳)』에서 시작해서 강희맹(姜希孟)의 『촌담해이(村談解頤)』, 송세림(宋世琳)의 『어면순(禦眠楯)』으로 이어지는 골계전류에서는 음담패설을 한문으로 옮겨 놓았다.
그러나 소설로까지 발전한 설화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고, 죽은 여자와 인연을 맺었다는 명혼설화(冥婚說話), 꿈속에서 뜻을 이루었다는 몽유설화(夢遊說話)이다. 김시습은 이 두 유형을 고독한 주인공이 사랑과 포부를 역설적으로 실현하는 구조로 바꾸어놓아 『금오신화(金鰲新話)』에 수록된 소설 다섯 편을 처음으로 이룩하였다.
조선왕조는 고려 때의 전통을 이어서 경축할 일이 있으면 산대희(山臺戱)를 공연하고 그믐날이면 나례(儺禮)를 거행하였는데, 그러할 때마다 노래와 춤, 각종 곡예, 그리고 소학지희(笑謔之戱)를 하는 광대, 재인의 무리를 동원하였다.
소학지희는 자못 연극적인 내용을 갖춘 재담인데, 산대희나 나례와 별도로 공연되면서 관원들의 좋지 못한 풍습을 풍자한 내용을 갖추기도 하여서 주목된다. 명종 때의 이름난 광대 귀석(貴石)이 그러한 놀음을 잘하였다고 한다. 한편, 탈춤은 민간에서 전승된 듯한데, 박광대 · 중광대 · 양반광대 · 초란이광대 등의 배역을 갖춘 것이 보인다.
조선 후기의 문학
임진왜란 · 병자호란으로 거듭된 전란은 문학에도 깊은 충격을 주어서 현실로 관심을 돌리게 하였다. 전란의 참상을 증언하고 나라를 위해서 고심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데 각계각층 유명 · 무명인이 분발하였던 것도 주목할 만한 전환이었다.
이순신(李舜臣)의 『난중일기(亂中日記)』와 시조, 박인로(朴仁老)의 「선상탄(船上嘆)」같은 가사는 참전한 장군의 증언이다. 유성룡(柳成龍)의 『징비록(懲毖錄)』은 뒷수습을 맡은 재상의 기록이고, 강항(姜沆)의 『간양록(看羊錄)』은 포로로 잡혀간 선비의 수기여서 임진왜란 때의 수난과 분발을 여러모로 나타내 준다.
병자호란을 겪고 이룩한 작품도 다양하여, 무명 궁녀의 『산성일기(山城日記)』(1636)가 있다. 또한 김상헌(金尙憲)과 삼학사가 청나라로 잡혀가면서 지은 시조가 전해져 더욱 이채롭다.
한편, 「달천몽유록(達川夢遊錄)」 · 「피생명몽록(皮生冥夢錄)」 · 「강도몽유록(江都夢遊錄)」 같은 몽유록에서도 전란에서 겪은 참상과 그 후유증을 다루었으며, 수많은 설화가 생겨나고, 그 가운데 일부는 소설로 수용되었다.
한문학은 복고와 혁신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권필(權韠)과 허균(許筠)이 규범과 격식을 파괴하고자 하였으나, 정통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서 나타났다. 이정귀(李廷龜) · 신흠(申欽) · 이식(李植) · 장유(張維)는 4대가로 일컬어지면서 복고적인 고문을 온전하게 하는 데 보조를 함께 하였다.
그러나 박지원을 위시한 실학파는 당대의 현실로 관심을 돌려 갈등을 생동하게 표현하는 문체를 창안해서 이와는 다른 길을 열었다.
정약용(丁若鏞)이 농민의 참상을 민요풍의 한시로 표현하자 한시에서도 변모가 일어났다. 신위(申緯)같은 시인은 개성 있는 표현을 통해서 한시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고자 하였다.
그 무렵 한시의 소재를 조국의 역사와 당대의 풍속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확대되어 「해동악부(海東樂府)」라고 하는 작품이 계속 나타난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한문학이 민족문학으로서의 사명을 깊이 자각하는 데 이르렀다.
과거를 보아 영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중인 · 서리 · 시정인 등이 불리한 위치를 분발의 발판으로 삼아 한시를 짓는 데 대거 열의를 보이자 문학의 판도가 달라졌다. 이들을 위항인(委巷人)이라고 한다.
정내교(鄭來僑) · 장혼(張混) · 조수삼(趙秀三)에게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위항인문학은 사대부문학과 같은 기준에서 경쟁하려는 것만이 아니었고 독자적인 방향을 찾았다. 서로 어울려 시사(詩社)를 결성하며 결속을 다짐하였다.
자기네의 한시는 풍요(風謠)라 하고서, 풍요는 지위나 학식에 구애되지 않는 천기(天機)가 저절로 드러난 것이라고 하였으며, 세태를 묘사하는 것을 실제 창작에서 장기로 삼았다. 창작의 성과를 스스로 정리해서 널리 알리기 위하여 『소대풍요(昭代風謠)』(1737) · 『풍요속선(風謠續選)』(1797) · 『풍요삼선(風謠三選)』(1857)을 편찬하였다.
문학의 본질과 사명에 관한 새로운 주장이 나타나면서 문학사상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먼저 허균은 문학이 도학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이치 이전의 자연스러운 정(情)을 긍정하여야 한다 하며, 험난한 경험이 창작의 바람직한 원천이라고 하였다. 장유는 문학이 그 자체로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만중(金萬重)은 모방에 급급한 한시문보다 무식한 사람들의 민요가 더욱 진실된 문학이라는 파격적인 논의를 폈고, 홍만종(洪萬宗)은 역대의 시화를 정리해서 『시화총림(詩話叢林)』을 편찬하는 한편, 국문시가에 대한 비평을 시도하였다.
홍대용(洪大容)은 일원론적 주기론(一元論的主氣論)을 배경으로 해서 문학이 천기의 발현이어야 하므로 선악이나 교졸을 척도로 삼을 수 없다는 이론을 심화하였다.
박지원은 현실을 비판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문학론을 통해서도 찾았으며, 정약용은 ‘조선시(朝鮮詩)’를 이룩해야 한다고 하였다.
사대부 시조는 윤선도(尹善道)에게서 언어 구사의 세련됨이 최고 수준에 이른 반면에 현실 감각은 오히려 고갈되었다. 그 뒤에, 이정보(李鼎輔)가 많은 작품을 내놓았고, 이세보(李世輔)는 가장 많은 수에 이르는 자기 작품으로 개인 시조집을 엮었다. 그는 위항인 시조의 작풍을 적지 않게 받아들인 탓에 창조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위항인은 한시에 힘쓰는 것과 병행하여서 시조에서도 사대부와 경쟁하였다. 위항인 출신의 가객들은 가단(歌壇)을 이루어 시조창과 창작을 수련하고 시조집을 편찬하였다.
평시조는 온통 바꾸어놓기 어려웠으나, 평시조의 품격과 형식을 파괴하고 비속한 경험을 자유스럽게 표현하는 사설시조를 만들어낸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김천택(金天澤)의 『청구영언』(1728)에서 김수장(金壽長)의 『해동가요』(1763년), 안민영(安玟英)의 『가곡원류』(1876)로 이어지는 시조집은 시조의 위치를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하였으며, 자료수집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경기체가가 자취를 감춘 대신에 가사는 더욱 큰 구실을 하게 되었다. 길이가 길어지고 형식이 산만해지는 한편, 일상 생활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향으로 소재가 확대된 것이 두드러진 변화이다. 기행가사로는 외국에 사신으로 가서 견문한 바를 다룬 것들이 나타났다.
김인겸(金仁謙)의 「일동장유가(日東壯遊歌)」는 1763년(영조 39) 일본으로, 홍순학(洪淳學)의 「연행가(燕行歌)」는 1866년(고종 3) 중국으로 파견된 사신의 일원으로 참가한 다음 두 나라의 사정과 풍속을 각기 자세하게 묘사한 장편이다. 풍속가사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일년 동안의 농사일을 달거리로 서술한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서울의 풍물을 소개하면서 도시적인 분위기를 잘 나타낸 「한양가(漢陽歌)」가 있어서 높이 평가된다. 「우부가(愚夫歌)」 같은 것들은 전통적인 가치관이 파괴되는 양상을 흥미롭게 나타내었다.
천주교에서 교리를 풀이하고 퍼뜨리자고 지은 천주가사(天主歌辭)도 적지 않은 수에 이르렀다. 가창가사(歌唱歌辭)가 성행하는 한편, 규방가사(閨房歌辭)가 나타났다.
지금 구전되고 있는 설화는 대부분 조선 후기에도 있었을 터이나, 그때 생겨났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숙종대왕미행담」 · 「어사 박문수이야기」 같은 것들은 해당 인물보다 앞서서 생기지 않았으며, 전에 볼 수 없었던 민중의 기대와 각성을 나타낸다. 김선달 · 정만서 같은 주인공을 설정해서 세태를 풍자하는 설화는 더욱 적극적인 의의를 가지고 널리 퍼졌다.
역사적인 내용을 지닌 인물전설은 야담이라고 하여 사대부 사이에서도 관심을 끌었으며, 유몽인(柳夢寅)의 『어우야담(於于野譚)』에서 시작해서, 작자 미상의 『청구야담(靑丘野談)』, 이희준(李羲準)의 『계서야담(溪西野談)』, 이원명(李源命)의 『동야휘집(東野彙輯)』(1869)으로 이어지는 역대 야담집에서 거듭 정리되었다.
그 가운데는 소설로 볼 수 있는 것들도 수록되어 있어서 주목된다. 김시습의 『금오신화』에서 시작된 한문소설은 허균의 「남궁선생전(南宮先生傳)」 · 「장생전(蔣生傳)」 등에 이르러서 활력을 다시 얻어 그 범위와 특성이 다소 유동적인 채, 국문소설에 비해서 주제의식이 한층 뚜렷해졌다.
이항복(李恒福)의 「유연전(柳淵傳)」이나 권필의 「주생전(周生傳)」 같은 것들은 실화를 다루었다고 한다. 정태제(鄭泰齊)의 「천군연의(天君演義)」같은, 심성을 의인화한 가전류가 한문소설로 취급되기도 한다. 「창선감의록(彰善感義錄)」 · 「구운몽」 · 「옥루몽(玉樓夢)」 등은 국문본과 한문본이 함께 유통되면서 광범위한 인기를 모았다.
한문단편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야담과 소설 양쪽에 걸쳐 있다고 하겠으나, 박지원의 「허생전」 · 「양반전」 같은 작품은 치밀한 구성과 깊이 있는 주제를 갖추고 사회비판을 전개하였기에 특히 높이 평가된다. 그 뒤를 이어서 이옥(李鈺) · 김려(金鑪) 등이 이에 못지 않은 경지를 계속 보여주자 한문소설의 의의가 더욱 확대되었다.
안민학(安敏學)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의 관에다 넣은 애도문(哀悼文, 1576)이 발견되기는 하였어도 조선 전기에는 국문이 산문의 영역에서 넓게 이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면, 우선 사대부 부녀들 사이에서 내간 · 제문 · 일기 · 실기 등을 국문으로 짓는 풍속이 정착되고, 궁중에서도 그 점에서는 다를 바 없었다.
『산성일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궁중 실기류는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혜경궁홍씨(惠慶宮洪氏)의 「한중록」(1805)은 비극적인 체험을 우아한 문체로 나타내어서 더욱 감동을 준다 하겠다. 소설이라고도 하는 「인현왕후전(仁顯王后傳)」은 덕행을 강조하고자 지은 것이나 흥미 또한 적지 않다.
작자가 남성이라고 밝혀진 국문본 실기로는 박두세(朴斗世)의 「요로원야화기(要路院夜話記)」(1678)가 있어서 세태 묘사를 하였고, 유의양(柳義養)의 「북관노정기(北關路程記)」(1773) 같은 기행문도 보인다.
국문이 이처럼 널리 이용되자 국문소설의 발달을 보게 되었다. 국문소설은 허균의 「홍길동전」에서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도술을 부리는 주인공의 활약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징을 삼았다.
「전우치전(田禹治傳)」도 그러한 예일 뿐만 아니라, 「임진록(壬辰錄)」 · 「박씨전」 · 「임장군전(林將軍傳)」에서 역사적인 시련을 이겨내는 영웅의 투쟁을 그릴 때에 사용된 수법이라는 점에서 또한 공통점이 발견된다.
「조웅전(趙雄傳)」 · 「유충렬전」 등에서는 중국을 무대로 하여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영웅의 투쟁이 전개되고, 「숙향전」 같은 것은 시련을 극복하는 주인공을 여성으로 설정하였다.
김만중의 「구운몽」 · 「사씨남정기」는 이러한 전통과 연결되면서 한층 더 세련된 표현을 갖추었다. 이러한 성과가 장편을 이루어 남영로(南永魯)의 「옥련몽(玉蓮夢)」같은 것이 나타났으며, 사대부의 이상을 뒤집어놓은 작품으로는 「천수석(泉水石)」이 있다. 「명주보월빙(明珠寶月聘)」 연작, 「완월회맹연(玩月會盟宴)」 등의 대장편도 생겨나서 소설의 인기를 알 수 있게 한다.
전기수(傳奇叟)가 낭독을 하고, 방각본(坊刻本)으로 출판이 되어 세책가(貰冊家)에서 빌려주면서, 국문소설은 작품이 계속 늘어나고 더욱 널리 보급되었다. 작자를 알 수 없는 대부분의 작품은, 소설은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수입이나 노리고 창작한 탓이다.
판소리는 서사무가를 세속적이며 일상적인 서사시로 바꾸어놓는 데서 시작되었고, 직업적인 광대가 생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발전시켰다. 광대가 하층민이기에 겪는 고난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상하층의 관심을 한데 아우르고자 하였기에 판소리는 특이한 구조와 주제를 갖추었다.
1754년(영조 30)에 이루어진 만화본(晩華本) 「춘향가」가 있는 것을 보면 판소리가 성립된 시기는 숙종말∼영조초가 아닌가 한다. 판소리는 원래 열두 마당이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여섯 마당만 사설이 전한다.
「춘향가」 · 「흥부가」 · 「심청가」 · 「수궁가」는 관습적인 도덕을 내세우는 것 같지만, 당시 사회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주제를 생동하는 문체로 나타내었기에 대단한 인기를 얻었고 소설로도 널리 읽혔다. 「가루지기타령」은 남녀관계를 음란하게 다루며 유랑민의 처지를 문제로 삼았다.
신재효(申在孝)가 「적벽가(赤壁歌)」까지 포함한 여섯 마당을 다듬으며 판소리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결과 판소리가 상승을 하면서 민중의식은 도리어 약화되었으리라고 본다.
민속극은 무당굿놀이 · 「꼭두각시놀음」 · 탈춤의 세 가지로 전승되면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그 동안의 성장에 대해서는 뚜렷한 자취가 남아 있지 않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이르러 탈춤을 선두로 주목할 만한 변모를 보였다. 농촌마을에서 양반의 묵인하에 공연되던 농촌탈춤이 상업도시의 발달과 함께 도시탈춤으로 바뀐 것이 획기적인 일이었다.
그 결과 18세기 이후 서울 근처의 산대놀이, 황해도 지방의 해서탈춤, 경상도 낙동강유역과 동해안의 오광대(五廣大)와 야류(野遊)가 나타났으며, 그 모두가 종래의 제약을 벗어나서 비판적인 희극으로서의 성격을 더욱 뚜렷하게 가지게 되었다.
취발이와 말뚝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 노장과 양반이 보여주는 종교적인 관념과 신분적인 특권의식을 비판하는 한편, 영감과 할미가 다투는 과장에서는 남성의 횡포까지 문제삼는 것이 공통적인 주제이다. 이와 함께 「꼭두각시놀음」은 모든 권위를 우스꽝스럽게 만들었으며, 무당굿놀이는 흥미 본위의 것으로 바뀌고 있었다.
민요에서도 적지 않은 변모가 일어났으리라는 점은 짐작할 수 있는 바이나, 쉽사리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민요와 가사의 중간 형태쯤 되는 것들이 「기음노래」 · 「합강정가(合江亭歌)」 · 「거창가(居昌歌)」 등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거기 나타난 항거와 고발을 알아볼 수 있다. 후대에 수집된 민요 중에도 그러한 내용을 갖춘 것이 적지 않아 서로 대응된다.
한편, 「아리랑」 같은 것은 19세기쯤 유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회 비판을 하는 것으로 특징을 삼는다. 무가에서 「노랫가락」이 파생되어 나온 것도 그 무렵의 일이다.
1860년 이후의 문학
최제우(崔濟愚)가 1860년 동학을 창건하자 문학사에서도 커다란 전환이 이루어졌다. 최제우는 동학을 일반 민중에게 널리 펴고자 국문가사를 지어 『용담유사(龍潭遺詞)』를 펴내었는데, 거기 수록된 작품이 모두 8편이고 따로 전하는 가사가 또 한 편 있다.
서양의 침략이 눈앞에까지 닥쳐와 오래지 않아 변란이 일어날 조짐인데 내부적인 파탄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경고하고, 유학이나 불교가 이미 운수를 다하였으므로 동학으로 위기를 극복하자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표현을 얻은 위기의식과 구국의지는 한 시기 문학의 기본적인 주제를 이루었다.
병인양요로 서양의 침략이 시작되자, 신재효가 「괘씸한 서양 되놈」(1866)이라는 가사를 지은 것도 새 시대의 과제를 이해하는 데 긴요한 자료이다. 한문학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두고 진지하게 고민하였으며, 침략을 규탄하고 나라를 구하자는 작품을 계속 내놓았다.
서양의 위협이 닥치고 일본의 침략이 시작되자, 위정척사(衛正斥邪)의 상소문이 빗발치더니 그 뒤에 벌어진 상황에서는 다각도의 대응책이 작품으로 표현되었다.
황현(黃玹)은 『매천야록(梅泉野錄)』을 지어서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으로 그 시대를 증언하였고, 1910년 망국이 닥치자 「절명시(絶命詩)」를 남기고 자살을 택하였다.
김택영(金澤榮)은 중국으로 망명을 하여서까지 민족적 영웅을 찾으며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시를 짓는 데 힘썼다. 항일의병장들도 싸움터에서 애국시를 지었으니, 유인석(柳麟錫)의 작품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한문의 구실이 전과 같을 수 없었다.
깊은 사상을 담은 글이나 정부에서 사용하는 공식적인 문서라도 한문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한문에다 국문을 섞어서 쓰는 국한혼용문을 택하게 되어서 한문과 국문의 비중이 역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문체의 좋은 예를 유길준(兪吉濬)의 『서유견문(西遊見聞)』(1895)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해인 1896년에 창간된 『독립신문』은 순국문을 택해서 국문운동이 더욱 철저하게 전개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국문을 정리하고 문법을 서술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게 일어나서, 이봉운(李鳳雲)의 『국문정리』(1897), 지석영(池錫永)의 『신정국문(新訂國文)』(1905)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고, 그 성과가 주시경(周時經)의 『국어문법(國語文法)』(1910)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움직임이 문학작품의 문체를 바꾸어놓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자극이 되었다.
신문 · 잡지 · 출판을 통해서 전개되던 애국계몽운동에서는 우선 전기(傳記)를 중요시하였다. 박은식(朴殷植)의 「서사건국지(瑞士建國誌)」(1907)와 장지연(張志淵)의 「애국부인전(愛國婦人傳)」(1907)은 번안전기이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상당한 구실을 하였다.
신채호(申采浩)는 국사상 영웅의 전기를 더욱 중요시해서 「을지문덕(乙支文德)」(1908) · 「이순신실기(李舜臣實記)」(1908) 같은 것을 내놓으며 구국의 웅변을 토로하였다.
전대의 전통을 빌린 몽유록 또한 널리 이용되며, 상상을 통해서 주장을 펼 수 있게 하였다. 유원표(劉元杓)의 「몽견제갈량(夢見諸葛亮)」(1908)에서는 제갈량을, 박은식의 「몽배금태조(夢拜金太祖)」(1911)에서는 금태조를, 신채호의 「꿈하늘」(1915)에서는 을지문덕을 등장시켜, 그러한 인물들과 국난극복의 방안을 논의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작품은 처음에 국한혼용문을 사용하다가 순전한 국문을 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기에 문체의 변화를 살피는 데도 소중한 자료이다.
창가(唱歌)가 나타나고 가사의 형식이 달라진 것도 함께 주목할 일이다. 『독립신문』은 창간된 해인 1896년부터 애국심을 고취하는 짤막한 노래 「애국가」 · 「독립가」 같은 것들을 독자투고로 실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창가이다.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에서는 1905년부터 1910년까지 매국노를 규탄하고 구국의 길을 찾자는 가사를 계속 실었는데, 과거의 가사와는 다르게 연을 나누고 반복구를 두어 긴박해진 상황과 합치되도록 하였다.
창가는 그 뒤에 널리 유행해서 학교창가로 쓰이는 한편, 최남선(崔南善)의 「경부철도가(京釜鐵道歌)」(1908) 같은 것들에 이르러서는 장편을 이루었다.
항일적인 창가는 탄압의 대상이 되고 유행가와 상통하는 창가가 오히려 많아졌다. 일본 시가의 율격인 7 · 5조가 창가를 통해서 수입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가사가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의병들이 지어 부른 것만 해도 적지 않았으며, 일본군이 탈취해서 일역해놓은 자료를 찾을 수 있다.
규방가사로 유포되던 것들 중에도 시대를 비판한 것이 있다. 사공수(司空檖)가 지은 「한양오백년가(漢陽五百年歌)」(1913)는 오랫동안 국사교과서 노릇을 하였다. 의병장 신태식(申泰植)은 잡혀서 옥고를 치른 다음 의병전쟁을 회고하고, 애국심을 나타낸 「창의가(倡義歌)」(1920)를 지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은밀히 보관되었다.
신소설은 새로운 소설이라는 뜻으로 그러한 이름이 붙었으나, 소설이 이미 광범위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데 힘입어 기존의 전개방식을 적지 않게 받아들이며 개화사상을 나타낸 것을 특징으로 삼는다.
『대한매일신보』에 발표된 단편 「소경과 앉은뱅이의 문답」(1905) · 「거부오해(車夫誤解)」(1906) 같은 것들이 처음으로 나타난 예인데, 작자의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고 풍자적인 수법으로 매국노를 규탄한 것을 특징으로 삼는다.
그 뒤를 이어서 이인직(李人稙)은 「혈(血)의 누(淚)」(1906) · 「치악산(雉岳山)」(1908) 같은 장편을 신문에 연재하였고, 이해조(李海朝)와 최찬식(崔瓚植)의 작품도 흥미본위의 전개에다 의존적인 개화사상을 내세우며 함께 인기를 얻었다.
안국선(安國善)의 「금수회의록(禽獸會議錄)」(1908), 이해조의 「자유종(自由鐘)」(1910)은 신소설이라고 하지만 토론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고 친일적인 성향을 띠지 않은 점에서 특이한 위치를 차지한다.
신소설의 친일적 성향과 흥미본위의 풍조는 그 뒤에 더욱 확대되어서, 마침내 신소설이 문학사적 의의를 잃고 저급한 통속문학으로 떨어지는 데 이르렀다.
신소설과 함께 나타난 새로운 갈래에 신체시(新體詩)가 있다. 신체시는 노래부르기 위한 시가 아니다. 전통적인 율격에서 벗어나 자유시로의 길을 택하였다는 점에서 창가와 구별되나 아직 교훈적인 내용을 적지 않게 지니고 있었다.
최남선의 「해(海)에게서 소년에게」(1908)가 그 첫 작품이고, 「구작삼편(舊作三篇)」(1909)이 이어서 나왔다. 이러한 작품들은 새로운 문학을 이루려는 의욕은 나타나 있다 하겠으나, 표현이 따르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이광수의 「우리 영웅」(1910), 현상윤(玄相允)의 「친구야 아느냐」(1914) 같은 것들이 추가되자 현대시에 좀더 접근할 수 있었다.
창극(唱劇)과 신파극(新派劇)이 나타나면서 연극이 달라졌다. 창극은 판소리를 고쳐서 배역을 나누어서 하는 연극으로 만든 것인데, 이인직이 「은세계(銀世界)」(1908)를 연극으로 공연할 때 처음으로 그러한 방식을 택하였다.
그 뒤 창극이 신파극과 함께 인기를 끌더니, 판소리가 지닌 가치를 새롭게 계승하지 못하고 통속적인 공연물로 처져서 마침내 자취를 감추었다.
신파극은 신소설 · 신체시와 나란히 일컬어질 수 있는 것인데, 일본 신파극을 수입해온 형태이기에 더욱 두드러진 한계를 가졌다. 임성구(林聖九)가 혁신단(革新團)이라는 극단을 조직해서 「불효천벌(不孝天罰)」(1911) 같은 작품을 공연한 것이 그 처음이고, 대강 설정된 줄거리에 따라서 즉흥적인 대사를 구사하며 격정적인 수법으로 눈물을 자아내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하여 생긴 신파조는 소설로까지 영역을 확대해서 커다란 역기능을 하였다. 그러는 동안에도 조중환(趙重桓)의 「병자삼인(病者三人)」(1912)은 희곡이 풍자적인 희극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신소설보다 한 걸음 더 발전된 소설은 현상윤이 이룩하였다.
「한(恨)의 일생」(1914)부터 신소설의 관습을 따르지 않았으며, 「핍박(逼迫)」(1917) 같은 작품에 이르러서는 식민지 상황에서 지식인의 내면적인 고민을 아주 절실하게 나타내었다.
이광수의 단편 「소년의 비애(悲哀)」(1917)도 내면적인 정신의 세계를 개척하는 데 기여를 하면서 그 시대의 문제를 다루었다. 장편 「무정(無情)」(1917)은 더욱 문제작이며 대단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하지만, 구사회를 암흑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문명을 식민지통치에 의한 변모와 구별하지 않았다. 이 시기의 문학론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신채호는 친일적이며 흥미본위의 문학이 대두하는 것을 극력 경계하고, 민중을 일깨우며 민족광복운동에 기여하는 문학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였으며, 망명지 중국에 가서는 그러한 주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한편, 이해조는 신소설 「화(花)의 혈(血)」(1911)의 서두와 결말에서 소설은 현실을 다루어야 하며, 허구로 이루어지지만 진실된 표현을 하여야 한다고 해서, 표현 방법을 바꾸는 데 관심을 두었다.
이광수는 그러한 주장을 이으면서 문학이 구시대의 가치관을 버리고 새로운 사상을 구어체의 문장으로 표현하되 감정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문학의 개념과 성격을 서양의 전례에 따라서 다시 설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었기에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남겼다.
1919년 이후의 문학
1919년 3 · 1운동으로 민족광복운동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표현되고, 식민지 조건에서나마 의식과 문화에서의 근대화가 추진되었으며, 일제는 무단정치를 완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한 추세에 힘입어 신문학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서 문학사의 단계가 달라졌다.
1919년 『창조(創造)』, 1920년 『폐허(廢墟)』, 1922년 『백조(白潮)』 같은 문학동인지들이 나타나고, 1920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창간되어 문학 활동이 발판을 얻었다., 근대적인 각성과 민족의 처지에 따르는 고민이 새로운 표현을 얻으면서 문학은 언론에 못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한문학을 청산하고 언문일치를 달성하며, 문학의 범위를 시 · 소설 · 희곡으로 설정하자는 것도 일치된 방향이었다. 문학운동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서양 근대문학에서 바람직한 전례를 찾고자 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 것도 그 무렵의 일이다.
이미 『태서문예신보(泰西文藝新報)』(1918)를 펴내어서 소개와 번역을 시도하더니, 김억(金億)의 번역시집 『오뇌(懊惱)의 무도(舞蹈)』(1921)가 이어서 나왔다.
일본에 유학하고 돌아와서는 낭만주의 · 사실주의 · 자연주의 · 상징주의 등을 표방하면서 문학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이와 같은 서양문예사조는 근대문학을 확립하는 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서양 근대화의 과정에서 가졌던 진취적인 기풍을 이미 상실한 단계의 산물이기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으며, 문화적인 배경이나 역사적인 경험이 다른 조건에서는 주장하는 것처럼 정착될 수 없었다. 서양문예사조와의 관련을 표방하지 않은 작가가 창작에서는 더욱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던 점도 간과할 수는 없다.
시는 개성과 감정의 해방을 이룩하자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하면서, 민족의 처지를 앞에 두고 비관에 빠지는 쪽과 희망을 찾자는 쪽이 서로 다른 경향을 보여주었다.
주요한(朱耀翰)의 「불놀이」(1919)는 자유시의 영역을 산문시로까지 확장하면서 격렬한 표현으로 정신적 방황을 나타내었기에 전환점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된다.
김소월(金素月)은 시집 『진달래꽃』(1925)에서 민요적인 정서를 그 시대의 슬픔으로 바꾸어놓아 깊은 공감을 자아냈다. 이상화(李相和)는 처음에 괴로움을 하소연할 수 있는 환상을 찾더니,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1926)와 같은 작품에 이르러서는 민족의 현실을 노래하면서 좌절하지 않는 정열을 일깨워주었다.
한용운은 민족광복운동에서 커다란 과업을 맡는 한편 시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 시집 『님의 침묵(沈默)』(1926)에서 좌절을 희망으로 전환시키는 논리를 사상적인 깊이가 있는 상징으로 표현하였다.
소설도 처음에는 나도향(羅稻香)의 「환희(幻戱)」(192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암담한 분위기에 휩싸여 낭만적 환상을 그리다가 사회문제를 다루면서 현실을 인식하고 타개책을 찾아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김동인(金東仁)은 불리한 환경 때문에 변모되고 희생되는 인간을 다루는 데 힘쓰는 한편 간결한 문체를 구사하는 소설 기법을 발전시켰다. 염상섭(廉想涉)은 그 시대의 풍속도를 그리고자 하였으며, 장황한 묘사를 특징으로 삼았다.
현진건(玄鎭健)은 불리한 현실 때문에 좌절하면서도 대결의 의지를 버리지 않는 인간형을 창조하였으며, 면밀한 구성을 갖추어 극적인 결말이 지니는 효과를 중요시하였다.
한동안 단편소설이 작품의 수준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다가, 그 성과가 장편소설로까지 연장되어서 염상섭의 「삼대(三代)」(1931), 현진건의 「적도(赤道)」 같은 문제작을 낳게 하였다. 희곡의 발전은 그다지 순조롭지 못하였다.
김영보(金泳俌)가 최초의 희곡집 『황야(荒野)에서』(1922)를 낸 것을 보면 출발이 뒤떨어지지는 않았으나, 신극이 관객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어려운 조건에 놓였던 만큼 희곡도 시련을 겪어야만 하였다.
신파극을 넘어선 근대극을 이룩하자는 운동은 동경 유학생들 사이에서 먼저 일어났으며, 김우진(金祐鎭)은 그 중심 인물로서 「산돼지」(1926) 같은 문제작을 남겼다.
거기에서 억압되고 위축된 시대에 자기를 위장하고 살아가는 지식인의 번민과 환상을 다루었다. 비교적 장기간 활동한 극단은 토월회(土月會)였다. 토월회를 이끈 박승희(朴勝喜)는 극단 운영자 · 연출가로 활동하는 한편, 많은 희곡을 창작해서 무대에 올렸는데 전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 무렵 좌익문학운동이 일어나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박영희(朴英熙)와 김기진(金基鎭)이 주동자가 되어서 문학은 무산계급의 해방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창작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한 이론이 강력하게 대두되던 해인 1925년 카프(KAPF)라고 약칭되는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이 결성되었다.
그렇게 되자,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쪽에서는 문학은 어느 계급의 것만일 수 없다면서 국민문학을 주장하였으며, 절충론도 함께 나타나 논쟁이 한동안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박영희는 1932년에 이르러 자기의 주장이 잘못이었다고 하여 내부적인 동요가 일어났고, 1934년에 이르러서는 일제에 의하여 회원들이 검거되고 1935년 카프는 해산되고 말았다.
카프의 주장은 일본을 통해서 받아들인 소련의 전례를 우리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려 하였기에 커다란 한계가 있었다. 또 서투른 이론으로 창작을 지도하려고 한 데서 부작용을 빚기도 하였지만, 커다란 영향을 끼쳤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때 좌경문학을 신경향파 · 프롤레타리아문학 · 동반작가문학으로 분류하였다. 목적의식이 불분명하다고 한 신경향파에 속하는 최학송(崔鶴松)은 이론이 아닌 절실한 체험에서 빈궁의 문학을 보여주었다.
또 동반작가라고 일방적으로 분류된 쪽도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이룩한 경우가 적지 않다. 정통 프롤레타리아작가라고 하는 부류는 카프가 해산된 다음 어느 정도의 타협을 하고서 비로소 작품다운 작품을 내놓았다.
좌경문학을 반대하는 쪽이 그에 대한 대응이론을 정비하지 못하였던 데도 문제가 있다. 계급을 넘어선 공동의 문학을 전통 계승을 통해서 이룩하자고 최남선 같은 사람이 주동이 되어 시조부흥론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최남선의 「백팔번뇌(百八煩惱)」(1926), 이은상(李殷相)의 『노산시조집(鷺山時調集)』(1932), 이병기의 『가람시조집(嘉藍時調集)』(1939) 등이 이루어져 현대시조가 자리를 잡았다.
이와 함께 역사소설을 개척해서 과거를 재인식하고 공감의 영역을 마련하자는 것으로도 대응책을 삼았으나, 역사소설이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질 수 있느냐는 작품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었다.
1930년 『시문학(詩文學)』이라는 시잡지가 나타난 것을 계기로 언어 중심 또는 기교 위주의 시풍을 개척한 것이 주목할 만한 변화였다. 시는 영탄일 수 없고, 내용이 선행되지 않는다 하며, 세련된 감각을 찾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정지용(鄭芝溶)은 『정지용시집』(1935)에서 시각적인 심상을 보여주었고, 김영랑(金永郎)은 『영랑시집』(1935)에서 미묘한 음악적인 표현효과를 구현하였다.
그런가 하면 김기림(金起林)은 「기상도(氣象圖)」(1936)로, 김광균(金光均)은 「와사등(瓦斯燈)」(1939)으로 도시문명의 감각을 회화적인 심상으로 펼쳐보이는 이른바 모더니즘의 수법을 개척하였다.
이와 함께, 이상(李箱)이 상식적인 이해를 거부하는 난해시를 발표한 것도 충격적인 일이었다. 1936년 『시인부락(詩人部落)』이라는 동인지가 나타나 유치환(柳致環)과 서정주(徐廷柱)가 생명의 의지를 추구하는 시풍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소설은 이보다 더 다양한 경향을 띠면서 일제의 검열이 더욱 가혹해지는 상황에 대처하고자 하였다. 이광수의 「이순신」(1931∼1932), 홍명희(洪命熹)의 「임꺽정(林巨正)」(1928∼1940), 현진건의 「무영탑(無影塔)」(1938∼1939)은 역사소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면서 서로 다른 방향을 택하였다.
농촌소설에 대한 관심이 크게 일어나서 이광수의 「흙」(1932∼1933), 이기영(李箕永)의 「고향」(1933∼1934), 심훈(沈熏)의 「상록수」(1935∼1936)가 서로 상이한 방향을 개척하였다. 김유정(金裕貞)은 어떠한 이념을 제시하지 않고 농민 생활을 해학적으로 다루었다.
이와 함께 세태소설로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박태원(朴泰遠)의 「천변풍경(川邊風景)」(1938) 같은 것이 그 좋은 예다.
채만식(蔡萬植)의 「탁류(濁流)」(1937∼1938) · 「태평천하(太平天下)」(1938)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태묘사와 풍자를 함께 보여주었다. 지식인의 고민을 다루고 내면심리를 문제삼는 소설이 나타난 것도 시대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이러한 계열에서는 이상의 「날개」(1936) 같은 단편이 특히 관심을 끌었다.
또한, 문학적인 가치나 문제의식은 버리는 대신에 광범위한 독자를 얻고자 하는 통속소설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의 일이다.
1931년 극예술연구회(劇藝術硏究會)가 창립되고 한층 수준 높은 번역극과 함께 창작극을 공연하자 희곡에서도 전환이 일어났다. 유치진(柳致眞)은 그 극단의 대표적인 작가로서 「토막(土幕)」(1932)을 첫 작품으로 내놓았다. 농촌 빈민 출신의 청년이 일본에 품팔이를 하러 갔다가 사형을 당하고 백골만 노부모에게 돌아왔다는 내용이다.
농촌소설이 성행하는 것과 병행해서 농촌극이 관심을 끌었으며, 유치진이 그러한 방향으로의 전환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광래(李光來)의 「촌선생(村先生)」(1936) 같은 문제작도 나왔다.
채만식은 소설가이면서 극작에도 참여하였다. 그 무렵 동양극장(東洋劇場)이라는 상업적인 극장이 생기고 이른바 고등신파를 표방하는 연극이 인기를 모았으나, 우수한 희곡작품이 나오기는 어려웠다.
프롤레타리아문학 때문에 벌어진 논쟁이 퇴조를 보인 다음에 전문적인 비평가가 담당하는 본격적인 비평이 정착되었다. 그런데 일본에 가서 서양 문학을 전공한 이른바 해외문학파(海外文學派)가 비평에서 주도권을 잡았으며, 서양 문학을 기준으로 삼아 창작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므로 본격적인 비평이 반드시 긍정적인 구실을 하였던 것은 아니다.
열성적인 활동을 한 사람은 독설과 험담을 일삼는 김문집(金文輯)과 영문학을 전공한 최재서(崔載瑞)로 각기 『비평문학』(1938)과 『문학과 지성』(1938)이라는 평론집을 내었다. 이와 함께 김기림은 모더니즘의 시론을 전개하였고, 김환태(金煥泰)는 예술지상주의를 주장하였다.
주지주의론 · 풍자문학론 · 휴머니즘론 등도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나, 서양의 전례를 적용하자는 것이었으므로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기 어려웠다. 같은 시기에 국학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고 고전문학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그 성과가 현대비평에는 활용되지 못하였다.
수필은 시 · 소설 · 희곡과 대등한 위치를 차지할 수 없었으며, 비평만큼 존중되지도 않았으나 문학의 범위 안에 드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또 직업적인 문인과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인이 함께 취미를 살릴 수 있는 영역으로 간주되었다. 최남선의 『심춘순례(尋春巡禮)』(1926) 같은 것은 한문 교양을 배경으로 하는 새로운 문체의 전례를 보여주었는데, 그 뒤에는 관심이 달라졌다.
홍난파(洪蘭坡)의 『음악만필(音樂漫筆)』(1938)은 이웃 분야 종사자의 문필 활동에서 얻은 좋은 성과로 평가되고, 김진섭(金晉燮)은 수필을 전문적인 영역으로 택하고서 본격적인 수필을 이룩하고자 해서, 두 가지 경향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새로운 문장을 수련하자는 관심이 일어나 이태준(李泰俊)의 『문장강화(文章講話)』(1940)가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아동문학은 최남선이 잡지 『소년』(1908)을 간행할 때부터 나타난 셈이고, 자녀 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에 힘입어 그 구실이 강조되었다.
방정환(方定煥)이 『어린이』(1923)를 창간하자 아동문학운동은 본격적으로 일어났고, 아동문학이 문학의 한 영역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 뒤 동요 또는 동시, 그리고 동화의 두 분야에 걸쳐 활발한 창작이 이루어졌다.
윤석중(尹石重)의 동시집 『잃어버린 댕기』(1933)와 마해송(馬海松)의 동화집 『해송동화집』(1934)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성과로 평가된다. 일제는 민족광복을 쟁취하려는 문학에 대해서 점차 더욱 가혹한 탄압을 하였으나, 심훈 같은 사람은 끝까지 맞서서 시를 썼으며, 이육사(李陸史) 또한 투지를 고취하는 시에다 정열을 쏟았다.
그런데 일제는 마침내 국어를 말살하고자 하였으며, 침략전쟁을 찬양하는 작품을 일본어로 내놓을 것을 강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광수 · 최재서 등은 변절을 하는 데 앞장섰고, 소극적인 동조를 한 작가는 더 많았다. 민족적 양심을 버리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침묵을 택하거나 투옥되었다.
그래서 1940년대를 국문학사에서 암흑기였다고 하지만, 만주 쪽에서는 사태의 악화가 늦게 닥쳐와 『재만조선시인집(在滿朝鮮詩人集)』(1942)이 그곳으로 이주한 시인들에 의하여 국어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육사와 함께 옥사를 한 윤동주(尹東柱)는 억압될 수 없는 민족적 양심과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시를 유고로 남겼다.
1945년 이후의 문학
1945년 8월 광복과 더불어 문학도 소생하였다. 그 감격을 함께 나누는 것이 공동의 관심사였음을 같은 해 12월에 나온 『해방기념시집(解放紀念詩集)』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학의 진로를 놓고 좌우익의 분열을 보게 되었다. 1946년에 이르자 좌익에서는 조선문학가동맹을, 우익에서는 전조선문필가협회(全朝鮮文筆家協會) 및 청년문학가협회를 각기 결성하여 심각한 논란을 벌였다.
그러다가 1950년의 전쟁을 겪고서 좌경문인들은 월북을 하였고 문단의 재편성을 보게 되었다. 월북작가 중 다수가 뒤에 숙청되어 남북 어디서도 용납되지 않았다. 남쪽에서는 계급문학론이 다시 대두할 수 없게 되어 논란이 끝났으나, 냉전체제의 고착으로 적지 않은 제약을 겪어야만 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시에서는 민족항일기에 이루어진, 민족시인들의 시집이 출간될 수 있었던 것이 우선 커다란 수확이었다. 이육사의 『육사시집』(1946),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1948), 심훈의 『그날이 오면』(1949)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생존하여 광복을 맞이한 시인들도 그 동안 창작하였던 작품을 시집으로 정리하여 내놓는 데 힘썼다. 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논란이 거듭될 때 박두진(朴斗鎭) · 박목월(朴木月) · 조지훈(趙芝薰)의 『청록집(靑鹿集)』(1946)이 나와 차분하게 다듬어진 표현으로 향토적인 정서를 일깨워주었다.
이용악(李庸岳)도 『오랑캐꽃』(1947)에서 이와 상통하는 세계를 보여주면서 생활의 실상을 중요시하였다. 서정주의 『귀촉도(歸蜀途)』(1946)와 유치환의 『생명(生命)의 서(書)』(1947)도 그 뒤 오랫동안 시단을 이끌어갈 두 시인이 모색하고 고민한 바를 잘 나타내주었다.
소설에서는 항일문학의 유산이 뚜렷하지 않았으며, 새 출발을 하면서 그 동안의 인습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가 우선 문제가 되었다.
이광수는 민족반역자였던 행적 때문에 위축되었고, 김동인은 통속소설로 기울어졌으며, 염상섭은 세태묘사를 계속하였으나 활력을 지니지 못하였다. 이태준은 그 동안 보여준 정서적인 미문과는 거리가 먼 좌경노선을 택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향토적인 정서를 서정시에 가까운 문장으로 표현하는 김동리(金東里)의 「황토기(黃土記)」(1949)와 황순원(黃順元)의 「별과 같이 살다」(1950)가 관심을 모았다. 이 두 작가는 그 뒤 소재를 확대해서 장편을 이룩하였으나, 처음 택하였던 작품세계가 계속 기저를 이루었다.
안수길(安壽吉)은 「북간도(北間島)」(1967)에서, 북간도를 무대로 펼쳐지는 4대에 걸친 가족사를 통하여 민족의 비극과 각성을 거대한 규모로 그렸으며, 소설이 지향하여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희곡의 경우 통속극과 친일극으로 거의 온통 기울어졌던 과거가 더욱 큰 부담이 되었으며, 새로운 발전을 이룩할만한 기반이 쉽사리 조성되지 않았다.
좌경노선을 택한 송영(宋影) · 함세덕(咸世德) 등이 역사를 그 방향으로 해석하고 이끌어가려는 작품을 내놓을 때, 유치진은 한층 더 심했던 친일행적 때문에 입은 타격을 상쇄하려고 농촌극에 다시 관심을 가졌고, 「원술랑(元述郎)」(1950) 같은 역사극에 힘썼으며, 그 뒤 반공극을 내놓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월남한 작가 오영진(吳泳鎭)은 한동안 즐겨 다루던 민속적 소재를 넘어서서, 「살아있는 이중생각하(李重生閣下)」(1949) 같은 데서는 혼란을 틈타 거부가 된 사기꾼 친일파를 풍자하였다. 김영수(金永壽)의 「혈맥(血脈)」(1948)은 어려워진 환경에서 생존권을 찾는 사람들을 인상깊게 다루어서 주목된다.
그 무렵 극단 신협(新協)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자 하였으나, 연극이 정착되기는 어려웠고, 이어서 영화가 인기를 모으게 되었다.
평론에서는 좌우익의 논쟁이 더욱 치열하게 벌어졌다. 처음은 결의문 · 성명서 같은 것이 오가더니 김동석(金東錫)과 김동리 사이의 논쟁이 시작되었다.
김동석이 김동리의 순수문학론을 공격하자 김동리는 이에 맞서서 순수문학은 인간성을 옹호하는 본격적인 문학이라고 하였으며, 김동석이 주장하는 계급문학은 문학의 상실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김동석의 『문학과 인간』(1947), 김동리의 『문학과 사상』(1948)이 논쟁의 산물인 평론집이다. 김동리의 주장에는 조연현(趙演鉉) · 조지훈 등이 가세하였으며, 이들이 그 뒤 문단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한편, 백철은 『조선신문학사조사』에서 신문학사를 서양 문예사조의 도입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하였으며, 조연현은 『한국현대문학사』(1957)를 내놓아 같은 작업을 다시 하면서 문단에서의 주도권 변천을 특히 중요시하였다.
수필은 문학잡지에서 시 · 소설과 함께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기는 하였어도 문학으로서의 의의가 재평가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김진섭은 본격적인 수필을 이룩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생활인의 철학』(1948)이라는 수필집을 내놓았다.
이양하(李敭河)같은 영문학자도 수필가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이와 함께, 수필가로 자처하지 않는 비전문가의 수필이 계속 수필에 관한 광범위한 관심을 일으켰다. 인생론을 담은 장편수필이 상당한 독자를 얻었던 것은 수필이 문학에서 차지한 불리한 위치와 좋은 대조가 된다.
아동문학은 초등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작품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강소천(姜小泉)의 동화 『진달래와 철쭉』(1945)이 광복 직후에 나오고, 그 뒤를 이어서 김요섭(金耀燮)의 『오 멀고 먼 나라여』(1959)에 이르기까지 환상적인 동심의 세계를 그린 작품이 계속 나타났다.
그러는 동안 초등학교 교사들 가운데 아동문학에 뜻을 두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환상보다는 현실을 다루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오덕(李五德)은 『탱자나무 울타리』(1969) 이후에 새로운 경향을 창작과 이론 양면에서 구체화하면서 널리 관심을 모았다.
신문과 출판이 상업주의적인 성향을 짙게 띠게 되면서 통속문학이 독자적인 판도를 이룩한 것도 함께 주목할 일이다. 방인근(方仁根)의 「고향산천(故鄕山川)」(1948)에서 김내성(金來城)의 「청춘극장(靑春劇場)」(1953∼1954)까지가 첫 시기 통속문학을 주도하였으며, 이 두 사람은 탐정소설을 내놓아 한때 인기를 모았다.
정비석(鄭飛石)의 「자유부인(自由夫人)」(1954)은 신문연재소설로 성공을 한 대표적인 예인데, 자극적인 내용 때문에 물의를 빚었고 통속문학을 격하시키는 구실을 하였다. 그 뒤 신문소설도 문학적 가치를 가지자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통속소설임을 표방하지 않고 문제의식을 갖춘 작품이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는 사례도 나타났다.
그 반면 영화나 방송극으로 통속소설의 맥락이 이어졌으며, 특히 최근 텔레비전의 방송극이 예술적인 가치는 돌보지 않고 일시적인 인기에만 영합하여서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통속문학과 전혀 반대가 되는 길을 간 것은 시였다. 전후의 시는 서구 현대시의 전례를 받아들여 난해하고 일반독자의 경험과 호응되지 않는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였다.
그러한 조짐은 박인환(朴寅煥) · 김경린(金璟麟) · 김수영(金洙暎)이 함께 낸 시집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1949)에서 나타나더니, 그 뒤 한 시대의 풍조를 이루었다.
사물에 대한 관찰과 언어 감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시의 사명이라는 경향이 또한 관심을 끌어서, 박남수(朴南秀)의 『갈매기 소묘(素描)』(1958), 김춘수(金春洙)의 『꽃의 소묘』(1959) 같은 시집이 나왔다.
또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정서를 살리면서 표현을 가다듬자는 움직임이 이와 대조를 이루었다. 박재삼(朴在森)의 『춘향(春香)이 마음』(1956), 김관식(金冠植)의 『김관식시선(金冠植詩選)』(1957)에서 그 좋은 예를 찾을 수 있다.
그러다가 4 · 19를 계기로 해서 시가 현실로 관심을 돌려, 문제의식에 근거를 둔 공감을 얻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더니, 김수영은 과거의 경향을 탈피해서 지식인의 고민과 각성를 토로하였고, 신동엽(申東曄)은 서사시 「금강(錦江)」(1969)에서 민족사의 격동을 깊이 있게 다루면서 표현 방법도 아울러 바꾸어놓고자 하였다.
소설에서는 박종화(朴鍾和)의 「임진왜란」(1955) 같은 역사소설이 회고적인 관심을 끌며 지난날의 작품을 지속시키고 있었다. 한편, 당대의 사회상을 직접 다룬 단편이나 중편에서는 전통적인 가치가 해체되고 인간성을 되찾기 어렵게 된 상황을 문제삼은 것들이 충격적인 작품세계를 보여주었다.
손창섭(孫昌涉)의 「잉여인간(剩餘人間)」(1959)에서 보이는 무기력과 소외감, 이범선(李範宣)의 「오발탄(誤發彈)」(1959)에서의 절망 같은 것이 한동안의 경향을 잘 나타낸다.
4 · 19를 겪고 나서는 민족분단의 비극을 다룬 최인훈(崔仁勳)의 「광장(廣場)」(1960), 이호철(李浩哲)의 「판문점(板門店)」(1961) 같은 작품이 쓰여진 것이 주목할 만한 일이다.
농촌의 현실을 다시 문제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타나는 가운데,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김정한(金廷漢)이 작품 활동을 다시 시작해서 「인간단지(人間團地)」(1970) 같은 단편집을 내놓았다.
박경리(朴景利)는 장편 대하소설 「토지」(제1부, 1973, 이하 속간)를 통해서 근대민족사의 전개를 깊이 있게 파헤쳤으며, 종래의 역사소설이 지닌 인습을 타파하는 데 적극 기여하였다.
희곡에서도 소설의 경우처럼 사회문제를 다루며 가치관의 혼란을 아울러 묘사하는 작품이 나왔다. 임희재(任熙宰)의 「복(伏)날」(1956)은 판자집에서 철거된 사람들의 경우를 문제로 삼았으며, 차범석(車凡錫)의 「불모지(不毛地)」(1957)는 전통을 지키려는 노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른 것을 보여주었다.
영화가 인기를 모으자 상업적인 연극은 설 자리를 잃게 되었고, 그 대신 소극장운동이 일어나 새로운 작품을 실험하는 데 열을 올렸으나 희곡에서 얻은 성과는 뚜렷하지 않다. 그러한 가운데도 이근삼(李根三)은 풍자적인 희극을 개척해서 주목되며, 「제18공화국(第十八共和國)」(1965) 같은 것은 대담한 정치풍자이다.
한편 탈춤에 대한 관심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탈춤을 계승한 마당극을 일으키자는 것이 최근에 이르러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다.
비평에서는 한동안 서양 현대문학의 새로운 경향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대두해서, 시와 소설에서의 움직임과 서로 호응하는 관계를 가졌다. 세계문학전집 또는 전후문제작품집 등으로 서양 문학의 최근 사조가 소개되기도 하였다.
그때 이어령(李御寧)은 『저항(抵抗)의 문학』(1958) 같은 평론집을 통해서 문학이 부조리한 인간조건에 대한 관념적인 저항의 언어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4 · 19 이후 관심의 방향이 달라져서 문학이 전통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현실참여의 길을 찾고, 분단시대의 사명을 자각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났으며, 이에 따르는 논쟁이 거듭되었다.
김윤식과 김현의 『한국문학사』는 관심의 전환이 문학사 이해와 관련되어 나타난 예이고, 백낙청(白樂晴)의 『민족문학과 세계문학』(1978)은 문학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사
국문학연구사는 한국 문학 연구의 역사이다. 한국 문학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한 것이 이 연구사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 연구사는 한국 문학사의 연구사, 문학갈래별 연구사, 개별작품의 연구사 및 연구방법론의 역사 등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는 국문학연구사를 시기별로 개괄하기로 한다.
국문학연구사의 제1기는 국학운동기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학문을 배경으로 하고 신교육도 더러 받은 국학자들이 민족문화운동의 일환으로 국학의 여러 분야를 다루면서 문학에도 관심을 가졌기에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
연구의 시발은 안확의 『조선문학사』이며, 최남선의 시조론이 그 뒤를 이었고, 신채호 · 문일평(文一平) 등의 논설에서도 문학에의 관심이 나타났다.
권상로(權相老) 또한 문학사를 서술해서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정인보(鄭寅普)도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에는 그 방향은 서로 다르더라도 민족문화운동에의 열의가 전제가 되어서 문학의 전통을 재평가하는 것을 과제로 삼았으며, 민족문화의 전체적인 성격이나 기본적인 특징을 거시적으로 파악하려는 관점을 가지고 부분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그런 데서는 평가할 만한 전례를 남겼다 하겠으나, 한계가 더욱 두드러졌다. 문학을 전공으로 택해서 지속적인 연구를 하는 학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문학유산의 전모를 파악할 수 없었다. 문학연구의 방법을 돌아볼 겨를도 가지지 못하였다.
제2기는 문학연구 기초 작업기라고 할 수 있다. 1926년 경성제국대학에 법문학부가 설치되고 여기에 조선어문학과가 설치되면서 여기서 근대적 대학교육을 받고 국문학을 주 전공으로 택한 학자들이 나타나서 국학자들의 작업을 전문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게 되었다.
김태준(金台俊)의 『조선한문학사』(1931) · 『조선소설사』(1933), 김재철(金在喆)의 『조선연극사』(1933), 조윤제의 『조선시가사강(朝鮮詩歌史綱)』(1937)이 이른 시기의 업적으로 나타나 이 시기의 과업이 무엇이었던가를 명확하게 하였다.
광복 후 조윤제와 이병기가 대학에서 국문학의 교육과 연구를 주도하게 되었으며, 구자균(具滋均) · 김사엽 · 이재수(李在秀)도 같은 임무를 담당하였다.
이 시기 문학사적 관점에서 국문학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삼았다. 첫 단계에서는 소설 · 한문학 · 연극 · 시가 등 각 영역에 걸친 문학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뒤 국문학사의 전체적인 전개를 포괄하는 문학사가 나타났다. 조윤제의 『국문학사』, 김사엽의 『개고국문학사』가 그 좋은 예이다.
문학사와 함께 중요시된 것은 국문학개설이다. 우리어문학회의 『국문학개론』(1949)은 공저이나 소중한 업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 다음 순서로 나온 조윤제의 『국문학개설』(1955)은 여러 측면에 걸친 체계적인 서술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해서 국문학의 전체적인 모습이 종적 · 횡적으로, 문학사와 개론의 양면에 걸쳐서 정리되었으며, 이와 함께 자료에 대한 대체적인 정리가 이루어지고, 분야별 연구과제도 어느 정도 부각될 수 있었다.
광복 후 설립된 각 대학의 국어국문학과의 교과 과정이나 교육 내용은 오랫동안 이러한 체계에 힘입어 대체적인 통일성을 얻고, 필요한 윤곽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체계화의 마땅한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데서 제기되는 문제가 조윤제의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깊이 있게 논의되지 않았다. 고전문학만 학문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현대문학은 비평의 소관으로 둔 것도 많은 부작용을 빚어내었다.
제3기는 분야별 작업기라고 할 수 있다. 광복 이후 대학의 국어국문학과에서 제2기를 주도한 학자들의 제자로서 학업을 마친 사람들이 일찍 대학강단에 서서 각기 자기 전공분야의 작업을 충실하게 하고자 하였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국문학을 전체적으로 체계화하려는 노력은 보류하였다.
교재용으로 적합한 국문학개론은 다시 마련하였어도, 국문학사는 나중에는 몇 권 내놓았을 따름이다. 그 대신 분야별 자료 작업과 연구 축적에서는 주목할만한 성과를 계속 이루었다. 한문학과 함께 현대문학도 연구의 한 분야로 등장시켰으나, 고전문학을 주로 다루었던 것도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고전시가 분야에서는 심재완(沈載完)이 『역대시조전서(歷代時調全書)』(1972)로 자료작업의 훌륭한 예를 남겼으며, 정병욱(鄭炳昱) · 최진원(崔珍源) 등이 문제와 방법을 찾아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소설의 경우 김기동(金起東)이 작품 해제를 계속하여 마침내 『한국고전소설연구』(1981)를 이룩하는 데 이르렀으며, 김동욱의 『춘향전연구』(1965) 같은 데서는 특정 작품에 대한 다각도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문학은 연구자가 많지 않았으나 이가원의 『연암소설연구(燕巖小說硏究)』(1965), 서수생(徐首生)의 『고려조한문학연구(高麗朝漢文學硏究)』(1971) 같은 방대한 업적이 나타나면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구비문학 분야는 늦게야 개척될 수 있었으나 장덕순의 『한국설화문학연구』(1970)가 나타났다. 극 분야에서는 이두현(李杜鉉)의 『한국가면극(韓國假面劇)』(1969)이 나왔다.
현대문학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전광용(全光鏞) · 송민호(宋敏鎬) · 정한모(鄭漢模) 등에 의해서 개척되었다. 이 시기 연구의 일반적인 방법은 실증주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와 사실을 존중하고 문학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서술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데서 문제가 제기되었으니, 사실이 원리를 유도하고 부분이 전체를 입증하여준다는 낙관론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성취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 서양에서 이루어진 문학연구와 비평의 이론 또는 방법이 계속 들어와서 이에 대처하는 방안이 무엇인가도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분야별 연구가 균형 있게 개척되지 못하였던 점도 문제였다.
한문학은 그 방면 전공자의 거듭된 주장이 있었지만 국문학의 전체적인 체계에 제대로 포괄되지 않았으며, 주변적이거나 부차적인 분야로 간주되는 관례가 쉽사리 청산되지 않았다.
구비문학은 관심의 대상으로 처음 등장하였을 따름이고, 민속학의 소관이라고 간주되었는데, 민속학이 독립된 학문으로서 자라날 수 없었기에 거의 버려진 영역이나 다름없었다.
그런가 하면, 현대문학은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노력이 나타났어도 비평의 대상으로 더욱 중요시되었다. 비평은 활발하게 전개되며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연구는 그러할 수 없었다. 그리고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연속성은 아직 널리 인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형편을 타개하자고 시작된 제4기는 방법론 전환기라고 부를 수 있다. 국문학을 전공하였으면서도 서양 문학에 대해서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서 이루어진 이론과 방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1960년대에 나타났고, 1970년대에 들어와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 학풍이 달라졌다.
받아들인 이론과 방법은 먼저 현대문학에다 적용하여서 비평적인 논의를 연구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고전문학으로까지 관심을 확대하는 것이 흔히 볼 수 있는 예였다.
김열규(金烈圭)가 그 전환을 마련하였으며, 『한국민속과 문학연구』(1971) 같은 데서 이미 고전문학 및 그 주변 영역에다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한 전례를 풍부하게 보여주었다.
그 뒤를 이어서 신동욱(申東旭) · 김용직(金容稷) · 김윤식 등이 현대문학 분야에서 작품 이해와 문학사적 문제점 해결에 대하여 방법론의 전환을 통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하였다.
이와 함께 방법 자체보다는 문학의 실상이 중요하다는 자각이 일어나서, 분야별 정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재선(李在銑)의 『한국개화기소설연구(韓國開化期小說硏究)』(1972)와 김윤식의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韓國近代文藝批評史硏究)』(1973)는 자료 정리를 또한 성과로 삼았기에 학풍의 전환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데서도 필요에 따라서 시도되었던 비교문학적 연구가 별도의 성과를 거두었던 예는 김학동(金㶅東)의 『한국문학의 비교문학적 연구』(1972)이다.
고전문학 분야에서는 이처럼 활기를 띠지 않았으나, 황패강(黃浿江)의 『한국서사문학연구(韓國敍事文學硏究)』(1972)에서는 김열규의 경우와 함께 고전문학에서도 새로운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탐색되었다.
박철희(朴喆熙)의 『한국시사연구(韓國詩史硏究)』(1980)는 시조에서 현대시까지를 일관된 원리에 따라서 파악하려는 노력의 소산이어서 주목된다.
이상택(李相澤)의 『한국고전소설의 탐구』(1981)는 소설사의 전개를 기본 가설을 가지고 다룬 것이다. 이와 함께 고전문학에서도 비교문학적 연구가 여러 가지 각도로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앞 시기가 남겨준 과제 중에서 어느 한 쪽만 해결하려고 한 것이다.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일관된 원리에 따라서 파악하려는 노력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는 하였으나, 국문학의 전체적인 판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국문학 자체에서 이론과 방법을 찾는 데 이르기까지에는 아직도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였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 비평계의 관심도 서양 문학의 새로운 경향과 이론을 받아들이자는 쪽에서 우리 자체의 전통을 찾고 근대문학을 이룩하려는 스스로의 노력을 문제삼으면서 민족문학을 제3세계문학과의 관련에서 확립하자는 쪽으로 바뀌고 있었기에 국문학 연구가 또 한번의 방향 전환을 하는 데 상당한 자극이 되었다.
제5기는 아직 태동하고 있는 움직임을 말하기에 이름을 짓기도 어려우나, 민족문학론 정립기라고 불러볼 수 있다. 국문학의 전체적인 판도와 맥락을 그 자체의 원리에 따라서 체계화하면서 근대문학으로서의 성장을 특히 중요시해서 다루며, 서양 문학과의 관계보다는 제3세계문학으로서의 의의를 파악하는 데 더욱 힘쓰자는 것이 전체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윤제의 전례를 재평가하는 한편 제3기의 실증주의적 방법과 제4기의 서양 방법론 의존을 함께 비판하였으며, 국문학의 실상을 더욱 포괄적으로 또한 심도 있게 파악하는 것이 선결 과제였다. 구비문학과 한문학에 대한 연구 열의가 대단해진 것이 또한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구비문학에서 기록문학의 원천만이 아닌 그 자체로서의 원리를 찾아내어 국문학의 기층구조를 확인하고, 한문학에서 민족적인 고민과 사상적인 모색이 나타났던 자취를 탐색해서 그 의의를 적극 평가하는 것은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을 다질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되자, 국문학은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연속체일 뿐만 아니라, 구비문학 · 한문학 · 고전문학 · 현대문학을 포괄하는 총체로서 이해되고, 각 영역의 상호관계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 역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방향과 개별적인 문제점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게 된다.
연구방법
연구사의 제1기에는 아직 뚜렷한 방법이 없었다. 국학의 여러 영역을 두루 파악하며 그 실상을 규명하자는 데서는 실학파의 고증학이 영향을 미쳤다 하겠으나, 바람직한 발전이 이룩되지 못하였으며, 최남선에게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사실의 열거가 오히려 폐단을 드러내었다.
‘조선심(朝鮮心)’을 내세운 정인보는 양명학(陽明學)과 관련을 가지고, 안확이 주장한 민족적 각성은 주체적 도가사상 또는 대종교(大倧敎)와 맥락이 닿아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근대적인 학문의 방법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웠다.
식민지적인 상황에서 도입되는 근대적인 학문의 방법이 전통적인 사상에 입각한 방법의 발전을 저해하였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제2기는 근대적인 학문의 방법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되었다. 그 방법은 문학사의 전개를 통해서 문학을 이해하자는 것이고, 자료와 사실에 대한 실증을 기초로 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김태준 · 김재철 · 조윤제의 첫 저작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문학사를 다루는 데는 아직 체계적인 방법이 등장하지 않았으며, 근대로 넘어오면서 역사 발전이 이룩되었다는 소박한 관점이 나타날 따름이었다.
자료와 사실에 대한 실증은 실증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까지 나아갔으며, 바로 이 점에서 제1기의 작업과는 구별될 수 있는 성과를 이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조윤제는 실증주의는 어디까지나 학문의 수단이라고 보고, 학문의 목적은 사실들의 총체적인 관련과 의미를 찾는 데 있다고 하였으며, 그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민족정신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수립된 민족사관에서는 문학은 민족정신의 구현이고, 문학사는 민족정신의 전개 과정이라고 하였으며, 문학사의 시대구분과 거기에 따르는 서술에서 독자적인 견해를 구체화하였다.
이와 함께, 국문학을 연구하는 목적이 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 민족해방을 이룩하고, 분단시대를 청산하여 민족통일을 이룩하는 데 기여하자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병기는 제1기 학문의 체질을 적지 않게 지녀, 문학과 서지, 문학과 음악의 관계 등으로 관심을 넓혔고, 판소리와 민요를 중요시하면서 문학의 저층을 밝히고자 하였으나, 연구한 바를 체계화하지는 않았다.
한편, 김태준이 단편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유물론적 방법은 그 뒤 이명선이 문학사 서술에 적용하여본 바 있지만, 뚜렷한 업적을 남기지 못한 채 자취를 감추었다.
구자균은 평민문학사의 맥락을 찾고자 하였고, 김사엽은 사실 열거에 충실한 실증주의를 택하였으며, 이재수는 방법론적 전환을 꾀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제2기에도 이미 방법론적 다양성이 어느 정도 나타났으나, 조윤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어느 방법도 필요한 논리를 갖추고 체계적으로 전개되지는 않았다.
제3기에 이르러서는 민족사관을 거부하고 실증주의를 발전시켜, 실증주의에 의한 민족사관의 극복을 시도하였다. 실증주의는 우선 문학연구를 자료학으로 이해하고, 자료의 충실한 수집과 정리에 힘쓰자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는 데는 원전 비판, 이본 비교, 작가 고증 등이 특히 중요한 과제로 등장해서 소중한 성과를 적지 않게 거두었다.
이러한 작업은 원칙적으로 민족사관을 위시한 다른 방법과 상충될 수 없는 것이고, 어떠한 연구에도 필요한 기초를 제공해준다 하겠으나, 이본을 비교하고 원본을 추정하는 경우 이본의 변모가 오직 타락의 과정이라고 하는 등으로 가치관이 개재되어 사정이 달라졌다.
민족사관과 실증주의의 관계는 연구사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실증주의의 문제점이 더욱 확대되어 나타난 양상은 작품을 부분으로 해체한 것이다. 대상을 엄밀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부분을 하나씩 검증하여야 한다면서, 전체와의 관련을 배제하고 각 부분의 유래 · 전거 · 특성을 독립적으로 고찰하는 학풍이 한동안 유행하여서, 민족사관에서 그처럼 중요시한 전체적인 유기성을 해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전체를 도외시한다고 하지는 않았으며, 전체는 부분의 집합에 의해서 자연히 드러날 터이니 미리부터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낙관론이 실제 연구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일으켰다.
서로 상반된 견해가 그대로 제시되기도 하였으며, 총괄적인 이해나 가치판단이 상식론으로 대치되는 경우 또한 적지 않았다.
실증주의는 사실을 몰가치론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며, 연구에 민족주의적 목적을 내세우는 태도는 학문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가치와 목적에 관한 문제는 소홀하게 여기거나 비평의 소관으로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한 가운데 실증주의의 결함을 보완하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김동욱은 비교문학에 관심을 보였으며, 문화사적 포괄성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장덕순 · 임동권(任東權) · 이두현은 현지 조사를 통한 구비문학 연구로의 길을 열고, 민속학적 방법을 택하고자 하였다. 이우성(李佑成)은 문학과 역사를 함께 연구하면서 사회사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개척하였다.
방법론적 관심이 이와 같이 확대되면서 문학과 인접분야의 관련성이 계속 논의되었다 하겠는데, 정병욱은 작품 자체에 대한 분석비평이라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학연구라고 하면서 이와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해서 나타난 방법론적 다양성은 제4기에 이르러서 한층 뚜렷해졌고, 이와 함께 방법론에 관한 논란이 치열해졌다. 새로운 방법론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현대문학을 다루는 데서 출발하여 서양에서 개척된 최근의 동향을 적용하고자 하다가 고전문학 또는 구비문학으로까지 관심을 확대시키고 국문학의 내재적인 원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이러한 모색과 전환의 과정에서 도입된 방법이 국문학의 실상과는 맞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으며, 서양의 방법이 여러 방향에서 나날이 달라지고 있어서 혼란을 겪어야만 하였다. 그래서 등장한 방법은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다.
김열규는 제의학파(祭儀學派)의 전례에 따라서 제의와 신화의 관계를 살피더니 구조주의적인 방법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황패강은 원형비평(原型批評)을 시도하다가 관심의 방향을 불교 쪽으로 돌려서 불교와 문학의 관계를 다루는 데서 새로운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신동욱 · 이재선의 소설론, 김용직 · 박철희의 시론은 작품 분석을 기본 과제로 삼으면서 문학사적 맥락을 찾는 것도 긴요한 과제로 삼았다.
김윤식은 다양한 방법론적 관점을 가지고자 하였다. 해석학적 방법, 정신분석학적 방법, 의식비평(意識批評) 같은 것들도 관심의 대상으로 등장하였으며, 문학사회학적 연구도 시도되었다.
제4기에서 제5기로 전환되는 계기는 국문학 연구사를 비판적으로 정리하자는 움직임이 광범위하게 나타난 것이다. 그 결과 제3기의 실증주의가 방법론 부재에 이르렀고, 제4기에서의 작업이 방법론적 혼란에 귀착하였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제2기의 민족사관을 재평가하는 데서 새로운 출발점을 찾았다.
문학사의 전개를 민족사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민족문학을 발전시키는 것이 지속적인 과제임을 재확인하자는 논리는 서양 문학이나 그 이론이 보편적이라는 전제를 비판하고 제3세계문학의 공동 과제를 찾아야 한다는 논거를 찾음으로써 과거의 민족사관에 머무르지 않고 현저한 진전을 이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방향전환은 비평계의 동향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졌기에 더욱 주목된다. 현대문학을 대신해서 한문학이 가장 관심 있게 연구되는 분야로 등장한 것이 또한 방법론의 전환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한문학을 사상사와 관련시켜 다루면서 비평의 전통을 찾고, 문학사상사의 전개를 깊이 있게 파헤치는 과정에서 문학의 용어와 개념, 이해의 체계와 이론의 방향을 다시 설정할 수 있는 출발점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구비문학연구를 통해서 민중적 미의식의 원천을 찾아 공동체의 예술, 관중 참여의 전개방식, 희극적 비판의 방법 등을 발견한 것도 국문학의 전반적인 양상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원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이 뚜렷한 결실을 거두며 널리 정착되기까지에는 아직도 많은 모색과 진통을 겪어야만 한다.
현황과 전망
국문학연구 제5기에 이르기까지 연구자의 대다수는 각 대학의 국어국문학과에서 배출되었다. 독자적인 방법론을 가진 학파의 형성에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지만, 연구세대의 교체에 따라 방법론의 확립을 위한 모색과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학회의 결성은 일찍부터 이루어져 국어국문학회 · 한국고전문학연구회 · 한국한문학연구회 등과 각 대학의 부설연구소, 학회 또는 지역문화의 특성을 표방한 연구소 등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문학연구 제1기에서 제5기에 이르기까지의 연구사와 연구방법론의 변천 및 현 단계의 연구 동향이 민족문학론의 수립을 주된 방향으로 삼고 있음은 앞에서 이미 약술하였다.
여기서는 현재 현대문학이 당면한 문제적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의 과제로 설정해두기로 한다. 한문학과 구비문학은 기반이 현저하게 축소되고, 고전문학과 함께 문화유산으로 편입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이다.
신문학운동과 더불어 시작된 현대문학은 그 판도를 결정적으로 넓혔으며, 산업화되고 민주화되는 사회가 요구하는 유일한 문학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현대문학은 역사의 무게를 지닌 현재적인 문화 양상으로 이해되고 창조되어야 하며, 한문학 · 구비문학 · 고전문학의 전통을 오늘날의 것으로 계승하면서 더욱 심화시키고 발전시켜야 할 임무를 지니고 있다.
이와 함께 현대문학은 서양 문학으로부터 받아들인 영향을 주체적으로 활용하여서 지난날의 상처를 극복한 제3세계문학의 성공적인 예로서 국제적인 지위를 다시 정립하여야만 한다. 민족분단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민족적 동질성을 계속 확보하고 내실화하는 한편, 분단을 청산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여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
신문 · 방송 등의 언론 활동이나 출판 활동은 문학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전개된다. 신문은 반드시 소설을 게재하고, 신춘문예 현상모집 등의 형태로 문학의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관례를 버리지 않는다.
방송에서도 문학이 적극 활용되어 방송극이 성행한다. 일반독자에게 널리 유포되는 잡지라면 반드시 문학에 상당한 지면을 제공하고,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널리 유포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출판에서도 문학의 창작 · 비평 · 연구에 관한 책이 다른 어느 영역보다 많은 종수를 차지하며 판매 부수도 앞선다. 일반 독자가 흥미와 교양을 찾아서 독서를 하는 경우에 문학서적이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것도 물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작품의 질은 돌보지 않고 이윤만 노리는 상업주의로 흐르는 것이 대부분이다.
현대에 와서 인쇄문화보다 전파문화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도 문학에 깊은 영향을 끼친다. 문학은 구비문학에서 기록문학으로 발전하여왔고, 인쇄술의 향상과 인쇄물의 대량 보급이 이루어지자 문학은 많은 사람의 관심사를 다루며 널리 유포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대중사회 또는 산업사회의 문학으로 변모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영화 · 라디오방송 · 텔레비전방송 등 전파매체에 의한 문화가 인쇄문화를 압도하는 추세를 보이고, 그 중에서도 텔레비전방송이 대다수 국민의 관심과 시간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게 된 상황에서 문학의 양상은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전자매체에 의한 문학은 구비문학과도 다르고 기록문학과도 다른 또 하나의 형태이다.
글로 적은 것을 전달한다는 점에서는 기록문학과 같으나, 말로 전달한다는 점에서는 구비문학과 상통하며, 몸짓과 표정 그리고 그밖에 여러 가지 시각적인 요소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서도 구비문학에 가까운 성향을 가지는 종합예술의 일부이다. 문학은 이러한 형태로의 발전에 힘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전파매체에 의한 문학이 상업주의에 휩쓸리고 있으며, 예술성이나 문제의식을 돌보지 않기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문학 교육 또한 매우 중요한 분야인데, 아직도 그 중요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문제이다. 교육 과정에서 문학은 국어교육의 한 영역으로 인정되고 있을 따름이지, 독자적인 과목으로 등장하지 않고 있다.
중등교육에서조차 국어교육은 문학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지 않고 있으며, 문학서적의 독서지도에 힘쓸 겨를이 없다. 문학작품을 탐독하는 것은 정규교육의 영역 밖에 자리잡은 바람직하지 못한 활동이라고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고등교육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사태가 시정되지 않은 채, 문학을 전공으로 택한 학과에서만 문학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문학연구를 하는 학과는 대학의 편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국어국문학과 및 여러 외국문학과로 나누어져 적지 않은 관심을 모은다. 그러한 반면에 문학일반론에 대한 집약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문학창작에 관한 교육 또한 부진하다.
문학은 비평의 독자적인 영역과 비평가의 자율적인 발언이 재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인정된 거의 유일한 분야이다. 비평은 창작의 한 형태라고도 하며, 창작과 연구를 매개하는 것으로도 간주되기도 하고, 연구에 깊숙이 관여하는 일도 있다. 문학연구는 비평과 상당한 관련을 가지면서 학문의 한 분야로서 상당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
국문학은 문학연구를 지칭하기도 하며, 국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 국사학 · 국어학과 더불어 기본을 다룬다고 인정되며, 연구 종사자의 수를 보거나 업적의 양을 보거나 다른 둘보다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국문학은 자생적인 뿌리를 가진 독자적인 학문을 이룩해서 민족문화의 발전에 적극 기여해야 하는 사명을 의식하고 있으며, 이를 두고 적지 않은 모색과 진통을 되풀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