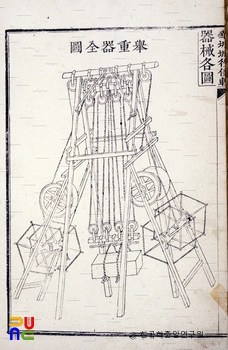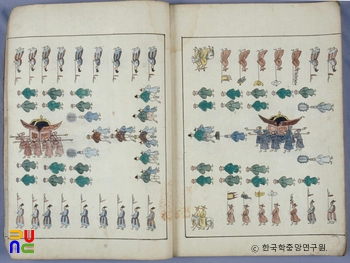조선 ()
조선은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8년간 한반도에 존재한 왕조 국가이다. 국왕의 밑에서 양반관료들이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갖추어 정치를 행하였다. 농업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자연경제체계가 강하였고, 양반 중심 세습신분제 사회였으나,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속에 신분제는 차츰 이완되어 갔다. 유교 문화의 위세가 계속 강해지는 가운데 서민과 여성들은 고유성을 강인하게 지켜 나갔다.
1.1. 국호
조선은 건국 후 약 7개월 동안 ‘고려(高麗)’를 국호로, 말기의 약 13년 동안은 ‘대한국(大韓國)’을 국호로 사용하였다. ‘고려’를 국호로 사용하였던 때나 ‘대한국’을 국호로 사용하였던 때나 모두 조선의 태조 이성계(李成桂)와 그 후손이 국왕이나 황제로 재위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옛 국호 고려를 사용한 시기나 새 국호 대한국을 사용한 시기 모두 흔히 ‘조선’이라고 부른다.
1392년 음력 7월 이성계가 새 왕조의 첫 군주로 즉위하였으나, 국호는 그대로 고려라 하였다. 고구려에서 비롯된 오랜 전통의 고려라는 이름을 새 왕조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았다. 이성계와 건국 주도세력은 1392년 11월 명(明)이 새 국호가 무엇인지 빨리 알리라고 요구하자, 그때야 비로소 신하들을 모아 의논하여 조선을 새 국호로 정하였다. 그리고는 명에 선정을 요청하는 형식을 갖추어 1393년 2월부터 조선을 국호로 사용하였다.
‘조선’은 고조선에서 비롯된 이름으로, 고려 후기에 주요 지식인 사이에서 대두한 단군(檀君)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되어 이어져 왔다는 역사 계승의식을 담고 있었다. 이 땅에 유교 문명이 처음으로 자리를 잡도록 한 인물이라고 유학자들이 믿은 기자(箕子)도 고조선의 국왕이었다고 전하고 있어서, 유교를 받드는 핵심 지배층에게 ‘조선’은 새 왕조국가의 국호로 삼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춘 이름이었다.
조선의 제26대 국왕인 고종 이희(李㷩)는 재위 34년이 된 해인 1897년 10월 ‘대한국’을 새 국호로 선포하고 황제로 즉위하였다. 2년 뒤에 반포한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 제1조는 “대한국은 세계만국에 공인되온 바 자주독립하온 제국(帝國)이니라.”라고 하여, 정식 국호가 ‘대한국’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한국’보다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을 더 즐겨 사용하였다. 대한국은 13년만인 1910년 7월 일본에 강제 합병됨으로써 끝났으나, ‘대한’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국호로 이어졌다.
1.2. 영토
한반도와 그에 딸린 여러 섬이 조선의 영토였다. 건국 후 약 반세기 동안은 점진적으로 한반도 북부지역의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이 전개되었다. 그 이후 전쟁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영토를 크게 상실한 때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보자면 조선이 지속되는 동안 영역에 큰 변화는 없었다.
고려 말엽에는 고려 후기에 줄어들었던 한반도 북부지역의 영토를 회복하고 나아가 더 확대하고 있었다. 이 흐름이 조선 건국 후에도 이어져, 건국 직후 압록강 중류, 상류 유역과 두만강 하류 유역에서 영토확장이 이루어졌다. 조선은 1400년 3대 국왕인 태종 이방원(李芳遠)이 왕위에 오른 뒤 여러 요인이 작용하여 여진족의 공격을 받아 경성(鏡城) 이북에서 두만강에 이르는 지역을 상실하였다가 다시 조금씩 영토를 회복하였다. 1433년(세종 15)부터 압록강 중류 및 상류 유역과 두만강 하류 유역에 4군 6진으로 알려져 있는, 요새를 갖춘 고을을 여럿 설치함으로써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으로 삼게 되었다.
조선이 이들 확장된 영토를 유지하는 데에는 커다란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였다. 6진 지역보다 4군 지역이 지리와 기후 등 여러 조건에서 더 열악하여, 수양대군(首陽大君) 이유(李瑈)가 주도한 쿠데타로 정국이 혼란스러워지자 1454년(단종 2)에 먼저 압록강 상류 유역의 삼수군(三水郡)을 폐지하고, 1455년(단종 3)에는 4군 중 여연(閭延)‧우예(虞芮)‧무창(茂昌) 3군을 폐지하였다.
이어서 1459년(세조 5)에 자성군(慈城郡)도 폐지하였다. 삼수군은 아전 등을 둘 필요가 없는 보(堡)로 강등하여 만호를 방어 책임자로 파견하였으나, 4군은 진(鎭)과 보 등의 방어시설까지 모두 폐지하였다. 이 폐사군 지역은 1683년(숙종 9)에야 다시 조선의 확실한 영토로 복구되었다.
한반도 북부 지역과 마찬가지로 고려 후기에 원(元)의 지배 아래 놓였고 반란도 일어난 일이 있는 제주도는 조선 건국 후 빠른 속도로 확실한 영토로 안정을 찾아갔다. 고려 말엽 왜구의 침입 때문에 주민이 이주하여 다른 고을에 통합되거나 수령이 향리 등을 거느리고 큰 고을로 가서 더부살이하던 바닷가나 큰 섬 지역에도 차츰 주민들이 돌아옴으로써 다시 고을을 두게 되었다. 그리고 16세기부터 서해안 여러 곳에서 꾸준히 간척이 이루어져, 영토의 면적이 증대되었다.
1.3. 인구
조선에서 실제 인구수를 조사한 통계나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조선의 인구와 관련된 조사는 주로 공물(貢物)을 걷고 요역(徭役)과 군역(軍役)을 부과할 목적으로 호(戶)와 구(口)를 파악하는 데에 집중하였다. 이를 위해 작성한 문서인 호적과 군적, 호적대장 등이 부분적으로 전하고 있고, 특정 연도의 총호구(戶口) 수가 『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전하기도 한다. 그러나 각 시기 또는 연도의 호구 통계가 일관된 기준 위에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지역의 호구 수가 누락된 경우도 많고, 같은 해의 통계임에도 자료에 따라 수치가 다른 일도 있고, 호구가 의미하는 내용마저 일관성이 적다. 그 까닭에 조선의 인구는 추정만이 가능하다.
조선의 주요 연도별 인구 추정치는 연구 성과에 따라 건국한 해인 1392년에 약 480만 명750만 명,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해인 1591년에 약 1000만 명1409만 5천 명,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어 인구가 크게 줄었다가 회복되던 중 큰 기근을 만난 때인 1669년에 약 993만 명~1319만 2천 명이다. 19세기 말엽에는 1700만 명 정도에 이른 것으로 추정한다. 이처럼 앞 시기로 갈수록 추정치의 편차가 큰 까닭은 1925년의 간이 국세조사 결과 파악된 총인구수 1902만 30명을 기준으로 연구마다 각기 변수를 달리 설정하여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계산한 데에 있다.
인구 증가와 감소는 다른 전근대 사회들과 마찬가지로 출생률보다는 주로 사망률에 따라 결정되었다.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았으나, 대체로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조금 더 높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다만 16, 17세기를 중심으로 날씨가 추웠던 해가 많았고, 그 결과 기근과 전염병이 유행한 때도 많아 인구감소가 자주 일어났다.
그 비중은 크지 않았으나 국외로부터 유입된 인구도 있었다. 고려말에 들어와 활동한 사람과 그 후손 중에는 조선의 문화 발전에 공헌한 사람들이 꽤 있었다. 요동 지역에 거주하던 고려 사람의 후예들이 조선 건국 후 대거 입국하였는데, 그 가운데 명(明)의 군호(軍戶)로 편성되어 있던 사람들은 명의 요구에 따라 그 가족과 함께 돌아가야만 하였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는 포로로 잡혀서, 19세기에는 농사지을 땅을 찾아 국외로 상당한 인구가 유출되었다.
조선 건국 당시 인구분포는 지리조건에 맞지 않게 뒤틀려 있었다. 고려말 왜구를 피해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도 해안지역의 주민들이 내륙으로 이주하였던 것이 그 이유였다. 그 때문에 조선 건국 무렵부터 내륙에서 해안지역으로 이주하는 흐름이 시작되었고, 그 움직임은 60년 이상 진행되었다. 그 결과 농사지을 땅이 많은 하삼도[충청도 · 전라도 · 경상도]에 전 인구의 반 정도가 거주하게 되었다.
북방 영토의 확장에는 사민(徙民)이라는 이름으로 인위적인 인구이동이 뒤따랐으나, 사민된 사람들 대부분이 도망하여 새로운 인구이동과 민심의 동요를 초래하였을 뿐 별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조선시대 전기간에 걸쳐 농업 인구가 85% 이상이었고, 18세기 이후 관아도시에 더해 상업도시 등이 성장하기는 하였으나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7~8% 정도였던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선왕조 동안 정치는 경제와 사회, 문화 등 다른 분야에 대해 대체로 지배적인 힘으로 작동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건국 후 약 한 세기 동안 가장 강하게 나타났고, 사림세력이 대두한 뒤로 다소 완화되었다. 18세기에 이르러 경제적 발전이 두드러짐으로써 그 영향력도 커졌으나, 정치의 지배적 주도력을 크게 위협하지는 못하였다.
2.1. 정치사의 흐름과 주요 사건
조선의 정치는 건국, 임진왜란 등 주요 사건과 관련하여 시기마다 맞게 된 과제들의 해결을 모색하면서 전개되었다. 이와 아울러 통치 일변도였던 데서 차츰 벗어나 정치세력 사이에서 이해관계 조절의 모색 또한 나타났으나, 그보다는 정치적 대립이 격화하여 파국으로 치닫는 일이 더 많았다. 확대된 정치세력은 새로운 차원의 정치적 전망과 실천이 요구받기 시작한 18세기를 거치는 동안 중앙세력과 지방세력으로 나뉘었고, 결국은 식민지로 전락하는 거대한 파국을 맞고 말았다.
2.1.1. 건국과 통치기반 확충
이성계가 강력한 군사권을 장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국 주도세력이 조선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고려말에 분출된 여러 사회적 요구의 일부는 법과 제도로 수용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새로 양전을 하고 과전법을 시행하여 토지제도를 바꾼 것으로, 이로써 국가재정이 전보다 튼튼해지고 자영농의 수가 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양전 결과로는 평상시 국가 운영에 필요한 정도를 채웠을 뿐, 비상시 군사력 가동에 필요한 몫을 비축할 수는 없었다. 다만 과전과 공신전 등의 사전을 경기에만 둘 수 있도록 제한하고 다른 도에는 공전만 존재하도록 함으로써 지배층의 불법적 수탈을 감시 통제하기 쉽도록 하고 자영농 계층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은 새 왕조가 들어선 뒤 전개될 정치의 방향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었다.
조선을 건국한 직후의 상황에서 민심을 안정시키고 새 왕조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등에 대해 권력집단 안에서도 생각이 서로 달랐다. 태조 이성계는 가장 먼저 자신의 즉위 사실을 명에 알리도록 하고, 이어서 그가 직접 군사권을 장악하고 행사해온 기구인 주1를 폐지하는 대신 주2를 설치하여 자신의 군사권이 변함없이 지속되도록 하였다.
친군은 태조 자신의 아들과 종친 및 핵심 공신들로 지휘부를 구성하였고, 친군 외의 병력도 도별로 태조의 종친과 대신들이 지휘하도록 하였다. 즉위할 때 서서 신하들의 주3를 받았던 태조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신하들을 강제하면서도 두 차례나 더 서서 조하를 받은 뒤에야 앉아서 조하를 받음으로써 신하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였다.
그러나 태조가 둘째 부인 강씨를 왕비로 책봉하고, 그 사이에서 낳은 당시 12세인 아들 주4을 2품 재상의 직책인 주5 절제사로 임명하고, 이어서 이방번의 친동생으로 당시 11세인 주6을 세자로 책봉함으로써 국왕의 확고한 사적 지배 영역이 존재하며, 그 영역에서는 전제 권력을 행사하고자 함을 드러내었다. 이는 신하들, 특히 정예 문신들의 지향과 크게 어긋나는 일이었다.
조선 건국을 반대한 세력에 대한 숙청은 즉위 교서에 사면령을 넣으며 사면에서 제외한 자들의 명단을 알리는 방식으로 56명을 처벌하였다. 그러나 이성계의 권위를 부인하거나 깎으려는 언행은 꽤 오래 이어졌다. 1394년(태조 3)에는 일부 관원이 새 왕조의 운명을 점친 일이 드러나고 이어서 고려 왕족 일부가 반란을 꾀한 혐의를 잡게 되자, 공양왕과 그 아들들은 물론이고 고려 왕족 전체를 찾아내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살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양 천도 또한 이러한 일을 겪은 뒤에야 결정되었다. 1394년 9월부터 약 2년 동안 국력을 기울여 한양에 주7와 주8, 궁궐과 여러 관아, 도성을 짓는 공사가 이어졌고, 그 중간에 한양부는 이름을 한성부로 바꾸었다.
천도가 마무리될 무렵 조선이 명에 보낸 주9을 놓고 두 나라 사이에 알력이 벌어지자, 조선의 주요 신료 사이에서 의견 대립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일들이 전개된 까닭에 태조 재위 동안에는 국가의 통치기반을 확충할 수 없었을 뿐더러, 고려 멸망 때의 법과 제도도 부분적으로만 변혁할 수 있었다. 정치세력 또한 왕족의 교체를 제외하면 그렇게 크게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다.
태종 이방원은 1398년(태조 7)에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였고, 1400년(정종 2) 친형 주10이 일으킨 쿠데타를 진압하여 권력을 더 굳건히 한 뒤 세자로 책봉되었다. 이 해에 사병을 혁파하고 도평의사사를 의정부로 개편하는 등의 제도 개혁을 단행하였는데, 이는 조선의 정치제도로 바뀌는 출발점이었다. 태종은 부왕의 뜻을 거슬러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복동생 등을 죽인 행위 등과 관련하여 권위에 큰 약점을 갖고 있었으나, 이러한 개혁을 통해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고 명분도 쌓은 후 왕위에 올랐다.
즉위 직후 태종은 중부 이남 지역에 대해 국가 통치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호구 조사와 양안 사업을 명령하였는데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다시 시행하도록 하였다. 재위 후반에는 양계라 부르는 북부지역으로도 사업을 확대하였다. 호구 조사의 주목적인 장정 파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14131416년(태종 1316)에는 주11도 시행하였다.
국가 통치기반을 확충하는 명분은 부국강병과 주12이었다. 이에 더해 태종이 공신과 자신의 외척을 숙청하면서 조성한 공포 분위기는 지역 사회에서는 공공연하나 중앙 권력에게는 들키지 않으면서 사적 지배 영역에 있던 양인 장정과 농경지의 상당 부분을 큰 저항 없이 공적 지배 영역 아래로 바꾸어 놓는 데에 한몫하였다.
1418년 태종은 적장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전통을 세우려는 생각을 포기하고, 14년이나 세자 자리에 있던 양녕대군 이제(李禔) 대신 그 동생 충녕대군 이도(李祹)를 세자로 책봉하였다. 태종이 선위함으로써 세자가 된 지 불과 두 달 만에 즉위한 세종은 부왕인 태종과 대립을 한 때도 없지 않았다.
세종은 특히 재위 초엽 태종이 주도하여 세종의 외척세력을 숙청한 것과 같은 정치 행태를 보인 일이 없었고, 불교에 대해서도 우호적이었다. 그러나 세종은 태종의 정치 방침을 대체로 존중하여, 중대한 사건을 겪으며 큰 공을 세운 신료가 나오더라도 공신 책봉을 하지 않았고, 국가 통치기반 확충에도 적극적이었다.
세종 때에는 태종 때에 비해 호구와 농경지의 추가 파악이 이루어진 것에 더해 고을별 특산물 조사도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 세종실록』의 「지리지」에 수록되었다. 국가가 파악한 호구의 수는 그 뒤로 증감을 겪기는 하였으나 뒷 시기로 가면서 증가 경향을 보인 반면에, 농경지는 세종 때를 넘어선 적이 없었다. 이 사실은 시간이 흐르면서 사적 지배 영역이 농경지를 중심으로 다시 확대되어 갔음을 뜻하였다. 즉, 세종 때는 조선시대 전체에서 지배층의 경제력이 가장 강하게 통제된 반면 국가의 경제력은 가장 여유로웠던 시기였고, 세종 때의 여러 성과는 이를 바탕으로 가능하였다.
2.1.2. 조선의 법령과 제도 형성
고려 말의 법과 제도 및 의례를 고쳐 조선의 법제와 의례를 마련하는 일은 조선 건국 직후 착수한 뒤 약 80년이 지나서야 마무리되었다. 이 기간 동안 왕권을 놓고 심각한 권력투쟁도 벌어지고 규모가 큰 반란도 일어났으나, 조선시기 전체 가운데 이 시기에 전반적으로 왕권이 가장 강력하였다. 태조 때에는 최고 국정기관인 도평의사사 재상의 인원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여 운영하였다.
그나마 재상들의 정치 의사를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명을 받들기 위해 소집되는 경우가 많았고, 정도전 등 핵심 인물 몇이 운영을 좌우하였다. 이로써 재상들의 정치적 영향력도 줄었는데, 이 방향으로 한층 더 나아간 결과가 의정부로의 개편이었다.
조선식 관료 조직과 제도는 태종이 소위 ‘왕자의 주13’에서 승리하여 권력을 장악한 뒤부터 갖추어졌다. 대체로 큰 틀은 태종 때, 세부적인 내용은 세종 때 개혁이 이루어졌고, 세조 때 이후 『 경국대전』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마무리하였다.
중앙 정치제도 개혁의 핵심은 의정부를 설치하고 육조 장관의 지위를 정2품으로 올린 것이었다. 의정부는 재상이 맡는 직책의 수가 영의정 이하 총 7자리로 정리되어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는데, 모든 직책을 다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의정부는 재상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육조의 장관인 판서가 재상의 품계인 정2품이 되었다는 것은 육조가 직계(直啓), 즉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왕에 아뢰고 또 직접 왕명을 받들어 시행할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하였다. 그리고 주14를 폐지함으로써 국왕이 국정을 직접 지휘할 수 있게 되었다.
세종이 즉위한 뒤 여러 차례 반역 음모가 있었으나, 차츰 정치적 안정을 이룬 뒤 영토 확장 등과 아울러 법제의 정비가 진행되었다. 황희 등이 책임을 맡아 관원 인사와 관련된 규정 등을 다듬고, 모든 관원이 관직이 있어야 한다는 고려 때의 원칙을 폐기하여 특별한 경우에만 산직(散職)을 주도록 하고, 실직에서 벗어난 관원은 당상관이 아니면 서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업무가 국왕과 직접 연결되는 의금부, 승정원, 사헌부 등을 제외한 일반 행정부서는 모두 육조에 나누어 소속시켰고, 주15에 따라 관직의 명칭도 통일하였다.
세종은 집현전을 활성화하여 정예 학자관료들을 육성하고, 이들과 경연(經筵)을 하며 학문의 발전을 이루는 한편 법률과 제도 정비 등 여러 방면에서 치적을 쌓았고, 그 결과 스스로의 권위도 강화되었다. 그에 따라 건강에 문제가 있던 세종은 국정 운영 방식을 다시 의정부서사제로 바꾸었다.
국상(國喪)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문종, 그 아들로 뚜렷한 보호세력 없이 즉위한 단종 때에는 대신들에게 정국 운영의 주도권이 기울 수밖에 없었다. 이때의 대신은 주16으로서 권위가 강화된 조건에서 의정부서사제가 작동함으로써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관원들 사이에 이에 대한 불만이 생겨난 것을 기화로 삼아 정변을 일으켜 결국 왕위에 오른 세조는 육조직계제를 다시 시행하였고, 이 뒤로 의정부서사제는 다시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예종이 즉위할 때 주17를 시행하고, 성종이 13세 나이에 갑자기 왕위를 계승하게 되자 주18을 시행하면서 왕위 계승에서 안전판이 강화되었다.
이 동안 조선에서는 많은 법령을 만들었다가 바꾸고 폐지하기를 거듭하면서 법제를 정비하였다. 조선은 건국 직후 첫 법령집으로 『 경제육전』을 반포하였으나, 고려의 제도에서 벗어나 조선의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진행됨으로써 폭넓게 새 법령들을 만들어야 하였다. 세조 때부터 이를 일관된 법제로 정비하는 사업을 벌여 『 경국대전』을 편찬 반포하였다.
『경국대전』에는 국왕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국왕은 법 규정을 초월한 존재로 볼 수 있으나, 법령의 체계를 보면 국왕이 입법과 사법, 행정과 정치 운영을 꼭대기에서 총괄하는 존재로 설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형식으로는 국왕 아래에서 의정부가 문반을, 중추부가 무반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위치에 있으나, 실제는 의정부가 문무백관을 모두 지휘하였다.
중추부는 조선 초기 동안 국왕과 궁궐 호위, 군대 지휘, 군사 기밀 등을 담당하기도 하였으나, 등급이 하나 낮은 오위도총제부가 이 직무를 담당토록 하고, 중추부는 직책이 없는 고위 관원을 대우하기 위한 관서로 활용하였다. 아울러 오위도총제부는 등급이 같은 병조의 감독을 받도록 하여, 양반관료제가 문신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였다.
2.1.3. 사림세력의 대두와
훈구주19세력이 결집하고 사림세력이 대두하는 과정은 15세기 후반에 과전법이 주20, 직전세로 바뀐 변화와 깊은 관계가 있었다. 조선 건국 후 정치 안정을 위해 모든 관원에게 과전을 지급하던 원칙은 관원이 계속하여 늘자 현직 관원 위주로 지급하도록 바꾸어야 하였고, 결국 현직 관원에게만 지급하는 직전법을 시행하여 세습 가능성도 차단하였다. 그리고 관원이 계속 증가하는 변화에 대응하여, 실직(實職)이 아니면 산직(散職)을 주어 모든 관원이 관직을 갖도록 하였던 고려 때의 원칙을 폐기함으로써, 관직을 갖고 있는 관원과 관직이 없는 관원으로 나뉘게 되었다.
이어서 15세기 말에 직전세의 관수관급제를 실시하여 관직자가 직전으로 받는 농경지와 그 농민을 직접 지배할 여지도 제거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농업이 발달하고 사회의 안정성이 높아지면서 농경지에 대한 소유권이 강화된 결과 가능하였던 한편, 일반 관직자가 주21으로 특권을 행사할 수 있던 시대가 끝났음을 나타내었다.
공신들은 일반 관직자와 달리 공신이라는 지위와 공신전의 수조권으로 강력한 특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왕실 구성원 및 왕실과 혈연관계가 있는 주요 가문의 구성원들도 국왕의 초월적 지위에 의지하여 특권을 행사하는 일이 많았다. 이제 관원이 과거처럼 특권을 누리려면 공신이 되거나 왕실과 관계를 맺어야 하였다. 공신이라는 지위를 발판으로 국왕과 혼맥을 만들면 매우 강력한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세조의 권력 장악과 왕위 찬탈 사건으로 오랜만에 공신을 책봉하게 된 뒤, 국왕이 새로 즉위하면 공신도 책봉하는 관행이 생겨났다.
새 공신세력은 왕실과 인척관계에 있는 기존의 명문가 출신들과 친분을 맺으며 권력 집단을 형성하였다. 그 까닭에 이들을 훈구(勳舊)세력이라 부르는데, 훈은 공신을, 구는 오래전부터 관원을 배출한 명문가를 뜻하였다. 훈구세력은 세조 때 이후 왕권에 밀착하여 정치 권력을 남용하고 관권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이러한 행태는 당시 확산하고 있던 성리학의 이념에 비추어 보면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국왕이 관직자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물적 토대의 힘이 약해짐에 따라 일반 관원들은 그들의 특권을 뒷받침할 새로운 수단을 찾고자 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유력하였던 것이 자신이 유교가 지향하는 덕목을 갖춘 주22임을 증명하여 드러내는 것이었다. 신진 관원 중 상당수가 성리학 이념에서 제시하는 군자의 모습을 갖추고자 하였고, 군자는 무리를 지을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세력을 이루었다. 이들은 주로 중소 규모의 지주로서 성리학을 수용한 세력에서 배출되어, 15세기 후반부터 관직을 획득하여 중앙 정치무대에 진출하였고, 차츰 세력을 이루어 사림(士林)이라고 불렀다.
성종은 사림세력을 등용하여 훈구세력을 견제하며 정치운영방식의 변화를 꾀하였다. 사림세력은 주23직을 맡아 유생들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여 활동하며 훈구세력의 행태를 비판하였다. 성종은 상소할 자격을 유생들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사림세력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켰고, 유생이 정치적 발언권을 공인받음에 따라 조선의 정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홍문관 관원들이 담당하는 경연(經筵)도 사림의 주요 활동 무대였다. 경연에 사관(史官)이 들어오게 되면서 경연을 마친 뒤 국왕 앞에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그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자, 사림세력은 이를 적절히 이용하여 훈구세력을 비판하며 사림정치를 이루고자 하였다.
사림세력은 사화(士禍)를 겪으면서도 확산을 거듭하였다. 4대 사화로 꼽히는 1498년(연산군 4)의 무오사화, 1504년(연산군 10)의 갑자사화, 1519년(중종 14)의 기묘사화, 1545년(명종 즉위)의 을사사화 등을 거치면서 사림이 부당하게 화를 당한 정의로운 존재라는 정체성을 강화하며 꾸준히 중앙정계에 진출하였다. 사화가 거듭되는 동안 의정부와 대신들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사정은 개선되지 않았다.
신료들이 폭군 연산군을 왕위에서 쫓아내고 그 이복동생 이역(李懌)을 왕위에 앉힌 사건인 중종반정 이후 왕권은 한 단계 약해졌고, 시기에 따라 기복이 있었으나 끝내 그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토지와 노동력에 대한 국가의 공적 지배가 위축되고 양반 사족의 사적 지배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직전을 폐지한 데 이어 주24 지급액도 줄여가야 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국왕이 정치를 주도하기 어려웠고, 의정부와 대신들도 지도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권력 다툼은 훈구세력과 사림세력의 대결로 단순화하기 어렵게 복잡한 구도를 띠어갔다. 특히 기묘사화 후 중종이 자신 및 세자의 외척이나 혼인관계를 맺은 가문의 인물들에 의존함으로써 이들이 세력화하였고, 이 양상은 명종 즉위 후까지 지속되어 한동안 외척정치 시기가 전개되었다. 이어서 명종 때에는 명종의 모친 문정왕후(文定王后)가 8년의 수렴청정이 끝난 뒤에도 명종의 배후에서 권력을 행사하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양반 사족(士族)이 꾸준히 성장하여 사회 지배층이 되고, 이들로부터 배출되어 정치세력으로 활동하는 사림세력이 계속 늘자, 결국 정국의 주도권은 사림세력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이 뒤로도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은 세력과 공신은 계속 등장하였으나, 이들은 과거와 달리 훈구라는 정체성을 표방하지 못하고 사림세력의 일부로 정착하였다.
2.1.4. 붕당의 출현과 변천
16세기 후반에 사림정치가 시작되자 정치행태도 크게 바뀌어 갔다. 사림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하자 곧 세력이 나뉘어 주25을 이루어 대립하기 시작하였고, 주도권을 쥔 붕당이 연속하여 분열하는 양상이 벌어졌다. 그 출발점은 동인과 서인으로의 분열이었다. 1575년(선조 8)에 심의겸과 김효원이 주26 인사를 놓고 다투다가 동인과 서인이 나뉘었다. 이 분열은 당시 중앙정계에서 활동하던 주요 관원 다수가 관련된 사건이었다.
16세기 조선에서 왕권은 약해졌고, 국왕들의 정치력도 쇠퇴하였다. 연산군의 폭정은 조선 왕실과 지배층 특히 훈구세력의 권위를 떨어트렸고, 중종과 그 뒤를 이은 국왕들은 모두 강력한 왕권을 행사할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정국 운영의 중심축이 신하들에게 옮겨간 상황에서 사림세력이 중앙정계를 장악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사림세력은 그 기반이 넓고 두터워, 학맥과 인맥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달리 행동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직을 둘러싼 경쟁이 ‘군자의 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한 관념의 대립으로 표현됨으로써 더욱 날카로워졌다. 언관, 곧 삼사 관원들은 상대 붕당에 대해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신랄하게 공격하는 풍토가 조성되었다. 성리학이 강조하는 의리는 이 적대관계가 후손으로 또 제자와 그 제자들에게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서인과 동인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각기 학연으로 연결되는 붕당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서인세력은 이이, 성혼의 학맥으로 연결되었고, 동인세력은 이황, 조식의 학맥으로 연결되었다. 두 붕당의 대립으로 말미암아 1589년(선조 22) 서인세력이 기축옥사(己丑獄事)를 일으켜 정여립이 반역을 도모하였다는 이유로 동인세력을 대거 축출하였다가, 그 조치가 과하였다는 역공을 받아 다시 동인세력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뒤 동인세력은 서인을 철저히 배척하는 북인과 그것을 반대하는 남인으로 나뉘었다. 이들도 공물 방납의 폐해를 비롯한 여러 개혁 과제를 해결하고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으나, 주도권 쟁탈전에 몰두한 결과 개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민심을 얻지도 못한 채 임진왜란을 맞고 말았다. 비변사는 임시기구로 설치되어 이미 상설기구로 기능하고 있었으나, 전란에 대비하는 데에는 중심 기구로 거의 구실을 하지 못하였고, 전쟁이 일어난 뒤에야 중심 기구로 작동하였다. 비변사가 활성화하면서 대신들도 차츰 권위를 강화하여 갔다.
임진왜란을 겪는 동안 북인세력이 남인세력의 대표적 관직자인 유성룡을 공격하면서 두 붕당의 거리는 더욱 벌어졌다. 임진왜란의 와중에 두 세력이 번갈아 정국을 주도하다가 전쟁 끝 무렵에는 남인이 주도권을 잡았고, 전쟁이 끝나자 척화를 주장한 북인이 대거 관직에 진출하였다. 주도권을 쥔 북인은 선조 말년에 주27과 주28으로 갈라졌고, 이들은 다시 어느 개인을 지지하는가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뉘었다.
이황과 이이 등 주요 인물들이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예견하였다는 사실, 나아가서는 전쟁을 겪는 가운데서도 붕당의 대립과 분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이 시기 사림정치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드러나고 있었다.
1608년 광해군이 즉위함으로써 대북세력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았다. 이것은 대북세력이 세자 시절 광해군을 지원하였고, 또 임진왜란에서 의병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으며, 일본에 대해 전쟁을 주장하며 명분을 쌓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광해군은 여러 붕당의 협조 위에 정치를 하고자 시도하여, 처음에는 대동법 실시와 같은 성과도 낼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대북세력에게 끌려다니는 꼴이 되어, 사림세력 대부분이 그의 적이 되었다.
대북세력은 선조의 계비인 주29를 주30으로 격하하여 서궁에 유폐하고 그 소생인 영창대군을 죽이는 주31를 감행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광해군이 명에 대한 주32를 최우선으로 삼지 않는 외교 정책은 붕당의 차이와 관계 없이 사림세력 전반으로부터 반발을 불러왔다.
광해군 때 대북세력이 보인 일당전제적 정치행태는 서인세력이 일으킨 인조반정으로 막을 내렸다. 정치권력을 장악한 서인세력은 남인세력을 국정 운영에 참여시켰고, 이로써 붕당정치의 틀이 세워졌다. 그러나 서인 안에도 남인에 대한 생각의 차이, 이념 성향의 강약의 차이 등에 따른 분파가 있었다. 인조반정은 광해군이 ‘조선을 구해준 명에 대한 의리를 저버렸다’는 판단에 사림세력 대다수가 동의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 결과 인조 때의 사림정치는 서인세력이 주도하고 남인세력이 참여하는 틀이 갖추어졌다.
그러나 당시의 정치는 이괄의 반란에 이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선조 때 정치적으로 실패하였던 궤적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임진왜란 때의 피해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자호란에 이르기까지 연이어 전쟁을 치르면서도 정치세력은 피해 극복을 위한 정책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그 양상의 중심축이 반정에 참여한 공신 계열과 그렇지 못한 일반 사류 사이의 대립이었다.
이들의 대립 축은 두 호란을 겪으면서 청(淸)과의 화해를 주장하는 주33과 화해를 거부하는 척화론으로 바뀌어 이어졌다. 병자호란 이후 청의 감시를 받는 가운데 최명길을 중심으로 하는 주화론자들이 정치를 주도하였으나, 양반들은 대부분 척화론을 추종하였다. 그러므로 주화론자들이 주도하는 정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 1645년(인조 23) 청에 대해 우호적이던 소현세자가 의문의 죽음을 맞고 주34이 세자로 책봉된 것은 그 맥락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1649년 효종이 즉위하면서 송시열, 김상헌 등의 척화론자들이 대거 정계에 진출하였고, 효종은 청에 대하여 복수하고 치욕을 갚는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 청을 정벌하고자 북벌을 추진하였다. 효종은 군비를 강화하고 대동법을 확대하는 등 재정을 확충한 후 송시열에게 협조를 구하였으나, 송시열은 국왕과의 독대를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소재로 삼았을 뿐, 적극 협조하지는 않았다. 효종이 북벌을 표방하고 국정을 주도한 까닭에 이 시기에는 실무형 관료들의 활동이 두드러졌고, 국정 운영에서는 대체로 서인이 주류를 이루면서 남인 일부가 참여하는 구도가 연장되었다.
17세기 후반 청의 중국 지배가 확고해지자, 사림세력 각자의 내심이 어떻든 겉으로는 공통의 목표이던 북벌론이 힘을 잃어, 붕당 사이에 대립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조건 위에서 발생한 것이 두 차례의 주35 논쟁을 둘러싸고 벌어진 정치적 대립, 곧 예송(禮訟)이었다. 먼저 1659년 효종이 사망하였을 때 첫 번째 예송이, 1674년 효종비인 인선왕후(仁宣王后)가 사망하였을 때 두 번째 예송이 일어났는데,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莊烈王后)가 어떤 복을 입어야 하는가가 대립 내용이었다.
서인들은 대체로 예의 보편성을 주장하여 효종을 둘째 아들로 보아 가벼운 복을 입어야 한다는 의견에 가담하였고, 남인들은 대체로 왕실 예법의 특수성을 주장하여 효종이 왕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적장자(嫡長子)로 보고 복을 입어야 한다는 의견에 가담하였다. 이 복제 논쟁은 학술적인 성격을 띠어 처음에는 각자의 주장이 반드시 학연이나 붕당과 일치하지 않았으나, 점차 정치적인 성격이 짙어지면서 붕당 사이의 논쟁이 되고 말았고, 각기 예송에서 승리한 붕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2.1.5. 사림정치의 파탄과 왕권
왕정체제 속에서 크게 확대된 정치세력을 대표하여 사림들이 정치를 주도하는 일은 전에 경험한 적이 없는 새로운 정치행태였다. 유생들은 양반층만이 아니라 서민의 의사까지 대변한다고 자부하였고, 사림세력은 유생들의 공론을 대변한다고 자부하였다. 이조 낭관과 삼사 관원들을 중심으로 질서를 갖추어 문신 당하관들이 당상관과 국왕에 대해 상당히 자율적으로 정치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의기구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사림세력 내부에서 의견 대립이 일어나면 논쟁 수준을 넘어서서 상대 붕당을 적대시하고 나아가 멸종시킬 대상으로 낙인을 찍어 공격하게 되었다. 붕당 사이의 싸움이 격렬해지자, 사림정치는 사회 모순을 개혁하는 길에서도 멀어져 갔다. 이로써 사림정치는 파탄 국면으로 접어들어, 주36정치와 주37정치를 거쳐 세도정치로 변질되었다.
2.1.5.1. 환국정치
예송이 진행되는 동안 차츰 상대 붕당을 배척하고 혐오하는 경향이 심해져 갔다. 더구나 국왕의 권위와 관련된 주제를 갖고 신료들이 논란을 벌이는 일이 국왕에게 달가운 일일 수 없었다. 더구나 효종 말엽 이후 20년 가까이 조선시대에서 가장 극심하게 연속되는 주38을 겪는 중이었다. 한편 청의 대륙 지배가 안정을 찾아감으로써 북벌론의 타당성이 옅어진 상황에서 조선의 국왕은 정치 주도를 위한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붕당이 상호 배척 수준을 넘어 상대 세력을 모두 죽이겠다고 싸우는 것을 국왕이 비판하며 개입하는 것이 가능해져 환국이 반복하여 일어났고, 그 결과 전보다 정국 운영에서 국왕이 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환국이 발생하기 시작한 숙종 때는 상품화폐경제가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신분제와 주39 사회의 세력 판도에 변화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환국은 이러한 커다란 사회 변동과도 관련을 맺으며 반복하여 일어났다.
1674년(숙종 즉위)의 갑인환국 이후 1728년(영조 4) 이인좌의 난까지 50여 년간 아홉 차례 환국이 발생하였다. 아직 환국정치의 초입부인 1685년(숙종 11)에는 낭관의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여 환국이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었다. 숙종 전반기에는 남인과 서인 사이에서 정국의 주도권이 바뀌는 형태로 환국이 전개되었다.
남인 중 왕실과 관계가 많은 세력이 군사지휘권을 장악하려는 기미를 보이자 숙종이 이들을 축출하고 서인세력을 다시 관직에 진출시킨 ‘ 경신환국’, 숙종과 소의(昭儀) 장씨 사이에 태어난 왕자의 지위와 이 왕자를 세자로 책봉하는 문제를 놓고 국왕의 뜻에 반대하던 서인들이 밀려난 ‘ 기사환국’, 폐비되었던 인현왕후(仁顯王后) 민씨를 복위하고 세자의 생모 장씨를 다시 왕비에서 빈(嬪)으로 강등하는 조치와 함께 남인을 물러나게 하고 서인을 등용한 ‘ 갑술환국’이 이어졌다.
갑술환국 이후에는 서인에서 갈라진 노론과 소론이 희빈장씨 소생 세자, 곧 경종을 놓고 대립하여 정국의 주도권을 주고받았다.
1710년(숙종 36) 당시 정국을 주도하던 소론의 지도자 최석정이 지은 『 예기유편(禮記類編)』을 걷어 불태우게 한 조치를 계기로 소론이 퇴조하고 노론이 득세한 경인환국, 1716년(숙종 42) 소론의 영수로 인정받던 윤증의 부친 윤선거의 문집을 훼판하토록 하고 이듬해에는 윤선거와 윤증 부자의 관작을 추탈토록 한 숙종의 처분으로 노론이 주도권을 한층 강화한 주40’ 등은 완만한 정국 변동이었다.
이 와중에도 1708년(숙종 34)에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1720년(숙종 46)에는 미진하나마 120여 년 만에 전국적인 양전을 시행함으로써 통치의 군란상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숙종 말년에서 영조 초년 사이에 노론과 소론이 왕위 승계를 놓고 대립하자 환국에 따른 정치적 파장도 급격히 커졌다. 1721년(경종 1, 신축)부터 그 이듬해 1722년(경종 2, 임인) 무렵에는 경종의 이복동생인 연잉군(延礽君) 이금(李昑)을 왕세제로 책봉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소론이 노론을 대거 숙청하고 주도권을 장악한 ‘신임환국’이 일어났다.
1724년(경종 4) 연잉군이 즉위하면서 소론 강경파인 준소계, 1725년(영조 1)에는 온건파인 완소계까지 내몰고 노론이 정국의 전면에 진출한 ‘ 을사환국’이 일어났다. 노론이 신임옥사 당시 처벌된 노론 계열의 인물들을 신원하고 소론을 처벌할 것을 집요하게 주장하자, 영조가 1727년(영조 3) 노론 인물들을 핵심 관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소론을 불러들이는 ‘ 정미환국’이 일어났다.
이처럼 환국은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붕당 또는 그 안의 특정 세력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이 생겼을 때 국왕의 권위로 이를 결정하고 주도권을 어느 붕당 또는 그 안의 특정 세력에 넘겨주어 정치적 국면의 변환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였다.
서로 대립한 붕당과 세력은 국왕을 향해 주장을 관철하고자 호소하였고, 그 수단은 언론 삼사의 언론 활동과 상소 등이었다. 그 내용은 충과 효 등 도덕성 또는 인성에 대한 것이 중심이었고, 백성의 삶을 좌우하는 정책과는 거리가 있었다. 환국의 결과로 남인이나 소론이 주도권을 쥐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노론세력이 더 커져 독주가 강화되는 흐름이 거세지는 속에서 환국이 일어나고 있었다.
2.1.5.2. 탕평정치
노론세력이 영조를 왕위에 올릴 대상으로 선택하였다는 사실은 역사적 발전 양상을 내포하고 있었으나, 왕권의 논리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조선의 정치는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지만 왕정 외에는 대안이 없었다. 당시의 정치세력이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판단하면, 국왕의 붕당에 대한 정치 주도권 행사가 가장 확실한 대안이었다.
그러므로 영조는 노론의 지지를 받아 왕위에 올랐음에도 노론의 구속에서 벗어날 길을 찾아야 하였다. 영조는 노론과 소론, 또 그 내부에서 분기하여 나온 정치집단들을 조정하고 통제하면서 정치 주도권을 행사하는 탕평정치를 지향하였다. 이인좌의 난을 진압한 뒤 영조는 더욱 강력하게 붕당을 부정하며, 붕당 관련 주장이 온건한 자들을 등용하였고, 이후 탕평정치가 전개되자 환국은 발생하지 않았다.
국왕이 정치를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은 숙종 연간부터 제기되었으나, 어느 붕당에게 정치 주도권을 줄지를 정하는 선에 머물렀다. 탕평정치는 이를 넘어서서 붕당의 존재를 인정하는 위에서 국왕이 주도하는 정치행태였다. 영조는 각 붕당이 명분으로 내세우는 의리를 사족의 공론이 아니라 당론(黨論)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국왕이 세도(世道)의 주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각 붕당이 공존하는 위에서 국왕이 정치를 주도하는 방안으로 조제보합을 핵심으로 하는 완론 탕평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각 붕당에서 반탕평론이 득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조는 재위 내내 탕평을 추진하였고, 결국 각 붕당에서 반탕평론이 퇴조하였다. 나아가 영조는 자신에 동조하는 인물들을 끌어들여 혼인 관계를 맺기도 하며 측근 세력으로 삼았다. 이로써 붕당은 정치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 갔고, 영조의 권위는 점차 강화되어 갔다.
이러한 변화는 붕당의 존재를 공인하였다는 것을 제외하면 중대한 정치적 퇴보였다. 그럼에도 이 시기에 이르러 비로소 균역법을 시행하여 양역의 폐해를 줄인 것을 비롯하여 서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시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였다. 영조는 재위 초엽부터 말엽까지 몇 차례에 걸쳐 억울한 판결을 줄이고 혹독한 형벌을 금지하였는데, 이것은 관직자와 아전들의 수탈 수단을 약화시키려는 조치였다.
탕평정치를 전개하면서 왕조 초기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얻은 영조와 그의 측근 인사들은 의례와 법제 등을 정비하여 17441749년(영조 2025) 동안에 주41』, 『 속대전』, 『 속병장도설』을 간행 반포하여 국왕의 권위를 강화하였다. 그 위에 균역법을 실시함으로써 중앙집권력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
영조 재위 말엽에 이르러 그의 측근들은 긴밀하게 연결된 특권집단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판서 이상의 요직을 맡다가 물러난 뒤에도 기능이 강화된 비변사의 당상 직책을 장기간 담당하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다. 이에 반해 이조 낭관의 주42이 폐지되는 등의 이유로 언관을 비롯한 당하관의 자율성이 훼손되어, 고위 관료들의 지휘권이 강화되었다. 그 결과 왕권이 강화되는 한편 당상관의 권한도 강화되고, 정치행태도 상당 정도 조선 초기와 비슷하게 바뀌었다.
영조를 둘러싼 특권집단은 새로운 정치집단의 진출을 막는 등 문제를 야기하였다. 1762년(영조 38) 영조가 자신의 정국 운영의 방향을 바꾸고자 하는 기미를 보였던 주43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 데에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는데, 특권집단이 영조의 행동에 동조 또는 방조하였던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정조는 영조 때보다 의리를 존중하는 준론 탕평을 표방하여, 각 당색의 논의를 대표하는 논자들을 아우르는 탕평을 내세웠다. 국왕이 온 백성의 어버이라는 오랜 관념과 국왕이 스승이라는 영조의 생각을 계승한 정조는 학문에 대한 스스로의 자부심까지 갖추고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조의 의지 앞에서 붕당은 인정될 수 없었다. 정조는 자신의 뜻을 펼칠 중심 기관으로 규장각을 설치하여 종합적 학술 정무기관으로 확장하며, 규장각을 통하여 신진 관료들을 육성하고 기존 관료들을 재교육시켰으며, 국왕이 독점할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한편 정책 개발, 감찰 기능까지도 담당하게 하였다.
정조 재위 초기에는 당하관의 집단적 자율권을 인정하여 이조 낭관의 통청권을 일시 부활하였으나, 재위 중반에 이를 다시 폐지하고 재상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정조 또한 영조가 예와 법 등을 정리하여 권위를 강화한 방법을 계승하여 17851790년(정조 914) 동안에 『 대전통편』을 편찬하여 다시금 법제를 정비하였다. 또 의례를 더 자세히 규정한 『 춘관통고』와 군사들의 전투기술을 중심으로 한 실전 훈련서인 『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하였다.
정조가 장용영을 신설하여 군문을 통일함으로써 병권을 장악한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였다. 화성을 축조하여 지방 경제의 새로운 중심지로 삼고 여기에 장용영을 설치하여 지방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려 하였으며, 신해통공을 실시하여 특권 상인을 통제함으로써 상업의 활성화를 꾀하였다.
정조가 탕평정치를 전개하는 동안 일반민이 국왕에게 억울함을 직접 호소할 길을 넓히고, 주44이 주45이 나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주46을 혁파하는 등 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된다. 이러한 정조의 정책은 성장하는 중간계층을 포섭하여 자신의 정치 기반을 넓히려는 방향이었다.
2.1.5.3. 세도정치
정조 때의 탕평정치는 붕당을 타파하고 외척을 포함한 기득권 집단을 제어하여 왕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정치권력이 어느 정도 국왕에게 집중되었는데, 국왕 개인의 학문적, 정치적 역량이 바탕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의 국왕이 계승하기에는 쉽지 않은 방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조가 급작스럽게 사망하자 국왕에게 집중되었던 정치권력이 순조에게로 순탄하게 이어지지 못하였다. 선왕의 결정이라는 이유로 공노비 해방을 시행하였음에도, 장용영을 해체하여 병력과 재정을 가져왔던 군영으로 모두 되돌렸고, 그 권력의 중심도 세도가문에게 넘어가, 세도정치가 시작되었다.
세도정치는 서울에 기반을 둔 소수의 유력한 가문이 정국의 주도권을 배타적으로 장악하여 행사한 정치 운영형태이다. 1800년에 즉위한 순조는 정국 운영의 구심점이 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권력 집중의 중심이 국왕으로부터 세도가문으로 이동하였다. 안동 김씨, 풍양 조씨, 반남 박씨, 대구 서씨 등의 가문이 불천위 제사를 중심으로 큰 세력을 형성하여 관직 인사 등을 과점하였다. 이들은 왕실과 외척 관계를 형성하여 왕권을 배경으로 자신들의 권한을 확대하고, 권한이 비대해진 비변사를 장악하고 배타적 연합체를 이루어 다른 세력의 정치적 진출을 차단함으로써 국가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사리를 추구하는 데에 사용하며 사회 모순을 증폭시켰다.
이에 농민들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농민항쟁을 일으켜 저항하였다. 1811년(순조11) 홍경래 등이 주도한 평안도 농민항쟁, 1862년(철종13) 삼남 지방을 시작으로 전국 여러 고을에서 일어난 임술민란 등이 대표적인 예이나, 기존 체제를 뒤엎고 새로운 체제를 세울 만한 역량을 갖춘 것은 아니었다.
1863년에 고종이 즉위하면서 그의 생부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실권을 장악하였다. 흥선대원군은 세도정치기에 기득권을 갖고 있던 가문과 그에 속한 인물들을 대거 축출하였으나, 세도정치의 틀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왕권을 강화하고 명령 계통의 일원화를 위해 의정부와 주47를 부활시켜 정치 · 군사의 최고 기관으로 삼는 개혁을 하였으나, 실상은 비변사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계승하고 있었고, 주요 관직 담당자가 왕실의 외척 가문 출신이 중심이던 것에서 왕실 내척 인물 중심으로 바뀌었을 뿐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안고서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국가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경복궁을 중건하고 쇄국정책을 강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였다. 국가 재정의 확충을 위해 양전을 하고, 주48를 시행하여 양반도 군포를 내게 하고, 환곡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주49를 실시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나, 재정 부족을 피할 수 없었다.
이에 대처하여 당백전을 주조하고 청전(淸錢)을 수입하여 유통한 일은 경제의 혼란을 초래하였고, 많은 서원을 철폐하여 그 소유 전지와 노비를 몰수하고 지방 양반층의 횡포를 막고자 한 정책은 양반 유생들의 맹렬한 반대를 야기하였다. 1866년(고종 3)의 병인박해와 병인양요, 제너럴 셔먼호 주50, 1871년(고종 8)의 신미양요 등은 이하응이 양반과 유생들의 지지를 받게 한 주요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하응은 이미 1864년 전국의 서원을 조사하여 불법으로 지은 서원을 국가에 귀속시켰고, 이후 1870년까지 만동묘와 화양서원 철거, 서원에 딸린 토지에서의 세금 징수, 명령을 어긴 서원을 없앴다는 명목으로 취해진 대규모 서원철폐가 이어진 것을 보면, 그에게는 권위의 독점이 더 중요하였다.
1873년 이하응이 권좌에서 물러난 뒤 형식적으로는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었으나, 실제로는 그의 외척인 민씨 중심의 세도정치가 부활하였다. 새 정권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던 사건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있었으나, 제국주의로 치닫고 있던 당시의 세계를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조선은 개항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2.1.6. 국민국가 수립 시도와 좌절
개항 이후 조선은 외침으로부터 국가 주권을 수호하며 안으로는 국민국가를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조선의 정치 지도자들이 조선이 처한 국제정치의 환경과 세계사적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이 정확한 이해를 하기에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고, 그 동안 적지 않은 비용을 치러야 하였다.
그들은 갑오농민혁명과 청일전쟁을 겪고 나서야 차츰 조선의 정치가 이루어야 할 목표를 선명히 보기 시작하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국왕과 왕권이 매우 중요하였다. 문제는 국왕 고종에게 조선의 정치가 이루어야 할 목표를 설득할 수 있거나, 강제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데서 발생하였다.
2.1.6.1. 개항에서 갑오개혁까지
조선 정부는 개항한 뒤에도 기존의 정책을 바꿀 뜻이 없었으나, 결국 청의 요구에 따라 개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고종은 청의 총리각국사무아문을 본따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여 청 방식의 개화를 추진하였다. 이어서 일본에 주51을, 청에 영선사를 보내 일본과 청에서 전개되고 있는 근대 문명을 조사하고, 일본식 근대 병력 양성을 위한 교련병대[별기군] 설치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1880년대에 전개된 일련의 개화 정책은 민씨정권에 가담한 온건개화파들이 고종의 명령을 받들어 추진한 것이었다.
고종의 친정을 계기로 흥선대원군이 권좌에서 물러난 뒤 명성황후는 점차 여흥 민씨 인물들을 중심으로 자파 세력을 형성하여, 1895년 시해될 때까지 조선의 정치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1880년 이후 명성황후의 친족들이 중앙정계의 요직을 거의 다 차지하여 매관매직과 조세 증수 따위의 전횡이 심하여 민심의 반발을 초래하였다.
1882년 임오군란 때 선혜청 당상 민겸호 등 민씨 인물 상당수가 살해당한 이후에 이들은 친청노선을 선택하여 개화당의 급진 개화운동에 반대하며 청에 의존하였다. 갑신정변에 이어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도 이들은 청에 군대 파견을 요청하였다.
개항 후부터 김옥균을 중심으로 형성된 개화당은 부국강병을 이룩하여 근대적인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급진개화파라고도 알려진 이들은 임오군란을 계기로 군대를 파견한 청이 조선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가 되고, 민씨 정권이 청을 배경으로 삼아 압박을 하자, 1884년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개화당은 정권을 장악한 뒤 청의 간섭을 배제하고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모델로 삼아 개혁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김옥균 등은 청이 베트남을 침공하여 청불전쟁으로 번지자, 자신들이 조선에 있는 일본군 병력을 빌려 정변을 일으켜도 개입하지 않으리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청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일본 정부는 청과의 충돌을 회피하려고 발을 빼고, 조선 내부의 지지도 얻지 못해 권력을 장악한 지 3일 만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 정변의 의도는 10년 뒤의 갑오개혁으로 연결되었다.
고종 재위 초기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는 10년 동안 주춤하였던 농민항쟁은 개항 전후부터 다시 활발해졌고, 목적 또한 정치적 색채가 짙어져 지배층의 수탈과 외세의 침입에 대한 저항을 표방하게 되었다. 임술농민항쟁을 거치며 지역별로 농민조직이 발달하고 있었으나 농민은 아직 정치세력화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들을 대변하는 세력 또한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학은 농민들에게 조직과 정신적 공감대를 제공하였고, 결국 농민들은 1894년 봄과 겨울 두 차례에 걸쳐 동학의 이름으로 봉기하였다.
동학농민군이 조선왕조를 부정하는 데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정치세력은 개화를 지향하는 세력과 주52를 주장하는 세력을 막론하고 모두 이들을 도둑떼로 치부하며 가치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동학농민군이 요구한 폐정개혁 조항은 결국 상당 정도 갑오개혁 등에 반영되었다.
1차 봉기한 농민군이 전주화약을 맺고 해산한 뒤에도 일본군은 철수하지 않고 계속 주둔하면서 왕궁을 점령하고 청일전쟁을 일으키자, 동학농민군은 10월에 다시 봉기하였다. 이 제2차 봉기에는 동학의 주53뿐만 아니라 주54도 가담하였으나, 12월에 우금치전투에서 일본군에게 대패하였다. 1894년 2월부터 1895년 초까지 계속된 동학농민혁명은 실패로 끝났지만, 이를 통해 농민들의 정치의식이 높아졌고, 일부는 이후 전개된 반일의병운동으로 이어졌다.
지방의 양반층은 이 시기에도 정치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개항 이후 민씨정권이 개화정책을 서두르자 지방 양반세력의 불만이 커졌다. 1880년에 청나라 황준헌의 『 조선책략』이 국내에 반포되면서 유생들의 격렬한 척사위정상소가 이어졌고, 소외감이 상대적으로 더 컸던 영남의 유생들은 만인소를 올렸다.
이에 따라 민씨정권이 곤경에 처하자, 승지 안기영은 권정호와 함께 흥선대원군과 결탁하여 고종을 폐위하고, 고종의 이복형으로 한직에 밀려나 불평을 품고 있던 이재선을 국왕에 추대하고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게 하려고 계획을 짰다. 이 정변 음모가 탄로나자 민씨정권은 이를 이용하여 위정척사 세력을 통제하였다. 동학농민군이 봉기하자 지방 각지의 양반층이 의병을 조직하여 농민군을 공격하였다.
갑오개혁의 추진 배경은 일본에 의해 마련되었으나 개혁의 주체는 온건개화파 계열의 조선 관료였고, 초기의 개혁 내용은 그들이 구상한 것이었다. 이들은 왕실과 정보의 권한을 구분하여 국왕의 자의적 통치행위를 막고, 세습신분제를 폐지하여 능력 본위의 사회를 건설할 것을 지향하였다.
경제에서도 재정 일원화와 도량형 통일 등 중요한 개혁이 있었으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토지제도의 개혁은 없었고, 특히 주권을 지키기 위한 개혁은 거의 없었다. 이어서 청일전쟁에서 승세를 잡은 일본이 개혁에 개입하여 일본이 식민지로 조선을 지배할 때 필요한 제도 변화도 포함하게 되었고, 내각도 친일 인사들로 교체되었다.
아직 갑오개혁이 진행 중이던 1895년 청일전쟁이 끝나고 시모노세키 주55 체결에 이어 주56으로 일본이 요동반도를 차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일본이 조선에서 누리던 지배적 지위가 급격히 약해졌다. 박영효 내각은 무너지고, 새로 들어선 김홍집 내각에는 미국이나 러시아와 가까운 인사들이 등용되었다. 일본은 이러한 변화의 이유가 조선의 왕비에게 있다고 보고 궁궐을 공격하여 왕비를 살해하여 잠시 세력을 회복하였으나, 이 을미사변은 단발령을 계기로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고종은 왕비가 사망한 후 드디어 정치 전면에 모습을 드러내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움직이기 시작하여,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하려다 실패한 뒤 1896년 2월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였다. 이 아관파천이 일어나자 개혁에 참여한 개화파 인사 다수가 살해되었고, 일부 개혁 조치도 폐기되었다.
2.1.6.2. 대한제국
고종이 러시아 공관에 있는 동안 러시아 등 열강의 의권 침탈이 본격화하였다. 국왕이 외국 공관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이 국가적 수모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 위기임을 파악한 관료와 지식인들이 자주독립국가를 이루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독립협회를 세워 운동을 전개하였다. 고종은 주57을 바라는 거국적 염원을 바탕으로 왕권을 회복하고 나아가 권위를 더 높이고자 하였다. 그 성과가 대한제국 수립이었다.
대한제국은 1897년에 조선 국왕을 황제로 격상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채택하며 국호를 바꿈으로써 성립되었다. 대한제국의 집권층은 친러파가 중심을 이루었다. 그들은 제정러시아의 전제 황정을 모방하여 「 대한국국제」를 제정하였다. 분리되었던 황실과 정부의 행정은 구분이 모호해졌고, 주요 세금이 정부가 아닌 황실로 들어갔으며, 황제가 모든 분야에 전제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이루어진 광무개혁은 국가재정을 확충하고 자본주의적 산업 기반과 근대적 국가체제를 갖추고자 하였음에도 한계가 뚜렷하였다. 황실재정의 가장 큰 몫이 군사력 증강에 투입되었는데, 국방을 위해 설치한 진위대보다 황제의 친위대와 시위대를 위한 몫이 더 컸다. 그 결과 러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한제국의 군대는 별 구실을 할 수 없었다. 당시 실권자였던 조병식 등은 민권 신장과 입헌군주제를 요구하며 외국에의 이권 양도를 반대하는 독립협회를 탄압하고, 경제권을 장악하여 근대적 회사와 기업, 은행 등을 설립하여 경영하며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다.
독립협회는 처음에는 왕실의 지원을 받으며 고급관료와 지식인들이 주도하였으나, 차츰 여러 층위의 사람들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단체로 성장하여, 1898년 말까지 구국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첫 사업으로 주58을 세운 뒤 『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강연회와 토론회, 집회 활동을 하여 근대 정치에 대한 지식을 알리고 권리 의식을 전파하였다. 러시아의 내정간섭이 노골화하자 종로에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는 등 반러여론을 조성하여 러시아의 절영도 주59를 막아내는 목적을 달성하였다.
그런데 정부가 독립협회 회원을 유언비어 유포죄로 체포하고 재판 없이 황제의 칙명만으로 유배형에 처하자, 독립협회도 자유 민권 운동과 내각 개편 운동, 나아가 의회 설립 운동을 벌여 대응하였다. 독립협회의 활동은 중추원 개편을 담은 새 관제 반포까지 이끌어내 잠시나마 국민참정권을 실현하는 성공을 거두었으나, 독립협회가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시행하려 한다는 공격을 받고 결국 강제 해산되었다.
당시 독립협회는 러시아의 침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도 미국이나 일본의 이권침탈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대하였고, 의회설립을 급박하게 추진하였다는 등의 한계가 있었으나, 왕정 이외의 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며 정치의식의 전반적인 변화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큰 성취를 이룬 셈이었다.
2.1.6.3. 통감통치와 대한제국의 멸망
삼국간섭 때부터 한반도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날카롭게 대립하던 일본은 1902년에 영일동맹을 맺음으로써 러시아에 대해 우위를 차지하였고, 1904년에는 러일전쟁을 일으켰다.
일본은 청일전쟁 때처럼 먼저 고종을 장악함으로써 대한제국을 장악한 뒤 전쟁에 들어갔고, 전쟁에서 승리한 뒤 1905년에 강제로 을사조약을 맺어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었다. 독립협회와의 합의를 뒤집고 황제전제정치를 확고히 한 결과는 보호국이 되는 절차는 물론 뒤에 식민지가 되는 절차도 황제가 재가하고 내각 대신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끝이었다.
을사조약에 따라 일본은 통감부를 두고 이토 주60를 통감으로 임명하여 외교를 한다는 구실로 대한제국의 내정 전체를 관리하였다. 이로부터 1910년까지 유생에서 고위 관직을 지낸 주요 인물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사가 상소와 자결로써 저항하였고,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장인환과 전명운은 미국인 외교 고문이었던 스티븐스를 사살하여 저항 의사를 표현하였다. 나아가 많은 국민이 의병 활동을 통해 저항하였고, 지식인들의 애국계몽운동도 전개되었다.
항일의병은 1895년 왕비 시해사건과 단발령을 계기로 지방 각지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났다가, 아관파천 후 왕명에 따라 대부분 해산하고 농민의병들만이 활동을 계속하였다. 을사조약을 전후하여 항일의병이 다시 대대적으로 일어나 의병전쟁이 전개되었으나, 전투력에 약점이 많았다.
그런데 이 을사의병이 전국적으로 번져나가고 있던 1907년 헤이그 밀사 주61을 이유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한 일에 자극받아 의병에 참여하는 이들이 더 많아졌고, 군대 해산에 반발한 시위대와 진위대 군인들 상당수가 의병에 투신함으로써 조직과 무장이 강화되었다.
이로부터 의병 부대들의 연합 작전도 진전되어, 이해 12월에 13도 연합의병이 결성되어 서울 진공을 시도하였으나, 총대장 이인영이 이탈하고 군사장 허위가 지휘한 선봉대가 패배하여 작전은 실패하였다. 의병들은 1908년에도 연합부대를 결성하여 서울 진공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였는데, 이 1907~1908년이 가장 활발히 의병전쟁을 전개한 때였으며, 그 성격에도 새로운 역사성이 나타나고 있었다.
당시 의병 지휘부는 각국 영사관에 의병을 국제공법상의 전쟁단체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의병장 또한 1/4 정도만이 양반 유생 출신이었다. 1909년 의병전쟁의 중심이 호남지역으로 옮겨가자 일본군은 이른바 남한대토벌작전으로 수많은 서민과 의병을 살육하였다. 이후 1915년까지 일부 의병만이 산악지대에서 유격전을 펼쳤고, 많은 의병이 간도와 연해주로 옮겨가 독립군으로 활동하였다.
근대사회를 지향하는 민족운동은 독립협회의 활동을 통해 확대되었고, 독립협회가 해체된 뒤 러일전쟁을 전후하여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하자 폭을 더 넓혀 애국계몽운동으로 전개되었다. 러일전쟁 중 보안회와 그 후신인 헌정연구회 등은 일본의 이권침탈을 막고 헌정체제를 세우고자 활동하였으나, 친일단체 일진회의 행위를 규탄하다가 통감부 설치 후 해산당하였다.
대표적 애국계몽운동 단체로 꼽히는 대한자강회는 을사조약 체결 이후 한국인의 정치 활동이 금지된 상태에서 1906년 헌정연구회의 후신으로 출범하여 정기 연설회를 열며 활발히 활동하였다. 그러자 일본은 1907년 고종 퇴위와 주62 체결에 반대한 것을 이유로 대한자강회를 강제 해산하였다. 대한자강회의 사업을 대한협회가 계승하여 회원 수만 명을 확보하고 정당정치를 주장하였으나, 일제의 지배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항일운동과는 거리가 있었다. 당시의 조건에서 일제에 대해 비타협적 운동은 비밀리 전개할 수밖에 없었고, 신민회가 그러한 조직이었다.
애국계몽운동 단체들은 신문과 잡지 발간, 학회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을 계몽하고, 회사를 운영하여 자본을 축적하고자 하였다. 당시 이들이 발간한 신문으로는 『 황성신문』, 『 대한매일신보』, 『 만세보』 등이 있었고, 지역을 기반으로 여러 학회가 결성 운영되었다. 애국계몽운동이 가장 활발히 전개된 분야는 교육으로, 관공립 학교의 14배에 가까운 2,000여 개에 달하는 사립학교 설립을 통해 근대적 교육을 보급하였다.
애국계몽운동은 지식인들이 벌인 국권 회복을 위한 계몽운동이었다. 계몽의 주요 내용은 국사와 국어, 국문 등 민족문화였고, 국권 회복 방법은 물질적 정신적 실력 증대였다.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논리의 근거는 사회진화론이었으며, 따라서 이들에게 강자인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리였다.
이들은 대다수가 주권 상실이 초래할 결과에 둔감하였고, 주권 상실의 의미를 피부로 깨닫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던 항일의병을 도적떼로 간주하며 그들을 혐오하였다. 대한제국을 포함하여 조선시대 내내 지식인의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컸던 특성을 고려하면, 애국계몽운동은 대한제국의 멸망에 상당한 책임이 있었다.
2.2. 왕권과 양반관료제
조선의 국왕은 절대 권력을 휘둘렀다고 할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 정통성을 갖추고 즉위하였으면 꽤 강력하게 국가를 지배할 수 있었다. 주변 강대국에 휘둘리다 결국 주권을 잃어 극동의 폴란드라는 이름을 얻었던 대한제국 시기에도 고종 황제의 지위와 권력은 초빙되어 재위하던 폴란드 국왕과 비교하면 매우 탄탄하고 강력하였다. 행정과 입법, 사법 모두에서 국왕 또는 황제가 최종 권한을 행사하였고, 주요 정책과 관직 인사에 대한 최종 결정권도 행사하였다.
그러나 국왕이 독단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일은 많지 않았다. 폭군으로 악명이 높은 연산군조차도 대개 대신의 동의를 구하여 권력을 행사하였다. 어느 군주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대개 재상, 곧 2품 이상 관직자들을 불러 의견을 들었고, 중요성이 더 높으면 더 많은 관직자의 의견을 들었다. 이는 국왕이 자신의 뜻대로 일을 진행하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수단일 수도 있었으나, 여러 사례로 볼 때 훌륭한 의견을 찾는 좋은 방법이었다.
조선이 관료제 사회였다는 말은 양반 출신 관료들이 주도하여 운영하는 사회였음을 뜻한다. 양반 관료가 행사하는 권력은 관료인 까닭에 왕권에 의해 뒷받침되는 부분과 양반의 소유 토지 등의 경제력, 성리학 이념, 법률에 보장된 특권 등으로 구성되는 부분이 결합되어 내용이 복잡하였다. 이 가운데 경제력은 조선시대 동안 큰 변화가 있었다. 당초에 과전법에 이어 직전법, 직전세로 이어지면서 수조권적 토지지배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고려시대만은 못하였지만 고위 관료들이 이를 바탕으로 상당한 경제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16세기에 직전세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다가 폐지되고, 녹봉도 제 액수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관료들은 스스로 갖춘 경제력에 의해 체신을 유지해야 하였다. 이로부터 관료들의 왕권에 대한 독자성이 높아지고, 양반이 양인 신분 내의 한 계층에서 독립된 특권 신분으로 바뀌어 세습 성향이 강해지는 변화가 이어졌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조선의 양반관료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퇴보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경국대전』 단계에서 조선의 중앙 관서는 87개였고, 그 중 행정 관서가 육조와 그 속아문 66개 등 72개였으며, 이 밖에 그 직무에서 행정의 비중이 큰 부서로 의정부, 한성부, 개성부, 승정원 등이 있었다. 그런데 육조의 66개 속아문 중 왕실의 생활과 의례 등을 위한 공상(供上)을 전적으로 담당하거나 겸하여 담당하는 관서가 19개로, 그 비중이 작지 않았다. 그나마 이는 건국 직후 30개였는데 태조~태종 때의 제도 개혁과 세종 때의 국용전제 실시에 따라 공상 담당 관서 다수를 폐지 또는 통합한 결과였다.
그 이후 18세기 말엽의 『대전통편』 단계에서 육조의 속아문이 54개로 줄었는데, 그동안 폐지되거나 통합된 관서의 반 이상이 공상 담당 관서이거나 주63과 연은전, 소격서 등 왕실의 독자적 제사 의례를 뒷받침하는 관서였다. 조선의 관료기구에서 왕실을 위한 행정을 담당하는 부분은 이와 같이 차츰 줄어갔으나, 대한제국 때 다시 대폭 확대되었다.
2.2.1. 양반관료제의 등장과 변천
조선은 양반이라야 관료가 될 수 있는 국가였다. 고려 때에 이어 조선 건국 후에도 양반은 문반과 무반의 관료를 합하여 부르는 이름일 뿐이었으나, 15세기 말엽부터 관료를 배출한 지배층도 차츰 양반이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법으로 명확히 특권 지배신분으로 규정한 일이 없음에도 조선 건국 후 약 한 세기가 지날 무렵 양반이 특권 지배신분으로 대두하였고, 이와 아울러 양반관료제 또한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 반면에 서리나 향리 출신이 관직에 진출하는 길은 매우 좁아져, 길이 끊긴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다. 16세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새로운 양반 가문이 등장하고 있었으나 이미 활력이 떨어져 있었고, 17세기 이후 등장하는 새로운 양반 가문은 기존 양반 가문의 벽에 막혀 관직자를 배출하지 못하고 토착세력으로 머무는 일이 많았다.
18세기에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따라 경제력의 중앙 집중이 쉬워지자, 서울과 경기 일대에 거처하며 대대로 관직자를 배출해온 주요 가문 출신의 관직 점유율이 더 높아졌고, 지방 양반가 출신들은 과거 급제자라도 주요 관직에는 나아가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경향분기(京鄕分岐) 양상은 19세기에 더욱 심해졌다.
제도와 의례로 보면 관료들을 대표하는 존재는 대신, 곧 의정들이었다. 그런데 양반관료제가 본격화한 뒤로 대다수 관료들의 생각에 대신은 제도와 의례 등 형식적인 측면에서만 관료들을 대표하고, 정치 행위에서는 국왕 편에 서 있거나 자신들과는 구분되는 기성세력일 뿐이었다. 문반 관직의 인사 행정을 담당한 이조의 낭관과 언론 활동을 담당한 사헌부 · 사간원 · 홍문관 관원들이 사림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국왕 및 대신과 아울러 국정 운영의 한 축을 이룸으로써 양반관료제는 차츰 사림정치를 구현하는 제도로 작동하였다.
그러나 사림세력이 정치를 주도하게 되자 어느 당색에 속하는가가 더 중요해졌고, 그 양상은 붕당 사이의 대립이 심할수록 더 뚜렷하였다. 환국정치에서 세도정치에 이르기까지 국왕과의 친분이나 혼인관계가 주요 관직에 진출하는 데에 관건으로 작용하였고, 양반관료제는 사림정치와 거의 무관하게 작동하였다. 그럼에도 유생들의 논의가 결집되면 정치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대신과 재상들은 대체로 기존의 질서와 제도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였으나, 조선 초기에는 꼭 그렇지만도 않았다. 역사적 조건에 따라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대신이나 재상들이 중심에 있어야 하였다. 조선 중기 이후에도 대동법이나 균역법과 같이 중요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는 데에는 대신과 재상이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그러나 군주의 명령으로 법이 제정되는 형식의 힘도 중요하였다.
고종이 친정을 한 이후 대한제국 때까지 제도가 자주 개혁되었는데, 어느 세력이 고종의 생각을 움직이게 하였는가에 따라 개혁 내용이 결정되곤 하였다. 조선 초기에 강력하였던 대신과 재상의 영향력은 16~17세기 동안 약해졌다가 18세기에 탕평정치가 본격화하면서 다시 강해졌다. 소속 가문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성향 및 세습 성향 또한 같은 맥락에서 변화를 겪었다. 조선 초기에는 대대로 한 지역에 거주한 내력이 지역의 공동 제의와 연결되어 가문의 위세를 뒷받침하는 현상이 남아 있었으나, 유교국가의 성격이 짙어지면서 이는 곧 사라졌고, 그 대신 불천위 조상신을 받드는 가문이 위세를 떨치게 되었다.
2.2.2. 양반관료와 기구
2.2.2.1. 양반관료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는 관직을 보면, 약 1천 개 가까이 되는 문반 경관직(京官職)에서 겸직을 제외한 수가 817개이고, 무반 경관직이 3,835개, 합하여 4,652개였다. 문 · 무반 외관직(外官職)은 약 900개였다. 그러므로 하나 이상의 관직을 맡아 임무를 수행하는 관원의 수가 늘 5,500명이 넘는 나라가 조선이었다. 행정 실무를 맡는 아전(衙前)은 서울에서 일하는 경아전만 3,400명 정도가 있었고, 지방의 아전은 그보다 훨씬 많았다.
전근대 국가 중 인구 대비 관리의 수가 조선보다 많은 경우는 찾기 어렵다. 그 반면 국가의 재정을 위해 파악하고 있던 인구와 농경지는 실제 수치와 큰 차이가 있었다. 조선이 꽤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갖추었다고 하여도, 기술적 제약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전근대 단계에서 오는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었다.
조선의 관직자 가운데에는 녹봉이 없거나 녹봉의 일부만 받는 이들이 있었다. 녹봉이 없는 관직은 무록관, 2명 또는 4명이 1인분 녹봉을 나눠 받는 관직은 체아직이라 하였다. 『경국대전』의 규정을 보면, 동반 무록관이 95, 체아직이 105자리였고, 서반 체아직이 3,005자리였다. 동반의 무록관은 양반의 자리였으나, 체아직은 기술관과 환관의 자리였다. 서반 체아직은 대부분 오위 소속 장교의 몫이었고, 나머지는 공신적장(功臣嫡長)과 습독관(習讀官), 의원(醫員) 등 다양한 관직자의 몫이었다. 그러나 서반 체아직은 16세기 이후 점차 양반관료층의 대기 발령 또는 예비 관직처럼 운영되었다.
이 밖에 잡직이 있었다. 동반 잡직은 144자리로, 공장(工匠)과 마원(馬員), 악사(樂師), 주64, 화원(畵員) 등이 받았고, 서반 잡직 1,607자리도 팽배(彭排), 대졸(隊卒), 파진군(破陣軍) 등 하급 직업군인으로 고역을 지는 이들이 받았다.
조선시대의 관료 조직은 문반과 무반의 양반 체제로 이루어졌고 상하 계급이 엄격하였다. 관료의 등급은 9품(品)으로 나누었고, 품마다 정(正)과 종(從)으로 나누어, 정1품에서 종9품까지 모두 18등급이었다. 정1품에서 종6품까지는 2개씩 계(階)를 두어 나누었으므로, 관료의 등급은 모두 30개였다. 문관은 4품 이상을 대부(大夫), 5품 이하를 낭(郎)이라 하였고, 무관은 2품 이상은 문관과 마찬가지로 대부라 하나 3품과 4품은 장군, 5~6품은 교위(校尉), 7품 이하는 부위(副尉)라 하여 명칭의 구분이 자세하였다.
4품 이상 관직은 서경(署經)을 거치지 않아 국왕이 직접 임명하는 형식의 교지를 받았고, 5품 이하 관직은 서경을 거쳐야 하였으므로 이조나 병조가 왕명을 받들어 임명하는 형식의 교지를 받았다. 당시 일반적으로 4품 이상 관원은 대부, 5품 이하 관원은 사(士)라 구분하였다.
실제 관직생활에서 더 의미가 큰 구분은 당상관과 당하관의 구분, 그리고 당하관을 다시 참상관과 참하관으로 나누는 구분이었다. 당상관은 정1품에서 정3품 상계까지의 관원을 가리켰다. 정3품 중 문관은 통정대부, 무관은 절충장군까지가 당상관이었다. 당하관은 정3품 중 문관은 통훈대부 이하, 무관은 어모장군 이하의 관원을 말한다. 그리고 종6품 이상을 참상관, 정7품 이하를 참하관으로 다시 구분하였다.
당상관은 고급 관료로서 주요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로, 여러 특권을 부여받았다. 이들은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왕명에 따라 승진할 수 있었고, 따라서 출근부도 없었다. 그리고 소속 관서의 당하관들에 대한 고과권을 행사하였다. 임기를 마치면 당상관으로 승진하는 특정 관직이 있기는 하였으나, 당상관으로의 승진은 대개 국왕의 발탁에 의해 이루어졌다. 당하관은 근무일수에 따라 승진하였는데, 참하관은 매 자급마다 근무일 450일, 참상관은 900일을 채워야 윗 자급으로 오를 수 있었다. 참상관은 고을 수령이 될 자격에 해당하며, 수령을 지내야 당상관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참하관에서 참상관으로 오르는 것은 문무과 급제자가 아니면 매우 힘들어, 승진 과정에서의 첫 문턱이었다.
관직에도 정해진 품계가 있어서 그에 맞게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관원의 품계와 관직의 품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를 위해 주65을 시행하였다. 세종 때에는 관원의 공로에 물품으로 상을 준 까닭에 승진이 늦어 관직보다 품계가 높은 관원이 맡는 주66을 운영할 일이 적었고, 때로는 자신의 품계보다 높은 관직을 맡는 주67도 운영되었다. 그러나 세조 때부터 관원의 작은 공로나 상서로운 일에 대해서도 관원들의 품계를 높여주는 일이 잦아, 행직이 잦았던 반면에 수직은 거의 생겨나지 않았다.
관직에 대한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국왕이 행사하였고, 아전이 맡는 주68의 인사권은 경아전은 대신, 고을의 외아전은 수령이 행사하였다. 문관의 인사 행정은 이조가, 무관의 인사 행정은 병조가 맡았다. 관원의 승진과 전임, 퇴임 등의 인사 행정은 도목정사(都目政事)라 하여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시행하였다.
일반적인 관직자 임명은 이조와 병조에서 삼망(三望)이라 하여 후보자 3인씩을 뽑아 국왕에게 올리면 국왕이 그중에서 적격자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국왕의 마음에 맞는 대상자가 없으면 망 단자를 다시 올리도록 하였고, 국왕이 의중에 둔 인물만을 올리는 단망(單望), 국왕이 마음대로 고를 수 있도록 해당 품계의 인물 모두를 올리는 장망(長望)을 하는 일도 있었다.
조선시대 정치의 특징 중 하나는 국왕의 학문기관인 경연에서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일이 많았다는 점이다. 주로 많은 관원이 참여하는 조강에서 논의를 하였는데, 영경연사 3인은 삼정승이 겸하고, 정2품과 종2품 직책인 지경연사 3인과 동지경연사 3인은 육조 판서와 사헌부 대사헌 등에서 각각 적임자를 골라 임명하였다. 참찬관은 여섯 승지와 홍문관 부제학이 겸직하였고, 강독과 해설 등을 담당하는 홍문관 관원 외에 대간도 참여하였다.
이와 같이 경연은 조선이 정예 학자관료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 중 하나였다. 낮에 하는 주강과 저녁에 여는 석강은 홍문관 관원 위주로 진행하였으며, 최고 수준의 학자관료들로부터 강의를 듣고 그들과 토론도 하는 자리였으므로, 경연은 국왕이 학문적 권위를 갖추어 가는 수단이기도 하였다.
2.2.2.2. 양반관료제의 기구
조선의 정치 기구는 의정부에서 육조, 육조의 속사(屬司)와 속아문(屬衙門)으로 이어지는 행정 담당 관서가 중심축을 이루고, 국왕과 직접 연결되는 주요 관서가 병렬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정치 기구의 배치 구조는 『경국대전』의 완성과 함께 정립되었다.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는 중앙관서 중 육조에 소속되지 않은 기구로는 최고 정책기관인 의정부를 비롯하여 육조, 왕명 출납기구인 승정원, 감찰과 간쟁, 학문기구로서 언론활동을 하는 사헌부와 사간원, 홍문관 등 삼사, 그리고 무반의 최고위 관서들인 중추부와 오위도총부 등이 있었다. 왕명을 받아 수사 및 재판을 하는 기구인 의금부, 국왕 친위부대인 겸사복과 내금위 등도 국왕 직속 기구였으며, 그 밖에 왕족, 왕의 외척과 공신에 대한 예우기관들이 있었다.
의정부는 형식적으로는 동반의 최고 관서이나, 서반의 최고 관서인 중추부에 담당 직무가 없었던 까닭에 실질적으로 서반까지 아우르는 최고 관서였다. 조선 초기에는 의정부와 육조 사이에 권한 변동이 생김에 따라 관원들의 의견이 의정부의 의결권을 통해 반영되던 주69, 육조가 모든 정무를 왕에게 직접 고하고 왕명을 직접 집행하던 주70가 반복되었다.
세종 때에는 승정원에 6승지체제를 갖춰 승지마다 육조와 각각 연결되도록 하였다. 대개 도승지가 이조, 좌승지는 호조, 우승지는 예조, 좌부승지는 병조, 우부승지는 형조, 동부승지는 공조와 연결되었다. 세조 때부터 육조직계제로 고정되면서 의정부와 대신들의 영향력도 의정부서사제를 시행할 때보다는 위축되었으나, 비변사가 등장하면서 대신들의 권한은 다시 강해졌다.
중추부는 본래 서반의 최고위 정책 결정 관서였으나, 『경국대전』 단계에서 관직이 없는 고위 관원을 대우하기 위한 기관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서반의 실질적인 최고위 관서는 오위도총부였다. 그러나 그 장관인 도총관은 문관이 겸직하였고 또 병조의 감독을 받아야 하였으므로, 서반의 관서들에 대한 권력도 문반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5세기 동안 조선은 국왕을 정점으로 하여 의정부와 육조 및 삼사가 서로 협력 또는 견제하면서 국정을 운영하였다. 국왕의 전제적 권력은 의정부의 의결권이나 대간의 간쟁 또는 삼사의 언론활동 등의 견제를 받았다. 중요한 결정은 국왕이 많은 관원의 의견들 듣고 난 뒤 내렸고, 특히 세종은 농민들의 의견까지 들은 적이 있었다. 이것이 조선시대 중 초기, 특히 세종 때에 가장 활력이 넘쳤던 이유였다.
그러나 16세기에는 사림정치가 천천히 전개되는 가운데 국왕들이 자신의 외척들을 요직에 임명하여 약해진 왕권을 보완하고자 하는 일이 자주 생겨나고, 이에 따른 마찰이 심각하게 일어나 국정 운영이 순탄할 수 없었다. 이조 전랑 자대제 실시는 사림정치의 진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변화였으며, 이어서 임시기구로 설치된 비변사가 상설기구가 되고, 임진왜란 이래 문무 고관의 합좌기구로서 국방 문제에 더해 일반 정무까지 의결하게 됨으로써 국정운영에 큰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비변사는 상설기구가 된 뒤에도 임시기구 때의 체제를 유지하여, 모든 관직을 다른 관서의 관직자가 겸임하였다. 최고위직인 도제조는 전임 및 현임 의정 전원이 겸임하였으나, 실제는 현직 수상이 비변사 운영을 총괄하였다. 이 밖에 2품 이상의 국방을 잘 아는 재상과 여러 현직 판서가 제조를 겸임하고, 승지가 부제조를 겸임하였으며, 병조 낭관 8인을 비롯하여 다른 관서 낭관이 겸임하는 비변사 낭청 12인이 실무를 담당하였다.
이처럼 비변사는 국왕과 원활히 소통하면서 국정 현안을 의결하고 나아가 시행을 지휘하는 강력한 관서로 기능하였다. 그 결과 의정부는 기능을 상실하였으나, 대신 특히 수상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지게 되었다. 비변사의 강화는 상대적으로 왕권의 약화를 의미하였다. 이러한 비변사에 의한 문무 고관의 합의제는 고종 초까지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의정부의 정부 최고기구로서의 권위는 형식상으로나마 갑오개혁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조 전랑 자대제는 문반 당하관의 인사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관직자가 자신의 후임자를 천거하여 사실상 왕권에 대해 자율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관행이었다. 여기에는 이조 전랑이 사림의 공론을 반영한다는 명분이 깔려 있었다. 이에 더해 삼사 관원을 임명할 때의 천거권도 이조 전랑이 행사하게 됨으로써 사림정치의 자율적 재생산과 정화 기능이 작동하게 되었다. 이로써 문무 고관이 합의제를 바탕으로 국정을 주도하는 비변사와 이조 전랑의 자대제 및 통청권의 연계 위에 작동하는 사림정치가 상호 견제하는 구도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사림세력이 여러 붕당으로 분열하여 대립하며 파행이 빚어지자 이조 전랑 자대제와 통청권이 혁파되면서 삼사의 비변사 견제가 어려워지고, 관직 사회의 자율정화 기능도 유명무실해졌다. 이에 따라 국정 운영에서 비변사를 통한 고위 관원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대신 중심 정치는 주71 정치의 성향을 띠게 되었다. 19세기에 왕권마저 약화되어 벌열을 통제하기 어려워지자 결국 외척들의 세도정치가 전개되었다.
2.2.3. 양반관료제의 특징
조선의 양반관료제가 지녔던 다음의 몇 가지 특징에서 조선 정치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로 과거를 중요시하였다는 점이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에 비해 고위 관직자에 음서 출신이 줄어든 대신, 과거 급제자 출신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것은 소수 문벌의 귀족 관료사회가 아니라 폭넓은 양반층의 관료사회를 지향하였음을 뜻한다.
둘째로 양반이 아니면 신분에 따른 승진의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양반은 당상관에까지 오를 수 있었으나, 기술관과 서얼은 당하관까지, 향리와 토관은 참상관까지, 잡직은 참하관까지만 승진할 수 있었다. 양반의 첩자손도 아버지의 품계, 첩인 어머니의 신분이 양인인가 천민인가 등에 따라 차등을 둔 승진 한계가 엄격하였다.
셋째로 문무 양반 가운데서 문관 우위가 뚜렷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유교 정치의 방향에 따라 자연히 문치주의로 기울어진 결과였다. 고위 무관직도 그 상당수를 문관이 겸직하였고, 군정(軍政)의 최고 관서인 병조가 동반직이었던 데다가 서반의 최고 군령(軍令) 관서인 오위도총부를 감독하였고, 오위도총부 도총관도 문관이 겸임하였다. 지방에서도 각 도의 관찰사가 그 도의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겸하였다. 또 수령도 해당 고을의 병력을 지휘하는 무관직을 겸하고 있었다.
넷째로 광범위하게 겸임제를 운영한 점이다. 당상관 중 핵심 인물은 주요 관서의 요직을 맡는 한편, 도제조와 제조 등의 직함으로 여러 하급 관서의 직책을 겸임하였다. 이러한 겸임제는 여러 관서 간의 직무상 연계성과 함께 인건비의 절감이라는 실리도 있었으나, 정치 권력이 소수에 집중되는 폐해도 있었다.
다섯째로 관직의 다양성이다. 주로 양반이 임명되는 동반직과 서반직에도 중급 이하 관직에는 중인도 나아갈 수 있었고, 무록관과 체아직, 영직(影職) 등을 두어 일반 양인까지도 관직을 받을 수 있었다. 대부분 체아직인 잡직에는 특수한 재능이 있는 양인과 하층민이, 토관직에는 평안도와 함경도의 토착 유력자가 나아갈 수 있있다.
누가 국왕이었는가, 대신과 재상을 비롯한 여러 중요한 직책을 어떤 사람들이 맡았는가에 따라 정치의 내용에 많은 차이가 생겨났다. 특히 국왕이 누구였는가는 중요한 변수였다. 제9대 국왕인 성종 때와 제10대 국왕 연산군 때의 정치를 살피면 같거나 비슷한 제도의 틀 위에서도 정치의 내용에 큰 차이를 낳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성종은 갑자기 왕위 계승자가 되어 어린 나이에 즉위하였음에도 원만하게 정치를 행하여 신료들로부터 훌륭한 군주로 평가받았으나, 성종의 아들로 11년이나 세자로 있다가 왕위를 계승한 연산군은 전제정치를 행하다 신료들이 일으킨 ‘반정(反正)’에 의해 왕위에서 쫓겨난 것이다.
그 한편 나이 어린 국왕이 즉위하여도 또 폭군으로 군림하다 쫓겨나는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도 비교적 원만하게 국정이 운영되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제15대 국왕인 광해군 또한 대다수 신료의 정치적 의사와 반대되는 정치행위를 하였다가 반정에 의해 왕위에서 쫓겨났다. 이처럼 신료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새 국왕을 옹립하면서 그 이름을 ‘왕위를 정당한 계승권자에게 되돌려 준다’는 뜻으로 반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사실도 조선 정치사의 특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
2.2.4. 중앙집권체제
2.2.4.1. 부국강병과 중앙집권체제
조선은 중앙집권 국가였다. 고려 때에 이미 발달해 있던 중앙집권체제가 조선으로 왕조가 교체된 뒤 더욱 강화되었다. 중앙집권체제가 발달한 요인은 주변의 강력한 외적이 침입하면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여 대처해야 하였던 데에 있었다.
그러나 고려의 중앙집권체제는 그 말엽에 이르러 매우 느슨해져 있었다. 국가의 경제력이 권문세족에게 분산됨으로써 주72을 갖추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원들에게 녹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많은 고을에서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호적도 새로 작성하지 못하였다. 국방력의 약화는 잦은 적침을 초래하여 인구이동을 비롯한 사회의 불안정성을 키웠고, 그 결과 국방력을 쉽게 강화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빚었다.
조선 건국을 주도한 세력은 고려 말엽에 대한 반성에서 부국강병을 기치로 내세웠고, 이를 위해 중앙집권체제의 강화를 추진하였다. 부국강병을 강조하는 기조는 권력 집단의 교체나 정치 세력의 성격 변화에 따라 강화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였으나, 상품화폐 경제가 차츰 발달해 감에 따라 중앙집권체제는 대체로 더 강해지는 추세를 보였다. 조선의 중앙집권체제와 관료제도 모두 전근대사회 왕조 국가로서는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근대국가의 제도가 요구하는 수준과는 거리가 멀었다.
관료제도와 중앙집권체제의 전근대적 역사성은 1876년 개항할 때는 물론이고 그 뒤에도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상당 부분 유지되었다. 전근대적 정치를 벗어나기 위한 모색은 부족하기는 하나 주73들이 제시한 바 있고, 19세기 동안 전개된 여러 민중항쟁은 더 뚜렷하게 새로운 수준의 정치제도를 요구하였다.
양반관료 가운데서도 유교 문명을 지키면서 제도 변혁을 추구하거나 입헌군주제를 모색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정치세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생들은 대체로 전통적 양반관료제를 고수하고자 하였다.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이렇게 다양한 정치적 욕구가 분출된다는 것은 기존의 양반관료제도와 중앙집권체제로는 국가 주권을 수호하기 어려워졌음을 의미하였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부터 근대적 내용을 갖추어 갔으나, 관료제도와 중앙집권체제의 본질적 혁신을 추구하지는 못하였다. 1897년 고종이 황제를 표방하여 국호를 바꾸고 광무개혁을 추진하여 여러 부문에서 근대로의 변화가 진행되었으나, 정치적 변화는 미진하였다. 관료제도 또한 겉모습은 근대적으로 바뀌는 듯하였으나 본질을 크게 바꾸지는 못하였다. 특히 황제가 전근대 군신관계를 바탕으로 한 정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근대적 중앙집권체제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조선은 중앙집권체제를 정점인 국왕으로부터 중앙과 지방의 관료기구를 거쳐서 각각의 호(戶)에 이르도록 조직하였다. 예컨대 군현제가 일원화한 것은 조선시대에 와서였다. 이에 따라 속군 · 속현을 없애고 중앙에서 수령을 모든 군현에 직접 파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향 · 소 · 부곡 등 특수 행정구역도 제도상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조선의 중앙집권체제 또한 수준이 높았으나 근대국가의 중앙집권체제와는 큰 차이가 있었고, 조선 건국 무렵의 핵심 관원들은 고려 말엽의 정치가 몇몇 인물에 좌우된 것에 대한 반성에서 법률과 제도를 잘 갖추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였다.
2.2.4.2. 지방 통치와 행정
조선은 명절 등에 왕실에 물품을 이바지할 때에는 중국식 봉건제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이를 제외하면 철저하게 군현제 방식으로 지방을 통치하였다. 지방통치체제는 태종 때에 전반적인 개편을 마쳤으나, 조선왕조 내내 부분적인 변천이 진행되었고, 대한제국 때 일본의 보호국이 된 상태에서 통감부에 의해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2.2.4.2.1. 도제와 군현제
지방 통치를 위해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아래 330여 고을이 소속되었다. 고을은 부(府) · 대도호부(大都護府) · 목(牧) · 도호부 · 군 · 현으로 등급을 구분하였고, 각각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지방관 곧 수령의 명칭은 각각 부윤 · 대도후부사 · 목사 · 도호부사 · 군수 · 현령 · 현감이었다. 각 도에는 관찰사를 파견하였다.
각 고을의 등급은 주로 인구의 많고 적음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고려에서 이어진 속현과 향(鄕) · 소(所) · 부곡(部曲) 등의 특수 행정구역은 태종 때의 지방제도 개편 이후 제도로서는 거의 모습을 감추었다. 그러나 실제 고을의 관할 구역 중 주74나 월경지(越境地)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의 상당수는 향 · 소 · 부곡의 자취였다. 개성부는 유수(留守)가 다스린 중앙 직할 지역이었다. 후기에는 광주(廣州) · 강화 · 수원에도 유수를 두어, 개성과 함께 4도(四都)라 하였다.
관찰사는 도내의 각 수령을 감독할 임무를 띠고 행정과 사법을 총괄하였고,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도 겸하여 군사권까지 장악하거나 감독권을 행사하였다. 그 까닭에 관찰사는 출신지에 임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고, 임기도 1년으로 제한하였다. 본래 관찰사의 주임무는 관내의 각 고을을 순회하며 감찰, 감독하는 일이었으므로 순찰사(巡察使)까지 겸하게 되었다. 관찰사의 보좌관인 도사(都事)는 관내 수령의 부정 규찰과 과거 실시를 관장하였고, 판관은 관찰사가 겸직하는 고을의 행정을 담당하였다.
각 고을의 수령은 고을의 등급에 따라 종2품에서 종6품까지 품계의 차이가 있었는데, 원칙적으로 수령 사이의 상하관계는 인정되지 않았다. 수령은 모두 담당 고을에서 행정권과 사법권을 행사하였고, 진관체제를 시행하면서 주75 이하의 군사 직함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수령의 임기는 3년이고, 역시 출신지에는 임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나이든 부모를 모시도록 옆 고을에 임명하는 일은 있었다. 수령에 대한 관찰사의 근무 평가는 승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관찰사와 수령 밑에는 중앙의 육조체제를 본떠 육방(六房)을 두고 아전을 소속시켜 지방 행정의 실무를 담당하게 하였는데, 흔히 향리라 하였다. 향리는 수령과 백성의 중간에 위치하여 고을의 주요 사무를 처리하였다. 수령의 하부기구로는 향리 외에 군사적 업무를 맡는 군교(軍校)와 사령(使令) 등이 있었다. 고을 향리의 대표는 호장(戶長)이었고, 이방과 형방이 육방 중 실속이 커서 이들을 삼공형(三公兄)이라 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관청의 기강이 엄하여 향리의 부정부패가 적었으나, 중기 이후 기강이 해이해지면서 향리가 수령과 결탁하거나 수령 모르게 사욕을 채우는 일이 많았다. 향리로 복무하는 댓가가 없는 제도상의 결함이 부정부패의 근본 원인이었다. 중앙에서는 관찰사나 수령의 부정, 토호의 불법, 민생의 상황 등을 살피기 위해 주76을 지방에 파견하는 일이 많았다. 암행어사는 뒤에 이것이 제도화된 것이다.
각 고을은 면으로 구분되고, 면은 이(里) 또는 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만 원이 지배한 적이 있던 함경도와 평안도에는 면 대신 사(社)나 방(坊)으로 구분한 곳들이 있었다. 면은 처음에는 동서남북 방위별로 4개 면을 두어 이와 촌을 묶는 중간 단위 구실만 하다가, 공법(貢法)이 시행되면서 주77을 결정하는 단위로 구실을 하였다. 17세기 이후 인구가 크게 증가한 고을에서는 이였던 단위가 면으로 승격하고 그 내부에 여러 이가 새롭게 들어서는 변화가 일어났으나, 그렇지 못한 고을에서는 북면 등 방위면의 이름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조선은 특정 지역에 토관을 둔 적이 있었다. 평안도의 평양, 영변, 의주, 강계와 함경도의 영흥, 경성, 그리고 육진(六鎭) 지역과 제주도에 토관을 두었다. 이들 지역은 고려말에 원의 지배 아래로 들어갔다가 조선의 영토가 된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토관은 그 지방의 토착인 중에서 유력한 사람을 임명하여 지방 행정의 효율화와 군사적 방어 조직을 강화하려는 회유책의 하나였다. 세조 때에는 경주와 전주, 개성 등에도 토관을 둔 적이 있었으나, 곧 폐지하였다. 토관직은 동반과 서반 각각 정5품에서 종9품까지 있었다. 이러한 토관제도는 조선 중기에 접어들면서 폐지되고, 토관직은 향리로 대체되었다.
2.2.4.2.2. 경재소와 유향소, 향청
중앙 정권은 지방통치체제와 수령을 통해 중앙집권적으로 지방을 통제하려 한 데 비해, 지방의 사족은 자치적 재량을 요구하고 있었다. 고려 말기 이래로 지방 사족들이 각 지방에 유향소(留鄕所)를 둔 것은 그러한 요구의 발로였다. 초기에는 중앙의 통제력이 강해 유향소가 두 차례나 혁파되었다가 허용되기도 하였다. 1410년(태종 10)에 혁파된 유향소는 1428년(세종 10)에 복구되었으나, 1467년(세조 13) 또 전국적으로 모두 폐지되었다가 1471년(성종 2)에 다시 허용되었다.
한편 중앙 정권은 현직 관료에게 연고지의 유향소를 통제하게 하는 경재소(京在所)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경재소는 정부와 지방의 중간에서 연락을 하고 지방 일을 주선하는 동시에 향소와 함께 수령을 견제하기도 하였다. 경재소에는 서울에 있는 그 지방 출신의 현직 관료가 배속되었으나, 뒤에는 그 지방과 연고를 가진 서울의 유력자가 맡기도 하였다.
유향소가 부활하여 제도로서 공인된 임무는 풍속의 규제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군현 안의 각종 조세의 배정과 주관 등의 일에 수령을 보좌하는 일을 맡았다. 따라서 초기 이래 면 · 이(里)까지 중앙집권적으로 통제하고자 한 원래의 의도는 좌절되었다.
유향소의 후신인 향소는 향청(鄕廳)이라고도 하였다. 여기에서는 지방의 양반 중에서 덕망 있는 자를 뽑아 좌수(座首)라 하고, 그 밑에 여러 명의 별감(別監)을 두었는데, 임기는 대개 2년이었다. 향소 역시 육방으로 나누어, 좌수가 이방과 병방을 맡고, 좌별감이 호방과 예방을, 우별감이 형방과 공방을 각각 분담하는 것이 통례였다. 향소의 기능은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 제도가 가장 발달한 곳은 영남이었다. 그 중에서도 안동은 중앙의 요직을 역임한 자가 향임을 맡는 풍속이 있었다.
향소의 기능을 뒷받침해주는 지방 자치규율로 향약(鄕約)이 있었다. 중국 남송의 주자(朱子)가 정리한 향약을 모범으로 삼아 중종 때 김안국 등 기묘사림에 의해 처음 시행되었다. 그 뒤 이황(李滉)의 예안향약(禮安鄕約), 이이(李珥)의 서원(西原) 및 해주(海州) 향약 등이 행해지면서 전국에 파급되었다. 향약의 4대 강령인 이른바 좋은 일은 서로 권하고[德業相勸], 잘못은 서로 규제하며[過失相規], 예속은 서로 교환하며[禮俗相交], 어려움은 서로 돕자[患難相恤]는 것은 유교의 도덕규범을 지방 자치규범으로 적용한 것이었다.
1603년(선조 36)에 경재소가 혁파되면서 지방 사회의 질서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이 조처는 중앙 관료의 지방 사회에 대한 지배권을 배제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지방 사림이 지방자치권을 장악하자 향소와 서원 사이에 향권을 다투는 이른바 향전(鄕戰)이 벌어져 마침내 서원이 사림의 구심기관이 되었다.
조선 초기의 면리제는 방위면제(方位面制)였고, 후기에 이르러 보다 정비, 발달되었다. 면에는 면장이 있어 행정을 집행하였는데, 면임(面任) · 풍헌(風憲) · 약정(約正) · 방수(坊首) 등 다양한 호칭으로 불렸다. 면 밑에는 이 · 초 · 동이 있는데, 그 장도 이정(里正) · 동수(洞首) 등 여러 가지 호칭이 있었다. 또, 이 이하에는 오가작통(五家作統)의 조직이 행해지기도 하였다.
이 밖에 향리 한 사람을 서울에 상주시켜 해당 고을에서 중앙 관아에 들이는 공물 따위의 일을 맡게 하였는데, 이를 경저리(京邸吏) 혹은 경주인(京主人)이라고 하였다. 경재소가 품관에 의해 운영된 데 비해 경저리는 향리였으므로 신분상 큰 차이가 있었다.
경저리의 주요 임무는 공물 상납 외에 해당 고을의 선상(選上) 노비가 소속 중앙 관아에 가서 일하도록 하는 일 등이 있었다. 수령이 새로 임명되어 그 고을에 부임할 때에도 경저리가 먼저 비용을 대고 뒤에 고을에 비용을 청구하여 받았다. 경저리에 대해서 감영이나 병영, 수영에 파견된 고을의 향리를 영저리(營邸吏) 혹은 영주인(營主人)이라고 하였으며, 이들 또한 고을에서 감영 등에 바치는 공물 납부 따위의 일을 맡았다.
2.3. 사법제도
2.3.1. 사법기관과 형벌
조선의 사법권은 근원적으로는 국왕에게 귀속하였다. 국왕이 사법 절차에 개입하는 일은 많지 않으나,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국왕이 개입할 수 있었다. 중국처럼 조선도 국왕이 권력을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관념이 지배하였는데, 이때 하늘은 모든 생명체가 본성에 따라 잘 살아가도록 돌보는 존재였다.
여러 생명체 가운데서도 사람, 곧 백성이 가장 중요하여 국왕의 임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목민(牧民), 곧 백성을 기르는 일이었다. 국왕에게는 백성을 기르는 권한과 책임만이 아니라, 하늘이 정한 질서를 어기는 백성을 처벌할 권한과 책임도 부여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사법권이 근원적으로 국왕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보는 논리였다.
조선의 사법 행위에서 반드시 국왕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은 지배층의 범죄와 관련된 것과 사형으로 판결이 난 것들이다. 이로부터 지배층이 죄를 짓고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죄에 비해 가벼운 처벌에 그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배층이 처벌받지 않거나 가볍게 처벌받을 특권은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었다.
조선은 명의 형률인 『대명률』과 『경국대전』 「형전」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사법제도를 운영하였다. 그리고 『대명률』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 대명률직해』를 편찬하여 그 내용에 따라 시행하였는데, ‘팔의’라는 조항에 죄를 지었더라도 처벌을 면제하거나 줄일 대상을 규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왕의 친족과 외척, 오랜 친구, 공신, 현인군자로 칭송받는 인물, 유능한 관원과 장수, 고위 관원 등은 죄를 지었더라도 왕명으로 사법기구에서 신문하거나 처벌하는 절차에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다. 이와 반대로 국왕의 눈 밖에 나면 국왕의 의지에 따라 누구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다.
조선의 사법은 행정과 분명히 구분되지 않고 긴밀히 결합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가벼운 수준의 사법권은 모든 관아가 행사하였다. 중앙에서는 형조 · 의금부 · 한성부 · 사헌부 · 장례원(掌隷院) 등이 각각 집중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였고, 지방에서는 관찰사와 수령이 각각 그 관할 구역 안의 사법권을 행사하였다. 현재의 사법기관에 가까운 기능을 한 것은 형조와 의금부뿐이었다.
형조는 사법의 감독기관인 동시에 복심(覆審)의 재판기관이었다. 의금부는 왕명을 받아 특수 범죄를 다루는 특별 재판기관으로서 왕족의 범죄, 국사범 · 반역 · 주78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 주79의 죄, 오래 판결하지 못한 사건, 사헌부가 탄핵한 사건 등을 다루었다. 한성부는 서울의 일반 행정과 함께 경찰 업무를 맡는 동시에 전국 토지 · 가옥 · 묘지 등의 소송을 담당하였다. 조선시대 당시에는 형조 · 의금부 · 한성부를 통틀어 삼법사(三法司)라 하였다. 사헌부는 규찰과 탄핵 등 감찰 업무를 맡았고, 장례원은 노비에 관한 문서와 소송을 맡았다.
감옥으로는 전옥서(典獄署)가 있고, 경찰로는 중앙에 포도청(捕盜廳), 지방에 진영장(鎭營將)이 겸하는 토포사(討捕使)가 있었다. 그리고 위법자를 직접 체포, 구금할 수 있는 기관을 직수아문(直囚衙門)이라 하였다. 중앙의 병조 · 형조 · 한성부 · 사헌부 · 승정원 · 장례원 · 종부시(宗簿寺)와 지방의 각도 관찰사 및 수령은 피의자를 직수할 수 있었고, 그 밖의 각 관서와 군문(軍門)은 형조에 통고한 뒤에 구금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형벌은 『대명률』에 따라 사(死) · 유(流) · 도(徒) · 장(杖) · 태(笞) 등의 5종이 있었다. 사형에는 교(絞)와 참(斬) 외에 사약(賜藥)이라는 독살, 주80 · 주81라는 사체 절단 등 극히 잔인한 방법도 있었다. 유형은 유배지의 원근으로 형의 경중을 구분하는데 정치범에 많이 적용하였다. 유형은 흔히 유양 또는 유배라 하였고, 유배지는 보통 육지에서 먼 섬이나 북쪽 국경지역, 남해안 지역 등으로 정하였으나, 때로는 경기 등 가까운 곳으로 정하기도 하였다. 도형(徒刑)은 먼 곳에 있는 염장(鹽場), 철소(鐵所) 등에 보내 중노동에 복역시켰다.
2.3.2. 형률과 소송
형벌은 『경국대전』 형전조(刑典條)에 따랐으나, 이는 『대명률』을 참고하여 제정한 것이므로 『대명률』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였다. 형사 소송에 있어 각 아문은 태 이하의 죄를 직결할 수 있고, 형조와 관찰사는 유 이하의 죄를 직단(直斷)할 수 있되 그 이상의 중죄는 각각 상급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하였다. 사형은 서울이나 지방을 막론하고 의정부에 보고하여 형조가 재심한 뒤 다시 국왕에게 보고하고, 의금부에서 3심(三審)하는 절차를 밟았다. 재판에 불복이 있을 때, 절박한 사건이면 즉시 다른 기관에 갱소(更訴)할 수 있었다.
일반 사건은 그 재판을 담당한 관리가 바뀐 뒤 2년 이내에 갱소할 수 있었다. 이 갱소는 중앙은 주82에게, 지방은 관찰사에게 상소하였다. 만일 거기서도 불복이 있으면 의금부의 신문고를 쳐서 국왕에게 직소할 수 있었다. 장(杖) 이상의 범죄는 수금(囚禁)하되 신분에 따라 구속 절차에 경중이 있었다. 단죄(斷罪)의 증거로는 피의자의 자백을 가장 중시하였다. 자백을 받기 위해서는 신체적 고문이 공인되었다. 서민 및 도죄(盜罪) 이외의 고문은 상사의 지휘를 받아서 하였다. 살인사건은 주83』을 전거로 검시(檢屍)하였다.
범죄 심리에는 죄질의 경중에 따라 결옥일한(決獄日限)이라는 기한의 제한이 있었다. 즉, 사형 등 대사에는 30일, 도(徒)나 유(流) 등 중사에는 20일, 장(杖)이나 태(笞) 등 소사에는 10일을 일한으로 하였다. 민사는 일정한 성문 규정이 드물었으므로 대개 관습에 따랐고, 분규의 해결도 대개 행정관의 재량에 맡기는 일이 많았다.
친족 등 가족제도에 관한 일은 유교의 예법이 그 기초가 되었다. 상속은 봉사(奉祀)의 계승을 중시하여 주84’의 관습과 법규가 발달하였다. 물건의 등기, 토지 · 가사(家舍) 및 노비의 매매는 100일 이내, 상속은 1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었다. 민사의 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증빙문서를 제출하고, 쌍방이 재판정에 함께 출두하여 구두로 변론하되 그 기한을 정하였다. 판결의 확정 과정에서 동일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옮기면서 세 차례까지 소(訴)를 올릴 수 있으나, 송사(訟事) 중 2차 패소한 것은 다시 소를 올릴 수 없었다.
2.4. 군사제도
조선의 위정자들은 고려가 멸망한 큰 원인 중 하나가 연이은 외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고, 강력한 군대를 갖추고자 노력하였다. 그 한편 병력이 반란에 이용되는 것을 막는 데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다. 조선 초기에 군령체계를 자주 바꾼 것은 그 때문이었으며, 장수가 특정 군대를 장기간 지휘하지 못하도록 자주 교체하였다. 초기에는 군사제도 운영에서 국방의 비중이 컸으나, 임진왜란을 겪은 뒤 중앙 정권의 보호에 치중하는 변화가 있었다. 병력은 크게 육군과 수군으로 나뉘어 있었고, 본래 기병이 육군의 주력을 이루었으나, 차츰 보병 중심으로 개편되었다.
2.4.1. 중앙의 군사 조직과 지휘
조선 초기의 군령(軍令) 기관인 의흥삼군부는 삼군진무소로, 다시 주85로 개편되었다가 1466년(세조 12)에 오위도총부로 정비되었다. 부대 조직도 처음의 10위(衛)에서 10사(司)로, 다시 12사로 바뀌고, 문종 때 5사가 되었다가 1457년에 오위로 정비되어 오위제도가 갖추어졌다.
군사 기구 중 군령 계통은 중추부 계열, 오위도총부 계열, 병조 계열 등의 사이에 변동이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1464년에 이르러 오위도총부가 병조의 감독을 받게 되면서 병조가 군령의 최고 기관이 되고, 중추부는 실권 없는 기관으로 전락하였다. 따라서, 서반으로 볼 때는 오위도총부가 실질적인 최고 관서였다.
『경국대전』에 나타난 오위의 편제는 대체로 주86과 지방 분담으로 구성되었다. 중앙군을 이루는 병종의 편제는 의흥위(義興衛)에 갑사(甲士)와 보충대(補充隊), 용양위(龍驤衛)에 별시위(別侍衛)와 대졸(隊卒), 호분위(虎賁衛)에 족친위(族親衛) · 친군위(親軍衛) · 팽배(彭湃), 충좌위(忠佐衛)에 충의위(忠義衛) · 충찬위(忠贊衛) · 파적위(破敵衛), 충무위(忠武衛)에 충순위(忠順衛) · 정병(正兵) · 장용위(壯勇衛) 등이 소속되어 입직(入直)과 시위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오위는 각기 지방의 병력을 분담, 관할하였다. 의흥위는 서울의 중부와 개성부 및 경기 · 강원 · 충청 · 황해도의 병력을 관할하고, 용양위는 서울의 동부와 경상도를, 호분위는 서울의 서부와 평안도를, 충좌위는 서울의 남부와 전라도, 충무위는 서울의 북부와 함경도의 병력을 각각 관할하였다. 또한, 오위의 각 위는 중 · 좌 · 우 · 전 · 후의 5부(部)로 나누어 전국의 진관(鎭管)을 망라한 지방 군사를 소속시켰다. 따라서 오위체제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즉, 중앙군을 망라한 구체적 부대 조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87 등에서 가동하는 전국을 망라한 훈련 체제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오위의 군계급과 정원 및 품계는 『경국대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데, 이는 오늘날의 계급 개념과는 다른 것이었다. 즉, 상호군(上護軍, 정3품) 9인, 대호군(종3품) 14인, 호군(정4품) 12인, 부호군(종4품) 54인, 사직(司直, 정5품) 14인, 부사직(종5품) 123인, 사과(司果, 종6품) 15인, 부장(部將, 종6품) 25인, 부사과(종6품) 176인, 사정(司正, 정7품) 5인, 부사정(종7품) 309인, 사맹(司猛, 정8품) 18인, 부사맹(종8품) 483인, 사용(司勇, 정9품) 42인, 부사용(종9품) 1,939인 등이 그것이다.
서반의 군직은 거의 서반 체아직이었다. 그것도 그나마 갑사(甲士) · 별시위 · 족친위 · 친군위 · 충의위 · 충찬위 등의 병종에만 주고, 충순위 · 정병 · 파적위 · 보충대 등의 병종에는 주지 않았다. 팽배 · 대졸 · 장용위 등의 병종에는 서반 잡직 체아직을 주었다. 한편, 서반 체아직은 오위의 병종이 아닌 선전관 · 겸사복(兼司僕) · 내금위(內禁衛) · 주88 · 태평소(太平簫) · 파진군 등의 병종과 군병이 아닌 여러 잡직에도 주었다.
오위의 상하 조직과 각 지휘관은, 위(衛, 衛將)―부(部, 부장)―통(統, 통장)―여(旅, 旅帥)―대(隊, 隊正)―오(伍, 伍長)―졸(卒) 등과 같았다. 위는 5부, 부는 4통, 통은 약간의 여, 여는 5대, 대는 5오, 오는 5졸과 같이 대체로 다섯씩을 묶어 올라가는 편제로서, 이것은 진법(陣法)을 바탕으로 하는 군사 조직이었다.
그러나 오위제도는 이미 임진왜란 이전에 해이해져서 정작 왜군이 침입하였을 때는 무력함을 드러내었다. 때문에 왜란 중에 포수(砲手) · 사수(射手) · 살수(殺手) 등 주89이라는 특수 부대를 훈련, 양성하는 훈련도감(訓鍊都監)이 신설되었다. 이것은 명의 주90이 주91』라는 병서에서, 왜구 방어를 위해 절강군(浙江軍)의 병술로 개발한 것을 본받은 것이었다.
그 뒤 1624년(인조 2)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서울과 경기 지방의 경비 강화를 위해 총융청(摠戎廳)을 두어 남양 · 수원 · 장단 등의 군사를 통솔하게 하고, 경기 안의 속오군(束伍軍) 중 용맹한 자를 뽑아 이 군영에 배속시켰다. 그리고 인조 초에 남한산성을 쌓고 1626년(인조 4) 그 안에 수어청(守禦廳)을 신설하여, 광주(廣州)와 그 인근의 여러 진을 경비하게 하였다.
1652년(효종 3)에는 어영청(禦營廳)을 신설하여, 총포병과 기병(騎兵)을 주력으로 하는 부대를 편성하였다. 또, 1682년(숙종 8)에는 도성의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금위영(禁衛營)을 신설하였다. 이상의 훈련도감을 비롯하여 총융청 · 수어청 · 어영청 · 금위영을 5군영(五軍營)이라 하고, 주로 서울과 경기 지방의 방위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로써 중앙의 오위군제가 후기에 이르러 5군영제로 바뀌었다.
2.4.2. 지방의 군사 조직과 지휘
지방의 군사 지휘체계는 진관체제(鎭官體制)로 조직되었다. 즉, 각 도의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가 있는 곳을 주진(主鎭)이라 하고, 그 아래에 몇 개의 거진(巨鎭)을 두었다. 그리고 그곳에 절제사 및 주92를 두어 각각 이를 관장하게 하였다. 거진 아래의 주93은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 만호(萬戶) · 절제도위(節制都尉)가 관장하였다.
병마절도사는 약칭으로 병사(兵使)라고 하며, 경기도 · 강원도에는 각 1인을 두어 관찰사가 겸임하도록 하였다. 충청도 · 전라도 · 황해도 · 평안도에는 각 2인을 두어 그 중 하나는 관찰사가 겸임하고, 또 하나는 전임의 병사를 두었다. 경상도 · 함경도에는 각 3인을 두어 하나는 관찰사가 겸임하고 나머지 2인은 전임 병사를 두었다.
수군절도사는 약칭으로 수사(水使)라고 하며, 강원도와 황해도에 각 1인을 두어 관찰사에게 겸임하도록 하였다. 평안도에는 2인, 함경도에는 3인의 수사를 두었는데, 그 중 하나는 관찰사가 겸임하고, 나머지는 병사가 겸임하였다. 경기도와 충청도에는 각 2인, 경상도와 전라도에는 각 3인의 수사를 두었는데 하나는 관찰사가 겸임하고, 나머지는 전임 수사를 두었다.
관찰사가 겸임한 병사를 겸병사(兼兵使)라 하였다. 관찰사와 병사와의 관계는 직품이 둘다 종2품이었으나, 관찰사는 행정권 · 사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흔히 직품 이상의 고관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연히 겸병사는 단병사보다 우위였다.
수사의 경우는, 수사의 직품이 정3품으로 관찰사보다 낮았으므로 관찰사가 겸임하는 수사에 비해 단수사의 지위는 더욱 낮았다. 거진의 절제사 · 첨절제사나 제진의 동첨절제사 · 만호 · 절제도위 등은 거의 각 지방 수령이 겸임하였다. 중종 때 이래로 해이해진 진관체제를 보강하는 방안으로 제승방략(制勝方略)이라는 주94이 시행되었다. 이것은 유사시에 각 고을의 수령이 소속 군사를 이끌고 본진을 떠나 배정된 방어 지역으로 가서 싸우는 제도이다.
2.4.3. 군역
조선시대의 병종은 크게 특권층 자제에게 특전을 주어 편성한 병종, 주95로 선발한 직업 군인, 양인의 의무 병역 등으로 분류된다. 특권층 자제의 병종은 왕실의 먼 친척, 대신의 자제, 공신의 자손 등으로 구성된 족친위 · 충의위 · 충찬위 · 충순위 등으로서 처음부터 군사력을 기대하지 않은 것이었다. 무예를 시험 보아 뽑는 갑사 · 별시위 등의 병종은 최고 정예군으로서 서울의 시위와 평안도 · 함경도의 변경 수비를 담당하는 기간 병력이었다. 여기에는 무예에 뛰어난 양반 자제도 많이 소속되어 있었다. 팽배 · 대졸 등도 시취로 뽑는 병종이지만, 토목공사에 주로 동원되어 양인이 기피하는 병종으로 변하였다.
양인의 의무 병역에는 육군인 정병(正兵)과 수군(水軍)이 있었고, 이들이 전체 병력의 8할을 차지하였다. 양인의 의무 병역은 16세에서 60세에 이르는 정남(丁男)이 그 대상인데, 직접 병역 의무를 지는 자를 호수(戶首) 또는 정군(正軍)이라 하였다. 그리고 호수가 군역을 수행하는 데 경비를 뒷바라지하는 자를 봉족(奉足) 또는 보인(保人)이라 하였다. 당시 군역을 지는 데에 필요한 재정 부담은 호수와 봉족 또는 보인으로 구성되는 군호 단위로 스스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봉족제는 고려의 양호제(養戶制)를 계승한 것으로, 1464년(세조 10) 주96으로 개편되었다. 봉족제에서 호(戶) 단위이던 것이 보법에서는 인정(人丁) 단위로 개편되어 2인의 정남, 즉 2정이 1보(保)로서 군호의 기본 단위가 되었다. 봉족제는 호 단위였으므로 유력자는 한 가호 안에 수십 명의 솔정(率丁)을 가지는 폐단이 있었다. 보법으로의 개편은 이러한 은익솔정을 추쇄(推刷)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각 호의 솔정을 모두 군역 대상으로 편성하고 말았다.
또, 보법의 시행으로 노자(奴子)도 반정(半丁)으로 치고, 보인의 보포(保布)는 매월 포 1필 이하로 규제하였다. 그러나 보법은 호와 유리된 것이어서 뒷날 군역제도 붕괴의 요인이 되었고, 보포도 규제 이상으로 수탈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욱이 보인으로 정군을 대립(代立)시키는 경우도 많아, 부강한 호수 대신 빈약한 보인만이 군역을 담당하게 되어 군역제도의 기반마저 흔들리게 되었다. 원래 군역의 부과는 요역과는 별도였다. 그러나 성종 이후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 나타나고 방군수포(放軍收布)가 성행하면서 군역제도가 더욱 문란해졌다.
조선 후기에는 의무병역 제도가 무너져 점차 모병제(募兵制)로 바뀌었고, 지방에서는 사노비까지 징발하여 속오군을 편성하였다.
2.5. 조선 정치의 특성 - 통치와 지배 중심의 정치
조선의 정치는 대체로 안정적이었다. 이 사실은 조선이 전근대국가로서는 상대적으로 정치제도와 관료 조직을 잘 갖추고 있었던 점과 관계가 깊다. 태조로부터 순종에 이르기까지 27대에 걸쳐 국왕 또는 황제가 재위하였는데, 내전 수준의 군사적 충돌을 거쳐 왕위에 오른 이는 전혀 없었다. 건국 초기인 1398년(1차 왕자의 난=무인정사)과 1400년(2차 왕자의 난), 그리고 1453년(숙부의 난=계유정난)에 격렬한 왕위 쟁탈전이 일어났으나, 모두 승패가 빠르게 결정이 나고 물리적 충돌도 크게 벌어지지는 않았다.
3.1. 산업
조선의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농업이었다. 주민의 대부분 또한 농민이었다. 양반가도 스스로 농사를 짓는 경우는 물론이고 노비를 시켜 농사를 짓더라도 ‘스스로 농사를 짓는다’고 자처하였다. 일반 농민들은 지리적 환경 조건에 따라 사냥이나 어업을 병행하였고, 생필품의 많은 부분을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산업 구성의 변화 또한 농업의 발달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다. 15세기 말엽부터 지방 상업이 발달한 것, 17세기 말엽부터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로써 자급자족 경제 체제의 해체가 천천히 진행되어 갔으나, 개항 후에도 자급자족 경제 체제의 속성이 강하게 유지되었다.
3.1.1. 농업
3.1.1.1. 농경지와 수리시설
조선 초기 농업의 중심은 밭농사였다. 농경지의 70% 이상이 밭이었다. 벼도 밭에서 재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로부터 논농사의 비중이 점차 커져갔다. 곡물로 보면 벼농사와 콩농사가 중심이었다. 국가 차원에서 부국강병을 위해 권농정책을 시행하면서 벼와 콩의 재배를 강제한 결과였다. 콩은 장을 담그는 데 필수 재료인 한편, 군사적으로는 말먹이로 중요하였다. 조선 초기의 군대는 기병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15세기는 14세기 후반의 외침과 대규모 인구이동, 그에 따른 대량의 황무지가 발생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 농업생산 기조를 잡아나가던 시기였다. 농민들의 생존을 위한 노력과 국가의 권농정책이 주요한 작용을 하여 주97 개간이 이루어짐으로써 빠른 속도로 농경지가 증가하였다. 당시 진황지는 주로 하삼도(충청, 전라, 경상도) 해안지역에 자리하였던 까닭에, 새로 개간하는 농경지는 논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농업기술의 발전과 수리시설의 확대, 보와 같은 새로운 수리시설의 등장도 농업생산의 증대에 크게 작용하였다. 15세기 중엽 이후 진행된 안정적인 농업생산의 성장 결과 16세기에는 토지소유의 분화가 심해졌다. 진황지 개간이 거의 마무리된 상황에서 산림(山林)과 천택(川澤)의 개간이 이어지면서 사유의 대상이 되는 토지도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15세기 후반부터 바닷가 갯벌을 막아 간척하는 ‘ 언전(堰田)’이 본격적으로 개발되었다. 언전은 14세기에 등장하기는 하였으나, 왜구 때문에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이제 진황지 개간이 끝나자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주체는 왕실, 훈척 등 대세력가들이었다. 이들은 다수의 노비노동력을 소유하고 수령 등의 도움을 받아 요역 노동 동원도 가능하여서 언전을 개발할 수 있었다. 일부는 토호(土豪)들이 만든 것을 탈취하여 자기 소유로 삼은 것도 있었다.
이와 아울러 소규모이나 새로운 형태의 농경지인 보전(洑田)을 개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는 산간지역에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 낮은 땅을 개간하는 방법으로, 중소지주들도 개간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 보전 또한 작게는 수십 명, 많게는 백여 명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하였으므로, 양반 사족이 아니면 하기 어려웠다.
논농사가 발달하여 그 비중이 커지는 현상은 14세기 무렵부터 본격화하였다. 바닷가 저지대를 활발히 개간하여 옥토로 인정받기 시작하였고, 농업생산에서 하3도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졌다. 이는 사회 및 정치에도 영향을 미쳐, 지배층이 주로 서울, 경기지역과 하삼도 지역에 분포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1432년)에 수록된 제(堤) 43개 가운데 38개가 하삼도, 그중에서도 주로 바닷가 지역에 자리하고, 나머지 5개는 경기와 황해도로, 역시 바닷가거나 섬(강화도)에 자리하였다.
제보다 규모가 작은 저수지 축조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1470년 무렵 간행한 『 경상도속찬지리지』에는 경상도의 저수지가 721개로 나타나며, 『 중종실록』에는 경상도에 800개, 전라도에 900개, 충청도에 500개의 제언(堤堰)이 있다고 기록하였다. 이 무렵 경상도의 논이 전체 농경지의 3분의 1이었다. 농경지 중 수리시설의 혜택을 보는 것은 약 5분의 1이었다. 하삼도 전체로 보면 6/10 정도가 밭이었고, 논은 4/10 미만이었다. 그러나 논에서 수확하는 것이 밭보다 배 정도로 계산하고 있었으므로, 수확물로 보면 논과 밭의 비율은 4:3 정도였다.
15세기 중엽부터는 보(洑)가 개발되어 관개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로써 논농사가 한층 활발해졌으나, 자연재해 특히 가뭄이 들 때 그 피해를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었다. 임진왜란 후 이모작을 위한 모내기가 보급되면서 보의 수리와 신축이 크게 증가하였다.
3.1.1.2. 논농사
세종이 뛰어난 농부들의 농업 기술을 널리 알릴 목적으로 정초(鄭招) 등에게 조사하여 편찬토록 한 『 농사직설』을 보면, 가장 좋은 논인 주98에는 일찍 수확하는 주99를 주100 방식으로 심고, 낮아서 항상 물이 고이는 곳이 중간 수준의 논으로, 이앙법(모내기)로 두 번째로 빠른 시기에 파종하여 수확하는 올벼인 차조도(次早稻)를 심고, 물 공급을 보장하기 어려운 하등의 논에는 늦벼를 심어 논에서 기르다가 가뭄이 오래가면 밭으로 바꿔 기르라고 하였다.
당시 모내기는 저습지에만 적용하는 농업 기술이었으나, 15세기 중반 이후의 기록에 나타나는 실상은 지대가 높아 물이 찬 곳에서 날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려 옮겨 심는 형태가 주류였다. 조선은 이 밖에 해안지역 개간과 관련하여 소금기에 강한 볍씨를 보급하였고, 가뭄에 대처하여 50일도(五十日稻)라는 단시일에 자라는 볍씨도 보급하였다.
17세기 이후 논농사는 직파법 중심에서 모내기 중심으로 바뀌었다. 모내기는 15, 16세기에 경상도 북부 일대와 강원도 남부에서 부분적으로 행해지다가 17세기 이후 충청도와 전라도로 확산되고, 18세기 전반에는 모내기가 가능한 곳에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당시 논의 7, 8할이 모내기를 하였다. 이렇게 17세기 이후 모내기가 빠른 속도로 확산된 이유는 임진왜란 때 많은 인구가 사망하거나 잡혀가 인력이 부족한 데다 농경지가 대거 파괴된 데 있었다.
새 논을 다시 개간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남아 있는 농경지를 최대한 집약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내기가 필연적이었다. 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에는 모판에 모를 기르는 곳 외에는 모두 보리 등을 심어 밭농사를 짓다가 물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되면 보리 등을 수확한 뒤 밭을 논으로 바꾸어 논농사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논에서 이모작을 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더해 모내기를 하면 김을 매는 데 드는 품도 절약할 수 있었다. 한편 모내기에는 수리 시설이 절실히 필요하였으므로 조선정부는 1662년(현종 3)에 제언사를 설치하여 지원하였고, 1772년(정조 2)에는 제언절목(堤堰節目)을 반포하였다.
이 시기 농업생산 기술의 발전은 전반적인 경제변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으며, 그 중심적인 변화는 논농사에서 이루어졌다. 결(結)당 생산량이 비옥한 땅에서는 최대 800두(斗)까지 생산되었고, 일반적으로 500두~600두는 생산되었다. 논농사에서의 식량 생산 증가가 인구 증가, 도시화 진전 등 사회적 변화의 기본적인 동력이었다.
3.1.1.3. 밭농사
밭은 대부분 주101을 하고 있었다. 다만 일부 산간 지역과 북부 지역은 주102이 잔존하였다. 밭농사는 농민의 생활에서 논농사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북부 지역에서는 논농사보다 밭농사의 비중이 훨씬 더 컸다.
대부분의 밭에서 1년 1작의 형태로 농사를 지었으나, 남부 지역에서는 2년 3작, 2년 4작도 하였다. 이 경우 주103를 통한 1년 2작과 엇바꾸기를 통한 2년 3작을 하는 일이 많았고, 사이갈이도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모두 농경지의 비옥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땅의 힘을 회복시키는 성능이 강한 콩과 작물과 깨 종류 작물을 섞어 재배하였다. 대표적 밭작물은 보리, 콩, 밀, 조 등이었고, 밭벼도 재배하였다. 콩과 작물은 콩과 팥, 녹두 등을 재배하였고, 밀과 기장, 수수, 모밀, 피 등도 길렀다. 기술적으로 밭농사는 16세기에 이미 중세의 최고 수준에 도달하여 있었으며, 이후로는 비료 주는 방법과 새로운 작물의 등장 등 부분적 발전에 머물렀다.
그러나 새로운 작물의 재배는 조선 사회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밭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새 작물은 목화였다. 목화는 재배하는 데 물이 많이 필요하였는데, 15세기 후반에 중부 이남 지역에서 목화를 보편적으로 재배하게 된 것은 수리시설이 보급된 결과 가능하였다. 면화 생산이 늘자 면포가 쌀과 함께 물품화폐로 기능을 하게 되었고, 나아가 마포(麻布) 대신 정포(正布)의 지위를 차지하였다. 면포와 쌀 가운데 기본 화폐의 기능을 한 것은 저장성이 더 높고 흉년에 가격 변동폭이 더 작은 면포였다.
16세기의 밭농사는 대체로 15세기 밭농사의 연장선에 있었다. 다만 한 군현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여러 작물이 재배되던 상태에서 점차 지역권에 따라 공통된 작물을 재배하는 양상이 확산되었다. 대체로 곡물 농사 중심지와 목화 농사 중심지 사이에서 농작물 교역이 이루어졌다. 17세기 이후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날씨가 추워지는 일이 잦아지자 고랑을 깊게 하여 보온 효과를 높이고, 이랑의 폭을 좁혀 집약적으로 농사를 짓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더 중요한 변화는 작물이 다양해진 데 있었다. 담배와 고추, 그 밖의 여러 작물이 재배되어, 상업적 농업이 발전하였다. 한 동안 담배는 대표적인 고소득 작물이었다. 도시 근교에서는 시장 판매를 위한 야채 재배가 활성화되었다. 감자와 고구마, 옥수수 등이 들어와 구황 작물도 많아졌다.
3.1.1.4. 농서와 농업 기술
15, 16세기에 이루어진 농업 기술의 두드러진 변화로 주104의 발전을 들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14세기부터 시작된 인분(人糞)의 사용이 확산된 것이었다. 가축을 기를 형편이 되지 않는 농민들도 인분을 삭혀 비료로 사용하면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었다. 누에똥과 깻묵으로 만든 금비(金肥) 사용이 증가하는 등 비료의 종류가 더 다양해졌고, 주로 농사를 짓기 전과 지은 후에 비료를 두는 방식인 기비법(基肥法)에서 바뀌어 농작물이 자라는 중간에 비료를 주는 추비법(追肥法)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휴한(休閑) 농법을 극복하고 해마다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고려 말에 원나라의 농서인 주105』가 간행되기는 하였으나, 우리 실정에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이에 세종 때 정초(鄭招) 등이 『농사직설』을 편찬하였다. 그 뒤 성종 때 강희맹(姜希孟)은 사철의 농작과 그 기술을 개설한 『 사시찬요』와 지금의 시흥 지방인 금양(衿陽)을 예로 농경 방법을 수록한 『 금양잡록』을 편찬하였다. 중종 때는 『 농사직설』의 보급을 위해 김안국(金安國)이 『농사언해』와 『잠서언해』를 간행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농서가 간행되었다. 효종 때 신속(申洬)은 『 농가집성』을 펴냈고, 숙종 때 박세당(朴世堂)은 『 색경』을 간행하였는데, 이는 밭농사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같은 시기에 홍만선(洪萬選)이 낸 『 산림경제』도 넓은 의미의 농서에 해당하고, 헌종 때 서유구(徐有榘)가 낸 『 임원경제지』는 후기 농서의 집대성이었다.
3.1.2.1. 토지 소유의 실상
『경국대전』에 정해진 토지제도 자체는 조선 말기에 이르기까지 개편되지 않았다. 그러나 임진왜란 후 그 실상은 여러 가지로 변모되었다. 직전(職田)은 소멸하였고, 왕실 소유 토지가 줄어들자 궁방전(宮房田)을 설정하였고, 황무지가 많아진 것을 기화로 삼아 관둔전(官屯田)을 확장하였고, 여러 둔전에 민전(民田)을 빼앗아 넣거나 투탁을 받는 일이 생기고, 양안에서 은결(隱結)이 급증하였다.
명종 때 실질적으로 직전을 폐지함으로써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제약은 더욱 약화되었다. 그러나 궁방전을 설정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국왕의 이름으로 아직도 초월적 토지 지배력이 행사되었음을 알려 준다. 궁방전은 임진왜란 이후에 설정되기 시작한 것으로, 1사(司) · 7궁(宮)이라 부르는 내수사, 수진궁(壽進宮) · 주106 · 어의궁(於義宮) · 주107 · 용동궁(龍洞宮) · 선희궁(宣禧宮) · 경우궁(景祐宮) 등 소속이었다.
궁방전은 갈수록 확대되었는데, 처음 절급(折給)된 토지, 궁방에서 사들인 토지, 공부세(貢賦稅)를 옮겨 부친 토지 등이 복잡하게 얽혀 운영상 혼란이 많았다. 그 때문에 『 속대전』에서는 관할권과 수세권을 함께 가지는 주108와 수세권만 가지는 주109의 토지로 정리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군영의 둔전을 비롯, 중앙 각 관서와 지방 관아의 관둔전이 날로 확대되었다. 관둔전도 처음에는 절수하여 설치되었으나, 민전을 뽑아들이는 폐단이 있었다. 숙종 때 이 폐해를 없애기 위해 값을 치르고 토지를 사들이는 정책으로 전환하였지만, 강제로 사들이는 폐단이 따르기도 하였다. 특히 주110는 사유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민전을 빼앗아 넣거나 투탁을 받는 일은 특히 궁방전과 관둔전에서 많이 벌어졌다. 이 현상은 국고수입원인 주111을 감소시키고 면세지를 확대시켜 재정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토지대장인 양안(量案)에 오르지 않는 은결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은결을 만드는 방법은 새로 양전을 할 때 관원과 결탁하여 토지 면적의 일부 혹은 전부를 빼내거나, 개간지를 황무지로 보고하거나, 신전(新田)을 보고하지 않는 것 등이었다. 조선 후기의 토지 결수가 세종 때의 160만여 결보다 항상 밑돌았던 주요 원인은 은결이 증가한 때문이었다.
양안을 분석한 연구에서 조선 후기의 토지소유 상태를 살펴보면 약 10% 내외의 부농이 전체 농지의 43%를 점유하고 있었다. 농업이 발달하면서 광작하는 부농과 농촌을 버리고 떠나는 이농민으로 농민이 분화하였다. 광작은 농업기술의 발달로 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짐으로써 가능하였는데, 이에 따라 경작지가 줄거나 경작지를 잃는 농민이 많아졌고, 이는 지주가 지대를 올릴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전호의 지주에 대한 신분 예속성도 다시 강화되었다.
개항을 하자 일본의 경제적 침투는 농촌에까지 미쳤다. 일본의 투자가는 조선 농민의 토지까지 매점하였다. 청일전쟁 후 일본의 대자본가에 의한 토지 약탈은 더 심해졌다. 1904년 일본의 황무지개척권 요구는 한국인 실업가들의 반대로 중지되었지만, 1907년 통감부의 압력에 의한 국유미간지이용법의 제정으로 일본인의 토지 약탈이 합법화되었다. 이후 일본 자본가들은 한국농업주식회사 · 한국흥업 · 한국실업 등 농업회사를 설립하여 조선에서 대농장을 경영하였다. 특히 1908년에 설립된 동양척식주식회사는 뒤에 가장 큰 지주로 성장하였다. 일본 농민의 이주와 자본가의 토지 투자 등에 의해 진행된 일본의 토지 약탈은 강점 후 ‘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더욱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3.1.2.2. 지주제와 농민
농장은 건국 초기에 한때 억제되었으나, 세종 · 세조 때에 점차 발달하다가 성종 때부터는 더욱 성행하였다. 조선 전기의 농장은 고려말의 농장과 달리 국가에 조세를 부담하는 법 질서 속의 토지지배 형태로 전환되어 있었다. 이후로도 권세 있는 양반들은 국가에서 내린 사전(賜田)을 비롯하여 황무지 개간, 강점 또는 투탁(投托), 장리(長利) 등 여러 수단과 방법을 통해 농장을 형성해 갔다. 그중에서도 농장을 이루는 가장 기본은 상속과 매득 및 개간이었다.
조선의 농장은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각지에 산재한 것이 특징인데, 아들과 딸 구별 없이 균분상속을 하였던 것이 원인이었다. 농장의 관리는 지주가 직접 하는 일도 있지만, 대개는 관리자를 따로 두고 있었다.
농장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주로 노비였으나, 차츰 전호 농민이 많아졌다. 지주들은 농장을 주112 또는 자작(自作)이라 하여, 지주 또는 관리인이 짠 농사 계획에 따라 노비 등을 동원하여 농사 과정을 관리 감독하며 짓는 것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이 가작제는 지주의 주거지 부근에 농경지와 노비가 함께 존재해야 가능하였다. 지주들은 가작을 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농경지를 팔고 주거지 부근의 농경지를 사고자 하였다.
지주가 관리 감독을 하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진 지역에 농경지와 노비가 함께 있을 경우 작개제(作介制)를 행하였다. 작개는 작개지(作介地)에서는 생산물 전체를 지주가 가져가고, 사경지(私耕地)에서는 생산물 전체를 노비가 가져가는 방식이었다. 15, 16세기의 농장 중에는 이 작개제로 농사를 짓는 곳이 꽤 많았다. 그러나 17세기 이후에는 차츰 장자 단독상속이 유행하고 노비의 도망도 심해져 작개제는 빠른 속도로 소멸하였다.
지주가 농경지는 있으나 농사지을 노비가 부족하거나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사용하였던 것이 병작(竝作)이었다. 병작제는 양인 농민에게 땅을 빌려주고 생산물의 반을 거두어가는 방식으로, 생산물 지대이자 정율(定率) 지대를 걷는 제도였다. 병작제는 고려 말엽에 발생하여 15, 16세기를 거치면서 점차 확대되었고, 17세기 이후에는 지주제 경영에서 중심을 이루어 갔다. 병작제에 의해 농사를 짓는 전호 농민은 자유농적 존재에 가까웠다. 그러나 종자와 여러 가지 전세(田稅)는 지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확 상황에 따라 지주의 수입이 변하기 때문에 지주의 간섭이 많았다.
정액지대인 주113에서는 농민이 자세한 내용을 지주와 계약하고 농사를 지어 지주의 감독권이 사라졌으나, 황무지를 처음 개간하여 위험성이 큰 경우에 주로 적용되었다.
3.1.3. 어업과 염업, 임업과 광업
3.1.3.1. 어업
조선은 영토의 3면이 바다이고 섬도 많은 까닭에 어업이 산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조선시대의 어업은 면화 재배의 확산에 따라 면망을 만들어 쓰게 되고, 제주도 어민과 해녀가 활동하면서 전보다 먼바다에도 나가 활동하고 물질을 하는 지역도 넓어지는 등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수산물의 종류는 다양하였고, 한반도 3면의 바다 전체에서 광범하게 영위되었으며, 어획량 또한 상당량에 달하였다. 조석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을 중심으로 주114 어업이 발달하였는데, 밀도가 낮을 뿐 동해안에도 어량이 존재하고 있었다.
19세기에 이르러 초엽에는 김을, 말엽에는 굴과 꼬막 따위를 양식하였다. 그러나 연안의 뻘과 바다로 개별적인 구획이 가능한 곳은 독점적 관리와 이용 또한 가능하여 대부분 권세가의 사유물이 되었다. 구획이 어려운 포안(浦岸)은 마을이 공동으로 점유하여 공동경영하였다. 어민이 자유롭게 어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은 원근해 어장이었으나, 기술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여 애로가 많았다.
어민은 대부분 어업을 전업으로 하지 않고 농사를 병행하며 살아갔다. 염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정이 비슷하였다. 그러나 국가는 이들을 어염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아 어한(漁漢), 염한(鹽漢)이라 부르며 양인이지만 천업에 종사하는 주115으로 규정하였다.
개항 후 어업은 외부, 특히 이미 자본주의 어업으로 바뀐 일본 어업의 침탈을 받으며 빠른 속도로 변모하였다. 조선의 어업은 일본에서 밀려오는 새로운 어법과 어선에게 침탈당하면서도 기존의 어업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다. 그 내용은 ① 연안에 고정시설을 설치하고 회유하는 고기를 포획하는 정치망 어업, ② 포 안의 암벽에 번식하는 미역 등 해조류를 채취하는 어업, ③ 해태를 중심으로 하는 양식업, ④ 중선(中船)을 주축으로 어선을 이용하여 회유하는 고기를 포획하는 어선어업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정치망 어업의 주종을 이루는 어장(漁帳)과 어전(漁箭)은 대개 권세가들이 사점한 것이거나, 수영(水營)이나 감영이 경영하는 것이었다. 채취어업은 포 안을 공동으로 차지하고 있는 어촌공동체가 공동경영하고 있었으며, 양식업은 몇몇 선구적인 어민들이 개별적으로 경영하고 있었다.
어선어업은 명태 · 조기 · 대구 · 청어 · 멸치 · 새우 등을 잡았고, 어선에서 조업할 노동력과 어선 · 어구 등을 갖출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어업계 등을 조직하여 영위하는 조합식 공동경영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이들은 선장 이하 화부(火夫)에 이르기까지 미리 정해진 몫에 따라 어획물을 분배받았다.
이상의 조선의 재래식 어업은 근대적 장비를 갖춘 일본 어선의 내침에 밀려나게 되었다. 개항 이전까지는 주로 통어(通漁)와 이주 형태로 조선의 바다를 침범하던 일본 어선은 1883년(고종 20)의 ‘재조선국일본인민통상장정’과 1889년의 ‘한일통어장정’에 의하여 합법적인 어업권을 얻게 되자, 먼바다에 그치지 않고 연안의 풍성한 정치망 어장과 유통과정까지 침탈하였다.
1888년에는 해산회사(海産會社)라는 어업 관련 기업이 처음 조선의 자본으로 설립되었다. 이 회사는 일본에서 어채 기구를 구입하여 새로운 어법을 시험한 뒤에 동남해 연안에서 조업을 시작하였고,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받으며 1890년에는 주116에도 진출하였다. 이 회사에 고용되어 있던 일본 어부가 256명, 임차된 어선이 22척이었으며, 조선의 주요 포구에 모두 지사를 설치한 거대 수산 기업이었다.
객주나 여각에 의해서 주로 유통되던 어물이 일본과 조선의 수산기업 소속 출고선(出賈船)에 의해 바다에서 직접 소비지 항구에까지 운반되자 어시장이 형성되었고, 그것을 경영하기 위하여 1903년 1월 자본금 60만 원으로 부산수산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그 뒤 마산 · 군산 · 인천에도 수산회사가 설립되었고, 1905년에는 소비지인 경성(京城)에도 주식회사 경성수산시장이 설립되었다.
3.1.3.2. 염업
조선에서 소금은 20세기 초 근대적인 천일제염방법으로 생산하기 이전에는 대체로 염전에 바닷물을 끌어들여 염분의 농도를 짙게 한 뒤 그 물을 길어 가마솥에 넣고 끓여 소금을 얻는 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다만 지리 조건이 염전을 만들기 어려운 곳에서는 바닷물을 길어 곧바로 가마솥에 넣고 끓였다. 이러한 방법은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하였고, 특히 땔감을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15세기 중엽에 이르러 왜구의 침입이 거의 단절되어 과거 폐지되었던 섬과 바닷가 고을들이 모두 다시 설치되자, 염전이 크게 확대되어, 차츰 이미 염전에서 어느 정도 소금 결정이 생기는 상태에서 바닷물을 길어다 소금을 굽는 쪽으로 발전해 가고 있었다. 소금을 굽는 일은 염한호(鹽漢戶)가 맡고 선군이나 공천(公賤)은 그 역을 도와야 하였다. 염역에 징발된 인원에는 연해 거주민도 포함되었다. 국가에서는 염간이 아닌 사람이 자염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세(收稅)를 하지 않는 특전을 부여한다든가, 혹은 염간들에게는 염세를 감면 조처하는 등 제염업 종사자를 확보하는 데 급급하였다.
소금은 만들기도 어렵지만 유통하는 데에도 품이 많이 들어 값이 비쌌다. 서민들은 여러 해산물로도 소금기를 섭취할 수 있었으나, 장과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라도 소금이 꼭 필요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조선 정부는 한편으로는 민생안정을 위해,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 확충을 위해 소금 생산과 공급 정책에 큰 관심을 보였다.
조선 건국 직후 선택한 것은 관이 직접 소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각염법(榷鹽法)이라 부르는 일종의 소금 전매제였다. 관이 염장 설치와 생산을 관할하고 내륙 고을에는 염창(鹽倉)을 설치하여 유통까지 관할하였다. 태조 때에는 쌀과 포(布), 태종 때에는 잡곡도 소금과 교환할 수 있게 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개인이 소금을 굽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았으나 상인의 소금 유통 판매를 엄격하게 배제한 결과, 소금을 얻기 어려운 곳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15세기 중엽에 이르러 소금 값이 비싸지는 현상이 나타나자, 의염법(義鹽法) 주장이 대두하였다. 결국 1445년(세종 27) 주117을 설치하여 사재감에서 맡고 있던 모든 소금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개인의 소금가마를 모두 몰수하여 생산과 유통을 완전히 독점하는 전매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로써 생계 수단을 상실하게 된 염간(鹽干)의 도망이 속출하여 생산이 줄자 소금값이 폭등하여, 1년 만에 의염법을 폐지하여 이전 방식으로 환원하였다.
이 뒤로 원칙적으로 소금가마는 모두 관의 소유로 하면서 개인의 소금가마 운영을 막지 않아 관제염이 주를 이루고 사제염도 가능하게 하였으며, 유통구조는 전과 같이 거의 관에서 관할하였다. 이 제도의 내용은 『경국대전』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제도가 1750년(영조 26) 균역법 시행 때까지 부분적으로만 개정 보완하며 유지되었다.
조선 초기 소금의 가격은 기록상으로는 시가(市價)에 의해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확실한 값을 알 수 없다. 1430년(세종 12) 면포 1필에 소금 2석 6두로 교환하게 하고 이 가격을 항식(恒式)으로 정한 일이 있어서, 조선 정부가 생각한 이상적 소금값을 파악할 수 있다.
집현전 직제학 이계전의 상소에 보면 의염색 설치 이전에는 민간에서 쌀 1두에 소금 3, 4두 혹은 5, 6두까지 교환되었는데, 의염색 설치 이후에는 쌀 1두에 소금 1, 2두를 바꾸게 되었다고 한 것에서 소금값이 쌀 때와 비쌀 때의 편차를 짐작할 수 있다. 조선 전기에는 고려시대보다 2배가 넘는 1,362개 염분이 있었고, 염소(鹽所)까지 계산하면 1,626개였으며, 북부 지방에도 널리 염분이 설치되어 있었다.
임진왜란 이후 국가 재정이 피폐해지자 1598년(선조 31) 다시 강력한 소금 전매제 주장이 대두하였다. 결국 소금의 사적 매매를 금하고 관이 정한 값으로 교환하게 하자 소금값이 이전의 배 가깝게 뛰어 백성들의 고통을 키웠다. 여기에 여러 주118가 동남 연안의 염분을 절수하고 권세가의 염분 점유가 더해져 민생을 더욱 궁곤하게 하였다. 힘이 센 군문과 관아들도 염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의 염분은 17세기 후반부터 염세 과징에 대해 염호들이 도망하여 저항함으로써 차츰 쇠락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제염 관련 제도는 강화되어 『속대전』에 규정되었다. 균역법 시행에 따라 염세는 어세 · 선세 등과 함께 호조 소관에서 벗어나 균역청이 관장하고, 새로 제정된 해세절목(海稅節目)에 따르게 되었다. 이때 여러 궁가가 절수한 염분을 모두 없애고, 염세는 돈으로 내게 하고 부담을 경감하였다. 이로써 염폐(鹽弊)가 많이 줄었으나, 수백 년의 고질적인 악폐가 하루아침에 근절될 수는 없었다.
개항 후 조선에는 많은 수입 소금이 횡행하였고, 그 결과 조선의 제염업은 급격히 쇠퇴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과세에만 급급하여 쇠퇴를 막지 못하였다. 여기에 더해 이전의 염세 외에 염분세를 부과하고, 각 궁방이 염분에서 직접 소금을 징수하는 등 과거의 악폐가 살아나 염세의 국가 수입은 현격하게 감소하였다. 염세는 이미 일본이 실질적으로 조선을 지배하기 시작한 뒤인 1906년에 염세규정을 정해 이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제염업자가 허가를 받아 가벼운 세금을 납부하고 제염업을 경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비로소 봉건적인 제도에서 해방되었다.
3.1.3.3. 광업
조선의 광업은 시대에 따라 주력 광물이 달랐고, 경영형태도 차이가 있었다. 주된 광물은 철, 유황과 금, 은, 납이었다. 처음에는 대개 농민의 부역 노동에 의존하는 관영 광산 위주였으나, 차츰 임금노동자를 투입하여 채굴하는 사영 광산이 많아지게 되었다.
3.1.3.3.1. 철광업
조선 건국 후 15세기 전반까지는 한양천도에 따른 토목공사와 무기제조에 많은 철물이 필요하였다. 중앙의 선공감과 군기감에서 필요한 철은 각 고을의 경작지 면적에 따라 철물을 부과하여 걷었다. 지방의 각 영(營)과 진(鎭), 계수관 등의 무기 제조에 필요한 철은 철이 나는 고을에 철장(鐵場)을 두어 채취하였다. 철장은 전국에 20여 곳이 있었고, 각기 200인의 취련군(吹鍊軍)을 동원하여 매일 할당량을 생산하였다.
여러 폐단을 무릅쓰고 강행되었던 이들 제도는 15세기 후반에 국가의 철물 수요가 줄자 농민들을 봄 · 가을 농한기에 동원하여 철을 채납하게 하는 철장도회제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산철지는 주로 사광이어서, 농민들은 대개 강가의 모래에서 철을 채취하였다.
철장도회제를 채택한 뒤 야장(冶匠)들에 의한 수공업이 성장하게 되었다. 이들 중에는 정철(正鐵)만을 채굴, 제련한 정철장, 정철 제련 외에 정철기구까지 제작하던 주철장(鑄鐵匠), 무쇠를 만들어 솥과 농기구를 생산한 수철장(水鐵匠), 구리 산지에서 놋그릇을 생산한 유철장(鍮鐵匠) 등이 있었다. 특히 수철장들은 광범위한 판로를 가지고 성장하여, 세종 초에 이미 10인 내지 20인의 장인(匠人)을 거느린 야장을 경영하고 있었다. 야철수공업이 성행하고 농민들이 강하게 저항하여 철장도회제는 15세기 말에 폐지되었다. 철장이 있는 고을에만 공철을 부과하고 아울러 철물수공업자들로부터 장세(匠稅)를 징수하게 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철물은 야철수공업자들로부터 구입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이로써 민간에서 철광업이 발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무기를 만들 철물이 많이 필요한 오군문은 점차 야철수공업자들이 자리 잡은 철 생산지를 절수하거나 야철수공업자들을 군졸로 편입시켜 수요를 해결하다. 단련도감에서는 진군(鎭軍)들이 철광을 채굴하여 운반하고 땔감도 공급하면, 덕주의 지휘 아래 야장들이 제련작업을 하였다. 덕주는 용광로인 철덕(鐵德)의 주인이었다.
3.1.3.3.2. 금 · 은 · 연광업
15세기에는 국가의 수요와 명에 보낼 금은 세공(歲貢)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금 · 은 광산을 개발하였다. 금광은 대부분이 사금광이고, 은광은 석광(石鑛)이었다. 광산 개발은 정부가 파견한 채방사(採訪使)가 시굴하여 공액(貢額)을 산정한 뒤에 현지의 수령이 채굴작업을 지휘하였다. 수령은 농한기에 농민을 동원하여 채납하였다. 금 · 은 광산도 부역하는 농민의 저항이 극심하였기 때문에, 은광은 1429년 명에 대한 세공이 면제되면서 중단되고, 금광은 일본에서 금이 유입되기 시작된 1484년에 폐쇄되었다.
그러나 16세기에 은을 제련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명 및 일본과의 무역이 활발해져 정부의 은광정책과 은광의 경영형태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졌다. 16세기 초에 김감불(金甘佛)과 김검동(金儉同)이 연은분리법(鉛銀分離法)을 개발하자 은의 함유량이 풍부한 단천 연광(鉛鑛)이 채굴되기 시작하여, 전국 여러 곳의 은광이 개발되었다.
무역이 활기를 띠면서 은의 수요가 급증하자 역관(譯官)과 주119들은 은광의 민영화를 끈질기게 추진하였고, 은광 주변 주민들에 의한 잠채(潛採)가 그치지 않았다. 정부는 명에 다시 은을 세공(歲貢)하게 될까 염려하여 은이 필요한 때만 관채를 하려 하였으나, 결국 부상대고들의 요청을 따르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은광 정책이 일관되지 않아 때로는 관채를, 때로는 민채를 실시하였고, 관채와 민채가 중지되면 곧 역관이나 부상대고와 결탁한 현지 주민들의 잠채가 성행하였다. 민채와 잠채는 모두 순수한 민영 광업이었다.
17세기에는 군영에서 연환(鉛丸)을 제조하기 위하여 연광(鉛鑛)을 개발하였는데, 연광이 곧 은광이었다. 17세기 말까지 68개 소의 연광을 개발하였으나, 호조에서 모두 탈취하였다. 임진왜란 중에 이미 단천 은광에 공은제(貢銀制)를 적용시켜 연간 1천 냥을 수취하였던 호조는 17세기 전반기에 청과의 외교 및 공무역에 필요한 은을 조달하는 문제가 심각해지자 관채를 실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민채를 허용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관채는 정부의 재력과 인력의 부담을 가중시켰고, 민채는 민간자본이 미약하여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 1651년의 설점수세법(設店收稅法)이었다. 광산의 전업적인 소생산자들이 광산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호조가 은광의 채굴 제련장과 부대시설까지 마련해 주면서 부근의 재목과 연료를 채취할 수 있게 하였고, 광군들을 임의로 고용할 수 있게 하였다. 설점수세업무는 호조에서 파견한 별장이 대행하였는데, 이들은 대개 서울에 거주하는 부상대고들로서 권세가의 사인(私人)들이었다.
호조 별장이 주관하는 은광업도 18세기 중엽부터는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호조가 군영의 연점(鉛店)을 모두 탈취한 데 대한 대응으로 군영이 호조의 설점과 은점 운영을 방해하였던 것, 지방의 토호나 부상대고들의 사채나 잠채가 활발해진 것, 수령들이 토호나 부상대고들과 결탁하여 별장제 폐지를 주장한 것 등이 그 원인이었다. 이에 호조는 1775년에 별장제를 혁파하고 수령 수세제를 채택하였고, 이로부터 상업자본에 의한 광산개발이 한층 더 촉진되었다.
이는 물주가 호조의 설점 허가를 받아 자기 자본으로 점소를 설치, 운영하면 해당 지역의 수령이 호조가 정한 세금을 수납하는 제도였다. 물주는 채굴 · 제련시설과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혈주(穴主)나 덕대가 임금노동자를 고용하여 분업적 협업하에 직접 광산을 경영하였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전반기에는 이러한 자본주의적 성격이 강한 물주제 하의 광업경영형태가 금광과 은광 및 동광업에 적용되었다. 광산에 고용된 광군들은 대체로 농촌에서 유리된 전업적인 광산노동자들로서, 광산의 규모에 따라 100여 인 또는 수천 인에 달하였다.
3.1.3.3.3. 개항 이후의 광업
개항 이후 조선의 위정자들도 서양 여러 나라가 금광을 채굴하여 국가재정에 충당하며, 무역에도 금 · 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로부터 적극적으로 전국 광산을 개발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어 새로운 광업 정책이 수립되었다. 지방의 광산 사무를 내무아문이 주관하고, 각 감영이 활발히 광산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광산 개발과 아울러 외국인의 불법 광산탐사와 채광 금지를 맡을 주120을 1887년에 설치하였다. 이어서 정부는 기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광사(鑛師)를 초빙하여 기술을 배우되 운영은 조선이 담당하도록 정책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1888년 미국에서 광사를 초빙하여 광무국에 처음으로 외국인 광산기술자를 고용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전국에서 광산의 수가 급증하였다. 1895년 이후로는 일본인 광산기사가 초빙되어 광무국에서 개편된 광산국에 일본인의 세력이 커지게 되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정부는 유망한 큰 광산들을 궁내부(宮內府)로 이속시켰다. 1905년에 통감부가 설치되고 나서 1906년에 이르러 궁내부 광산도 외국인의 이권 획득 목표물이 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결국 궁내부 소속 광산 26개 소도 1907년 8월에 폐지되었다.
열강은 조선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뒤 금광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우선 광산채굴권을 요구하여 광업 전반에 걸쳐 특허권을 확보한 뒤, 채굴할 때가 되면 금광개발에만 주력하였다. 각 열강별로 차지한 광산을 살펴보면 미국인이 채굴한 운산금광, 독일인이 채굴한 당현금광, 영국인이 채굴한 은산금광과 수안금광, 일본인이 채굴한 직산금광 등이 있었다.
3.1.4. 수공업
조선시대 수공업은 초기에는 관장제(官匠制)였다가 중기 이후 사장제로 바뀌었다. 관장제란 공장이 관부에 예속되어 물품을 생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중앙의 공조와 그 밖의 여러 관아에 소속된 장인을 경공장, 지방의 도와 군현에 소속된 장인을 외공장이라 하였다.
공장의 신분은 양인과 공천(公賤)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기 소속기관에 정원수대로 등록되어 물품 생산에 종사하였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중앙에는 30개의 관아에 2,800여 명의 공장이 예속되어 129종의 물품을 만들었고, 지방에는 3,500여 명의 공장이 27종의 물품을 만들어냈다.
경공장 중에는 사기 · 철물 · 무기 · 직물 등의 장인이 가장 많았고, 외공장 중에는 지물 · 돗자리 · 궁시(弓矢) · 목기 · 칠기 등의 장인이 가장 많았다. 장인들은 작업장에서 관의 수요에 따라 각기 책임량을 생산해야 하였고, 품질과 규격에 엄격한 규제를 받았다.
장인이 작업에 응하는 것은 공역(公役)에 속하는 것이므로 대개는 무상이었다. 공장 중 일반 공장을 감독하는 극히 소수의 인원에게는 잡직인 체아직이 주어졌다. 공장이 공역 이외에 사적으로 영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세금을 내야 하였다. 공장들은 예속된 관아나 세력자들로부터 책임량 이상의 제품을 강요당하는 일이 많았다. 때문에 자유로운 수공업 발달의 저해 요인이 되었다. 그리하여 장인들이 관공장을 피해 도망하게 되어 16세기 초부터 관공장제 수공업은 쇠퇴하고 그 대신 사장제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17, 18세기에 이르러서는 관아의 재정 부족으로 관장제 수공업제는 거의 없어지고, 다만 자기 · 제지 · 화폐 · 주조 · 무기 제조 등 특수 분야에서만 관장제가 지속되었다. 후기에도 관장과 사장의 구분은 있었으나, 이때는 관장도 임금기술자가 되었고, 사장은 임금기술자가 되거나 다른 장인을 고용, 직접 제품을 생산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 상공업의 발달은 대동법의 실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대동법 실시 이후 수공업자와 공인과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수공업의 생산 의욕을 크게 자극, 수공업계는 활기를 띠게 되었다. 공장의 일부는 아직도 관아에 예속된 임금기술자로 남아 있기도 하였으나, 그 대다수는 자유수공업자가 되어 상업자본가에게 임금기술자로 고용되거나 독자적인 수공업자가 되어 제품을 생산, 판매하기도 하였다. 특히 유기와 칠기 등의 분야에서 매뉴팩처가 발달하였다.
3.1.5. 상업
조선시대의 상업 형태로는 서울의 시전(市廛)과 난전, 각 지방의 장시(場市) 및 상설 점포 외에 선상(船商), 보부상(褓負商) 등의 행상, 그리고 도고(都賈)와 주변 국가나 세력과의 무역 등이 있었다.
정부에서 서울 종로거리에 행랑(行廊)이라는 관설 상가를 만들어 상인에게 점포를 대여하고, 그들로부터 행랑세라는 점포세와 좌고세(坐賈稅)라는 영업세를 징수하였다. 이들 시전은 궁중과 관부의 수요를 조달하는 대신, 상품 독점판매의 특권을 얻은 어용 독점상점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17세기 전반기부터 이들 시전 중 수요가 가장 많은 명주 · 주단 · 면포 · 모시 등의 직물과 각종 종이류 및 어물류 등 여섯 가지 품목의 상점이 가장 번창하였는데, 이들을 육의전(六矣廛)이라 하였다.
조선 후기 서울에는 상인이 점차 늘어나 시전 상인과는 별도로 관청의 허가 없이 장사하는 난전이 등장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처음에는 육의전에만 난전을 금하는 권한을 주었으나, 나중에는 모든 시전에게도 난전을 금하는 권한을 주었다. 난전 중에는 보잘것없는 상인이 많았지만, 더러는 시전 상인과 맞설만한 부상도 있었다.
시전 상인이 정부와 결탁한 독점상점이라면, 난전은 양반층과 결부된 상업 세력이라고 할 수 있었다. 난전의 세력이 점차 커지자, 정부는 1791년(정조 15)에 신해통공(辛亥通共)이라 하여 육의전을 제외한 모든 시전에 난전을 금하는 특권을 없애버렸다.
지방에서 발달한 주121는 15세기 후반에 전라도 지방의 큰 가뭄이 계기가 되어 등장하였다. 정부의 논의에서 장시가 도적의 소굴이 된다는 이유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서민들이 기근을 해결하는 주요 수단이라는 의견에 따라 장시를 허용하였다. 16세기 중반에는 충청도와 경상도에까지 장시가 전파되었다. 18세기 전국의 장시는 약 1,000개 소에 달하였으며, 큰 고을에는 5개 이상의 장시가 자리를 잡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장시는 5일마다 정기적으로 서는 5일장이 일반적 형태였고, 지역마다 교역권이 형성되어갔다.
행상은 대개 소량의 상품을 짊어지고 각지의 장시나 민가를 돌면서 소매하는 상인을 말한다. 보부상은 본래 상품을 보에 싸서 행상하는 봇짐장수 또는 항아장수라 불린 주122과, 상품을 지게에 짊어지고 행상하여 등짐장수라 일컬어진 주123을 합하여 부르는 명칭이었다. 그런데 지역 단위로 일종의 협동조합과 같은 조직을 갖추어 관으로부터 지역이나 물품에 대해 독점권을 얻어 활동하는 이들의 명칭이 보부상으로 고착되었다.
이 보부상은 관으로부터 특권을 인정받은 까닭에 유사시에는 관에서 전령 혹은 치안의 일을 요구하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로부터 상품을 봇짐으로 또는 지게로 옮기며 장시를 돌아다니며 상행위를 하는 이들은 보부상이라 하지 않고 장돌뱅이라 하여 구분하게 되었다.
이들과 달리 큰 자금력을 갖추고 활동하는 행상도 있었는데, 바로 배로 영업을 하는 선상(船商)이었다. 『경국대전』에는 육로로 행상을 하는 이는 육상(陸商), 수로로 행상을 하는 이는 수상(水商)이라 하였는데, 육상에게서는 매달 저화 8장을 세금으로 받았으나, 수상에게서는 대선(大船)을 갖고 영업하는 자는 매달 저화 100장을 세금으로 받았다. 작은 배로 영업하는 자라도 매달 저화 30장을 세금으로 내야 하였으므로, 선단(船團)을 꾸려 영업하는 대상인은 거대한 자금력을 갖추었으리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이들을 사상(私商)이라고도 하였는데, 경기도와 충청도 연안 일대를 활동 무대로 하였던 경강상인이 대표적이다.
후기 상업 활동의 특징 중의 하나는 도고의 활동이었다. 대동법의 실시로 공납이 없어지자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은 공인을 통해 조달되었다. 공인은 주로 시전 상인이나 경주인 · 공장(工匠) 등에서 나왔다. 공인은 자기 자본으로 물품을 사서 납품한 뒤에 대가를 받는 결제 방법으로, 동일 상품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도매상으로 성장하면서 상업자본을 형성해갔다. 도고 중 주124은 거의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였고, 평양과 의주, 동래 등지에도 도고 상인이 형성되어 있었다. 지방의 장시에서는 여각(旅閣) 또는 객주(客主)라는 도매상이 보부상을 상대로 창고업 · 운수업 · 숙박업 · 대부어음 등의 다양한 형태로 자본을 형성해갔다.
3.2. 과전법과 직전법
3.2.1. 과전법
조선시대 토지제도는 고려 말기의 전제 개혁인 과전법이 그 근간이 되었다. 고려 말기의 전제 개혁은 농장(農莊)의 발달에 따라 문란해진 경제 질서를 바로잡아 국가 재정을 유족하게 하고, 위로는 신진 관료의 경제적 기반을 보장하며, 아래로는 도탄에 빠진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과전법의 시행은 농장의 탈세지를 모두 국가의 과세지로 재편성하여 수조(收租)를 가능하게 하였다. 과전법에서 토지를 분급하는 주요 대상은 왕실을 비롯, 국가기관 · 지방 관부 · 공공기관 · 관료 · 한량관 · 향리 등이었다.
과전법에서 사전(私田) 재분배의 중심이 된 것은 관료에게 분급하는 과전으로서, 이는 신진사대부에게 경제적 기반을 보장해준 것이었다. 과전법으로 권문세가에게 빼앗긴 농민의 토지는 되돌려주고, 전호의 소유권을 보장하였다. 그리고 공전 · 사전을 막론하고 농지 1결(結)마다 10분의 1조(租)인 30두(斗)의 전조(田租)를 물리게 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었다. 당시 주125가 일반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분의 1조로 규정한 것은 농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었다.
현직 · 산직(散職)을 막론하고 모든 관료에게 18등급에 따라 150결에서 15결까지 과전이 분급되었다. 과전과 공신전은 모두 경기도 안으로 제한하여 지방 토호화(土豪化)를 막는 동시에 강력한 중앙집권적 관료 세력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기내사전(畿內私田)의 원칙으로 분급된 과전 · 공신전은 그 자손에게 전수되었다. 과전의 분급은 원칙적으로 1대에 한하지만, 관료의 사망 후 그 처가 재가(再嫁)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신전(守信田)으로, 또 관료 부부가 모두 세상을 떠나고 유약한 자녀만이 남는 경우에는 휼양전(恤養田)으로 과전의 전수가 허용되었다. 이에 반해 공신전은 애초부터 세전이 인정되었다.
과전 · 공신전의 세습화에 따라 경기도 안의 분급 토지가 절대 부족해지자, 1417년(태종 17) 기내 사전의 3분의 1을 충청도 · 전라도 · 경상도의 하삼도(下三道)에 이급하였다. 이것은 과전 분급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전주의 토지 소유를 분산시키며, 국가 재정상의 필요로 군자전을 경기도 내에 확대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조처로 지방에서 사전주의 주126이 일어나고, 서울로의 쌀공급이 순조롭지 않는 폐단이 생겨났다. 때문에 1431년(세종 13) 하삼도로 이급하였던 사전을 기내로 환급하였다. 이때의 신급전법은 국왕의 강력한 간섭과 통제를 주요 골자로 한 것으로, 이로써 관료들은 과전을 균점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비해 과전의 총면적이 1만 5000결이나 감소되었으니 일종의 사전억제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 억제는 직전법으로 계승되었다.
3.2.2. 직전법
과전법에서 직전법으로 전제가 바뀐 것은 조선 건국 후 70여 년이 지난 1466년(세조 12)의 일이었다. 과전법에서 산직자까지 분급하던 토지를 직전법에서는 현직 관료에게만 분급하였다. 또 과전법에서 관료의 미망인이나 자녀 등 유족에게 주던 토지도 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토지 분급의 결수도 과전법에서 150결 내지 15결이던 것을 직전법에서는 최고 110결, 최하 10결로 줄였다. 그 결과, 관료들은 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직전세의 수렴을 가혹히 하게 되었다.
국가에서는 이에 대처하여 1470년(성종 1)에 직전세의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를 실시하였다. 이 제도는 국가가 전주를 대신하여 전호로부터 조세를 직접 거두어 전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직전세의 관수관급제로 전주의 직전에서의 토지 지배는 불가능해졌다. 또한 대표적 사전이라 할 직전까지도 수조(收租) 관계가 공전과 같게 되었으므로 공전 · 사전의 구별도 없어졌다. 그리고 명종 때에는 이 직전제마저 사실상 폐지되고 말았다.
3.2.3. 토지소유와 농민
과거 토지제도 연구에서 토지국유제론과 토지사유제론이 맞서 있었다. 토지국유제론은 일제강점기 이래 오랫동안 정설로 인정되어왔으나, 1960년대부터 토지사유제론이 대두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당초 토지국유제론이 제기된 것은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토지국유제론은 유물사관론자들에 의해서도 주장되었다. 그들은 ‘국가는 최고의 지주다.’라는 마르크스(Marx, K.)의 동양사회이론을 바탕으로 토지국유제론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근래 토지국유제는 하나의 표방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토지사유제임이 밝혀지고 있다. 토지사유제론을 주장하는 근거는 먼저, 토지지배 관계의 형태론적 연구로서 공전 · 사전 · 민전의 개념에 대한 반성이고, 다른 하나는 토지지배 관계의 실태로서 민전에 대한 규명을 들 수 있다. 공전과 사전의 개념은 토지국유제론자가 말하는 대로 수조 관계로서의 개념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이 밖에 소유 관계로서의 개념도 들어 있는 것이다.
수조 관계로서의 공전과 사전의 개념은 공전이 국가의 수조지이고, 사전이 전주의 수조지라는 뜻이다. 그렇지만 소유 관계로 보면, 공전은 국유지 또는 관유지를 뜻하고, 사전은 사유지를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전 · 사전보다는 민전의 개념과 실태를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민전은 수조 관계로서는 국가나 전주의 소유지를 뜻하나, 소유 관계로서는 민유지를 뜻하는 것이다. 민전은 상속 · 매매할 수 있는 토지이며, 그 속에 토지 사유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민전은 평민은 물론 양반 · 중인 · 노비 등 모든 계층의 민유지였다.
3.3. 조세와 재정
조선의 국가 재정은 토지를 대상으로 거두어들이는 전세(田稅), 인정(人丁)을 대상으로 동원하는 신역(身役)으로서의 요역과 군역, 그리고 호(戶)를 대상으로 하는 공물이 그 대종을 이루었다. 중기 이후에는 농민의 구호곡이었던 환곡(還穀)이 재정 수입의 일부가 되기도 하였다.
3.3.1. 전세
양전은 토지와 그에 기초하여 생활하는 인구를 파악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그 결과로 작성되는 자료가 양안(量案)인데, 조선 초기에는 자주 양전을 할 수 있었으나, 뒷 시대로 갈수록 양반 지주들의 반대가 심하고 오래 양전을 하지 못해 생긴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양전을 하기가 어려웠다.
14011404년(태종 14년)의 양전 결과 93만 결을 확보하였으나, 태종의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태종은 과전법 시행을 위해 양전할 당시 권세가가 소유한 농경지는 비옥도를 크게 낮추어서 기록하였던 것을 알고 있었고, 조선 건국 후 국제정세가 안정되면서 새로운 개간도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양전을 지시한 것인데, 기대치를 채우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에 1405년(태종 5년) 하삼도〔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1406년 중3도〔경기, 강원도, 황해도〕에 다시 양전을 실시하여, 30여만 결을 추가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1413년(태종 13) 평안도와 함경도에서 처음으로 양전을 실시하였는데, 이때는 결로 파악하지 않고 일경(日耕)으로 파악하였다. 대체로 1432년(세종 14)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세종실록』 「지리지」의 통계를 보면, 평안도가 311,770결, 함경도가 149,306결이고, 전국의 결수는 총 1,719, 806결이었다.
토지 결수 증가의 의미는 국가 재정이 충실해졌다는 것, 지주들의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을 뜻하였다. 농업경제에 의존하는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통치기반을 확보한 것이다. 세종 연간(1418~1451)에 섬 지역까지 수령을 파견하였는데, 이는 중앙 권력이 전국의 민에 고루 미치게 되었음을 반영한다.
조선의 전결(田結) 액수는 이후 세종 때보다 많았던 적이 없다. 임진왜란 후 약 50만 결 정도로 줄었다가 18세기 초엽에는 140만 결 정도로 늘어났으나, 인구의 증가를 고려하면 세종 때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었다. 이는 양안에 오르지 않은 농경지가 많았음을 뜻하였다.
조선 초기의 전세제도는 고려 말기 과전법의 조세 규정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즉, 조(租)는 매결(結) 수확량의 10분의 1인 30두였고, 세(稅)는 유세지의 유전자(有田者)로부터 결당 2두씩을 징수하였다. 조세율은 매년 풍 · 흉에 따라 정하는 답험손실법(踏驗損實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과전법의 조세 규정은 1444년(세종 26)에 공법(貢法)이라는 새로운 세제로 개혁되었다. 이 세제는 처음 일부 지역에서 실험적으로 실시된 후, 세종 말에 전라도, 세조 때에 경기도 · 충청도 · 경상도, 성종 때에 황해도 · 강원도 · 평안도 · 영안도에 각각 시행되었다. 이 공법에서 조세는 매 결에 수확량의 20분의 1인 20두 내지 4두였다.
조세량을 정하는 기준은 전분육등법(田分六等法)과 연분구등법(年分九等法)에 따랐다. 전분육등법은 전국의 토지를 기름지고 메마름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한 것으로, 이때에 결부제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연분구등법은 매년 풍 · 흉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과전법 당시의 3등전과 공법의 6등전을 평수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과전법의 상등전은 1,844평, 중등전은 2,897평, 하등전은 4,184평이고, 공법의 1등전은 2,753평, 2등전은 3,247평, 3등전은 3,932평, 4등전은 4,724평, 5등전은 6,897평, 6등전은 11,036평이었다. 그리고 연분구등법은 상상년부터 하하년까지 9등년으로 나누어 20두에서 4두까지로 정하였다. 연분구등의 실시 단위는 읍내와 동서남북 등 5가지 연분으로 조정되었다.
과전법의 답험손실법은 공법으로 바뀌면서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정액수세법이 되었다. 그리고 조와 세가 통일되었으며, 10분의 1조가 20분의 1세로 반감되었다. 결부법(結負法)은 토지 면적과 그 토지에서의 수확량을 이중으로 표시하는 독특한 계량법이었다. 벼 한줌을 1파(把)라 하고, 10파를 1속(束), 10속을 1부(負), 100부를 1결이라 하였다. 따라서, 1결의 면적은 토지의 기름지고 메마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공법으로의 전세 개혁은 경차관의 농간 등 답험손실법의 운영상의 결함을 시정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즉, 조선 초기의 휴한법이 극복되고 연작법이 보급되어 농업생산력이 증가, 이로써 정액수세법이 제정된 것이다. 공법에 따른 20분의 1세의 상상년급 20두는 1결당 생산량을 400두로 보고 산정한 것이다. 또, 1결의 면적도 종전의 3등전에 비해 축소되었으므로 실지로는 하중년급 6두나 하하년급 4두의 적용이 많았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4두로 고정되고 말았다.
1653년(효종 4)에는 종래에 사용하던 주127의 법을 폐하고 균일한 주128을 사용하여 환산하는 규정이 발표되었다. 이때의 양전척은 세종 때의 일등전척(一等田尺)을 기준으로 실적(實積)을 역비례로 산출, 1등전은 100부, 2등전은 85부 1파, 3등전은 70부 1속 1파, 4등전은 57부 7파, 5등전은 40부, 6등전은 25부로 삼았다. 다시 말하면, 종래 먼저 토지의 등급을 정한 뒤에 해당한 양전척으로 측량하던 것을, 이제는 모두 1등 양전척만으로 측량하여 전제상정소준수조획 준정결부(准定結負)라는 환산표에 따라 각 등전의 결수를 산출해내는 방법으로 고친 것이다.
그러나 후기에 1결당 전세 4두라는 것은 명색일 뿐, 실제로는 갖가지 명목으로 훨씬 많은 양을 징수하였다. 훈련도감이 신설된 이후, 삼수병(三手兵)을 양성하는 비용이라는 명목의 삼수미로 2두 2승(升), 공물의 전세화에 따른 대동미로 12두, 균역법의 결작(結作)으로 2두, 이 밖에 전세의 부가세로 주129 · 주130 · 주131 · 주132 · 주133 · 주134 등이 그것이었다.
그리하여 『속대전』에 궁방전 · 아문둔전 등의 면세전에 1결당 수세액을 23두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1결당 수세액은 23두 가량인 것으로 짐작된다. 정약용(丁若鏞)이 제시한 강진군의 사례를 보면, 세의 종목이 44개에 달하며, 국가에서 거두는 종목이 12개로 23두 내지 24두, 선급(船給)이 3개 종목으로 2두 2승, 읍징(邑徵)이 28개 종목으로 30두 내지 37두로 되어 있어, 1결당의 실제 부담은 55두 내지 63두나 되었다.
3.3.2. 역(役)
국가가 백성에게 부과하는 역은 일시적인 요역과 항구적인 국역(國役)으로 구분된다. 요역은 지방 관아에서 동원하는 경우와 중앙의 명령으로 동원하는 경우가 있었다. 지방의 요역은 전결 8결에 1부(夫)씩 1년에 6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복호(復戶)라 하여 요역의 면제를 큰 특전으로 농간을 부리기도 하였다. 때문에 과중한 요역에 시달리다 못해 주135하는 자도 많았다.
지방의 요역으로 성곽 · 주136 · 도로 · 제방 등의 수축 · 주137, 공물(公物)의 운반, 그 밖의 잡역에 동원되었다. 중앙의 요역으로는 도성의 축조, 산릉(山陵)의 조영 등에 지방에서 많은 민정(民丁)이 징발되었다. 이와 같은 요역에는 식량이나 기구 등을 자변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항구적인 역이라 할 국역은 신역(身役) 혹은 직역(職役)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신분에 따라 양역과 천역의 구별이 있고, 그 역종도 군정(軍丁) · 이교(吏校) · 노비 등 다양하였다. 그리고 공장(工匠)이나 주138 등은 그들이 생산하는 물품을 공납하여 국역이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역과 신분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역은 신분을 규정하고 신분은 곧 역을 규정하였다. 역은 정(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초기에는 호(戶)를 매개로 한 정이라는 관념이 짙었다. 조선 초기의 편호법(編戶法)은 1392년(태조 1)에 재정한 주139에 따라 3등호제를 시행하다가, 1398년(정종 즉위년)에 인정(人丁)과 토지를 함께 산정하는 계정계전절충법(計丁計田折衷法)으로 바뀌고, 다시 1435년(세종 17)에는 계전법에 따른 5등호제로 바뀌었다.
『경국대전』에 전8결 출1부(田八結出一夫)라는 규정은 첫째로 전결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둘째로 1호의 토지가 8결에 미달일 때는 여러 호가 합해서 1부를 내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는 호를 매개로 한 정이라 할 수 있다.
국역의 경우에도 건국 초부터 군역(軍役) 등의 역이 있는 자에게 호 단위로 의무를 지웠고, 군역을 비롯하여 천역에 이르기까지 조호(助戶, 봉족)를 공정(公定)하였다. 이러한 법제적인 호는 대개 3정을 1호로 삼았다.
국역에 당번 의무를 지는 자를 호수(戶首) 또는 정군(正軍)이라 하였다. 호수가 당번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뒷바라지하는 자를 봉족 혹은 보인이라 하는데, 호수와 봉족의 관계는 원래 아들 · 사위 · 아우 · 조카 · 족친(族親)이나 겨린[切隣]으로 충당, 공동 책임을 지게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 관계도 없는 타인에게 책임을 지우기도 하였고, 쇠잔한 가호는 3개의 자연호를 1개의 법제적인 호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봉족제는 1464년(세조 10) 주140으로 개편되었다. 즉, 2정을 1보로 삼고, 봉족 대신 보라는 이름을 쓰고, 호 대신에 정을 기준으로 삼았다. 보법에서는 노복도 조정(助丁)의 반으로 환산하였고, 보인의 재정적 부담을 매월 포 1필 이하로 규제하였다. 때문에 양역이나 천역을 막론하고 그 입역(立役) 대신 포로 대납하는 일이 많아졌다.
양역인 군역에 있어서는 입역자의 비용을 봉족 또는 보인이 부담하여 보포(保布)를 냈고, 차츰 입역 의무자조차 군포로 입역을 대신하였다. 그리고 명종 때부터는 군포를 국가 세입으로 수납하였다. 천민에게도 입역 노비에게 봉족을 정해주고, 주141는 신공(身貢)을 상전에게 바쳐 독립호를 영위할 수 있었다. 사노비(私奴婢)도 상전에게 역 내지 신공을 바쳤다. 그러나 양반은 원칙적으로 역의 의무가 지워지지 않았다.
조선 전기에는 양반으로 구성된 군대와 양인으로 구성된 군대가 구분되었다. 그러나 후기에 양반으로 구성된 군대는 거의 없어지고, 양인만이 군포를 바쳤으므로 이를 양역(良役)이라 하였다. 그러나 1년에 군포 2필을 내는 것은 농민에게 무거운 부담이었다. 당시 포 2필은 쌀 12두에 해당하였고, 풍년에는 20두 값이었다.
군포의 징수 과정에서 어린이에게 부과하는 황구첨정(黃口簽丁)이나 죽은 자에게 부과하는 백골징포(白骨徵布) 등 많은 폐단이 있었다. 그리하여 양인 중 부강한 자는 면역의 길을 찾게 되었고, 빈한한 자는 토호의 양호(養戶)로 투탁하거나 도망하였다.
숙종 때 이르러 양역의 폐단이 논의되어 양역이정청(良役釐整廳)이 설치되고, 양역사정절목(良役査正節目)이 제정되기도 하였으나 확고한 대책은 없었다. 그후 1750년(영조 26)에 균역법(均役法)이 실시되어 종래 2필의 군포를 1필로 줄여 받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따른 국가 재정의 부족액은 여러 방안으로 보충하였다. 즉, 종래 궁방이 점유하던 어장세 · 염세 · 선박세 등을 정부에 귀속시키고, 새로이 전 1결당 결작(結作)이라는 이름으로 2두씩 징수하게 하였다. 또, 선무군관(選武軍官) 시험의 불합격자에게 군관포를 징수하는 한편, 은결을 적발하여 조세를 징수, 균역청 경비로 충당하였다. 그런데 균역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왕실과 양반관료층과의 대립이 있었다.
그리하여 왕실은 궁방이 독점하던 어장세 · 염세 · 선박세 등의 이권을 양보하고, 양반관료층은 결작과 군관포의 신설 등을 양보함으로써 균역법이 성립되었다. 그렇다고 균역법으로 역이 균등해진 것은 아니었다. 양반은 여전히 군포 징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농민들의 부담이 다소 가벼워진 효과는 거둔 셈이었다.
3.3.3. 공물과 대동법
공물은 호를 대상으로 부과하였다. 즉, 각 주 · 현을 단위로 백성이 공납할 토산의 현물을 배정하고, 주 · 현에서는 배정된 공물을 다시 각 민호에 배정하였다. 공물은 중앙 각 사(司)에서만이 아니라 감영 · 병영 · 수영 및 각 주 · 현에서도 현물을 징수하였다.
공물의 분정은 대개 지방관에게 맡겨지고, 향리가 그 실무를 맡아보았다. 하지만 종류가 잡다하여 분정에 공정을 기하기가 어려웠다. 공물은 현물을 민호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민정(民丁)을 동원하여 요역으로 조달하는 경우도 있고, 현물의 대가로 미(米) · 포(布) 등을 부과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관아에서 직접 공물을 마련하는 관비(官備) 공물도 있었다.
공물의 부담은 전세나 역보다도 무거웠고, 또 부과나 징수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 그것은 일단 배정되면 감면이 어려웠고, 당초에 배정된 토산물이 뒷날에는 생산되지 않은 것도 있었으며, 애초부터 실지로는 생산되지 않는 물건이 배정되는 경우조차 있었다.
공물의 종류에는 천연 산물이 있는가 하면 가공품도 있어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해마다 내는 상공(常貢) 외에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징수하는 별공(別貢)도 허다하였고, 공물 외에 토산의 현물을 바치는 진상(進上)이라는 것도 있었다.
공물은 납세의 일종으로서 주 · 현 단위로 1년에 한 번 내지만, 진상은 납세라기보다 외신(外臣)이 국왕에게 바치는 예물이었다. 즉, 궁중에서 쓰일 물품을 각 도 단위로 감사와 병사 · 수사가 매달 한 번씩 상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물과 마찬가지의 의무적 부담이었고, 각 주 · 현에 분정되었으므로 민호의 부담이라는 점에서는 공물과 다름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후기 대동법의 실시는 공물의 전세화(田稅化)로서 재정제도의 일대 개혁이었다. 공물의 수납 과정에서 청납업자들이 모리를 일삼던 방납(防納)과 이서(吏胥)들이 농간을 부리던 점퇴(點退)의 폐단은 일찍이 조광조(趙光祖)와 이이(李珥) 등에 의해서 지적되었다. 특히 이이는 그 대안으로 대공수미법(代貢收米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대동법은 1608년(광해군 즉위년)에 이원익(李元翼)의 주장에 따라 경기도에 실시하기 시작한 뒤 17세기 중에 강원도 · 충청도 · 전라도 · 경상도에 확대되었고, 1708년(숙종 34)에는 황해도에까지 실시되었다. 이로써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에 실시되기까지 무려 100년이나 걸렸는데, 이는 이 법의 실시를 극력 반대한 세력 때문이었다.
한편, 대동법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선혜청이 신설되었으며, 대동미라 하여 전 1결당 쌀 12두씩, 혹은 그에 상당하는 포(布) · 전(錢)을 바치게 하였다. 대동미는 주142와 주143로 나누어, 봄에 내는 상납미는 중앙의 재정에, 가을에 내는 유치미는 지방 재정에 충당되었다.
대동법은 전결을 기준으로 공납을 징수하였으므로 농민들의 부담이 그 이전보다 가벼워졌다. 실제로 선혜청이라는 명칭은 농민에게 은혜를 베푸는 관청이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대동법의 실시는 공인에게 상업자본을 형성하게 하여 상업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공인의 주문을 받아 상품을 생산하는 수공업을 발달시키는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다.
3.3.4. 환곡
환곡도 중기 이후에는 국가의 세입 재원이 되었다. 환곡 또는 환상(還上)이라는 제도는 본디 춘궁기에 국가가 관곡인 의창곡(義倉穀)을 농민에게 대여하였다가 추수 뒤에 회수하는 제도였다. 즉, 진휼(賑恤)과 동시에 관곡을 신곡으로 교체하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1423년(세종 5) 1석(石)에 3승의 주144을 받는 고리대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명종 때에는 모곡이 1할에까지 이르고, 회록법(會錄法)이라는 제도로 발전하였다. 회록법이란 모곡 1두 5홉 중 10분의 9는 지방 관아의 수입이 되고, 나머지 10분의 1인 1승 5홉은 호조의 장부에 올려 국가의 회계에 넣는 제도인데, 뒤에는 3분모(分耗) 회록에까지 이르렀다.
이와 같이 환곡은 지방 관아와 중앙 정부의 재원이 되면서부터 굶주린 백성의 구휼이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농민을 수탈하는 수단이 되어버렸다. 조선 후기에 크게 문제가 된 ‘삼정(三政) 문란’이란 곧 전정(田政) · 군정(軍政) · 환곡 등 국가 재정의 3대시정의 문란을 뜻하는 것이었다.
3.3.5. 개항 후의 재정
1896년도의 한국 최초 예산안의 재정 규모는 500만 원 정도로 일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조선 정부의 재정 구조는 1910년까지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 세입에는 지세와 항세, 즉 해관세(海關稅)가 주세입이었고, 상공업 부문으로부터의 수세는 적었다. 이것은 당시 조선 경제가 농촌 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근대적 상공업이 크게 발달하지 못하였음을 반증한다. 위의 예산의 특징은 화폐 발행액이 세입의 5분의 1 이상을 점하고 있고, 재정 적자가 150만 원에 달하고 있는 점이다.
당시 정부는 개항 후 개화 · 자강 정책의 실현을 위해 근대적 시설의 운영, 외국인 고문과 기술자의 초빙, 해외 사절 및 유학생 파견 등을 추가로 필요로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전세(田稅)의 증수는 물론 상공업 분야에서의 새로운 세원(稅源)의 확보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상공업 부문에서의 세입은 미약하였다. 정부는 오히려 지불 보증이 없는 화폐를 증발(增發), 경비를 마련한다는 고식책을 선택하였다. 실질가치보다 명목가치가 높은 당오전 같은 화폐의 발행은 주145의 확보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가 등귀와 인플레 등 유통 질서를 혼란시키는 역기능을 수반하였다. 때문에 화폐를 무한정 발행할 수 없었고 이를 위해 외국의 차관을 도입해야만 하였다.
1881년부터 1894년까지의 외국차관액수는 일본에 69만 원, 청나라에 100만 냥(兩) 정도였다. 1894년에는 일본으로부터 300만 원의 차관을 도입한 일이 있고, 1905년 이후에는 대일차관액이 1300만 원, 1910년경에는 2400만 원에 달하였다. 누적된 적자 재정은 외국의 차관을 필요로 하였고, 또 청 · 일 양국은 차관 공여를 미끼로 조선을 정치적 · 경제적으로 예속화하려고 하였다. 1907년에 범국민적으로 벌어진 국채보상운동은 바로 이 누증하는 외채를 상환하자는 국민들의 자발적 운동이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3.4. 상품경제와 화폐
조선 전기에는 화폐 유통이 저조하여 교역의 매개에는 주로 미 · 포가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1401년(태종 1) 사섬시(司贍寺)를 두어 저화(楮貨)의 유통을 꾀하였고, 세종 때에는 조선통보(朝鮮通寶)라는 동전을 주조, 저화와 병용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화폐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 · 포는 여전히 유력한 유통 수단이었다. 이 가운데 특히 면포가 가장 대표적인 유통 수단이 되었으며, 저화는 자연 소멸되고 말았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상업과 수공업의 발달로 화폐가 필요하게 되고, 정부에서도 경제정책상 화폐가 필요해졌다. 그리하여 1678년(숙종 4) 상평통보(常平通寶)라는 동전이 발행되면서 17세기말 경에는 동전이 전국적으로 유통되기에 이르렀다. 화폐의 유통은 전국 각지의 물산을 상품화시켜 상거래를 촉진시켰다. 따라서 이후 상품의 매매나 임금의 지불, 각종 납세 등에도 화폐를 사용하게 되었다.
개항 전후 시기에 조선의 상업 활동은 주로 육의전(六矣廛) 상인, 공인(貢人) 등의 어용 상인, 그리고 객주(客主) · 여각(旅閣) 등 사상(私商)이 담당하였다. 객주 · 여각 등은 개항 후 거간과 보부상들을 매개로 일본 상인과 거래하였다. 그러나 일본 상인들이 점차 이들 중개 상인을 거치지 않고 조선인 소비자 내지 생산자들과 직접 거래하자 조선 상인들은 위협을 느꼈다. 또, 1880년대에는 개화사상가들에 의해 근대적 회사 설립의 필요성이 역설됨에 따라, 객주와 여각은 상회사(商會社)를 설립, 외국 상인들에 대항하였다.
일종의 동업조합인 상회사는 1883년 원산에서 최초로 설립되었다. 그 뒤 일반 상인들이 양조회사 · 출판사 등을 설립하는가 하면, 정부는 1883년에 보부상을 보호하기 위해 혜상공국(惠商公局)을 설치하였다. 따라서 1894년까지 설립된 상회사의 수는 30여 개에 이르렀다.
정부는 1883년에 주146 · 박문국(博文局) · 전환국(典圜局) 등을 설치하여 각각 무기 제조 · 인쇄 · 조폐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한편, 1887년에는 광무국(鑛務局)을 두어 광산 개발을 감독하였다. 이 외에도 정부 주도로 해운업이 운영되었다.
그런데 1894년 이전까지의 조선의 근대 기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관설회사(官設會社)가 많았다. 더욱이 사기업이라 해도 관리들이 참여하거나 정부의 허가 또는 보호하에 운영되는 관허회사(官許會社) 형태의 것이 많았다. 그러나 1897년 대한제국이 성립되고 독립협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근대적인 민족산업이 크게 발전하였는데, 특히 이때는 민간인의 기업 진출이 활발해졌다.
공업 분야에서는 방직업(紡織業)에 관심이 기울어져 1897년에 안경수(安駉壽)는 대한직조공장을, 그리고 1900년에 종로직조사(鍾路織造社)를 설립, 운영하였다. 방직업 외에도 요업 · 제분정미업 · 금속세공업 · 연초제조업 등의 분야에도 기업인들이 진출하였다.
이러한 상공업의 발전에 발맞추어 은행도 설립되었다. 우리나라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최초의 은행은 1896년 김종한(金宗漢) · 안경수 등이 설립한 조선은행(朝鮮銀行)이었다. 이를 필두로 경강상인(京江商人)들과 김종한이 합작하여 설립한 한성은행(漢城銀行), 1899년 민영휘(閔泳徽) 등이 세운 대한천일은행(大韓天一銀行), 호남의 백인기(白寅基)가 세운 한일은행(韓一銀行) 등이 있었다.
이들 은행은 대체로 거상 배경의 자본가들과 전직 관리들의 합자로 설립되었다. 이들 한국인이 설립한 은행은 일본인 은행에 비해 자본과 경영 실적면에서 열세였다. 개항 후부터 강점 때까지 근대적 산업을 이끌어간 기업가는 관료, 객주 · 여각 등의 상인, 지주, 평민 등 다양한 계층의 출신이었다. 그러나 김종한 · 안경수 · 이용익(李容翊) 등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현직 관료 혹은 관료 출신 기업가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것은 조선의 산업화가 관주도였음을 시사해주는 것으로서 이는 일본의 경우와는 다르고 중국과 유사하였다.
3.5. 교통과 통신
3.5.1. 교통
국내 교역이 대부분 장시나 행상에 의존해 있던 만큼, 도시와 도로의 발달은 더디었다. 지방에는 관아를 중심으로 극히 작은 행정적 소도시가 있을 뿐이었고, 이런 소도시 사이를 연결하는 작은 길이 있을 뿐이었다.
육상 교통에는 보행 아니면 고작 기마나 가마가 사용되었다. 물화의 수송에는 인력과 우마가 이용되었을 뿐, 민간에는 수레도 보급되지 않았다. 수로에서는 판선(板船)이 많이 이용되었다. 관용교통 수단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역(驛)이었다. 주요 도로에는 대개 30리 정도의 거리마다 역을 두고 역마를 배치, 공문을 전송하였다. 그리고 공무 여행자에게 역마를 제공하며, 그 밖에 진상이나 공납의 수송을 담당하게 하였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전국 41개 도(道)의 도로에 540여 개의 역이 있었다. 각 도에는 찰방(察訪)을 두어 이를 관장하게 하고, 각 역에는 역장 · 역리(驛吏) · 역졸 등을 두어 역의 관리와 공역(公驛)을 담당시켰다. 역은 삼남 지방에 가장 조밀하게 분포되었는데, 대개는 각 읍 인근에 소재하였다. 역마 이용자에게는 그것을 인가하는 증표로 마패(馬牌)를 발급하였다. 관료의 품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마패에 동원할 수 있는 마필수를 새겼다. 마패 발급은 중앙에서는 상서원(尙瑞院), 지방에서는 감사와 병사가 하였다.
고관이나 공무 여행자의 숙식에 대비, 지방 관아에는 관(館) 또는 객사(客舍)라는 숙소를 두었고, 요로마다 원(院)이라는 일종의 관영 여숙을 설치하였다. 원은 사용자가 극히 제한된 까닭에 점차 퇴폐해간 것이 많았다. 사용으로 여행하는 민간인은 점(店) 또는 주막이라는 사설 여숙을 이용하였다.
세미(稅米)를 서울로 운송하는 데는 조운(漕運)이라는 수상 운송수단을 이용하였다. 이를 위해 조운 수로의 요지에 조창(漕倉)을 두어 인근의 세미를 집결시켰다. 평안도와 함경도의 세미는 국경의 군량 보급과 사신의 접대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그 도에 보관하고, 나머지 전국의 세미는 조운을 통해 서울로 운송되었다. 조운의 운영은 조선 초기에는 관영이던 것이 중기 이후로는 민영으로 바뀌었다.
개항 후 새로 등장한 대표적 교통수단은 철도였다. 철도의 중요성은 이미 조선 정부 측에서도 인식하고 있어서 국왕은 1883년 미국공사에게 철도건설 계획을 상의하고 1891년에는 경의선 부설 계획도 구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자금 및 기술 부족과 청 · 일 · 미 등의 협조 결여로 좌절되었다.
1896년 일본에 의해 최초로 경인선이 준공되었다. 이러한 외국인에 의한 철도 건설에 자극받아 한국인 자력으로 철도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으나, 일본의 방해, 자금 및 기술의 부족 등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04년 러일전쟁을 전후해서 일본이 경부선 · 경의선을 완공함으로써 한국과 만주 침략의 기간교통로로 삼았다.
조선 정부는 근대적 수상 교통을 위해 1899년에 기선회사를 설립하였다. 이것은 1892년에 관민합병회사인 이운사(利運社)로 흡수되었다. 광무연간에는 민간해운업이 발달하였다. 대한협동우선주식회사 · 인천우선회사 · 인한수선주식회사(仁漢輸船株式會社) 등이 그 대표적인 예였다. 그러나 한국인이 경영하는 해운회사는 활동 영역이 국내의 하천과 연안에 국한되었고, 해외 운수업은 외국 기업들에 의해 장악되었다.
3.5.2. 통신
조선시대 대표적인 통신 수단은 봉수(烽燧)였다. 이는 변방의 긴급한 사항을 중앙이나 변경의 기지에 알리는 군사적 목적의 통신망이었다. 대략 수십 리 간격으로 마주 바라보이는 산봉우리를 잇는 봉수대 또는 연대(烟臺)에서 밤에는 불, 낮에는 연기로 신호를 보내 이어가는 방식이었다. 주요 봉수선은 서울을 중심으로 함경도의 경흥, 경상도의 동래, 평안도의 강계와 의주, 전라도의 순천 등 다섯 곳을 기점으로 하고 서울의 주147을 종점으로 연결되었다.
중앙에 보고된 신호는 병조가 이를 주관하여 승정원에 보고하는 체계였다. 위의 다섯 간선 외에도 보조선이 조직되어 있었고, 국경 지대에는 각 초소로부터 본진으로 연결된 것도 있었다.
조선에 부설된 최초의 근대적 전신 시설은 청나라가 1883년에 군사 · 경제적 목적으로 개설한 서울―인천―의주 간의 주148이었다. 일본은 이보다 조금 앞서 1883년에 부산∼나가사키(長崎) 간의 해저 전선을 개통한 바 있다. 1888년에는 조선전보총국 관할하에 서울∼부산 간의 전신선으로서 남로전선(南路電線)이 개통되었다. 이것은 조선 정부가 주관하였으나 1905년에 관할권이 일본으로 넘어갔다.
그 뒤 1891년에는 서울∼원산, 1899년에는 서울∼함흥 간의 전신이 가설, 개통되었다. 남로전선이 개통되면서 처음으로 모스부호를 이용한 한글전신부호가 제정되었다. 조선 정부는 1884년에 홍영식(洪英植)의 건의에 따라 미국의 우편제도를 모방하여 우정국을 개설하였다. 그러나 그 업무는 갑신정변으로 중단되었다. 그 뒤 1893년에 전우총국, 1895년에 우체사(郵遞司)를 두어 우편 사무를 재개하였으며, 1900년에는 만국우편연합에 가입하였다.
4.1. 호구
조선시대 호구 파악은 국가운영상 매우 중대한 과제였다. 즉, 인구보다도 역(役)의 부담자를 알아내려는 목적이 앞섰으므로 항상 정(丁)의 조사에 중점이 두어졌다. 호구 파악은 매 3년마다 하는 호적 정비를 통해 실시하였다. 호적에 기재되는 사항은 주소, 본인의 관직 · 성명 · 연령 · 4조(四祖), 처의 성씨와 연령, 솔거 자녀의 성명과 연령, 노비 및 고공의 성명과 연령 등이었다.
호란 오늘날 가구의 뜻인 가호를 이르기도 하였고, 법제상으로는 3가(家) 외에 3정(丁)을 호로 편성하였는데 신분의 고하와 역의 경중에 따라서도 달랐다. 또, 호의 등급도 인정 · 전결, 또는 가택의 간가수(間架數) 등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였다. 호가 군역과 결부될 때는 정규병을 뜻하고, 호와 봉족을 아울러 이를 때는 호보(戶保)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한편, 구(口)는 당시 호구 통계자료에 따라 남정을 뜻하기도 하고, 남 · 여 정(丁)을 뜻하기도 하였다. 또, 호구는 호와 구, 또는 호구수라는 뜻 말고도 호적이나 호적단자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법제상 호의 등급은, 그 호의 정수(丁數) · 가산(家産) 또는 가옥 간가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대 · 중 · 소의 3등급으로 가르는 것이 고려 말 이래 통례였다. 이후 조선 건국 초에 주149에 따라 정해진 3등호제 계정계전절충법을 거쳐 주150으로 바뀌면서 호의 등급도 대 · 중 · 소 · 잔(殘) · 잔잔(殘殘)의 5등호제가 되었다.
한편, 자연호의 경우는 신분과 빈부의 차이에 따라 수십 명에 이르는 대가족이 있는가 하면, 불과 서너 명의 소가족도 있었다. 호적 정리와 함께 5가작통법이라는 겨린[切隣]의 공동책임제와 호패라는 신분 증명의 패용을 아울러 실시하게 한 것도 호구 파악을 위한 제도였다. 조선의 역대 호구의 추세와 호구 자료를 통해 추정한 조선시대의 인구 규모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 연대 | 호 | 구 | 추정 인구 |
|---|---|---|---|
| 태종6 | 180,246 | 370,365 | 5,869,000 |
| 세종 때 | 220,375 | 801,847 | 6,512,000 |
| 인조26 | 441,321 | 1,531,365 | 10,860,000 |
| 효종8 | 658,771 | 2,290,083 | 11,226,000 |
| 현종10 | 1,313,453 | 5,018,644 | 13,192,000 |
| 숙종43 | 1,560,561 | 6,846,568 | 16,347,000 |
| 영조 29 | 1,772,749 | 7,298,731 | 18,656,000 |
| 순조7 | 1,764,504 | 7,561,403 | 18,619,000 |
| 철종3 | 1,588,875 | 6,810,206 | 16,625,000 |
| 광무8 | 1,419,899 | 5,928,802 | 17,219,000 |
| 〈표 1〉 조선시대 호구수와 추정인구 | |||
| *주 : 태종 6년의 호수는 수도 제외, 세종 때 추정인구는 세종 14년의 것임. | |||
4.2. 신분
조선시대 신분 계층은 학자에 따라 달리 분류될 수도 있겠으나, 대체로 15세기에는 양반 · 상민 · 천민의 3계층으로, 16세기 이후에는 중인층의 형성으로 양반 · 중인 · 상민 · 천민의 4계층으로 대별된다. 15세기는 사회 신분층이 크게 개편된 시기로, 양인의 확대와 함께 지배층의 계층 분화가 진행되었다. 양인층의 확대 시책으로는 노비의 주151, 승려의 환속, 신량역천층(身良役賤層)의 설정, 신백정(新白丁)의 양인화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집권 사대부들은 향리 · 서리 · 기술관 · 서얼 등이 관료로 진출하는 길을 크게 제약하였다. 그 중 주요한 것으로는 향리의 과거응시 자격의 대폭 제한, 주152의 처벌, 군현 개편에 따른 향리의 대폭적인 이동, 그리고 한품서용법 등을 들 수 있다.
4.2.1. 양반
양반이란 고려시대에는 문반과 무반을 아울러 지칭하는 말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와서는 사회 지배층인 사대부 계층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 사대부의 법제상 개념은 5품 이하의 관료인 사(士)와 4품 이상의 관료인 대부(大夫)의 통칭으로서 품계가 있는 관료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박지원이 “독서인을 사라 하고, 벼슬한 사람[從政人]을 대부라 한다.”고 하였듯이 글공부를 하여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장차 벼슬길로 나갈 사람을 뜻하게 되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양반층은 고려시대의 문벌귀족에 비해 그 저변이 많이 넓어졌다.
양반 가문이 증가함에 따라 관료 진출에 과거가 중시된 반면, 가문을 보아 등용하던 음서의 비중은 줄어들었다. 따라서, 양반 자제는 출세하려면 과거를 치러야 하였고, 과거를 치르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유교적 교양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여러 교육기관에서 주153와 주154의 학문을 열심히 닦았다. 이는 양반이란 곧 관료로 출세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는 계층을 뜻하였다. 관료가 되면 국가로부터 토지와 녹봉을 받아 생활이 안정되었고, 부역의 의무를 지는 괴로움도 겪지 않았다.
그런데 같은 양반이라도 문관이 요직을 독점하였으므로 문관이 무관보다 지체가 높았다. 또 양반 자손이라도 서얼은 차별 대우를 받았다. 서얼에게는 문과에 응시할 자격조차 주지 않았고, 관료가 되어도 당상관에 승진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재가한 여자의 자손은 벼슬할 수도 없었다. 지역적 차별도 있어 평안도 · 함경도 출신은 약간의 예외를 제하고는 높은 지위에 등용하지 않았다.
서울 양반들은 북촌과 남촌에 모여 살았다. 그 중 북촌은 득세한 양반들이 사는 지역이었고, 남촌은 세도에서 밀려난 양반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다. 지방 양반들은 흔히 동족촌락을 이루며 각기 그 지방에서 토호 노릇을 하였다.
양반들이 사는 마을을 반촌(班村)이라 하고, 상민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민촌(民村)이라 하였다. 조선 전기의 양반은 대체로 지주이자 지식층으로서 관료층을 이루었다. 설사 벼슬하지 못하였을지라도 학덕을 쌓아 선비로서의 품위를 갖추면 사회 지도층으로 존경을 받았다. 반면 양반으로 태어났어도 상민이나 다름없이 산 사람도 있고, 정국(政局) 변동으로 양반 계층에서 탈락하는 자도 있었다.
양반관료의 등용에는 과거제가 매우 중시되었다. 과거에는 문관에 소과(小科)와 대과(혹은 문과), 무관에 무과, 기술관에 잡과가 있었다.
먼저 소과에는 유교의 경전을 시험보는 생원과(生員科)와 시(詩) · 부(賦) · 송(頌) · 책(策) 등을 시험보는 진사과(進士科)가 있었는데, 이를 통틀어 생진과 또는 사마시(司馬試)라 하였다. 소과에는 초시(初試)와 복시(覆試, 또는 會試)가 있었다.
초시는 한성부와 각 도의 감영에서 주관하였다. 소과초시에 대행되는 것으로 서울에 승보시(陞補試)와 각 도에 공도회(公都會)가 있었다. 이들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복시를 치르는데, 각 과에 100인씩 모두 200인이 뽑혔다. 합격자는 백패(白牌)라는 합격 증서를 받고, 생원 · 진사의 칭호와 함께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와 동시에 하급 관료가 되는 자격과 성균관에 입학하는 자격 및 대과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졌다.
대과에는 생원 · 진사와 하급 관료가 응시하였다. 시험 과목은 유교 경전과 사서(史書) 및 사장(詞章)이었다. 대과 역시 초시는 한성부와 각 도 감영에서 시행되고, 이에 대행되는 것으로 통독(通讀)이 있었다. 대과복시에서 33인이 선발되고, 다시 전시(殿試)에서 갑과 3인, 을과 7인, 병과 23인으로 등급이 결정되었다. 대과 급제자에게는 홍패(紅牌)가 하사되었다. 갑과의 장원은 종6품, 을과는 정8품, 병과는 종9품으로 등용되었다. 기성 관료로서 장원한 자는 4등급, 을과는 2등급, 병과는 1등급씩 승진되었다.
무과에는 초시 · 복시 · 전시의 3단계가 있었다. 초시는 서울과 지방에서 각각 시행하였다. 복시는 서울에서 28인을 뽑고, 전시에서는 갑과 3인, 을과 5인, 병과 20인으로 등급이 결정되었다. 무과의 시험 과목은 궁술 · 창술 · 격구 등의 무예와 병서 및 유교 경전이 부과되었다. 무과 합격자는 선달(先達)이라 하고, 등용되는 품계는 문과의 경우와 같았다.
잡과에는 역과(譯科) · 의과(醫科) · 음양과(陰陽科) · 율과(律科) 등 4과가 있었다. 잡과 합격자는 사역원(司譯院) · 전의감(典醫監) · 관상감(觀象監) 및 형조 등의 종7품 이하 기술관으로 채용되는데 모두 동반 체아직에 속하였다.
과거 중 매3년마다 자(子) · 묘(卯) · 오(午) · 유(酉)의 해에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식년시(式年試)라 하였다. 임시로 시행하는 과거로는 국가에 큰 경사가 있을 때 실시되는 증광시(增廣試), 임금이 친림하는 알성시(謁聖試) · 춘당대시(春塘臺試), 절일에 시행되는 절일제(節日製) 등이 있었는데 선발 인원은 일정하지 않았다.
실제 문과 응시는 양반 자제에게만 허락되었고, 무과는 천민만을 제외하고 응시의 문을 넓혔다. 현직 관료의 문과 응시는 대과는 당하관 이하, 소과는 5품관 이하만 응시할 수 있고, 수령의 소과 응시는 금지되었다.
향리 억압책으로 향리의 과거 응시에는 많은 제약이 따랐다. 또 서얼이나 재가녀(再嫁女) 자손은 소과 · 대과의 응시가 허용되지 않았다. 양인의 응시를 제약하는 규정은 따로 없었으나 경제 사정이나 교육 여건, 그리고 신원보증서에 해당하는 주155의 제출 등으로 실제 응시는 어려웠다.
과거제도와는 별도로 특정직 임용 또는 승진을 위한 취재(取才)가 있었다. 문관으로는 수령의 선임, 경아전인 녹사(錄事) · 서리(書吏)의 임용을 위한 취재가 있었다. 무관의 경우 시취(試取, 역시 취재라고도 함)는 무과 응시자격의 부여, 무과 합격자의 임관, 해직자의 재임용, 무록군관의 급여 등을 위한 시험이었다.
이 밖에 공신이나 당상관의 자제를 과거에 의하지 않고 등용하는 음서(南行이라고도 함)의 제도가 있었다. 음서에는 학문과 덕행으로 천거, 임용되는 추천(推薦)과 유공자의 자손이나 궁정의 친척 등에게 관직이 주어지는 문음(門蔭)이 있었다.
4.2.2. 중인
조선 건국 초부터 집권 지배층의 자기도태 시책으로 16세기 이래 향리 · 서리 · 기술관 · 서얼 등의 신분이 격하하여 중인이라는 새 계층이 형성되었다. 중인은 양반과 상민의 중간 계층으로, 좁게는 서울의 기술관을 뜻하였으나, 넓게는 서울과 지방의 하급 관리인 아전 · 군교, 서얼 등의 계층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었다. 중인인 서울의 기술관은 의관 · 역관 · 율관(律官) · 산원(算員) · 관상감원 · 사자원(寫字員) · 화원(畵員) 등인데, 중인이라는 이름은 그들이 서울의 중부에서 살았기 때문이었다.
잡과계의 교육은 각기 그것을 담당하는 관서에서 맡아 가르쳤다. 즉, 역학(譯學)은 사역원, 의학은 전의감, 천문 · 지리 · 명과(命課, 또는 占卜)는 관상감, 산학(算學)은 호조, 화학(畵學)은 도화서, 도학은 소격서(昭格署) 등에서 담당하였다.
서울의 서리는 경아전, 지방의 서리는 향리이다. 경아전에는 녹사(錄事) · 서리(書吏)가 있었다. 녹사는 종6품까지, 서리는 종7품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조선 초기 녹사에게는 퇴직 후 수령의 자격 시험에, 서리에게는 주156 · 도승(渡丞)의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져 그들 중 상당수는 수령이나 역승 · 도승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5세기 말부터 그 길이 막히고 중인은 중인 계층의 신분으로 굳어졌다.
지방 관아의 서리는 향리 또는 외아전이라 하고, 국역(國役)의 특수 형태인 향역을 부담하는 유역인(有役人)으로 파악되었다. 세종 말에는 향리에게 주던 주157 제도가 폐지되었다. 뿐만 아니라 당초부터 녹봉이 지급되지 않아 지방 관아에서 일정한 삭료(朔料)가 지급될 뿐이었다.
일률적으로 향리라 해도 그 내부에는 신분적 차등이 있었다. 즉 호장층 · 육방층 · 색리층이 있어, 호장층은 지방 행정의 고문역을 맡고, 육방층은 지방 행정의 실무, 색리층은 향역 중 천역을 맡았다. 군교는 중앙에서는 궁중의 사역을 맡는 액례(掖隷)와 각 군영의 ‘군영소속’이 있고, 지방에는 군교라는 직역이 있었다. 군교는 향리와 함께 이교(吏校)라고 합칭되기도 하지만, 향리는 군교보다 그 지체가 조금 높은 것으로 여겨졌다.
서얼은 중인과 같은 신분적 처우를 받았으므로 중서(中庶)라고 합칭되었다. 서얼은 문과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여 동반직 등용을 금하였고, 간혹 서방직에 등용되어도 한품서용의 규제를 받았다.
중인은 대개 기술이나 행정의 실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실속이 있고 나름대로 행세를 할 수도 있었다. 예컨대, 역관이 사신을 수행하여 무역의 이득을 본다든지, 지방 향리가 수령을 조종하여 세도를 부린다든지 하는 따위이다. 한편, 중인의 기술 교육은 그 업무를 관장하는 관서에서 맡아 하였다. 이들 중 과거의 잡과에 합격되면 체아직으로서 관직에 나갔으나, 한품서용으로 당하관에 그쳤다.
4.2.3. 상민
상민은 농민의 상층부와 약간의 상공인이 이에 포함되어 있었다. 상민은 백성 · 양인(良人) · 평민 · 서인(庶人) · 상인(常人) 등 여러 이칭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상민과 천민의 구별이 뚜렷해, 전기에는 상민에게 군역의 의무가 있었으나 천민에게는 그 의무가 없었다.
상민은 법제적으로 과거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의복 · 가옥 · 일상 거동 등에서 관직이 없는 양반과 비슷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록 상민에게 과거 응시의 길이 열려 있다고는 하나, 경제적 · 사회적 여건으로 진출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농민의 신분 구성은 크게 상민층과 천민층으로 이루어졌다. 농민은 국가에서 토지를 분급하지는 않았으나, 자기 토지를 소유한 자작농도 있고, 자작 겸 소작농도 있으며, 전호라는 단순 소작농도 있었다.
조선 전기에는 토지를 소유한 농민이 7할이었으나 후기에는 토지 없는 농민이 7할로 역전되었다. 자작 농민은 국가에 전세를 물고, 소작농인 전호는 전주에게 병작반수제(竝作半收制)에 따라 수확량의 2분의 1을 전조(田租)로 바쳤다.
상민은 16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는 정남(丁男)이라 하여 요역과 군역의 의무를 부담하였다. 토목 공사나 잡역에 동원되는 요역은 법으로 1년에 6일간이었지만, 사실상 수시로 징발되었다. 군역은 상민의 의무 병역으로서 입속하던 병종은 정병(正兵)과 수군(水軍)이었다. 복무 형태는 두 가지로서, 하나는 정군으로 당번 입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봉족(奉足)으로서 정군의 재정적 뒷바라지를 담당하는 것이었다.
농민에게는 또 공물이라 하는 지방 토산물의 공납 의무가 있었다. 농민에게 공납은 전세보다 무거운 부담이었다. 지방 장관이 국왕에게 바치던 진상도 결국은 농민들의 부담이었다.
양인과 천민 사이에 신량역천의 계층이 있었다. 초기에는 양인 확대 시책에 따라, 종래 천민으로 간주되어왔지만 양 · 천이 불분명하였던 간 · 척, 양반의 비첩산(婢妾産), 천남(賤男)과 양녀(良女) 사이의 소생, 고려의 판단백성(判斷百姓) 등이 신량역천으로 설정되었다.
후기에는 조례(早隷) · 일수(日守) · 나장(羅將) · 조군(漕軍) · 수군 · 봉수군 · 주158 등을 칠반천역(七般賤役)이라 하였다. 이들은 신분상으로는 양인이면서 직업이나 부과된 역이 천역인 계층이다.
4.2.4. 천민
사회 계층 중 최하층인 천민의 대다수는 노비였다. 노비는 상전이 누구냐에 따라 공노비와 사노비로 구별되었다. 공노비는 공천이라고도 하여 왕실이나 국가기관에 예속된 노비를 이르고, 사천이라고도 하는 사노비는 개인 노비였다. 같은 노비라도 사노비는 공노비보다 더 천시되었다.
노비는 다시 독립된 가호를 가지고 따로 살림을 하는 외거노비와 상전의 집안에서 기거하는 솔거노비로 구분되었다. 외거노비는 솔거노비보다 사회적 · 경제적으로 조건이 좋은 편이었다. 공노비는 또 의무 부담의 내용에 따라, 서울이나 지방 관아에 일정 기간 입역(立役)하는 선상노비(選上奴婢)와 노비 신공(身貢)으로 신포(身布)를 사섬시에 바치는 납공노비(納貢奴婢)로 구분되었다.
납공노비는 선상노비에 비해 의무 부담이 조금 가벼운 편이었다. 사노비도 그들의 상전에게 노역을 제공하거나 신공을 바쳤다. 노비 소생은 아버지의 신분이 어떻든 간에 고려시대 이래 적용되어온 주159에 따라 상전 소유의 노비가 되었다. 다만 종친의 2품 이상의 첩자손이나 적자손이 없는 양반의 첩자손 승중자(承重者)에게는 주160을 적용하였다. 때문에 노비 신분이 상승하는 길은 거의 막혀 있는 실정이었다.
노비는 재산으로 간주되어 토지나 가옥처럼 매매, 증여, 상속되었다. 상전은 노비를 마음대로 형벌할 수 있었고, 관아의 허가를 얻으면 죽일 수도 있었다. 노비는 모반죄를 제외한 상전의 어떤 범죄도 관아에 고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만일, 노비가 상전을 고발하면 강상을 어긴 것으로 인정되어 교살죄(絞殺罪)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노비 중에는 토지나 가옥뿐만 아니라 다른 노비까지 소유한 자도 있었는데, 이는 법률로도 인정되었다. 특히 농장(農莊)을 관리하는 간복(幹僕)은 대단한 재산과 권세를 누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노비 중에는 공장으로 수공업에 종사하는 자도 있었고, 상업에 종사하는 자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비는 마치 서구 농노처럼 상전의 토지에 묶여 그것을 경작함으로써 연명하였다.
천민에는 노비 말고도 재인(才人) · 백정 · 무당 · 주161 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백정이 가장 천시되었다. 백정은 고려시대에는 주162이라 하여 극도로 천대받다가 세종 초에 백정이라 개칭되고 사회적 대우도 다소 개선되었다. 재인 · 백정은 원래 이민족(異民族)으로 특수 집단을 이루고 주163 제조나 가축 도살 등 특수 직종에 종사하였다.
그들이 전통적인 유목 생활의 유습에서 농경민으로 전환하게 된 것은 조선 중기 이후의 일이다. 재인은 광대라고도 하여 음악을 직업으로 하였다. 그 계보는 백정과 구별이 있었던 것 같으나, 조선시대에는 동일시되었다. 단골은 남자는 박수, 여자는 무당이라 하여 민속 신앙에 종사하였으며, 재인과 혼인하는 일이 많았다.
4.2.5. 신분 변동
조선 중기에 이르러 양반 중심 사회에 신분제의 변동이 일어났다. 즉, 계속 정권에 참여한 양반인 벌열과 정권에서 소외되어 지방에 토착 기반을 가진 향반(鄕班), 향반 중에서도 가세가 몰락한 잔반(殘班) 등으로 양반층이 분화되었다. 이 중 향반은 벌열에 비해 지위가 떨어졌으며, 잔반은 대부분 소작농이 되었는데 그 수는 점차 늘어갔다.
한편, 중인 계층에도 신분상의 변화가 이루어졌고, 적서 차별도 조금은 개선되어 규장각(奎章閣)의 요직인 검서관(檢書官)에 서얼 출신이 임명되기도 하였다. 역관들은 청나라를 내왕하면서 견문도 넓히고 사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여 사회적 지위를 높여갔다. 의관은 전문적 기능으로, 서리들은 행정 능력이나 문학적 소양으로 새로운 사회적 위치를 차지해갔다.
상민의 대부분을 차지한 농민도 계층 분화가 일어났다. 농민 중의 일부는 농업 기술의 발달, 농업 경영 방법의 개선, 상업 농업의 발전 등으로 부농이 되거나 서민 지주가 되기도 하였다. 또, 납속책(納粟策)으로 공명첩(空名帖)을 사서 신분을 높여 군역을 면제받기도 하였다.
노비제도도 무너졌다. 임진왜란 때 노비문서가 불타버린 데다 국가에서 군사적 · 재정적 이유로 신분상의 제약을 점차 풀어주었기 때문이다. 즉, 속오군(束伍軍) 등으로 군에 편성한 후 무술 시험을 통해 양인이 되기도 하고, 2대 이상 양역(良役)에 종사하였다 하여 양인 신분을 얻기도 하였다. 또, 전란 때 군공을 세우거나 혹은 주164으로 양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마침내 1801년(순조 1) 공노비를 해방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관노비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사노비는 그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노비제도 자체는 그대로 지속되었다. 이후 이것이 완전히 혁파된 것은 갑오경장 때 이르러서였다. 조선 후기 신분제의 변동으로 양반호가 현저히 증가한 반면, 노비호는 격감되었다. 노비에서 상민으로, 상민에서 양반으로 신분 상승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신분 상승을 가능하게 한 방법으로는 납속책 · 신분모칭(身分冒稱) · 주165 · 노비종모법 등이 있었다.
4.3. 가족과 친족
조선시대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는 가족이었다. 가장은 대내적으로 가족공동체를 지휘, 통솔하고 대외적으로 가족을 대표하였다. 가족 집단은 가부장의 권위로 유지되었으므로, 민간에서의 계약은 가장의 의지로 행해졌고, 관청에서 내리는 명령도 가장을 상대로 하였다.
또, 조상의 제사를 주재하는 일, 가정을 관리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일, 자녀의 교육과 혼인에 관한 일 등이 모두 가장권으로 집약되었다. 가장과 가족 성원과의 관계는 효도와 정렬 등 유교적 윤리 덕목으로 맺어져 있었다. 조선시대 친족의 단위는 가(家)만이 아니라 그보다 큰 문중(門中)이었다. 문중이란 부계의 일족 분파로서 이를 종족(宗族)이라 하고, 종족 집단에서의 통제 규범을 종법(宗法)이라고 하였다.
조선 초기에 주자의 『 가례』가 유행되면서 의식도 유교식으로 정착되어갔다. 이에 따라 종족 집단이 점차 조직화하여 종중에는 주166가 생기고, 종중 재산이 형성되었다. 아울러 종족의 공동 이익이나 상호 부조를 위한 주167가 운영되었다.
16세기부터 족보가 널리 유행, 종족 관념을 더욱 굳게 하였다. 또, 가족제도와 지연을 결부시킨 집단으로 동족 촌락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친족 집단은 종족에 비해 그 범위가 좁아 4대조를 공동 조상으로 삼는 동고조(同高祖) 8촌의 집단이었다.
그것은 종족 안의 한 분파를 뜻하는 것으로, 제사에서도 4대봉사가 통례화하고, 복상(服喪)의 한계도 남자의 경우 8촌친까지였으며, 족징(族徵)의 한계도 8촌의 범위였다. 따라서, 친족은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인 가족이 확대된 것이고, 또 종족은 친족 집단의 연장으로서 각기 사회 구성의 단위가 되었다.
가족제도와 관련된 예법으로 혼인 · 상장(喪葬) · 제사가 있다. 이러한 예법은 양반가에서 엄격히 준행되었고, 서민 사회에서는 훨씬 가볍게 다루어졌다. 혼인에 있어서는 고려 말기 이래 금해오던 동성혼이 더욱 엄격히 금지되었고, 외척과의 혼인도 6촌 이상으로 정해졌다.
혼인 연령은 『경국대전』에 남자 15세 이상, 여자 14세 이상이라 하였다. 재혼은 남자의 경우 처가 사망한 뒤 3년이 넘어야 하였고, 여자의 재혼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태종 때 서얼금고법(庶孽禁錮法)이 제정되어 적 · 서 차별이 심하였다.
가부장적 가족제도 아래 여자의 지위는 남자보다 낮아서, 사회적 활동은 제한되고, 법률적 행위는 반드시 남편이나 가장의 허락이 있어야 하였다. 여필종부라 하여 순종은 여성의 미덕으로 삼았고, 정절은 부녀의 생명보다도 중히 여겼다.
상장은, 상복의 양태에 따라 참최(斬衰) · 재최(齊衰) · 대공(大功) · 소공 · 시마(緦麻)의 오복제도(五服制度)였다. 복상 기간은 3년(27개월) · 기년(12개월) · 대공(9개월) · 소공(6개월) · 시마(3개월)로 구분되었다.
남자는 본종의 8촌친까지, 외친은 4촌친까지, 처친은 처부모와 여서(女婿) 및 2촌친의 외손까지를 한계로 하였다. 여자는 부족(夫族)에 7촌친까지, 친가의 5촌친까지를 한계로 하였다. 부모상은 3년상이지만 이것은 사대부의 경우고, 일반 서민은 100일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뒤에는 반상의 구분 없이 3년상이 되어버렸다. 제사도 원래 6품 이상의 관료는 3대까지, 7품 이하는 2대까지, 서민은 부모 1대에 한하였으나 뒤에는 상하 없이 4대봉사가 일반화되었다.
제사는 적장자가 주관하는 것이 원칙이나, 적장자에 후사가 없으면 차자가 받들고, 차자도 무후하면 양첩자(良妾子), 그도 후사가 없으면 입후(立後)라 하여 종족 안에서 양자를 들여 봉사하게 하였다. 그러나 후기에는 서자도 무시하고 적자에게 후사가 없으면 곧바로 양자를 들여 대를 이었다. 가계와 혈통은 매우 중요시되었으므로 봉사와 입후 또한 중히 여겼다. 재산 상속은 종법에 따라 자녀에게 고루 분배하였으나, 제사 주재자의 계승이라는 의미에서 적장자에게 분배된 비율이 높았다.
4.4. 향촌사회
조선시대 지방 사회의 구성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면리제(面里制)의 확립이었다. 고려시대에서 이(里)란 개경(開京)의 하부 편제의 단위 이름이었는데, 말기에 이르러 지방의 자연촌도 이(里)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조선 건국 후에는 이장 · 이정의 제도가 행정 체제의 말단을 이루게 되었다. 자연촌이 이로 체계화한 배경은 자연촌의 규모가 커진 자체적 성장, 그 상부 구조의 약화, 집약 농업으로 농업 기술이 발달한 데 따른 공동체적 질서의 변모 등을 들 수 있다. 이 지역을 수령이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적당히 통괄한 구획이 면이었다. 조선시대 면리제의 운영에는 상반된 측면이 있었다.
하나는 중앙집권적 측면으로, 수령이 이(里)를 직접 통제하기 위해 면 단위로 지방의 유력층인 유향품관(留鄕品官)을 권농관 · 군적감고(軍籍監考) 등으로 삼아 수령의 행정을 협조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재지적(在地的) 성향을 가지고 면 혹은 군현 단위의 자치를 요구한 것인데, 각 지방에 유향소(留鄕所)가 세워진 것은 그 까닭이다.
고려시대에는 대개 지방의 유력자인 중소지주층이 그 고장의 자치권을 누려 중앙집권과의 마찰이 없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중소지주층이 대개 관료신분층으로 전환되면서, 중앙집권적인 통제와 재지 세력에 의한 자치라는 양면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초기에는 중앙집권적 힘이 우위였다. 따라서 자의적으로 세워진 유향소가 혁파되기도 하고, 복설되어 제도로 공인되던 단계에서는 수령의 보조 임무만이 부여되었다. 또, 중앙의 현직 관료에게 연고지의 유향소를 통제하게 하는 경재소제도가 생기기도 하였다.
유향소의 명목상 임무는 향풍(鄕風)의 규제 등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군현 안의 전세 · 역 · 공물 등을 배정, 주관하는 일에 수령의 보조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이 유향소가 지방 행정에 참여하게 된 것은 이(里)의 직접적인 지배를 추구하던 중앙집권적인 의도를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조선시대 향촌은 중국 송 · 명 때 자연촌을 직접 지배하던 주168나 주169와는 달랐다. 도리어 중기 이후에는 유향소의 후신인 향소 내지 향청의 향임(鄕任) 주도 아래 면에는 면임, 이에는 이임이 두어지면서 향임이 대표가 되어 수령의 관권과 접합하는 체제로 정착되어갔다.
지방 통제의 구조에서 수령과 향청과 경재소 등이 서로 얽혀진 것은 세 계열이 모두 양반 신분으로서 지방 사회에 대한 지배권이 분배되고 분산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수령과 유향소와의 결탁이 이루어졌는가 하면, 중앙의 권신(權臣)들은 경재소를 이용, 사적으로 특정 지방을 직접 장악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때문에 지방 사회의 질서 확립을 위한 수단으로서 향약이 주목을 끌게 되었다.
향약 보급은 사림세력 계열에서 주장된 것이었다. 15세기 말부터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대두한 사림세력은 훈신(勳臣)이나 척신(戚臣) 계열과는 달리, 대개 지방에 생활 기반을 가진 계열들로서 새로운 성리학적 정치 질서를 추구하였는데, 그 한 방법으로 향약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사림세력이 정치적 주도권을 잡게 되자, 1603년(선조 36)에 경재소 제도는 혁파되고 말았다. 이로써 중앙의 현직 관료가 지방 사회를 지배하던 구조는 사라지게 되었다. 사림은 서원을 중심으로 향권을 주도하는 한편, 자연촌에 향약을 실시하여 지방의 지배 질서를 확립해갔다.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에 걸쳐 사회적 · 경제적 변동으로 지방 사회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16, 17세기는 사족(士族)의 향촌자치제였으나 18세기에는 사족 외에 소농민 경제의 발전으로 주170이 등장하였으며, 이들 신향이 18세기 후반부터 향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사족의 향촌지배력이 상실되고 국가가 농민에 대한 직접 지배를 강화하면서 민란이 야기되었다.
그런데 지방 사회의 하부 구조를 이해해야 할 것으로 촌락제(村落祭)와 동족 촌락의 문제가 있다. 촌락제는 이(里)로 된 자연촌의 질서를 위해 행해진 행사로, 고려 때의 향도(香徒)에서 유래된 것이다. 향도는 고려 중기까지는 군 · 현 단위의 불교적 행사였으나, 고려 말기에는 규모가 이 단위로 축소되고, 신앙 대상도 자연촌의 수호신으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16, 17세기 향약의 실시는 이가 그 단위로서 촌락제의 대상만을 유교적인 것으로 교체하려는 것이었다. 한편, 17세기 후반부터 자연촌 내부에 동성동본의 동족 촌락이 이루어지기 시작, 부계 중심의 혈연 의식이 고착되었다.
4.5. 사회적 갈등과 민의 항쟁
4.5.1. 민의 항쟁과 성장
15, 16세기에는 한국 중세시기 가운데서 농민의 항쟁이 가장 덜 활발하였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민의 항쟁은 15세기 후반부터 점차 활발해져서 16세기 후반에는 꽤 격화되었다. 15세기 전반에는 명화적과 백정의 활동이 자주 기록에 나타난다. 평안도 대성산 농민항쟁은 신분제와 지역적 특성과 관련하여 장성 축조에 동원되고 또 사민에 쫓기는 등 어려운 처지에 몰린 사람들의 투쟁이었다.
15세기 후반 이후 도적, 수적에 대한 기록이 많아져, 경제력 회복 이후 토지소유의 집중 현상이 재연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준다. 도적 집단의 일부는 장시와의 관계 속에서 활동하였다. 홍길동이라는 도적의 활동이 대표적이다.
16세기 후반 임꺽정 집단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왕실 외척에 의한 정치가 진행되면서 부정부패가 심해진 속에서 백정 출신 임꺽정의 도적활동에 향리층, 서민층이 쾌감을 느끼거나 동조한 것이 특징이다. 의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다. 이처럼 조선 전기에는 대체로 민생고에 의해 일어난 도적 활동이 중심이었다. 국가 및 지주층을 대상으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진행된 항쟁은 찾기 어렵다.
17세기는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는 사정 때문에 농민항쟁이 전개되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었다. 그럼에도 분산적인 항쟁 활동은 계속되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양반가의 노비 추쇄에 대한 저항이다. 임진년 전쟁 때 많은 노비가 도망하자, 양반들은 국가 권력에 의지하여 이들을 추쇄하고자 하였다. 노비들은 살주계(殺主契), 주171 등을 조작하여 저항하였다. 이어서 17세기 말에는 도적 집단의 활동이 다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장길산의 무리가 가장 유명하며, 지방 장시의 발달이 군도(群盜) 활동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안성, 부안의 내변산 지역 등이 그 집결지로 유명하다.
18세기 이후 나타나는 중요한 양상은 민중의식의 성장이다. ‘민중’이라는 용어를 이제는 잘 쓰지 않으나, 1980년대 사회민주화운동의 열기가 활발할 때 스스로 자신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처지를 인식하게 된 피지배층을 부르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조선의 역사에서 그러한 존재로서의 민중이 출현한 시기가 18세기였다. 18세기 이후 증가한 몰락한 양반 지식인 또는 유랑 지식인 계층도 민중의 의식 성장에 상당한 작용을 하였다. 그러나 18세기까지는 민중이 스스로 항쟁에 나선 경우가 거의 없었고, 양반 사족이 정치적 목적으로 변란을 기도하였을 때 그에 동원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9세기 농민항쟁이 전개되면서 그 과정에서 민중의 조직이 발전하고, 민중의식도 아울러 성장하였다.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삼정문란으로 표현되는 부세제도 운영에서의 모순이었다. 수령과 향리, 향임 세력의 수탈 심화, 세도정권의 국정운영에 따른 문제 등이 겹치면서 국가와 농민 사이의 대립, 지주와 전호 사이의 대립이 전개되었다.
민중 불교와 미륵신앙이 중심이 되어 무속이나 정감록(鄭鑑錄)의 운수사상 등과 결합하여 민중사상이 형성되었다. 게다가 천주교가 서학의 일부로 전래되어 18세기 말엽부터 서양의 철학 내지 종교로서 파급되기 시작하였다. 19세기 초에는 서민들에게도 전파되었는데, 이는 한글로 된 천주교 서적이 영향을 미쳤다. 1801년 조선 천주교회는 83종의 한글 서학(西學) 책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18세기 말엽 주로 지식인들이 관심을 갖고 천주교에 접근하던 것에서 바뀌어 이미 19세기 초에는 많은 서민 신도가 발생하였다. 천주교의 평등 개념은 신분체제에 익숙하였던 신도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충효의 대상인 부모와 군주도 천주의 피조물로서 상대화되었으며, 절대적인 충효에서 상대적인 충효로 변모되었다. 천주교도들은 신분제도에 비판적으로 접근하게 되었는데, 이는 조선 정부와 주자성리학이 천주교를 사학(邪學)으로 규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였다.
1860년에 최제우가 동학(東學)을 창시하였다. 최제우는 19세기 중엽의 조선 사회가 천리(天理)를 따르지 않는 난세(亂世)라고 보고, 서학을 경계하면서 전통사상에 바탕을 두고 동학의 교리를 만들었다. 조선 조정은 동학도 사학(邪學)으로 간주, 1864년 대구에서 최제우를 좌도난정률(左道亂正律)에 의거 사형에 처하였다.
4.5.2. 19세기 농민의 항쟁
농민항쟁의 일반적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촌사회에서 농민들의 집단적 저항이 심해지기 시작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저항 형태는 유망(流亡) 곧 유리 도망이다. 이어서 항조(抗租), 항세(抗稅) 운동으로 진전되는데, 개별적 운동에서 집단적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어서 수령에게 호소문을 보내는 정소(呈訴), 수령이 행차할 때 꽹과리를 쳐서 호소를 들어줄 것을 요구하는 격쟁(擊錚), 관아 앞에 모여서 함께 소리내며 우는 관전(官前) 호곡(號哭), 불만과 요구 사항 등을 글로 써서 붙이는 괘서(掛書), 수령이 지나가는 산길에서 집단으로 소시를 질러 위협하는 산호(山呼), 밤중에 관아 앞에 모여서 횃불을 들고 위협 시위를 벌이는 거화(擧火), 변란(變亂)에의 참여,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관아와 지주가를 공격하는 농민항쟁이다.
변란은 정치적 목적을 띠고 일으키는 난리를 말한다. 곧 정치세력이 주도한 반란이다. 농민항쟁은 조선시대 당시에는 대개 민란이라 하였으며, 농민들이 주도한 저항으로 홍경래가 주도한 평안도 농민항쟁과 1862년의 농민항쟁, 1894년의 농민전쟁 등이 대표적이다. 농민항쟁에는 미륵신앙, 동학 등의 사회변혁을 지향하거나 신앙의 내용에 그러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영향을 주었다. 서학도 일부 영향을 미쳤으나, 직접적인 사상으로 작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개항에서 강제 병합에 이르는 동안은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난 일대 전환기였다. 조선 후기에 빈발하였던 농민항쟁을 통해 전통적인 사회신분제가 해체되고, 그 대신 새로운 사회 질서가 형성되고 있었으나 아직 정착되지 못한 유동적인 상태였다. 임진왜란 후에 나타난 중인층의 성장, 노비의 해방, 양반 특권의 동요 등의 현상이 개항 이후 더욱 촉진되었다. 그러다가 갑오경장을 통해 양반 · 중인 · 상민 · 천민으로 구분되는 엄격한 세습적 신분제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갑신정변과 갑오경장에 서자나 중인 출신이 많이 참여한 점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준양반계층의 사회 진출이 두드러졌다. 개항장의 객주 · 여각 등 사상(私商)들은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였으며, 일반 상인이나 양반 지주들도 근대적 회사나 공장 설립에 참여하는 등 근대적 경제 활동을 벌였다. 전통 사회에서 천대받던 상인계층은 자기들이 축적한 부를 기반으로 갑신정변 · 갑오경장 · 독립협회운동 · 애국계몽운동 등에 참여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관계(官界)로 진출하였다. 이러한 상인 및 기업가의 대두와 함께 부두 · 광산 · 공장 등에서는 근대적인 임금노동자 계층이 창출되었다. 이들 노동자들은 대부분 농촌 사회를 이탈한 농민들이었다.
조선 왕조의 지배층은 주로 주172 출신들이었다. 그러나 개항 후에는 전통시대에서 소외되었던 지역, 즉 서북지방과 영남 · 호남지방의 인사들이 정치 · 경제 · 문화 등 각계 분야에 지도층으로 대두하였다. 기독교 수용이 가장 활발하였던 서북지방 인사들은 애국계몽운동에서 선도적 구실을 담당하였다.
이 시기에는 전통적인 유교 소양을 갖춘 양반 지식인보다는 서구의 근대 문물을 몸에 익힌 개화 지식인이나 개신 유학자 등 자립적 중산층 인사들이 사회 지도층으로 부상하였다. 이들은 전통 사회의 신분 차별 · 가족주의 ·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거족적 · 평등주의적인 민족국가 수립을 지향하였다. 이 시기에는 전통적인 농촌 사회의 구조가 점차 해체되고 있었다. 이 시기에 도시와 농촌에서 성장한 각종 신흥 세력은 1919년 3 · 1운동에서 그들의 단합을 과시하였다.
5.1. 종교와 사상
5.1.1. 유불 교체
고려로부터 조선으로 왕조가 교체됨으로써 유불교체가 이루어졌다. 고려 때 불교가 누리던 국가 종교와 유사한 특권적 지위가 박탈되고, 유교가 그 대신 특권적 지위를 누리게 된 것이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국왕을 비롯한 최고 지배층이 도덕적 규범에서 생활 태도에 이르기까지 기준을 제시하던 가치 규범의 지위를 유교만 누리고, 불교는 탈락하였음을 뜻하였다.
그러나 이 변화가 왕조 교체와 함께 곧바로 전면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이미 고려 말엽에 유교 지식인 가운데 성리학을 수용하고 나아가 주173』에 실려 있는 의례들을 스스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국가가 나서서 사대부들이 모두 『주자가례』의 의례들을 시행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었다.
한편 유불교체가 이루어진 뒤에도 불교의 종교로서의 기능은 단절되지 않고 유지되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유교에도 종교적 속성이 있기는 하나, 불교가 수행한 종교적 기능 전체를 유교가 대신할 수는 없었던 데에 있었다. 다만 조선 건국과 함께 유교만이 국가의 지배이념으로 작동함에 따라, 국가 의례에서 불교 형식의 것은 배제되고, 유교 형식의 것만 시행하게 되었다. 국가 차원에서 거행하던 연등회와 팔관회도 중단되었다.
왕실 구성원이 불교 의례를 거행하는 것은 처음에는 별말이 없었으나, 이것도 차츰 양반층의 비판을 받게 되었다. 신료들과 무관하게 왕실이 행하는 의례는 국왕이 중심이 되어 거행하거나 왕명으로 거행하는 것이 아니면 국가 의례와 구별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왕실의 일과 국가의 일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때가 많아, 왕실의 불사(佛事)가 자주 신료들의 비판을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대왕대비 이하 왕실의 여성들이 불교 의례를 행하는 일은 물론이고, 원당을 짓는 것도 19세기까지 지속되었다.
조선의 유불교체는 중국에서 일어난 원명교체 및 중화주의의 대두와 관련이 깊었다. 명 태조 주원장은 유교 의례를 정리하여 다시 국가의례로 시행하였고, 고려에 이어 조선도 그 영향을 받았다. 그런데 조선은 유교식 국가의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소중화주의라 부를 만한 행태를 보였다. 주(周) 시대의 예기를 복구하여 사용코자 하였고, 의례 거행에 필요한 음악 또한 주 시대의 음률을 복원하고자 하였다. 이는 명에서 사용하고 또 시행하고 있는 예악이 주 시대의 것에서 벗어나 있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한 결정이었다. 즉, 주 시대의 예악 전통을 올바로 계승하는 것은 명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예악의 정비를 진행하였던 것이다.
의례는 『세종실록』 「오례」에서 한 단계 정비한 뒤 『 국조오례의』에 부족하였던 부분들을 채우면서 새로 정비하였다. 의례에는 여러 신(神)에 제사하는 규정처럼 종교적 속성을 띤 것도 있고, 관례와 혼례처럼 일생의례에 해당하는 것도 있는 한편, 군주와 신하가 만나는 의례, 군사 의례와 외교 의례처럼 정치적 성격이 강한 것도 있었다. 관념상으로는 유교에서 법보다 지위가 높았던 의례에는 국왕이 해야 할 행동 등에 대해 규정해 놓았다. 이로부터 국가 의례는 모두 유교의 의례로 거행되었다.
5.1.2. 유교
조선 건국을 추진한 신진사대부의 학문은 성리학이었다. 성리학은 고려 말기에 전래된 주174으로서, 우주의 근본 원리와 인간의 심성(心性) 문제를 다루는 철학적인 유학이었다. 성리학은 건국 후 국가의 장려 아래 크게 발달하였다.
그러나 조선 초기에는 유학의 두 경향이 대립하고 있었다. 그 하나는 문예 · 사장(詞章)을 주로 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정치 ·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학풍이고, 다른 하나는 유교 경전을 통해 유교의 정치 철학을 체득, 이를 정치 현실에 반영시키려는 학풍으로 전자를 주175, 후자를 주176라 한다.
관학파는 철학적인 학문보다 실제적인 법전 · 전례(典禮) · 문예 · 사장 등에 능통하면서 경세(經世)적 학문에 주력, 기성사류(旣成士類)를 형성하였다. 반면, 사학파는 고려 말기 길재(吉再)의 학통을 이었으며, 그 일부가 성종 때 중앙 정계에 진출, 기성 세력과 대립하는 이른바 사림세력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사림세력은 계속되는 사화(士禍)로 박해를 받아 관직을 단념하고 은거하며 학문에만 전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때문에 그들의 학풍은 16세기 이후 철학적 경향이 짙어져 갔다. 한편, 성리학은 인간의 본성을 선(善)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유교적인 교화 정치의 이론적 근거를 찾는 학문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우주만물의 원리를 밝혀내려는 철학적 유학이기도 하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성리학은 주리파(主理派)와 주기파(主氣派)로 갈라졌는데, 주리파는 이언적(李彦迪)에서 비롯되어 이황(李滉)이 대성하였다. 반면, 주기파는 서경덕(徐敬德)에서 비롯되어 이이(李珥)가 대성하였다.
이황은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을 주장하였으나, 그의 이론은 결국 주리적 관점이었다. 주리설에서는 사물의 법칙을 인식하는 것보다 우주의 근원이 되는 생명력에 대한 인식이 더 중요시되었다. 또, 인간의 본질도 실제 행동보다 이념적인 면을 더 추구하였다. 따라서 인간의 도덕적 · 인격적 완성을 가장 중시하였다.
주리파는 이황 이후 유성룡(柳成龍) · 김성일(金誠一) · 정구(鄭逑) 등에 계승되어 이른바 영남학파를 이루었다. 또, 이황의 학문은 일본에 전파되어 퇴계학파를 형성케 하고 큰 영향을 주었다.
이이의 주기설은 사물의 법칙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관점에 서 있었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질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이념적이기보다는 실질적인 윤리를 더 중요시하였다. 이에 이이는 비단 철학자로서만이 아니라 정치 · 경제 · 국방 등 현실 문제에 대해서도 개혁론을 주장하였다. 주기파는 이이 이후 김장생(金長生)과 정엽(鄭曄) 등에 계승되어, 이른바 기호학파를 형성하였다.
이황과 이이는 조선의 유학사상에서 쌍벽을 이루었지만 서로 대립적인 것이 아니고, 다만 시대 배경이 그런 차이를 가져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황이 살던 때는 사림이 재야의 비판적 처지에 있었고, 이이가 살던 때는 사림이 중앙 관계의 주도권을 잡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기설(理氣說)의 논쟁에서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은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사단이란 측은(惻隱) · 수오(羞惡) · 사양(辭讓) · 시비(是非)의 마음을 각각 인(仁) · 의(義) · 예(禮) · 지(智)의 실마리로 보는 이론이고, 칠정은 희(喜) · 노(怒) · 애(哀) · 낙(樂) · 애(愛) · 오(惡) · 욕(欲)의 감정을 가리킨다.
조선 후기 주리설은 주자의 학설과 가까워져서 관념론에 중점을 두었다. 때문에 현실을 관념적인 원리로 정당화시키려는 경향을 띠었다. 이에 비해 주기설은 대체로 실학파 학자에 이어져 현실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현실 개혁에 철학적 근거를 찾으려는 경향을 띠었다. 주리론은 기정진(奇正鎭) · 이진상(李震相) 등에 의해 이일원론(理一元論)으로 발전하여 뒤에 척사위정사상의 철학적 배경을 이루었다. 한편, 주기론은 임성주(任聖周)와 정약용을 거쳐 최한기(崔漢綺)에 이르러 서양의 경험론과 결합하여 발달하다가 그 뒤 개화사상과 연결되었다.
한편, 조선 후기 사회적 · 경제적 여러 변화와 함께 실학사상이 발달하였다. 당시의 학풍은 성리학의 이기설이나 예론(禮論)에 사로잡혀 붕괴되어가는 사회 질서를 세우는 데 무력하였다. 따라서, 유교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 현실적으로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학문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실학의 발생 원인은 임진왜란 이후 자아(自我)에 대한 반성과 서양 사상 및 과학적 지식이 시야를 넓혀준 데 있었다. 실학자의 연구 대상은 여러 분야에 걸쳤으나, 공통 기반은 현실적 · 실증적 · 독창적 · 민족적인 것이었다.
실학자들이 부국강병과 민생안정을 위해 제시한 개혁안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었다. 하나는 중농적(重農的) 제도개편론을 편 주177이고, 또 하나는 중상론(重商論)과 기술도입론을 편 주178였다. 경세치용학파는 전제(田制)를 비롯, 행정 기구 등 제도상의 개혁에 중점을 두었다. 그에 속하는 대표적 학자로는 유형원(柳馨遠) · 이익(李瀷) · 정약용 등을 들 수 있다. 그들은 자영농 육성을 주장하고, 농민에게도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어 능력에 따라 관료로 등용하는 농업 중심의 이상적 국가 건설을 기본 목표로 삼았다.
이용후생학파는 상공업을 일으키고 기술을 도입하며 부국강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을 흔히 주179라 한 것은 청나라의 문화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그에 속하는 대표적 학자로는 유수원(柳壽垣) · 박지원 · 박제가(朴齊家)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북학파의 사상은 뒷날 개화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조선의 현실 개혁을 위해 청나라의 우수한 문화를 수용하자는 입론은 개화사상에서 자본주의 선진제국의 장점을 수용하자는 입론으로 이어진 것이다. 북학파가 국내 산업과 대외무역을 일으키자는 주장은 주180가 통상무역을 강조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또, 조선에서 산업이 뒤지고 백성이 가난한 원인은 놀고먹는 양반들 때문이라고 지적한 북학파의 주장은 개화기의 민권사상으로 연결되었다. 주181은 삼강오륜에 입각한 유교적 사회 질서를 고수하면서 주자학 이외의 학문이나 문화를 배척하는 사상이다. 18세기 후반 서학(천주교)의 전래와 서세동점의 물결을 유교 문화에 대한 일대 도전으로 간주한 보수주의적 유학자들은 천주교를 사교(邪敎)로 규정하고 서양을 이적시(夷狄視)하여 서양과의 통상 내지 외교를 반대하는 척화양이론(斥和壤夷論)을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정통과 이단, 화(華)와 이(夷)를 엄격히 구분하는 주자학적 세계관 내지 주182에 근거하였다. 이항로(李恒老)와 최익현이 그 대표적 인물로, 전자는 병인양요 시 척양론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후자는 개항을 전후한 시기에 서양과 일본을 동일시하는 왜양일체론(倭洋一體論)을 전개하여 다같이 외국과의 통교에 반대하였다. 이들은 서구 및 일본제국주의의 침투로 빚어질 경제적 악영향을 우려하였다. 이 사상은 최익현 · 유인석 등이 구한말에 조직, 지도한 의병운동의 사상적 기반을 이루었다.
또, 19세기 말에 조선의 일부 개신 유학자들은 서양 문물의 우수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전통 유학의 보수성과 배타성을 비판하면서 유교를 민족의 독립 보전이라는 과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신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청말의 변법자강사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대표적인 개신 유학자였던 박은식(朴殷植)은 종래의 제왕 중심이었던 유교를 공자의 대동주의(大同主義)와 맹자의 인본주의에 입각하여 민중적 유교로 개신하였다. 또, 학교 설립이나 서적 간행을 통해 유교를 민중에게 널리 포교하며, 지리한만한 주자학보다 간이직절한 양명학(陽明學)을 강조할 것을 주장하였다. 박은식과 장지연 등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909년 대동교(大同敎)를 창건하기도 하였다.
5.1.3. 불교
조선 왕조는 건국과 함께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하였다. 태조가 신봉한 종교는 불교였으나, 정치적으로는 유교 정책을 채택하였다. 그는 도선(道詵)의 밀기(密記)에 지정된 절과 승 100인 이상이 상주하는 절 외에는 토지를 몰수하였고, 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첩제(度牒制)를 강화하였다.
태종도 22사(寺)만 사격(寺格)을 인정하고 나머지 주183는 노비와 토지를 몰수하였다. 태종 때 몰수된 사사의 노비는 8만여 구였고, 사사전(寺社田)도 전국에 1만 1000결만 남기고 몰수된 것이 5만∼6만 결로 추산되었다. 이로써 불교는 재기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
세종은 불교의 7종파를 선종(禪宗)과 교종(敎宗)의 양종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절도 36본산(本山)에만 사격을 인정하고 본산에 7, 950결의 토지만을 보유하게 하였다. 그러나 세종은 자신이 창제한 훈민정음으로 주184」을 짓고, 「 월인석보」를 간행하게 하기도 하였으며, 말년에는 궁궐 안에 내불당(內佛堂)을 짓고 법회(法會)를 행하는 등 불교를 독신하였다.
세조도 건국 이래 불교억압책을 늦추어 원각사(圓覺寺)를 짓고, 간경도감(刊經都監)을 두어 많은 불경을 번역, 간행하였다. 그러나 그 뒤 성종 · 연산군 · 중종은 잇달아 다시 불교억압책을 시행하였다. 이에 선종 · 교종 양종의 중앙기관이 없어지고, 고려 이래의 승과(僧科)와 승계(僧階)도 폐지되고 말았다.
그 후 명종 때 문정왕후(文定王后)가 섭정하면서 중 보우(普雨)를 중용하고 불교를 비호하는 등, 일시적으로 활기를 띠었다. 이때 봉은사(奉恩寺)를 선종, 봉선사(奉先寺)를 교종의 본산으로 삼고, 승과도 부활시켰으나 문정왕후 사후에 불교는 다시 탄압을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 승려의 법맥은 크게 두 갈래가 있었다. 고려 말기의 양대 법문인 나옹(懶翁) 혜근(惠勤)과 보우(普愚)의 법맥이 그것이다. 나옹 혜근의 법사(法嗣)는 무학(無學) 자초(自超) · 기화(己和) 등으로 이어져 처음에는 세력이 컸으나 그 뒤 법맥이 끊어졌다. 보우의 법맥은 지엄(智儼) · 휴정(休靜)으로 이어져 조선 불교의 정통이 되었다.
휴정은 임진왜란 때 왕의 부름을 받고 의승군(義僧軍)을 일으켜 큰 공을 세웠다. 그리고 그 문하에서 준수한 제자들이 배출되어, 조선 불교는 거의 휴정의 종문을 따랐다. 그의 좌선견성(坐禪見性)이라는 교의(敎義)는 불교를 선 · 교 양종에서 조계종(曹溪宗)으로 일원화하였다.
휴정은 염불을 선(禪)과 동일시, 불교의 대중화에 크게 이바지하였고 이로부터 염불을 중요한 수행의 방법으로 삼게 되었다. 휴정은 선 · 교 · 염불의 일원화뿐만 아니라, 유 · 불 · 선 3교의 일의(一義)를 제창, 후기 불교의 3교합일론의 기원을 이루었다. 휴정의 문하에서는 유정(惟政) · 언기(彦機) · 태능(太能) · 일선(一禪)이 가장 뛰어나 이들에 의해서 4대 종파가 성립되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숙종과 정조가 불교를 숭상하였다. 숙종은 진관사(津寬寺)를 재건하고, 정조는 용주사(龍珠寺)를 건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승려의 사회적 지위는 천류로 떨어지고, 불교는 궁중이나 민간에서 부녀자들이나 믿는 종교가 되었다.
1880년대에는 개화승 이동인(李東仁) · 탁정식(卓廷植) 등이 대외 활동을 벌이고, 또 일본 불교가 전래, 1896년에 이르러서는 승려의 입성금지령(入城禁止令)이 철폐되었다. 이 시기의 불교는 현실 문제에 초연하였기 때문에 괄목할만한 교세 확장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반면 일제의 보호를 받는 일본 불교는 계속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일제에 의해 국권이 위태롭게 되자 1909년에 나철(羅喆)에 의해 우리 민족의 원시 신앙을 체계화한 민족 종교인 대종교(大倧敎)가 창건되었다. 환인(桓因) · 환웅(桓雄) · 단군(檀君)의 삼신(三神)을 섬기는 대종교는 일제강점 뒤 만주 및 중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의 신앙 체계로서 성장하였다.
5.1.4. 도교
고려 때에 무분별하게 설립되었던 도교 기관은 조선 건국 후 정리되어 소격전과 대청관만 남았다가 1422년(세종 4) 이후 소격전만 남아 각종 도교 의식인 주185를 주관하였다. 소격전은 1466년(세조 12) 대규모 관제개혁 때 소격서로 이름이 바뀌었다. 소격서에는 삼청전(三淸殿), 태일전(太一殿), 십일요전(十一曜殿), 직숙전(直宿殿) 등의 건물에 여러 신들을 모셨다.
태일전에서는 칠성(七星)과 여러 별을 제사하였고, 삼청전에서는 옥황상제(玉皇上帝), 태상노군(太上老君), 보화천존(普化天尊) 등 10여 위를 제사지냈는다. 이 밖에 안팎의 여러 단에 사해용왕(四海龍王), 신장(神將), 명부시왕(冥府十王), 수부(水府)의 여러 신들을 모셨는데, 위패에 이름을 쓴 것이 무려 수백이었다. 재초는 소격서 이외에 지방의 태일전과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에서도 거행되었다.
1504년(연산군 10)에는 소격서를 종실 안양군(安陽君)의 집으로 옮기는 조치가 취해졌는데, 이것은 사실상 국가기관으로서의 소격서가 혁파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종은 즉위 다음 달인 원년(1506) 10월에 원래의 소격서를 급히 수리하게 하여 관원을 새로 임명함으로써, 안양군의 사가로 옮겨졌던 소격서를 부활시켰다. 이후 소격서의 혁파를 둘러싸고 중종과 신하들간의 논쟁이 거듭되었다.
중종의 태도가 워낙 완강하였으므로 혁파 주장은 수그러들고 말았지만, 1518년(중종 13) 신진사류를 대표하는 조광조의 소격서 폐지 상소를 계기로 이에 대한 논의가 재연되었다. 결국 중종이 굴복하여 소격서 혁파 결정을 내렸으나, 곧 기묘사화가 일어나 조광조가 죽임을 당한 후 소격서를 다시 세우게 되었다. 소격서는 임진왜란 후 없어졌고, 이후 소격서를 복립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조선에서는 개인의 건강증진과 무병장수를 목적으로 도교적 양생법이 유행하였다. 또 도교적 기양법(祈禳法)이 병액을 제거하기 위하여 무격이나 불재와 함께 베풀어졌다. 소격전의 초례, 온신제(瘟神祭), 여제(厲祭), 명산대첩 기도, 성황당 기도 등이 이에 해당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임진왜란 때 들어온 명의 장수 등의 영향을 받아 도교의 한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삼제군(三帝君) 신앙’이 유행하였다. 삼제란 관성제군(關聖帝君, 촉한의 주186), 문창제군(文昌帝君, 진의 장아), 부우제군(孚佑帝君, 당의 여순양)을 말한다. 이 세 사람은 신선이 되어 천궁으로 올라가 제군의 자리에 앉아서 하계 인간의 선악을 감시하여 화복을 내리는 존재로 받아들여졌으며, 그 중 관우를 지상지존으로 섬겨 ‘삼계복마대성관성제군(三界伏魔大聖關聖帝君)’으로 불렀다.
5.1.5. 기독교 - 천주교와 개신교
서학은 서양 문물과 함께 명을 통해 전해졌다. 서학에 처음 관심을 가진 것은 실학자들이었다. 광해군 때 이수광(李睟光)은 『 지봉유설』에서 마테오 리치(Matteo 주187의 『 천주실의(天主實義)』를 소개한 바 있고, 이익(李瀷) · 안정복(安鼎福) 같은 실학자도 서학에 호기심을 가졌으나 신앙으로서는 비판적이었다.
18세기 말부터 학문의 대상이 되었던 서학은 남인 학자를 중심으로 천주교 신앙운동으로 번져갔다. 그런데 이때는 서양 선교사의 전도로서가 아니라, 중국에서 들어온 천주교 서적을 읽고 자발적으로 신앙으로 발전한 것이었다. 1783년(정조 7) 이승훈이 최초로 세례를 받았는데, 당시 신자가 된 이벽, 이가환, 정약전의 3형제, 권철신 형제 등은 모두 이익의 문인이었다.
당시 천주교 운동은 벌열 중심의 양반 사회와 성리학 지상주의의 사회적 질곡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었다. 천주교의 도전은 유교적 의식을 거부한 전례 문제로 표면화해 박해가 시작되었다. 1791년 주188에서 윤지충 등이 처형당한 것을 필두로, 1801년(순조 1)에는 신유박해가 일어났다.
신유박해는 대왕대비 김씨와 연결된 노론의 벽파가 시파를 타도하기 위해 천주교 탄압을 행한 것인데, 이때 황사영 백서사건이 일어나 천주교에 대한 탄압은 더욱 심해졌다. 그런 탄압 속에서도 1831년(순조 31)에 조선교구가 독립하였고, 서양인 신부가 들어와 선교에 힘썼다. 1839년(헌종 5) 기해박해로 천주교는 또 큰 탄압을 받았다. 이 무렵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이 귀국하여 활동하다가 순교하기도 하였다.
철종 때 천주교에 대한 금압이 다소 느슨해지자 신도가 약 2만 명으로 늘어났다. 천주교도는 처음 남인계 양반들이 많았으나, 점차 무식하고 빈천한 사람들과 부녀자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지역으로는 서울과 그 인근에 신자가 집중되어 있었다.
18세기 말에 전래된 천주교는 흥선대원군 이하응 치하 때 철저한 탄압으로 그 선교 활동이 한때 둔화되었다. 그러다가 1880년대 국내에 개화운동이 일어나면서 개신교가 전래되고, 구미와 외교 · 통상 관계가 수립된 뒤로는 기독교의 국내 선교가 묵인되었다. 그 뒤 주로 미국 · 캐나다 등에서 파견된 개신교 선교사들은 선교 사업 외에 근대적 교육 · 의료 사업 및 자선 사업 등을 병행하면서 개화를 추구하는 청년지식인 · 중소지주 · 상인들에 영향을 주었다. 개신교는 자립적 중산층의 형성이 비교적 빨랐던 관서 지방에서 가장 왕성하게 수용되었다.
개신교가 한말 사상계에 준 가장 큰 공헌은 개인의 발견에 있다. 가족 윤리와 충군애국사상을 강조하는 유교와는 달리 개신교는 신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개인주의를 강조하였다. 이로써, 인간의 주체적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한 자유주의 · 평등주의 등 근대적 정치 이념의 정립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또, 개신교 선교사가 주동이 되어 설립한 교회나 학교에서 영향을 받은 한국인들은 교회 또는 학교 내 활동 경험과 서구 지식을 바탕으로 민주적 국민국가 건설 내지 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정치 · 사회 운동에 가담하였다. 서재필의 독립협회와 안창호의 신민회는 그 좋은 예이다. 그리고 개신교의 청교도 정신과 직업소명 의식은 자립적 중산층의 직업 윤리를 강화하는 효과를 낳았다.
5.1.6. 동학
동학은 1860년에 경주의 몰락 양반인 최제우(崔濟愚)에 의해 창도되어 농촌사회에 뿌리내린 신흥종교이다. 최제우는 서학(西學), 즉 천주교의 침투에 대항, 동양의 유 · 불 · 선 삼교를 종합하고 아울러 전통 사회의 가치 체계를 원용하여 외세의 침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목적에서 동학을 창도하였다.
1863년에 교조 최제우가 처형된 뒤, 제2대 교주인 최시형은 1880년대 초에 『 동경대전(東經大全)』 · 『 용담유사(龍潭遺詞)』를 간행하여 교리를 체계화하고, 포접제(包接制)를 실시, 교문의 조직을 강화하였다. 주문을 외우거나 부적을 사용하는 등 전통적인 무속신앙의 요소를 띠고 있는 동학은 그 당시 정신적 지주가 필요하였던 민중에 쉽게 침투, 보급되었다. 그 결과 삼남 지방에 동학의 교세가 확장되었다.
동학사상의 요체는 인내천(人乃天)으로 상징되는 평등주의이다. 인내천은 제3대 교주 손병희(孫秉熙)가 최제우의 ‘천심즉인심(天心卽人心)’ · ‘천인여일(天人如一)’과 최시형의 ‘사인여천(事人如天)’의 사상을 집약한 표현이었다. 동학의 평등주의 사상은 조선조의 봉건적 신분제도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또한 동학 창도 이전의 시대는 하늘[天]의 대리자인 성현이 다스리는 선천시대(先天時代)이지만, 동학 창도 이후의 후천시대(後天時代)에는 하늘이 모든 사람에게 강령하여 하늘과 사람이 일체가 되어 지상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후천개벽사상(後天開闢思想)은 현실을 부정하는 혁명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당시 민간에 유행하던 『 정감록(鄭鑑錄)』의 운수론과도 관련된 것이었다. 동학에 내포된 반외세 · 반침략의 민족주의, 신분제를 부정하는 평등주의, 후천개벽사상에 나타난 현실부정적 혁명사상 등은 1894년 동학운동의 사상적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동학의 교단 조직은 동학운동에서 크게 활용되었다. 동학은 1905년 손병희에 의해 천도교(天道敎)로 개칭되었으며, 이에 반대한 이용구(李容九)가 1906년에 시천교(侍天敎)를 창건하여, 두 파로 분파되었다.
5.1.7. 개화사상
19세기 후반 서구와 서양화된 일본의 중첩된 충격을 받은 뒤, 서구 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양 문명의 요체를 받아들여 부국강병을 이루고 나아가 자주적인 근대 국민국가를 건설하려는 의식이 형성되었는데, 이를 개화사상이라고 한다. 개화사상은 박지원(朴趾源)의 손자인 박규수(朴珪壽)와 역관 출신 오경석(吳慶錫) 등이 중국에서 간행된 주189의 『해국도지(海國圖誌)』, 서계여(徐繼畲)의 『영환지략(瀛環志略)』 등 서양 소개 서적을 국내에 들여온 뒤 이를 독서층에 보급하여, 1870년대에 서울 북촌(北村)의 양반 자제들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초기의 개화사상은 1877년경부터 개화의 실현 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로 온건론과 급진론으로 갈라졌다. 온건론은 중국의 주190을 본받아 동양의 전통적인 사상 체계 내지 정신 유산, 즉 도(道)를 유지하면서 서양의 기술, 즉 기(器)만을 선별적으로 채용하여 개화하자는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을 따르는 것이었다. 이것은 전통적 유교사상과 사회 체제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 외래의 기술을 도입하되 국민을 계몽하는 방법을 취하는 점진적 개혁론이었다.
이 온건론의 대표자는 민영익(閔泳翊) · 김홍집 · 김윤식(金允植) · 어윤중(魚允中) 등이었다. 이에 비해 급진론은 일본의 주191을 모방, 서양의 기술뿐만 아니라 그 정치 · 경제 · 군사 · 교육은 물론 사회제도까지도 수용하여 급진적으로 변혁시키고자 한 사상이다. 따라서 기독교의 수용을 긍정적으로 보고 기존 양반제를 철저하게 비판하였다. 따라서 온건론이 청나라 말기의 주192에 영향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급진론은 청나라 말기의 ‘변법자강론’과 일본의 ‘문명개화론’에 자극을 받은 것이었다.
온건론자들이 군권(君權) 혹은 국권(國權)을 강조한 데 비해, 급진론자들은 민권(民權)을 중시하였다. 박규수와 유홍기(劉鴻基, 大致)의 훈도를 받은 김옥균 · 박영효 · 서광범(徐光範) 등 급진개혁파는 결국 갑신정변을 주도하였다.
5.2. 한글
우리 민족 문화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훈민정음, 즉 한글 창제이다. 그런데 사실 훈민정음을 ‘한글’이라 부르게 된 것은 20세기 초에 들어와서부터였다. 국자(國字)인 한글이 생기기 전에는 한자만이 사용되었으므로 대단히 불편하였다. 비록,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이두(吏讀)나, 한자 자획 일부를 뗀 구결(口訣)로 한문에 토를 달아 읽기도 하였지만, 워낙 어려워 일부 양반만이 배우고 썼을 뿐, 일반 백성은 문맹자로 살았다.
세종은 『 훈민정음』 서문에서 한글 창제의 취지를 민족 의식과 애민 정신으로 밝혔다. 그러나 훈민정음 창제의 보다 중요한 역사적 배경은 훈민 정책에 있었다. 고려 말기에 신흥사족(新興士族)이 권문세족과 싸워 이긴 것도 당시 농민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과전법에는 소유권 보장 및 10분의 1조 등의 규정으로 농민의 권익을 보장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고, 지위를 향상시켰다.
조선 왕조는 이러한 농민의 기반 위에 세워졌으므로 그들의 생활 안정과 함께 교화하는 정책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조정에서는 농민을 교화하는 데 두 가지 방향을 잡아나갔다. 그 하나는 농업 기술의 지도 보급이요, 다른 하나는 유교 윤리인 삼강오륜의 실천 · 권장이었다. 농업 기술의 지도를 위해 태종은 이두로 토를 단 농업기술서를 간행하였고, 세종은 『 농사직설(農事直說)』을 엮어 농민에게 보급하였다.
한편, 삼강오륜의 권장을 통해 왕에 대한 신하의 충성, 부모에 대한 효도와 함께 전주(田主)에 대한 전호의 의무까지 하나의 윤리 질서 속에 묶었다. 세종 때 『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를 만들어 농민들을 가르치고, 그 뒤에도 이와 비슷한 책들이 잇따라 나온 것은 모두 농민교화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기술서나 윤리교본 등이 모두 한문으로 되었으므로 무식한 농민을 교화하는 데는 별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때문에 세종은 쉬운 국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세종의 뛰어난 생각과 꾸준한 집념, 그리고 집현전(集賢殿) 소장 학자들의 우수한 두뇌가 어우러져 훌륭한 새 글자를 발명하여,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1446년(세종 28)에 반포되었다. 그러나 훈민정음은 당시 양반들에게 환영받지 못하였다. 양반들은 한문을 진서(眞書)라 하고 훈민정음은 언문(諺文)이라 하여 멸시하였다.
그러나 한글이 창제된 뒤, 조선 건국을 찬양한 「 용비어천가」를 비롯, 부처님의 일대기를 적어 그 공덕을 찬양한 「 월인석보(月印釋譜)」 등이 한글로 지어졌고, 이 밖에 유교 · 불교의 여러 경전들이 한글로 번역, 출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모화사상에 찌든 양반들에게 중요한 서책은 여전히 한문으로 기록, 간행되어, 한글이 국자로서 제구실을 하게 된 것은 훨씬 뒷날의 일이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한글 소설이 나오고 시조 등 한글 시가가 활발히 지어지면서 한글은 자리를 잡아가다가, 한말에 이르러 민족적 자각과 함께 국자로서 우리 문자 생활의 주도적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5.3. 과학 기술
5.3.1. 천문학과 기상학
천문 · 기상은 농업과 깊은 관계가 있어 일찍부터 많은 관심이 기울여졌다. 1442년(세종 24) 측우기를 만들어 전국의 강우량을 조사하였는데, 이는 서양에서 최초로 발명한 이탈리아 카스테리의 측우기보다 약 200년이나 앞선 것이었다.
세종 때는 이 밖에도 천문 관측을 위한 대소의 간의(簡儀), 천체관측기인 혼천의(渾天儀), 해시계인 앙부일구(仰釜日晷), 물시계인 자격루(自擊漏) 등이 만들어졌다. 또, 천문학의 발달에 따라 역법(曆法)도 중국과 아라비아의 역법을 참조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 칠정산내편(七政算內篇)』과 『 칠정산외편』이 저술되었다.
18세기에는 천문 관측에 있어 조선 중심의 천문학이 수립되었다. 즉, 종래 주193 중심의 관측에 편도시차(偏度時差)를 추가함으로써 조선 중심의 일식(日食) · 월식(月食) 시각방위의 관측법이 수립된 것이다. 또, 서양 역법이 중국을 통해서 들어와 1653년(효종 4) 시헌력(時憲曆)을 채용하게 되었다.
한편, 김석문(金錫文) · 홍대용(洪大容) 등은 지동설(地動說)을 주장하여 종래의 세계관과 우주관에 큰 변혁을 가져왔다. 새로 혼천의를 제작하여, 천문을 관측하였으나 자체 역서(曆書)를 편찬하지는 못하고 청(淸)의 역서를 가져다 쓰는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이 시기의 한계였다. 기상학에서도 뚜렷한 새로운 발전은 없었다.
5.3.2. 지리학
18, 19세기에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김정호(金正浩)의 실측 지도와 역사지리가 대표적이며, 역사지리는 정약용 등 실학 역사가들에 의해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 더 큰 발전을 이룬 분야는 지리지이다. 이중환(李重煥)의 『 택리지(擇里志)』를 비롯하여 인문지리가 발달하는 한편, 국가 통치와 관련된 읍지에도 인문지리적 내용이 포함되었다. 읍지도 등 일부 지도에는 인문적 성격이 가미되어 문화적 이채를 띠었다. 영조 때에는 『세종실록』 지리지의 계통을 잇는 국가통치자료 차원의 내용을 담은 『 여지도서(輿地圖書)』를 간행하였다.
5.3.3. 의학
고려시대의 약재는 중국산을 들여다 썼으나, 고려 말기부터 국산 약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져서 1433년(세종 15)에는 이를 집대성한 『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이 나왔다. 1445년에는 역대 중국의 의서를 널리 수집하고 참조하여 의학의 백과전서라 할 수 있는 『의방유취(醫方類聚)』가 편찬되고, 같은 세종 때 일종의 법의학서(法醫學書)인 『 신주무원록(新註無寃錄)』이 간행되었다.
1610년(광해군 2)에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동양의학사상 특기할만한 역저인 허준(許浚)의 『 동의보감』이 편찬되었다. 또 1798년(정조 22) 정약용이 지은 『 마과회통(麻科會通)』에는 주194의 시술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이처럼 다른 과학 분야에 비해 의학은 월등한 발전을 이루었다. 전통사회에서는 의학과 약학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문제가 뒷날의 의약분업 추진에도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약을 통한 치료, 침구를 통한 치료에서 인체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이루어짐에 따라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졌다. 서민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발전은 폭넓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편한 치료 방법 개발 등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제마(李濟馬)의 사상의학(四象醫學)은 인체에 대한 음양오행적 이해를 보여준다. 천연두에 대한 예방 기술 개발 노력으로 인두법을 시행한 사실은 경험 또는 실험에 입각한 귀납적 방법론을 채택하였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5.3.4. 인쇄술
우리 나라는 이미 1234년(고려 고종 21)에 금속활자를 사용하였다. 이는 서양보다 약 200년이나 앞선 것이고, 1403년(태종 3)의 계미자(癸未字)도 서양의 금속활자보다 약 50년이나 앞선 것이었다. 조선 초기의 국가적 편찬 사업은 인쇄술을 발달시켰다. 즉, 계미자의 사용은 고려 말기 이래 망각되었던 금속활자를 부활시켰다. 그러나 이때의 활자는 동판 위에서 황랍(黃蠟)으로 고정시켰기 때문에 활자가 움직이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1420년(세종 2) 경자자(庚子字)에 이르러 활자마다 네모의 입방체로 크기를 같이 하여 황랍을 쓰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아 인쇄가 편리해졌다. 1434년에는 활자를 개주하여 자체가 정교하기로 유명한 갑인자(甲寅字)를 만들었다. 조선 후기에도 1772년(영조 48) 15만 자의 임진자(壬辰字), 정조 때에 8만 자의 한구자(韓構字), 1796년(정조 20) 30만 자의 정리자(整理字) 등은 좋은 활자로 인정되고 있다.
5.3.5. 무기와 전선
고려 말기에 화약의 제조법을 알게 되어 화통도감(火筒都監)을 설치하고 화약과 화포를 제조하였다. 당시 화약은 신무기로서, 이웃 일본이나 여진은 아직 그 제조법을 몰랐다. 때문에 여말 선초에 왜구를 격퇴하고, 세종 때 육진의 개척하고, 사군(四郡)을 설치한 것은 화약에 힙입은 바가 컸다.
1448년(세종 30)에 편찬된 『 총통등록(銃筒謄錄)』에는 화포의 제조법과 사용법이 그림과 함께 한글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문종 때에는 일종의 로켓이라 할 수 있는 화차(火車)가 제조되었다. 그 뒤 화약을 사용하는 대포 완구(碗口)와 소포인 총통(銃筒) 등이 제조되었다.
임진왜란 중에 이장손(李長孫)은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를 발명하였다. 임진왜란 뒤에는 조총과 서양식 대포인 홍이포(紅夷砲)가 꾸준히 제조되어 무기의 제조 기술이 진보하였다.
병선(兵船)은 고려 때의 전선(戰船)인 예선(曳船)에 덮개를 씌운 귀선(龜船)이 1403년(태종 3)에 만들어졌다. 이것이 실전에서 크게 전투력을 발휘한 것은 임진왜란 직전에 완성된 이순신(李舜臣)의 거북선이었다. 이 밖에 정약용은 청나라에서 들여온 주195』 중 테렝(Terreng. J., 중국명 鄧玉涵)의 『 기기도설(奇器圖說)』에서 얻은 지식을 토대로 기중기를 고안, 수원화성 축조에 이용하게 하였다.
18세기는 15세기 이후 발달이 정체되었던 과학기술을 다시 부흥시키는 시기였다. 그러나 과학사상 자체가 전반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부분적으로는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새로운 과학사상의 체계를 형성하였는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5.4. 문학과 예술
5.4.1. 문학
문학은 훈민정음 창제 직후 악장(樂章)인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이 창작되어 한글 문학의 문이 열렸다. 시조는 국문학 중 가장 대표적인 우리 고유의 정형시로서, 고려 중기에 발생한 이래 조선시대에는 더욱 발전하였다. 시조는 박인로(朴仁老) · 신흠(申欽) 등을 거쳐 윤선도(尹善道)에 의해 대성되었다.
시조는 조선 후기에 이르면서 양반 문학에서 서민 문학으로 전환되어갔다. 형식면에서는 사설시조라는 장형시조가 발달하였고, 표현에서는 사실성을 띠게 되었다. 또한, 작자는 양반뿐만 아니라 서리나 기생 등에 이르기까지 신분계층이 확대되었다.
김천택(金天澤)은 1728년(영조 3) 『 청구영언』, 김수장(金壽長)은 1763년(영조 39) 『 해동가요』라는 시조집을 편찬하였는데, 그들은 다같이 서리 출신이었다. 거기에는 자신들의 작품 외에도 하급 신분 작가의 작품이 무명으로 많이 수록되어 있다. 1876년(고종 13) 박효관(朴孝寬) · 안민영(安玟英)이 편찬한 『 가곡원류』는 고시조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
조선 중기에는 가사(歌辭)가 발달하였다. 가사는 송순(宋純)에 이어 송강가사(松江歌辭)의 저자 정철(鄭澈)에 의해 대성되었다. 이와 아울러 조선 후기 문학에 나타난 큰 변화로는 한글 작품이 많이 쏟아져 나온 점을 들 수 있다.
광해군 때 허균(許筠)은 「 홍길동전」을 지어 국문소설의 효시를 이루었다. 이는 서얼차대와 빈부 문제 등 사회적 모순을 비판한 내용이었다. 고전 국문소설들을 내용에 따라 살펴보면, 권선징악류에 「 장화홍련전」 · 「 심청전」 · 「 흥부전」, 군담류에 「 임진록」 · 「 임경업전」, 애정물에 「 춘향전」 · 「 옥루몽」 · 「 숙향전」 등이 있다.
국문학에서 특징 있는 장르의 하나는 판소리이다. 판소리는 18세기 호남 지방에서 발생하였으며 19세기에는 여러 주196이 나와 그 전성기를 이루었다. 사설의 정리에는 신재효(申在孝)가 절정을 이루었다. 그는 판소리 여섯마당을 지어 서민뿐만 아니라 양반층까지 판소리의 세계로 끌어들였다. 한편, 조선시대 문학의 한 큰 갈래로 한문학이 있다. 성종 때 서거정(徐居正) 등이 『 동문선』을 편찬하여 신라 이래 조선 초까지의 시문을 정리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관료 문인들의 설화문학이 성하였다. 그 대표적인 설화집으로는 서거정의 『 필원잡기(筆苑雜記)』, 성현(成俔)의 『 용재총화(慵齋叢話)』, 어숙권(魚叔權)의 『 패관잡기(稗官雜記)』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김시습(金時習)은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인 「 금오신화」를 지었다. 초기의 유명한 한문학자인 권근(權近) · 김종직(金宗直) 등은 고려 말 이제현(李齊賢) · 이색(李穡)의 뒤를 이었는데, 그들은 송 · 원나라 문단의 영향을 받았다. 중기에는 명의 영향으로 고문의 부흥이 유행하였는데, 이정귀(李廷龜) · 신흠(申欽) · 장유(張維) · 이식(李植) 등이 유명하다.
종래 전통적인 문체에 구애없이 자유롭게 표현하는 새 문체를 개발한 사람은 조선 후기 실학자 박지원이었다. 그가 지은 「 열하일기」는 참신한 문체와 독보적 내용으로 세인의 주목을 끌었다. 박지원의 뒤를 이은 한문학자로는 신파사가(新派四家)라 불리는 이덕무(李德懋) · 유득공(柳得恭) · 박제가(朴齊家) · 이서구(李書九) 등이 있다.
김택영(金澤榮)의 문인 왕성순(王性淳)은 우리나라의 한문 10대가를 꼽았는데, 고려시대 김부식(金富軾)과 이제현을 비롯하여, 조선시대의 장유 · 이식 · 김창협(金昌協) · 박지원 · 홍석주(洪奭周) · 김매순(金邁淳) · 이건창(李建昌) · 김택영 등이었다. 후기 한문학의 새로운 변화는 서얼이나 기술관 · 서리 신분의 문인이 많이 배출되고, 이들에 의해 시가의 수집 · 편찬이 이루어진 점이다. 즉, 숙종 때 홍세태(洪世泰)는 항간에 전해오는 서민의 시가를 모아 『 해동유주(海東遺珠)』를 출간하였다. 영조 때 고시언(高時彦)은 이를 증보하여 『 소대풍요(昭大風謠)』를 간행하였으며, 철종 때 유재건(劉在建) 등은 『 풍요삼선(風謠三選)』을 냈다.
5.4.2. 그림 · 글씨 · 공예
조선시대의 그림은 주로 신분이 낮은 화원(畵員)들이 그렸으나, 양반 중에도 취미로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있었다. 전기의 그림은 초상화가 많았는데, 이는 양반들이 자신들의 출세를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예술적 가치는 희박하였다. 양반의 그림은 대부분이 산수화였는데 북종화(北宗畵) 계통의 화풍이었다. 초기의 주요 화가로는 세종 때 안견(安堅) · 최경(崔涇) · 강희안(姜希顔), 중종 때의 이상좌(李上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16세기 이정(李楨) · 신사임당(申師任堂) 등의 그림에서는 화법이나 의도에 한국적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후기에는 북종화에서 남종화로 바뀌어갔고, 한국적 특징을 나타내려는 경향이 농후해졌다. 또, 전기의 사실적 화풍에서 운치를 중시하며 수묵화를 주로 하는 문인 화풍이 널리 유행하였다.
17세기 이징(李澄) · 윤두서(尹斗緖) 등은 보다 한국적인 그림을 그렸고, 정선(鄭敾)에 이르러 한국적 독자성이 완전히 정착되었으니, 그의 「 금강산도(金剛山圖)」는 대표적인 예이다. 후기 그림 중 또 하나의 특징은 풍속화의 개척이다. 김홍도(金弘道)와 신윤복(申潤福)은 풍속화의 쌍벽으로, 서민 생활 속에 깊이 파고들어 그 애환을 소박하고 해학적으로 표현해냈다. 19세기 말에 장승업(張承業)이 나와 안견 · 김홍도와 함께 조선시대 3대 화가로 일컬어졌다.
서예는 양반들의 필수 교양이어서 누구나 글씨를 썼다. 여말 선초에는 주197가 유행하였고, 중기에는 주198의 서체가 유행하였다. 안평대군(安平大君)은 송설체, 중종 때의 김구(金絿)는 왕희지체의 명필이었다. 여기에 초서의 양사언(楊士彦), 해서의 한호(韓濩)를 합해 조선 전기 서예의 4대가라 일컫는다. 후기에 김정희(金正喜)는 중국 서예의 모방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주199를 개척하였다.
조선시대 공예품 중 자기에는 분청과 백자가 있었다. 초기의 분청자기는 고려청자가 퇴화한 것인데, 기법의 차이에 따라 상감분청(象嵌粉靑)과 백토분청(白土粉靑)으로 구분된다. 분청자기에 이어 청화백자(靑華白瓷)가 만들어졌는데, 백자에도 순백 · 유백 · 회백 등 약간씩의 차이가 있었다. 백자의 형태는 아래쪽이 펑퍼짐해져서 안정감과 실용성이 더해졌다. 조선시대의 백자는 귀족적 · 곡선적인 고려청자에 비해 서민적 · 직선적인 것이 특징이다.
5.4.3. 음악과 춤
예(禮)의 정리에 짝하여 악(樂)의 정리가 시작되었으나, 악의 정비가 먼저 이루어졌다. 음악의 정리는 대부분 세종 때 이루어졌는데, 박연(朴堧), 맹사성(孟思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주(周) 때의 음악인 아악을 조선에서 재현하고자 하는 시도도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주 때의 음률(音律)을 재현하고자 하여 음률의 기본인 십이율을 정하는 척도인 주200을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표준 음률을 다시 잡아 표준악기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표준악기는 편경(編磬)으로 정하였다. 편종(編鐘)은 기온에 따라 부피가 늘고 주는 정도가 많은 데 비해 옥돌을 사용하는 편경은 그 정도가 작아 기준 악기로 삼게 된 것이다. 아울러 악보를 제정하여 전래음악을 정리하고 새 음악을 쉽게 창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전에는 입에서 입으로 악보를 전하였다고 추정되는데, 고려의 가사에 보이는 ‘얄리얄리얄라성’이나 ‘아으 아롱다리’ 등은 가사가 아니라 악기 연주소리라고 보는 견해가 강하다.
세종 때 정간보(井簡譜)를, 세조 때 오음약보(五音略譜)를 개발하여 고려 때부터 전해온 음악의 일부와 조선 건국 후 창작한 음악을 기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성현(成俔) 등이 왕명을 받들어 1493년(성종 24년) 『 악학궤범(樂學軌範)』을 간행하였다. 새로 창작한 음악은 대부분 악장(樂章) 가사로, 국가 의례 때 사용하는 것이었다.
국가, 왕실의 의례는 대규모 악단을 편성하여 연주하였으며, 아악 외에 향악도 사용하였다. 또한 정대업(定大業), 여민락(與民樂), 치화평(致和平), 보태평(報太平) 등 새로운 악장가사가 창작되었는데, 이들은 기존 가요( 만전춘, 서경별곡 등)의 곡조를 바탕으로 창작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양반의 음악은 시조(時調)와 가사(歌辭)로 발전하였는데, 소리가 길게 이어지면서 유장(悠長)한 멋을 풍기는 것이 특징이다. 민중의 음악은 민요가 발전하여 농부가, 어부가 등 노동과 연관된 노래들이 창작, 발전되었다. 또한 강강술래, 쾌지나칭칭 등 전쟁 때의 창작 민요도 생겨났으며, 이 노래들은 속도가 빠르고 역동적이거나 구슬픈 정서를 직설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5.5. 서민문화
18세기 이후 조선사회는 중세사회의 기본적인 틀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중세사회를 유지하는 두 가지 큰 축 가운데서 토지제도의 경우는 이미 조선 건국 직후부터 커다란 변동을 겪었고, 그 결과 관료들이 토지와 농민을 지배하는 특권을 보장해주는 장치인 과전이 축소를 거듭하다가 직전으로 변화되고, 결국은 16세기 중엽에 폐지된 바 있다. 또 하나의 축인 신분제도는 특권 신분인 양반의 수가 점차 늘어가다가 18세기에 이르러서 일부 지역에서는 양반층의 비율이 반을 넘는, 비정상적인 양상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모내기와 이모작이 본격화하면서 이루어진 경제적 발달과 이에 따른 사회 변동에 바탕을 두고 진행된 것으로서, 특권을 유지 보장하는 장치가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나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와 함께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서민층이 차츰 대두하고, 이들이 독자적인 문화를 생산하고 향유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었다. 크게 보아서는 지배 문화 내지 주류 문화의 영향도 적지 않게 받고 있었으나, 지배 문화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색깔과 특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주목되는 변화였다.
이 시기 서민문화의 여러 양상 가운데서 가장 중요시되는 변화는 한글 서책의 유행이었다. 고대사회에 이어 중세사회가 지속되는 동안 내내 지배층 가운데서도 핵심 세력의 전유물이었던 문자에 대한 해독 능력과 문자에 의해 축적되는 지식을 소수이기는 하나 서민들이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변화였다. 물론 서민들이 해독하는 문자는 주로 한글이었다. 서양 근대사회의 진전에 각각의 민족이 로마 문자를 빌려 자신들의 언어로 문자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 끼친 영향은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조선에서는 여기에 더해 독자적인 문자로 문화 활동을 하는 이들이 지배층의 여성으로부터 서민층으로 확산되고 있었던 것이다.
서민들은 이와 아울러 민요와 탈춤 등을 통해서 독자적인 정서를 응집하여 표출하고 있었다. 중세 신분질서의 모순 등을 담아 공동 제의에 이어 축제로서 공연되던 탈춤은 차츰 여러 지역에서 상업문화로 변모하였고, 나아가 판소리나 한글소설에도 서민적 정서가 담겨지게 되었다. 장시의 발달로 전보다 정보의 확산이 쉬워진 환경 속에서 일어난 이러한 변화는 민중의식을 고취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었다.
민화는 조선 후기 서민의 독특한 미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장르이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민화는 대부분 서민 가운데서도 경제력을 축적한 축이 향유하였던 내용에 국한된다. 이 시기의 신분제 변동 양상이 양반이 급증하는 추세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인데, 민화는 경제력을 축적한 서민들이 한편으로는 선비 내지 학자관료를 흠모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한편, 세속적인 욕망이 가득한 존재였음도 내비치고 있다. 개항 이후 주자성리학의 시대가 마감된 뒤 사회를 주도하게 될 자본가 계층이 어떠한 문화와 정서를 갖게 될지를 이미 이 시기의 민화가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5.5.1. 한글서책, 방각본, 소설
18세기부터 19세기 전반기까지의 기간은 문학의 활기가 매우 융성하였다. 17세기 이래의 사회적 변동은 종래의 이념 · 제도 · 문화의 균형을 뒤흔들면서 새로운 문학의식과 창작, 유통의 바탕을 조성하였다.
이 시대의 문학적 변화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양상은 국문문학의 성장과 활발한 유통이라 말할 수 있다. 15세기에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 관찬문학과 여성 중심의 생활기록문학을 통해 점차 성장해 오던 국문문학이 17세기에는 좀 더 창작, 소통의 폭을 넓히게 되었고, 18세기에 이르러서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시조 향유층의 확대와 가집 편찬, 가사의 다양한 분화, 국문소설의 발달과 방각본 소설출판의 성행, 국문 기록문학의 성장 등은 그 주요 양상이다.
이처럼 국문문학이 활기를 띠게 된 데에는 평민층의 사회경제적 성장과 문화적 욕구의 증대, 한글 해독 인구의 증가, 상업적 출판 및 서책 유통업의 대두, 시정문화의 확산에 따른 창악예술의 발전 등의 요인들이 직간접적인 연관을 맺으면서 작용한 것이었다. 사회 전반의 생산력 증가와 상당수 평민층의 생활수준 향상은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인구를 증가시켰고, 실용적 방면과 문학 분야 양면에서 문자문화에 대한 수용능력을 높였다.
한문이라는 문자상의 제약 때문에 문학적 욕구의 구현이 어려웠던 서민층에게 국문문학은 작품을 창작하고 소통하며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 국문문학은 평민층의 체험과 의식세계 그리고 감정들을 반영하였고, 국어의 풍부한 언어적 자산을 흡수함으로써 한문문학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를 확대하였다. 이렇게 국문문학의 발전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서민문화는 질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상업의 발달과 시정문학의 성장은 민속극 · 판소리와 여러 가지 언행 예술이 성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 탈춤 · 꼭두각시놀음과 남사당 같은 전문적 놀이패의 예능은 상당히 오랜 기원을 가지는 것이지만, 상업과 교통의 발달로 전국 각지에 도시적인 생활공간이 많이 생겨나면서 더 널리 전파될 수 있었다.
판소리는 이러한 하층민 예술로부터 출발하여 점차 예술적 세련을 성취하면서 상하층의 청중 모두에게 호소력을 발휘하는 언행예술로 발전해 갔다. 특히 판소리는 문학과 음악이 결합된 창악예술로서, 주201으로서의 탁월한 성취를 이룩하였을 뿐 아니라 그 사설의 문헌 정착과 유통 및 개작을 통해 판소리계 소설이 발전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18~19세기의 문학에서는 주202의 활기가 가장 두드러진다. 그 바탕에는 서민층의 사회경제적 성장, 독서인구의 증가, 문학유통의 발달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가운데서 방각본 소설의 출판과 주203의 기여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조선 후기 소설의 발달과 상품경제적인 소통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방각본 소설의 출판이었다. 방각본이란 민간에서 판각하여 출간한 책을 말한다. 민간출판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출판 · 판매하는 책으로서, 대개 목판 인쇄 방식을 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방각본이라 부른다. 방각본에 소설이 등장한 사례로서 가장 앞선 것은 영조 원년의 한문본 「 구운몽」인데, 18세기 후반쯤에는 국문소설 방각본도 나왔으리라 추정된다. 19세기에 들어와서는 방각본 소설의 출판이 무척 성행하여 수많은 작품들이 간행되었다. 인기 있는 작품은 여러 종류의 이본을 낳으면서 거듭 출판되어, 「 조웅전」, 「 소대성전」과 「 장풍운전」은 각각 8회의 간행 횟수가 확인된다.
세책가는 방각본 소설보다 먼저 나타나서 방각본과 더불어 19세기까지의 소설 유통에 상보적 소통체계를 형성하였다. 좁은 의미의 세책가는 도회지의 고정된 장소에 책을 비치해 두고 일정한 세책료를 받으며 빌려주던 것을 의미하나, 부녀자들의 신변용품을 파는 방물장수 등이 일정한 기간마다 오가며 새 소설을 빌려주던 일도 넓은 의미의 세책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유형까지를 포함한 세책업은 17세기 말이나 그 이전에 나타났으리라 생각된다. 이보다 앞서 책을 읽어주는 사람인 전기수들도 활발히 활동하였는데, 세책가가 늘자 전기수는 줄어들게 되었다.
방각본은 출판비 부담 때문에 분량이 많은 작품들을 피하고 소품종 다량생산이 가능한 소설들을 선호하였다. 반면에 세책가는 대작을 환영하고 다양한 작품들을 수집하여 유통시키는 쪽으로 기여하였다. 수십 책에서 200여 책에 이르는 규모의 대작소설들이 조선왕조 말기의 궁중장서에서 다수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서울지방의 세책가를 통해 궁인들의 읽을거리로 납품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그런 점에서 세책가는 기존 소설작품의 유통에만 상보적으로 기여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소설 취향을 확산시키고 그에 부응하는 작품들이 보다 많이 출현하도록 하는 데에도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5.5.2. 국문소설의 발달
조선 후기에는 사대부 가문의 부녀자나 중인 · 평민층 남성을 중심으로 국문이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있었다. 더욱이 상품화폐 경제질서가 사회 전반에 확대되면서, 점차 방각본의 출판과 세책업과 같은 상업적 유통을 통해 소설도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창작되고 상품화되는 변화를 맞이하였다. 17세기 후반에 김만중의 「구운몽」, 「 사씨남정기」, 조성기의 「 창선감의록」 등이 잇따라 나타난 이후, 18~19세기에는 국문소설이 본격적으로 융성하게 되었다. 국문소설은 구성이나 인물형, 혹은 주제와 같은 요소를 기준으로 영웅소설, 환몽소설, 애정소설, 가정소설, 가문소설, 세태소설 등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국문소설의 창작은 당대인들 사이에 자랑할 만한 일로 여겨지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것을 독자적 창조행위로 존중하는 의식이 희박하였다. 한문으로 쓰인 시와 산문만을 정통문학으로 간주하던 문화적 풍토 속에서 소설은 여전히 천시되고 폄하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풍속을 어지럽히고 인륜을 타락시킨다는 이유로 소설배격론이 나오는 것도 흔한 일이었다. 대다수 국문소설이 그 작가나 창작시기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이 같은 사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
영웅소설은 조선 후기에 가장 성행한 소설 유형이다. 「홍길동전」에서 초기적 형태가 성립한 이후 영웅소설은 영웅적 주인공의 군사적 활약상을 주 내용으로 하여 발달하였다. 대략 17세기에 창작되기 시작하여 18~19세기에 이르러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그런 만큼 다른 어떤 유형보다도 많은 방각본 출판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통속소설적 성향도 짙게 띠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영웅소설의 성행에 자극을 받아, 남성이 아닌 여성을 영웅적 주인공으로 설정함으로써 규방에 속박되어 있던 부녀자들의 잠재욕구를 대리 충족시키려는 여성영웅소설들이 창작되기도 하였다. 영웅소설에는 「 유충렬전」, 「 소대성전」, 「 조웅전」, 「 장풍운전」 등이 있고, 여성이 주인공인 영웅소설에는 「 정수정전」, 「 김희경전」, 「 정현무전」 등이 있다.
역사군담소설은 영웅소설과 달리 실제의 역사적 전란을 배경으로 한 소설 유형이다.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 임진록」과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 박씨전」, 「 임경업전」 등이 그것이다. 이 소설들이 비록 그 제재와 인물을 역사적 사실에서 취해 오고 있다 해도,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은 사실 그대로이기보다는 두 차례의 전란 이후 민간에 유포되어 있던 설화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허구적인 것이 압도적이다. 이 소설들은 전란의 피해와 아픔을 민중의 상상력으로 재구성한 새로운 역사라고 할 수 있다.
17세기 말 김만중이 쓴 「구운몽」은 18~19세기에 유행한 환몽소설의 전범이 되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숱한 모방작과 아류작이 나타났다. 「 구운기」, 「 옥선몽」, 「 옥루몽」, 「 임호은전」 등이 그것이다. 이들 환몽소설에서 몽중세계에 해당하는 세속적 삶의 이야기는 영웅소설의 유형적 특질에 근접하는 경우가 많다. 주인공이 신선이었던 전생에 죄를 지어 인간세계로 오게 되었다는 구조도 그렇고, 영웅적 주인공의 다채로운 군담과 그 과정에서 맺어지는 여성 등장인물들과의 결연이 특히 그러하다.
소설에서 애정을 다루었던 것은 「 금오신화」, 「 주생전」, 「 운영전」과 같은 조선 초기 내지 중기의 작품에서도 보인다. 그러나 조선 후기 유행하였던 애정소설은 젊은 두 남녀가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맺어지기까지 겪어야 하였던 시련과 그 극복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 춘향전」이 있고 이 밖에도 「 숙향전」, 「 숙영낭자전」, 「 윤지경전」, 「 백학선전」 등이 있다.
현재 전하는 판소리계 소설로는 「춘향전」, 「 흥부전」, 「 토끼전」, 「 배비장전」, 「 장끼전」, 「 옹고집전」 등이 있다.
이 부류의 작품들은 세속의 현실을 중시하는 일원적 세계상 위에서 범용한 사람이 생활 현장에서 겪을 만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 초인적 능력을 지닌 영웅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건 전개에 있어서도 경험적인 이해관계가 보다 중시된다는 점, 운문과 산문이 혼합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고도로 세련된 전아한 언어와 평민층의 발랄한 속어와 재담, 육담이 섞여 있다는 점, 그리고 삶의 고통을 담은 비장함이 구수한 해학이나 신랄한 풍자와 어우러져 조선 후기 사회의 생활상을 폭넓게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 등에 의의가 있다.
또한 주제를 구현하는 방식이나 문체상의 특징을 비롯하여 날카로운 세태 묘사 등 판소리계 소설은 조선 후기의 여러 문학 양식에 자극을 주었고, 고전소설을 다채롭게 만드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판소리계 소설의 영향은 동물을 의인화하여 인간사회의 문제를 풍자적으로 다룬 일련의 우화소설에서도 발견된다. 「 토끼전」이나 「 장끼전」 은 판소리로 불리던 것을 소설화한 판소리계 우화소설이다. 이들 각각은 힘없는 토끼와 자라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부패한 봉건군주 용왕의 향락과 탐욕을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는가 하면, 장끼부부를 통해 절대적인 궁핍으로 말미암은 가정의 파괴와 그 극복을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 두껍전」은 몰락해 가던 사족과 성장해 가던 평민부호층과의 대비를 통해 점차 경제적인 능력으로 움직여 나가던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세태를 다루기도 하였다. 이렇게 우화소설은 조선 후기의 구체적 인물과 생활 현실을 풍자적 시각으로 그려냈다.
5.5.3. 풍속화와 민화
조선 후기의 회화에서 지극히 중요하게 평가되는 것은 풍속화의 발달이다. 풍속화는 이전부터 윤두서, 조영석 등의 사대부 화가들이 그리기 시작하였지만 조선 후기에 이르러 단원 김홍도, 혜원 신윤복, 궁재 김득신 등의 화원들에 의하여 크게 발전하였다.
김홍도의 『 단원풍속화첩』에 실려 있는 그림들을 보면, 기와이기, 주막, 빨래터, 자리짜기, 벼타작, 점심, 대장간, 활쏘기, 우물가, 고기잡이, 씨름, 벼타작, 논갈이, 서당, 무동, 고누놀이, 담배 썰기, 편자 박기 등을 다루었다. 대부분 서민들의 일상생활이나 생업에 종사하는 모습을 소재로 하고 있다.
신윤복은 김홍도처럼 일반서민들의 생활상을 파헤치기보다는 생활의 여유를 가지고 인생의 즐거움과 남녀간의 ‘애정’를 추구하는 한량과 기녀들의 세계를 묘사하는 데 주력하였다. 김득신 또한 김홍도에 버금가는 훌륭한 풍속화가였다. 「밀희투전」이나 「성하직리」 등 그의 작품들에서 김흥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과 김득실 역시 뛰어난 기량을 가졌다는 사실이 잘 드러난다.
민화는 대부분 제대로 회화 훈련을 받지 못한 떠돌이 화가들이 서민대중을 위하여 그린 그림들을 일컫지만, 도화서 화원들이 그린 것들 중에서도 일월오봉도, 십장생도, 목란도 등 매우 전통적이고 인습적인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작품들 역시 궁중 민화, 또는 장식화로 분류된다.
민화는 18세기 이후 농업 생산의 증대, 수공업의 발전과 시장경제의 확대 등 경제의 성장에 따른 서민 대중 사이에서 생겨난 회화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흔히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화는 18세기 이후에 성장한 서민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 민족의 미의식, 조형상의 특성, 색채 감각 등을 보다 진솔하고 직설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민화는 대부분 채색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는데 대체로 대담하게 단순화되고 도안화된 표현, 소박하고 천진난만한 미적 효과 등이 돋보인다. 그래서 민화에서는 일반 정통 회화에서 느끼는 것과는 또 다른 해학과 멋을 볼 수 있다.
5.5.4. 판소리
판소리는 주204이라고 하는 가수가 주205라는 고수의 북 장단에 맞추어 부르는 민속 가요의 한 형식이다. 판소리는 처음에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남도 지방에서 발생하여,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판소리 명창들이 남도 지방에서 배출되었고, 오늘날 판소리를 ‘남도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초기 단계의 판소리는 내용과 표현이 모두 소박하였지만, 차츰 다채로운 레퍼토리와 풍부한 내용 및 음악적 탁월성을 갖추면서 18세기 중엽의 판소리는 매우 높은 수준의 창요적 서사시로 발전하였다.
판소리의 창자들은 창을 엮어냄에 있어서 새로운 이야기를 창작하기보다는 전래하여 오던 설화를 근간으로 하여 그것을 다채롭게 윤색하고 개작하였다. 이렇게 해서 일단 성립한 작품들은 창자들의 사승 및 교류에 따라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승되면서 다시 부분적으로 개작되고 확장되어 매우 다양한 내용과 음악적 표현을 축적하게 되었다. 열두마당 중에서 현재까지 창으로 전해지는 「 춘향가」, 「 흥보가」, 「 심청가」, 「 수궁가」, 「 적벽가」를 전승 5가라 한다.
「춘향가」는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봉건사회에서 양반과 상민 사이의 신분적 불평등과 부패한 당시의 현실을 비판하고, 남녀 간의 순수한 사랑에 대한 지향을 진실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심청가」는 눈 먼 심봉사가 눈을 뜨고 죽었던 심청이가 살아나게 되는 환상적인 현상을 통해 당시 백성들의 암담한 처지와 행복한 삶에 대한 희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흥부가」는 18세기 초에 이미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형제간의 의리에 대한 민간 설화에 토대를 두고 창작된 판소리 대본이다.
판소리 명창들에 의해 전해오는 과정에 「흥부타령」, 「 흥부전」 등의 다른 형태를 낳게 되었다. 작품은 탐욕스러운 놀부와 착한 흥부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통해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운 부유한 양반 계층의 약탈성과 탐욕성, 도덕적 파산을 풍자 · 조소하고 행복하게 살아보려는 대중적인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
「수궁가」은 서민계층으로 의인화된 토끼의 형상을 통해 그들의 비참한 처지와 슬기를 보여주고, 봉건 군주와 관료로 의인화된 용왕과 자라, 문어, 잉어 등의 형상을 통해서는 봉건 군주의 탐욕적인 면과 양반 관료들의 위선을 풍자하면서 불합리한 봉건사회의 현실을 폭로하고 있다.
「 장끼타령」은 봉건사회의 가부장적 가정에서 전횡을 일삼던 가장의 행동을 조소하고 있으며, 까투리를 통해 당시 아무 권리도 없던 여성들의 처지와 그들의 재가를 허용하지 않던 봉건 도덕을 비판하고 있다.
「옹고집타령주206」은 권선징악의 유교 도덕과 불교 교리를 장려하고 있고, 「배비장타령」은 구전 설화를 토대로 양반 관료들의 위선과 부패성을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다.
5.5.5. 민요
민요는 노동 생활이나 민속놀이 과정에서 자연 발생한 것으로, 대부분 창조자와 부르는 사람이 따로 구별되지 않고 대중 속에서 널리 불리면서 다듬어지고 완성된 노래들이다. 물론 민요 가운데는 특정인이 대중의 생활 감정을 반영하여 창작한 것도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 구전되는 과정에서 창작자의 개성은 사라지고 보편적 정서만 남게 되어 집단의 창작물로 전환된다. 우리나라의 구전 민요는 내용과 기능에 따라 크게 노동요, 세태 민요, 민속놀이 민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노동요는 사람들의 작업 동작과 사상 감정을 하나로 통일시켜 주고, 노동의 피로를 덜고 어렵고 힘든 일을 보다 흥겹게 하도록 함으로써 노동 능률을 높이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 세태 민요는 일상생활에서 창조되고 불리던 노래로, 여기에는 민족 정서와 생활 감정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민속놀이 민요는 지난날 우리 백성들이 여러 가지 민속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창조하고 불러온 노래이다. 민속놀이 민요는 놀이의 분위기와 흥취를 한결 돋우어 줄 뿐 아니라 놀이에 참가한 사람들의 동작을 하나로 통일시켜 주는 역할을 하였다.
5.5.6. 탈춤과 탈
탈춤은 마을사람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발달된 주207적인 탈춤과 유랑예인들에 의해 연출된 사당패적인 탈춤 그리고 무당들의 굿에서 나오는 탈춤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두레패적인 탈춤은 농경사회에서 풍농을 비는 마을 굿에 기원을 두고 있다. 마을 행사의 하나로 출발한 탈춤은 대륙 전래의 각종 교방잡회와 불교 선전극의 일종인 기악, 그리고 궁중의식의 연회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르러 도시가 성립되자, 농촌탈춤에서 도시탈춤으로 변모되거나 풍물의 잡색놀이로 남게 되었다.
탈춤을 지방별로 구분해 본다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일대의 주208, 황해도의 해서탈춤, 낙동강의 동쪽 일원인 야유와 서쪽 일원인 오광대의 경남 일대의 탈춤 등으로 분류된다. 중부지방의 산대춤은 비교적 섬세한 맛이 있고 손을 내놓고 추기 때문에 손짓이 부각되는 춤사위가 많으며, 동작 하나하나가 매듭춤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해서지방의 탈춤은 한삼의 휘돌림과 힘찬 도무로 무폭이 큰 것이 일품이다. 경남지방의 야유나 오광대춤은 덧배기춤 또는 배김새춤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덧배기의 의미는 ‘장단을 배긴다’, ‘힘차게 박는다’라는 의미로 추측하고 있다.
5.6. 생활문화
5.6.1. 식생활
조선시대의 주식은 각종 쌀(쌀, 좁쌀, 보리쌀)로 고려시대와 큰 차이가 없었다. 17세기에는 모내기에 따른 이모작이 확산되면서 보리밥의 비중이 커지나, 그 이전에는 아직 보리밥의 비중이 별로 크지 않았다. 항상 찌개나 국을 해서 주식인 밥(쌀밥, 보리밥, 조밥)과 같이 먹는 방식이었다. 부식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조선 후기 고추를 재배하면서 일어났다. 조선 전기에는 무나 오이 등을 소금물에 담가 절인 김치였으나, 고추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아는 김치 쪽으로 변화하였다. 장류에 간장과 된장에 고추장이 추가되었고, 젓갈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조선 후기의 그림들을 보면 양반들은 독상이 원칙이었다. 성인 남성은 모두 독상을 받았다. 「춘향전」에서 어사 이몽룡이 거지차림으로 변학도의 잔치에 찾아가서 말석에서 상을 받는 내용이 있다. 거지에게도 부러진 개다리소반이든 어떻든 역시 독상을 내주었다. 언제부터의 전통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보통 앉아서 먹는 상을 사용하였으나, 제례상만은 입식 상을 썼다. 중국에서 들어와 고려 때 이미 지배층의 전통이 된 뒤 조선으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구황을 위해 조선 초기에는 국가에서 도토리를 줍도록 시켰다. 고급 구황식품은 밤이었다. 이 밖에 귀리, 솔잎과 소나무 껍질 등이 구황에 사용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감자가 새로운 구황식품으로 등장하였고, 18세기 이후 고구마, 옥수수 등이 새로 들어오면서 구황식품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특별 음식으로 떡, 두부, 국수, 엿, 술 등이 있었다.
5.6.2. 주생활
조선시대에도 신분, 지위에 따라 집의 크기에 규제를 받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크기는 칸수, 기둥의 높이, 들보의 길이에 따라 정해졌다. 16세기 이후 추운 날이 많아지자 집집마다 온돌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와 아울러 마루가 딸린 집의 형태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는데, 완전히 정착되는 시기는 18세기이다. 따라서 16, 17세기는 아직 ‘초가삼간’이라 부르는 전형적인 시골 서민의 농가가 정착해 가는 중이었다.
성리학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안채와 사랑채가 구분되고, 사당이 딸린 집이 권위 있는 양반가, 곧 사대부 가옥의 모습으로 등장하였다. 여기에 경제력이 풍부한 경우는 별채와 격식을 갖춘 정원도 마련하였다. 측간도 여성용과 남성용으로 내외를 하였다. 사대부 가옥은 양반 집성촌인 경우에는 평지에 들어서 있는 경우가 많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네에서 높은 곳에 자리하였다. 높은 곳에 자리한 이유는 사회적 위계질서를 반영하고, 비밀 유지를 쉽게 하기 위해서였다.
서민 가옥은 담이 없거나, 있어도 야트막하지 않으면 싸리 따위로 울을 치는 정도여서, 남들이 다 들여다볼 수 있었다. 문이 없는 경우는 더 많았다. 사대부가의 담은 튼튼하고 높게, 궁궐의 경우는 더 높고 크게 지은 것과 명확히 구별되었다.
5.6.3. 의생활
조선시대는 한복이 자리 잡는 과정이었다. 고려시대의 복색에서 고려 말 조선 초에 옷고름을 달기 시작하였고, 조선시대에 들어와 차츰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졌다. 남자 저고리는 조금 짧아지는 데 그쳤지만, 여자 저고리는 더 많이 짧아져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기녀(妓女)들이 입는 옷은 18세기에 이르면 겨드랑이 밑에까지 오게 되는데, 서민들도 이를 흉내 내는 모습이 연출되었다. 기녀들은 저고리 아래에 띠를 둘렀으나, 서민들은 그 띠를 마련하지 못해 젖가슴을 내놓는 일이 벌어지기 십상이었다. 조선에서도 여전히 신분과 직업에 따라 의복도 달랐다. 관리, 군인, 승려, 광대, 장돌뱅이 등등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색이 있는 옷을 입었다.
5.7. 기록문화
조선시대에는 기록문화의 전성기였다고 할 만큼 다양한 기록물을 제작하였다. 조선시대 기록문화의 대표로 꼽는 『조선왕조실록』 등의 역사서로부터 주209 주210의 기본 자료였던 호적과 양안, 호적 작성을 위한 자료였던 호구단자, 상속 및 매매 관련 문서들도 엄연한 기록물이었다. 국가에서 제작한 기록물은 대부분 책자 형태이고 때로는 주211인 것도 있으나, 민간에서 만든 것은 낱장이나 몇 장의 문서인 것이 많다.
내용에 따라 살펴보면, 첫째로 역사와 연혁에 대한 기록, 둘째로 특정한 개별 사실에 대한 기록, 셋째로 경제적 내용에 대한 기록, 넷째로 지리에 대한 기록, 다섯째로 인물에 대한 기록, 여섯째로 국왕에게 아뢰거나 국왕과 대화한 내용에 대한 기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특정한 개별 사실이나 인물에 대한 기록 등에는 기념을 위한 것들도 다수 있다.
국가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사나 건축물 축조는 의궤(儀軌)나 주212이라는 이름의 책자로 정리하여 기념하였고, 별도의 기록화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등록은 의궤보다 격이 낮은 기록물의 명칭으로, 세자나 세자빈 이하 왕실 구성원의 의례는 의궤로 정리하기도 하였으나 대개 등록이라는 이름을 붙여 정리하였다. 이러한 기록문화는 조선의 지배체제가 원만히 운영되면서 장기간 지속할 수 있었던 정신적 힘이었다.
5.8. 교육
양반관료제 아래의 학문과 교육은 주로 양반 자제를 대상으로 관료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때문에 학교는 과거 준비기관이나 다름이 없었고, 따라서 교과 내용도 유학과 한문학이었다. 양반 자제들은 7∼8세가 되면 서당에 들어가 한자와 습자를 배우고, 15∼16세에 이르면 중앙에서는 주213, 지방에서는 향교(鄕校)로 진학하였다. 사학과 향교에서 수년간 수학한 자는 주214에 응시하는 것이 상례였다.
최고 학부인 성균관은 주215의 준비기관이었다. 사학이나 향교를 거쳐 소과에 합격하면 성균관에서 다시 수학하여 대과를 치러 고위 관직에 나가는 것이 정규 과정이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성균관에는 생원 · 진사가 많았지만, 사학의 생도나 공신 · 훈신의 자제로서 입학시험에 합격한 자, 현직 관료 중의 지망자들도 함께 수용, 문과 응시자격을 주었다. 성균관에는 공자를 비롯한 성현을 봉사하는 문묘(文廟), 학문을 강의하는 명륜당(明倫堂), 생도의 숙사인 동재(東齋)와 서재, 도서관인 존경각(尊經閣), 과거장인 비천당(丕闡堂) 등이 있어 성현에 대한 경모와 강학의 기능을 겸하였다.
지방의 향교도 문묘 · 명륜당 · 재 등이 있어 성균관을 축소한 형태였다. 사학과 향교는 시대에 따라 쇠미해지고 사숙(私塾)인 서당 이외에 서원이 성해졌으나, 성균관은 후기까지 국립의 최고 학부로서의 권위를 유지하였다.
서원은 성현을 봉사하는 사(祠)와 후학을 교육하는 재의 기능을 갖춘 점에서 향교와 그 기능이 비슷하였다. 서원의 기원은 1543년(중종 38) 풍기군수 주세붕이 고려의 명유 안향(安珦)의 고향인 영주 순흥(順興)에 세운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다. 이 서원은 뒤에 풍기군수로 부임한 이황의 건의로 1550년(명종 5)에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었다.
사액서원이란 조정에서 칙액(勅額)과 함께 서적 · 노비 · 토지 등이 하사된 서원을 말한다. 그 뒤 서원은 각지에 설립되어 선조 때에 124개소이던 것이 숙종 때에는 한 도에만 80∼90개소나 되는 곳도 있었다. 그리하여 서원은 사림의 근거지로 변화하여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무과 계통의 교육은 유교 경전과 병서 등 학술 이외에 무예를 닦아야 하는데도 특별한 교육기관이 따로 없었다. 훈련원에서 군사의 시재(試才), 무예의 연마, 병서의 습득을 실시하기는 하였으나 곧 과거와 직결되는 교육기관은 아니었다.
서당은 이미 15세기부터 주요 가문에서 자손의 교육을 위해 등장하였다. 서당의 사회적 의미는 사림파의 등장과 시기를 같이 하여 대두하였고, 중종 때 사림파의 향약 보급운동과도 일련의 연관성이 있었다. 16세기 서당 설립을 주도한 세력은 당시 향촌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지녔던 명문 사족이었다. 서당의 교육내용은 고급 성리서(性理書)를 위주로 하거나 과거 응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양란 후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사족들은 약화된 재지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서당을 중심으로 관권 및 외부 사림과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사림들은 관권과 결합하여 서당을 설립하고, 수령을 서당에 불러서 강회(講會)를 열고 상벌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17세기에도 사족이 연합하여 서당을 세우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혈연 위주의 폐쇄적인 양상이 대종을 이루지는 않았다.
18세기 후반에 동족마을이 서당 설립의 가장 주요한 주체가 되자, 서당의 성격에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동족마을은 서당의 운영을 위하여 문중 중심의 주216를 만들기도 하고, 학전(學田)과 학름(學廩)을 비치하기 위한 서당수호절목(書堂守護節目)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종손을 중심으로 한 종중(宗中)이 서당을 공동관리하였으며, 강학 외에 문중의 대소사도 처리하였다. 또 서당에서 선조를 제사하기도 하였다.
서당은 19세기 말 근대적 교육의 전개와 더불어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였다. 옛날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재래식 서당과 새로운 시대의 조류에 적응한 개량 서당으로 나뉘었고, 개량 서당에서는 근대교육 교과를 도입하고, 교원 또한 근대식 교육을 받은 자들로 구성하였으며, 민중교육에 큰 공헌을 하였다. 총독부의 통계에 의하면 1911년 3월 말의 서당 수는 1만 6540개소이며, 학동수는 14만 1604명이었다.
5.8. 신문화의 수용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립된 근대적 교육기관은 원산에 민간인이 설립한 원산학사(元山學舍)와 통역관 양성을 위해 외아문(外衙門)에 부설된 동문학(同文學)이었다. 정부는 1886년에 본격적인 서양식 교육 보급을 위해 미국인 교사를 초빙하여 육영공원(育英公院)을 개설하였다. 또 같은 해 선교사들에 의해 배재학당 · 이화학당이 설립되었다. 갑오경장 이후에는 새로운 학제가 실시되면서 소학교 · 중학교 · 사범학교 · 외국어학교 등 관립학교가 많이 생겨 근대적 교육이 보편화되었다.
1905년을 전후한 애국계몽운동을 통해 독지가의 사재(私財), 국민의 성금, 종교 단체의 재정적 후원 등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 즉 사학(私學)이 크게 일어났다. 특히 1905∼1910년 간에는 개신교 계통의 학교 설립이 활발하여 미션계 학교는 그 당시 전체 학교 수의 3분의 1이 되었다. 그 결과 1910년에는 전국의 학교 수가 2,000여 개에 달하였다. 그러나 일제가 1908년에 「 사립학교령」, 「교과용도서검정규정」 등을 발표하여 사학을 규제하고, 교육을 통한 국권 회복을 모색하였던 애국계몽운동은 많은 제약을 받았다.
1883년에 최초의 근대적 신문 『 한성순보』가 창간되었다. 이것은 1886년에 『 한성주보』로 개칭되었는데, 주로 한문으로 쓰여진 관보적 성격의 신문이었다. 또 1896년에 이르러 최초의 순한글 민간지인 『 독립신문』이 서재필에 의해 발간되어 민권 · 법치주의 · 주권수호 등 독립 의식을 각성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1898년에 이르러 양홍묵(梁弘默)의 『 매일신문』, 남궁 억 · 유근(柳瑾) 등의 『 황성신문』, 이종면(李鍾冕)의 『 제국신문』 등이 발행되었다.
러일전쟁 후인 1904년에 영국인 베델(裵說, Bethell, E.)과 양기탁(梁起鐸)이 『 대한매일신보』를, 1906년 오세창(吳世昌)이 『 만세보』를 발간하였다. 그 중 『대한매일신보』는 일제의 침략을 규탄하고 정부의 실정(失政)을 비판하면서 국권회복운동에 앞장선, 그 당시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민족언론지였다. 그 뒤 일제통감부에서 1907년에 「 신문지법」, 1909년에 「출판법」 등을 만들어 한국인에 의한 언론 활동을 제한하고 검열을 강화하자 민족 언론은 쇠퇴하였다.
국어 연구 분야에서는 주시경(周時經)이 『독립신문』을 통해 한글표기법의 통일 작업을 모색하다가 1906년 『 국어문법』, 1908년 『 국어문전음학』 등을 저술하였다. 또 유길준은 1890년대에 작성한 『 조선문전』을 개고하여 1909년에 『 대한문전』을, 지석영(池錫永)은 1905년에 한글의 문자 체계를 확립한 「대한국문설」을 발표하였다. 이능화(李能和)는 1906년 학부에 국문법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국문에 대한 민간학자들의 관심 제고로 정부에서는 1907년 학부에 ‘ 국문연구소’를 설치하였다. 이 연구소에서는 1909년 국문의 연원, 자체(字體)와 발음의 연혁, 철자법 등 11항목에 대해 통일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한말에는 국사 연구도 활발하였다. 박은식 · 장지연 · 신채호(申采浩) 등은 신문 · 잡지 등을 통해 국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역사상의 영웅들을 소개, 민족 정신을 고취하였다. 김택영(金澤榮)은 『 역사집략』 등 국사교과서를 저술하였고, 현채(玄采)는 저술 · 번역 활동을 통해 근대적인 역사서술 방법론 도입에 기여하였다. 또 최남선(崔南善)은 1910년에 조선광문회를 조직하여 고전, 특히 실학자들의 저술을 발굴, 간행하였다.
1900년 이후 서양의 문학 작품이 번역, 소개되면서 전통적 소설체를 탈피한 언문일치(言文一致)의 한글 문장을 사용한 신소설이 나타났다. 신소설은 미신 타파 · 신교육 · 신사상 · 독립의식 고취 등 계몽적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주제면에서 구태의연한 권선징악적 범주를 탈피하지 못하였다. 이인직(李人稙)의 「 혈의누」, 이해조(李海朝)의 「 자유종」이 신소설의 대표작이다.
음악 · 미술 등 예술면에서는 양반들 사이에서는 시조, 서민들 사이에서는 「춘향가」 · 「심청전」 같은 판소리가 계속 유행되었고, 미술에서도 전통적 동양화가 계승되는 가운데 서민들이 개발한 민화가 새로이 등장하였다. 또, 한말 개신교의 찬송가에서 영향을 받은 서양식의 악곡에 맞추어 부르는 신식 노래, 즉 창가(唱歌)가 유행하였는데 이들은 독립 · 애국 · 신교육 · 신문화를 주제로 하였다.
개항에서 일제강점에 이르는 시기는 조선이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에서 벗어나 근대적 국제질서로 편입되어 마침내는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시기였다. 그러나 이와 아울러 한국인이 근대 민족국가의 건설을 지향하고, 외세에 대한 투쟁과 개화 · 자강의 노력을 멈추지 않은 역사적 과정이기도 하였다. 그 노력은 헛된 것 같았지만,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으로 계승되었으며, 광복 후 우리나라 발전의 토대를 이루었다.
이 시대의 역사적 성격은 사상적인 면에서는 전통 사회의 이데올로기였던 유교가 사회적인 영향력을 상실해가고, 그 대신 새로운 사상 체계가 형성되는 시기였다. 서구사상의 영향하에 변형된 유학 체계인 개신유학사상과 기독교 · 동학 등이 영향력이 큰 새로운 사상으로 부상하였다. 이들 사상으로 민족주의 및 민주주의적 정치 이념이 개발되었고, 반면 보수적 유학사상은 여러모로 계속 그 뿌리를 보존하고 있었다.
문호 개방 뒤 근대적 교육제도가 도입, 실시되었으며 새로운 교육의 결과로 우리 민족의 자주적 근대화 노력이 지속되었다. 동시에 이 시기에는 한글이 보급되고 역사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는 등 문화적 민족주의가 발달하였다. 또 양반 중심의 문화에서 일반 서민을 위주로 한 새로운 국민문화가 대두하고 있었다. 신문과 잡지의 발행, 국 · 한문혼용체로 서술된 교양 서적의 보급, 언문일치체 신소설의 등장 등은 이러한 국민문화의 기반을 다져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6.1. 명과의 관계
조선은 명에 대해 사대(事大)로써 친선을 유지하였다. 여기서 명에 사대한다 함은 조선의 왕이 명의 책봉을 받고 그 연호를 사용하며, 중요한 국정을 보고하여 그 의견을 듣는 따위의 일을 말한다. 고려 말에 있었던 친원파와 친명파의 대립은 원나라를 배경으로 한 권문세족과 사회적 모순을 개혁하려는 사대부층의 이익이 상반되었기 때문이다. 신진사대부층의 지지를 받은 이성계가 당시 권문세족과의 투쟁 과정에서 내세웠던 친명정책은 조선 건국 후에도 필요하였다.
명은 조공(朝貢)이라는 관무역으로 이득을 취하고, 명목상 종주국이라는 자존심을 얻었다. 이에 대해 조선은 정치상 기본적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조공에 따르는 관무역으로 이득을 얻고, 선진 문화를 수입하였으며, 정권의 국제적 승인이라는 효과를 거두었다.
조선과 명과의 관계는 대체로 원만한 편이었으나 종계변무(宗系辨誣) 등의 문제가 없지는 않았다. 이는 주217』에 조선의 태조가 이인임(李仁任)의 아들로 잘못 기록된 것을 수정해 달라는 요청이 약 200년을 끈 다음 선조 때에 이르러서야 겨우 해결되었다.
6.2. 여진과의 관계
여진과는 교린(交隣)이라는 관계를 맺었다. 조선은 여진 추장에게 명예 관직을 주어 형식상 종속 관계를 맺고, 진상과 회사(回賜)라는 관무역이 행해졌다. 조선은 그들의 복종에 만족하고, 여진은 문물 수입으로 만족하는 관계였다. 조선 초기 여진의 갈래는 흑룡강 유역의 야인(野人), 두만강과 압록강 북쪽의 건주여진(建州女眞), 송화강 유역의 해서여진(海西女眞) 등이 있었다.
명은 주218 때 만주 경략을 본격화하여 약 180위(衛)를 두어 지배 체제를 갖추었다. 그러나 조선의 북쪽 경계 밖에는 명의 지배가 미치지 못한 지역이 많았다. 조선은 이들을 야인이라 하고, 한편으로는 정복하고 한편으로는 회유하는 정책을 썼다.
두만강 유역의 여진과의 관계를 보면, 태조 때부터 여진 경략에 착수하여, 세종 때 김종서(金宗瑞)에게 종성 · 온성 · 회령 · 부령 · 경원 · 경흥 등에 6진을 두게 하고 두만강으로 국경선을 확정하였다. 한편, 압록강 방면의 여진은 세종 때 최윤덕(崔潤德) · 이천(李蕆) 등에게 여연(閭延) · 자성(慈城) · 무창(茂昌) · 우예(虞芮) 등 4군을 설치하게 하여 압록강 상류 지역까지 국경선을 확장하였다.
6진 설치로 압력을 받은 오도리족은 그 대부분이 압록강 방면 파저강(婆猪江) 부근으로 이주하여, 그곳 우량하족의 추장이며 건주본위도독(建州本衛都督)인 이만주(李滿住)와 합류하였다. 그러나 두만강 북안에 잔류한 여진은 기회만 있으면 조선에 침입하여 소란을 피웠다.
그리하여 1460년(세조 6)에는 신숙주(申叔舟)가 강원도 · 함경도체찰사로 우량하족의 본거지를 무찔렀고, 1491년(성종 22)에는 허종(許琮)이 우디거 여러 촌락을 소탕하였다. 4군이 설치된 지역은 방어하기가 더 어려워서 1458년에는 4군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이는 영토의 포기가 아니라 국방선의 후퇴였다. 세조 초에 건주여진의 추장에게 주는 관직 문제로 조선과 명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1467년 이시애(李施愛)의 난을 토벌하고 있을 때, 만주에서는 명이 건주본위를 토벌하고자 조선에 협공을 요청해왔다. 조선에서는 이에 호응하여 강순(康純) · 남이(南怡) 등이 압록강을 넘어 건주위의 본거지를 공략하고, 이만주 부자를 죽이는 등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 뒤 1479년에도 명의 요청으로 윤필상(尹弼商)이 압록강 너머 여진 본거지를 토벌하였고, 이어 신립(申砬)도 여진의 이탕개(尼湯介) 토벌에서 공을 세웠다. 그러다가 17세기 초 건주좌위 출신의 누루하치가 청나라를 건국한 후, 조선은 호란이라는 대란을 겪게 되었다.
6.3. 청과의 관계
건주좌위 출신의 누루하치는 16세기 말경 인근 촌락을 차례로 정복하여 세력을 확장하더니, 1616년(광해군 8)에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워 만주 지방의 태반을 통합하였다. 광해군은 양단정책(兩端政策)을 써 명에 대한 사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후금의 비위도 거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인조반정 이후 향명배금정책(向明排金政策)을 뚜렷이 하자 후금이 1627년(인조 5) 우리 나라에 침입하니, 곧 정묘호란이다. 1636년에 후금은 국호를 청이라 하고 다시 조선에 침입하여 병자호란을 일으켰는데, 이때 조선은 청나라에 항복하고 말았다.
병자호란 이후에도 숭명배청(崇明排淸)의 경향이 오래 지속되었으나, 표면상의 대청 관계는 사대의 예를 지켜 주219이 계속되었다. 조공 이외에 사신에게 공인된 사무역이 행해졌고, 또 국경에는 호시(互市)가 시작되어 관허무역인 개시(開市)와 밀무역인 후시(後市)가 있었다. 효종 때에는 북벌을 계획하기도 하였으나 실행되지 못하였다. 또, 효종 때에는 청나라의 요청으로 두 차례나 나선정벌(羅禪征伐)에 출병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유사 이래 러시아와의 첫 대결로서 조선은 모두 승리하였다.
한편,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가 문제되기도 하였다. 1712년(숙종 38) 청나라는 오라총관(烏喇摠管) 목극등(穆克登)을 시켜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웠는데, 이때 북계의 경계에 대한 우리 측 주장과 그들의 주장이 서로 달라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 뒤 북계의 국경 분쟁은 고종 때 다시 일어났으며, 1909년에 일본은 청나라로부터 주220의 부설권을 얻어낸 대가로 간도(間島) 지방을 청나라의 영토로 넘겨주는 간도협약을 맺었다.
6.4. 일본과의 관계
조선 건국 초에는 왜구의 노략질이 뜸하였다. 그것은 조선의 국세가 강해진 것과 신무기인 화약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왜구의 소규모 약탈 행위는 가끔 있었으므로 1419년(세종 1)에 이종무(李從茂)에게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對馬島)를 정벌하게 하였다. 1443년에는 일본과 계해약조(癸亥約條)를 맺어 웅천의 내이포(乃而浦), 동래의 부산포, 울산의 염포(鹽浦) 등 3포를 개항하고, 세견선(歲遣船)을 50척, 세사미두(歲賜米豆) 200석으로 제한하였다.
그 뒤 1510년(중종 5)에 삼포왜란으로 3포가 폐쇄되어 일본과의 교역이 중단되었다가 1512년에 임신약조(壬申約條)로 세견선과 세사미두의 수량을 반감하여 다시 교역을 허락하였다. 1535년에 고성(固城) 사량진(蛇梁津)의 난으로 통교가 중단되었다가, 1547년(명종 2)에 정미약조를 맺어 더욱 많은 제약 밑에서 교역하였다.
16세기 수 차례의 왜변으로 조정에 비변사를 상설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 오랜 전국시대의 혼란을 수습하고 국내 통일을 이룬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부터 정유재란까지 전후 7년 간의 전쟁을 일으켰다. 조선은 전국토가 전쟁터가 되어 왜군의 약탈과 살육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임진왜란으로 국가 재정이 고갈되자 납속(納粟)으로 관직을 팔아 국정이 문란해지고, 인구는 줄었으며, 토지는 황폐해져 경작 면적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호적과 토지의 대장이 소실되어 역을 부과하고 조세를 징수하는 일조차 어려워졌다. 또한, 문화유산 손실도 커서 왕궁을 비롯, 유서깊은 시설들과 사고(史庫)의 실록 등 많은 문헌들도 소실되었다.
임진왜란은 조선뿐만 아니라 명 및 일본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명은 임진왜란에 국력을 기울이다가 결국 청나라에게 멸망하였다. 일본은 조선에서 도자기와 활자 등의 기술을 배워갔으며, 성리학 등 학문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임진왜란 후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가 서자 일본의 요청으로 1609년(광해군 1)에 기유약조를 맺어 통교를 재개하였다. 기유약조 이래 통신사(通信使) 파견은 모두 12회나 되었다. 조선 통신사는 일본에 경조(慶吊)의 일이 있을 때마다 에도〔江戶〕까지 내왕하였는데, 비단 외교사절일 뿐 아니라 문화 전파의 역할까지도 담당하였다.
한편, 왜인들의 내왕을 통제하기 위해 전기와 같이 입국 증명을 꼭 소지하게 하였다. 입국 왜인의 개항장은 부산이었고, 입국 왜선은 세견선(歲遣船)과 임시적인 사송선(使送船)이 있었다. 사송(使送)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차왜(差倭)는 무역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그들은 예조판서 · 동래부사 등에 공식적인 서계(書契)와 예물인 별폭(別幅)을 바치고 회답서계(回答書契)와 회사(回賜) 예물을 받아갔다. 이후 예물은 점차 증가되어 무역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차왜의 종류에는 막부장군(幕府將軍)의 관백승습(關白承襲)을 비롯, 통신사호행(通信使護行) · 진하(陳賀) 등 30여 종이나 되었다.
1811년(순조 11)에는 역지교역(易地交易)이라 하여 조선 통신사를 대마도에서 영접하기 시작하였다. 역지교역이란 일본이 조선 통신사 일행 500여 명 내외가 에도까지 내왕하는 데 드는 접대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대마도에서 외교와 교역 사무를 처리하자고 한 것이다. 이 역지교역은 일본의 국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조선은 일본이 무례하다 하여 역지교역이 실시된 1811년부터 1876년 병자조약 때까지 통신사를 파견하지 않았다.
6.5.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와의
유구(琉球)주221는 고려 말에 중산(中山) · 산남(山南) · 산북(山北)의 3부로 나뉘어 있었다. 그 중 중산왕(中山王) 찰도(察度)가 고려 및 명과 각각 교섭을 시작하였다. 조선 건국 후인 1401년(태종 1)에 찰도가 다시 사신을 보내 수호하고, 매년 신하라 칭하며 방물(方物)을 공납해왔다. 그 중에는 조선이 공인하는 세견선으로 내왕하고 관직을 받은 자도 있었다.
유구는 해외무역으로 생계를 삼았는데, 토산물과 안남(安南) · 샴[暹羅] 등 남쪽 산물을 중개하였다. 조선과 유구의 교통은 비교적 많은 편이었고, 표류민을 자주 송환해왔다. 유구에는 조선에 오는 해로를 잘 아는 자가 적었다. 때문에 일본의 승려 · 상인으로서 유구에 거주하는 자가 사신이 되어 오는 경우가 있었다. 유구의 조공물은 남양 산물이 많았으며, 그들과의 통교는 인조 때까지는 아주 끊어지지 않았다.
자바[爪哇]와 샴을 남만이라 불렀는데, 당시 남만의 배는 안남을 지나 마카오 · 광둥[廣東] · 아모이〔泉州〕 내지 대만 · 유구 · 일본의 기타큐슈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그 중에는 조선까지 들어온 것도 있었다. 샴은 당시 아유티아 왕조로서 태조 때 사절을 보내왔으며, 방물로는 소목(蘇木) · 속향(束香) 등이었다. 자바도 태종 때 이래 진언상(陳彦祥)이 여러 번 사절로 왔고, 남양의 여러 토산과 인도 지방에서 생산하는 번포(蕃布) 등을 가져왔다. 이때의 자바는 마지바히트 왕조로서 국세가 한창 융성하던 시기였다.
6.6. 개항 후 국제관계
19세기 후반기는 산업혁명을 거친 서구의 제국주의 열강들이 상품 시장과 원료 공급지의 확보를 위해 본격적으로 동양에 진출하는 시기였다. 이에 잦아진 주222의 출몰과 양이(洋夷)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흥선대원군 치하의 조선 정부는 중국 및 일본과 전통적인 사대교린 정책을 고수하는 한편, 서양에 대해서는 쇄국양이 정책을 취하였다. 서양과의 통상 · 외교를 거부하는 쇄국정책은 서양의 무력 침략은 물론 유교 질서를 부정하는 서학(西學)의 침투를 막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흥선대원군은 1860년대에 조선과 접경하게 된 러시아가 통상을 요구해왔을 때, 천주교 신자 남종삼(南鍾三)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영국 및 프랑스의 세력을 동원하여 러시아의 남하를 막으려는 이이제이(以夷制夷)의 정책을 시도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 계획을 포기하고 그 대신 정부 내의 보수주의자와 유학자들의 주223을 받아들여, 러시아를 비롯한 서구 열강에 대해 문호를 폐쇄하고 국내의 천주교도들을 탄합하는 정책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쇄국 및 천주교 박해정책은 프랑스 및 미국이 ‘은둔국 조선’에 대한 무력 행사를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1866년의 병인양요와 1871년의 신미양요로 프랑스와 미국 함대의 도전을 받았으나, 이를 성공적으로 격퇴시켰다. 이후 흥선대원군은 양이쇄국 정책에 박차를 가해, 변방 수비를 강화하고 척화비(斥和碑)를 세우는 등 강한 쇄국 의지를 내외에 보여주었다. 한편 1868년 메이지유신 후, 근대적 외교 · 통상 관계의 수립을 요망해온 일본의 협상 요구도 서계문제(書契問題)를 구실로 거부하였다. 그러나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은 1873년 말에 고종이 친정(親政)을 개시하면서 막을 내렸다.
흥선대원군이 하야한 이후 고종 치하의 조선 정부는 일본과의 무력 충돌을 피하기 위해 1876년에 일본과 처음으로 근대적 조약( 강화도조약)을 맺었다. 그 뒤 점차 서양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하는 정책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조선이 일본에게 외교권을 박탈당한 1905년까지 조선은 청나라와 일본 이외에 미국(1882) · 영국(1883) · 독일(1883) · 러시아(1884) · 이탈리아(1884) · 프랑스(1887) · 오스트리아(1892) · 벨기에(1902) · 덴마크(1902) 등 9개국과 차례로 외교 ·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시기에 맺어진 열국과의 조약은 형식상 자주독립국 간에 체결된 조약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선에게 불리한 주224 · 고정관세(固定關稅, 혹은 협정관세) · 주225 등 요소가 포함된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 시기 조선의 외교는 주로 국내에 주재한 외국 공사를 상대로 하는 소극적인 외교였다. 조선은 1887년과 이듬해에 일본과 미국에 각각 공사관을 개설하고 외교 사절을 상주시켰다. 1890년대 이후 유럽 각국에도 공사관을 설치하였지만 이들 해외 공관은 적극적인 외교 · 통상을 추진하지 못하였다. 조선과 청나라는 1894년까지 전통적인 사대조공 관계를 지속하였다. 청나라는 1879년 일본이 유구를 병탄하기 전까지 조선 문제에 무관심하여 조선에 종주권을 강조하지 않았다. 그러나 1860년 이후 러시아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과 일본의 조선 침략을 예방하기 위해, 조선이 서양제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이들을 견제하도록 권도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1880년대 초 청나라의 북양대신 이홍장(李鴻章)은 “조선은 원래 중국의 속방이나 내치 · 외교는 자주”라고 하면서 미국과의 조약을 알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882년에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청나라는 군란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병자호란 이래 처음으로 조선에 군사 개입을 하였다. 군란 진압 후 청나라는 군란의 주모자로 알려진 흥선대원군을 청국으로 구치하고 조중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하였다. 또, 조선에 고문관과 군사교관을 파견하는 등 고압적인 간섭 정책을 폈다. 1885∼1894년 간에는 주226를 주차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로 임명하여 조선의 내외 정치를 노골적으로 간섭, 종주권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러나 1894에 청일전쟁에서 일본에 패배한 청나라는 시모노세키조약〔下關條約, 또는 주227으로 조선에 대한 우월권을 모두 상실하였다. 그 뒤 청나라는 조선과 통상적인 외교 · 무역 관계를 유지하였다. 메이지유신 뒤 일본은 제국주의 열강의 수법을 모방하여 조선 침략을 획책하였다. 일본의 조선 침략 정책은 황국사관(皇國史觀)에 입각한 일본의 국수적 민족주의, 러시아의 남하를 예방해야 한다는 전략적 동기, 메이지 정부에 대한 반대파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려는 정치적 동기, 그리고 통상을 통한 경제적 이익 추구와 과잉 인구의 해외 유출이라는 식민주의적 고려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었다.
일본의 대한정책은 일본 내의 상황과 국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우선 순위 내지 실현 방법이 바뀌었지만, 끈질기게 추구되어 마침내 1910년에는 조선을 병탄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일본은 1876년에 조선과 조일수호조규( 강화도조약)를 체결하여 부산 이외의 2개 항구 개항, 조계설치권 · 무관세무역권 · 일본화폐유통권 등을 획득하고, 1883년까지 조선 시장에 독점적으로 침투하였다. 1880년 이후 일본은 조선에 군사교관을 파견하고, 조선의 중견 관료들을 자기 나라에 초청하였으며, 일본의 근대 문물을 견학하게 하여 조선이 일본의 문명개화상을 모방하도록 하였다.
임오군란 이후 제물포조약으로 군대 주둔권을 획득한 일본은 조선에서 청나라 세력의 확대에 불안을 느끼고 1884년 말 친일개화당의 갑신정변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갑신정변이 3일 만에 실패함으로써 오히려 청나라의 대한간섭 정책을 조장한 결과가 되었다.
그 뒤 일본은 1885년에 톈진조약을 체결하고, 한반도에서 청국과의 세력 균형을 꾀하였으나, 조선에 대한 정치적 · 경제적 영향력은 쇠퇴하고 있었다. 그동안 군사력을 키워온 일본은 1894년의 동학농민의거를 계기로 청일전쟁을 도발하고, 승리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청국 세력을 축출하는 한편, 조선에 대해 서구 열강과 본격적인 제국주의 경쟁을 벌이게 되었다.
청일전쟁 중에 일본은 조선에 친일 정권을 수립하여 보호국화하려는 적극 간섭 정책을 추진하였다. 일본의 지나치게 고압적인 간섭 정책은 도리어 조선 정부 내에서의 반일친러파를 형성하였다. 이에 1895년 일본은 을미사변을 일으켜 친러파의 거두인 명성황후를 시해하여 상황을 호전시키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결국 이듬해에는 아관파천이 이루어져 일본 세력은 조선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 뒤 일본은 일본 다음으로 조선에 가장 예민한 관심을 보인 러시아와 협상을 벌이면서 조선에서의 이권 확충에 주력하였다. 1898년 니시-로젠협정으로 러시아로부터 조선에서의 상공업상의 우월권을 인정받은 일본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1900년 이후에는 ‘만한교환조건(滿韓交換條件)’의 협상을 러시아에 제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협상이 여의치 않자 삼국간섭 이래 계속 군비를 증강해온 일본은 1902년에 영일동맹을 맺고 결국 1904년에 러일전쟁을 일으켰다. 일본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러시아 세력을 한반도에서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다. 주228 · 태프트-가쓰라밀약 · 영일조약 갱신 등으로 러시아 · 미국 · 영국 등 조선에 이해 관계가 있는 나라들로부터 한국 지배를 승인받은 일본은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보호국화 하더니 1910년에는 조선을 강제 병합하였다.
미국은 조선이 외교 관계를 맺은 최초의 서양 국가였다. 1882년에 청나라 이홍장의 알선으로 체결된 조미조약은 주229 조항을 포함하고 있고, 또 협정 관세율이 비교적 높게 책정되었다는 점 등으로 조선이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에 비해 비교적 관대한 것이었다.
조선의 국왕과 외교담당자는 미국의 거중조정과 그 부력(富力)에 기대를 걸고 미국에 의존하는 정책을 선택해, 미국으로부터 고문관 · 기술자 · 교사 등을 초빙함은 물론 미국인 선교사도 받아들였다. 1883년에는 미국에 보빙사를 파견하고, 1888년에는 워싱턴에 공사관을 개설하였다. 조선에 대해 내정불간섭 정책을 견지한 미국은 전략적 동기보다는 경제적 · 문화적 동기로 조선에 접근하였다.
미국은 처음에는 조선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가치에 회의를 느끼고 1885년에 주한공사의 직위를 격하시키는 등 소극 · 퇴영 정책을 선택하였다. 미국은 내정불간섭 정책을 표방하면서 청일전쟁과 을사조약 체결 시 조선 측의 거중조정 요청을 무시하더니, 1905년에는 일본과 태프트-가쓰라밀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하였다. 미국 정부가 주장한 내정불간섭 정책과는 달리 주230을 비롯한 미국 외교관과 선교사들은 개화 세력과 제휴하여 조선의 근대화를 도왔다. 그리고 1895년 이후 조선에 진출한 미국의 자본가는 운산금광 채굴권 · 철도 및 전철 부설권 등 알찬 경제적 이권을 획득하였다.
1860년 북경조약(北京條約)의 체결을 계기로 러시아가 연해주(沿海州)를 차지하게 되자, 조선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 1860년대 초 러시아는 조선에 경흥부(慶興府)를 통해 여러 차례 통상을 요구하였으나, 조선 측의 협상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갑신정변 후 청 · 일 간의 대립이 격화되자, 조선 정부는 러시아 세력을 한반도에 끌어들일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1884년에 한로수호통상조약(韓露修好通商條約)을 체결하였다.
그 뒤 청국이 조선에 노골적인 간섭 정책을 펴자, 조선 국왕은 ‘친아거청책(親俄拒淸策)’의 일환으로서 2차에 걸쳐 한로밀약 체결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청 · 일과 충돌을 원하지 않는 러시아는 조선의 보호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았고, 1888년에 조로육로통상조약(朝露陸路通商條約)을 맺어 상권을 확장하는 데 그쳤다. 그 뒤 1891년에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기공한 러시아는 청일전쟁 중에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고, 삼국 간섭으로써 일본의 요동반도 진출을 견제하였다.
그러나 1896년에 조선의 친러파와 주한러시아공사 베베르(Veber, 주231가 후원한 아관파천이 성공하자, 러시아는 조선에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을 파견하는 등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1898년에 여순(旅順) · 대련(大連)을 조차한 러시아는 요동반도 경략에 치중하는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진출을 잠시 등한시하였다. 이는 1898년 일본과 체결한 니시-로젠협정에서 만주는 러시아가, 한국은 일본이 주도 장악한다는 만한교환 원칙에 입각한 것이었다.
1900년 중국의 주232을 계기로 만주를 장악한 러시아는 그 해에 여순 · 대련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마산항을 점령, 그 조차를 요구하였다. 또 1903년에는 압록강 하류의 용암포(龍巖浦)를 점령하고, 그 조차를 조선 정부에 요구하는 등 적극 침투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일본과 대립하더니 드디어 1904년에 러일전쟁을 치르게 되었다. 그러나 러일전쟁의 패배로 제정러시아의 침투는 중지되었다.
영국은 1830년대 이래 한반도에 관심을 나타냈으나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직접적인 접근을 보류해왔다. 그 뒤 1883년에야 치외법권과 낮은 관세율을 특징으로 하는 조영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고 조선에 경제적으로 침투하는 데 치중하였다. 갑신정변 후 러시아의 한반도 침투 가능성이 높아지자, 영국은 1885∼1887년 간 거문도를 점령하고 러시아 해군을 견제하였다. 1902년에는 일본과 동맹을 맺어 일본을 앞세워서 러시아를 견제하려 하였다. 1905년에 영국은 영일동맹을 갱신함으로써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하였다.
1834년 이래 가톨릭 선교사를 파견함으로써 조선에 관심을 보인 프랑스는 병인양요로 조선과 대결하다가 1887년에 조불수호조약(朝佛修好條約)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프랑스는 가톨릭 선교사의 포교권을 인정받았다. 영국 · 프랑스 · 독일 등은 조선의 내정에 간여하지 않았으며, 조선에 진출한 다른 열강들과 경쟁하면서 각종 경제적 이권을 얻는 데 주력하였다.
6.7. 무역
국제무역은 중국 · 여진 · 일본과의 사이에 행해진 관무역 외에는 사신의 내왕에 따르는 약간의 사무역이 허용되었다. 17세기 이후에는 의주 · 중강(中江)이나 봉황성(鳳凰城)의 개시무역(開市貿易)과 후시무역(後市貿易)이 발달하였다. 일본과도 왜관무역(倭館貿易) 외에 밀무역도 성하였다. 중국과의 무역에는 의주의 만상(灣商), 평양의 유상(柳商), 개성의 주233 등이 활약하였다. 일본과의 무역에는 동래의 주234과 개성의 송상이 활약하였는데, 이들 외국무역의 주도권은 송상이 쥐고 있었다.
무역상들은 많은 자본을 축적하여 거부가 된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역관들도 끼어 있었다. 당시 국제무역의 주요 상품은 인삼과 은이었다. 또 청 · 일 등 외국과의 무역으로 치부한 의주의 만상(灣商), 부산의 내상(萊商), 주로 인삼을 취급하는 개성의 송상(松商), 한강을 활동 무대로 한 강상(江商)들의 대두는 상업 경제의 발달을 촉진하였다. 그러나 양반 집권층은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개항기 조선의 경제 상태는 자본주의적 맹아가 형성되었다고는 하나, 충분히 개발되지 못한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제사적으로 볼 때, 19세기 이후의 세계사는 산업화에 성공한 선진 산업국가가 후진 농업국가를 자본주의적인 세계경제 체제에 편입시키는 과정이었다. 선진국가가 후진국가를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자본 자체의 속성, 선진국가 간의 경쟁, 자국 내의 정치 · 사회상의 모순, 후진국가의 국내 여건 등에 따라 양상이 다른 제국주의 정치가 전개되었다. 제국주의의 침략은 포함외교 혹은 ‘달러외교’를 통한 불평등조약 체제의 구축 현상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체제하에서 조선은 유치 산업의 보호를 위한 주235를 실시할 수 없었다. 또 부등가교환(不等價交換)으로 잉여자본을 축적할 수 없었으며, 각종 임산 · 수산 · 광산 자원을 마구 침탈당하였다.
반면에 제국주의 열강들은 무역 · 이권 취득 · 차관 공여 등의 방법으로 조선 경제를 침탈하여 자본을 축적하였다. 그리고 축적된 자본을 재투자하여 경제 침략을 강화하였다. 특히, 조선에 침투한 제국주의 국가 중 선두주자였던 일본은 조선과의 통상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어 원시적 자본 축적을 이룩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1876∼1882년의 기간에 일본은 조선의 무역을 독점하였다. 그러나 임오군란을 계기로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강화하면서 일본의 상권은 침식되었다. 그리하여 조선의 대청 · 대일 수입액의 비율은 1885년 19 : 81에서 1892년 45 : 55로 바뀌어갔다.
그러나 청일전쟁의 패배로 조선에서의 청나라 상권은 쇠퇴하였고, 일본과 구미열강의 상권 진출이 두드러졌다. 일본의 경제적 침투는 아관파천 뒤 잠시 주춤하였으나 이내 조선의 대외무역액 가운데 수입의 과반,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1885∼1893년 간 조선의 대외무역 수지는 수입 · 수출의 비가 2.5 : 1이나 되는 만성적인 입초 현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만성적인 국제 수지의 불균형으로 조선 정부의 재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조선의 수출품은 쌀 · 콩 · 금 · 인삼 등이었다. 쌀은 대일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조선 정부는 필요에 따라 주236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수입품은 영국산 면제품이 대종을 이루었고, 중국으로부터는 서적 · 약재 등도 수입하였다. 청 · 일 상인은 영국 제품을 조선 시장에 파는 중개무역을 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산업화를 추진한 일본은 점차로 자국산 제품을 수출하기 시작하였으며, 1901∼1906년에 조선의 수입품 중 일본 상품이 차지한 비율은 61.6∼77.3%로 비약하고 있었다. 또한 공무역 못지않게 밀무역도 성행하였다. 조선은 청나라와 일본 상인의 밀무역을 방지하고 세수(稅收)를 확보할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1890년대 외국 상사의 조선 진출 상황을 보면, 1896년 총 258개의 외국인 상사 중 일본 상사가 210개일 정도로 일본 상인의 진출이 압도적이었고, 그 다음이 청국 상인이었다. 이어서 미국 · 영국 · 러시아 · 독일의 상사들이 진출하였다. 이들 외국 상사들은 상업과 무역 외에도 선운(船運) · 광업 · 대금업 · 제조업 · 염업 · 농업 · 요업 등 광범한 영역에 투자하였다.
한편, 이들 상사들을 후원하는 은행도 진출하였는데, 그중 일본의 금융 진출이 가장 두드러졌다. 일본의 국립제일은행 · 제18은행 · 제58은행 등은 1890년부터 조선에 지점을 설치하여 일본 상인에게 자금을 공급하였다. 또 조선산 금을 매입하였으며, 조선 정부에 차관을 제공하는 등 금융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특히 국립제일은행은 보통 은행업무 외에 조선 정부의 해관세업무 · 우편위체자금의 보관 사무, 그리고 1905년 이후에는 통화발행권을 확보하여 조선 정부의 준(準)중앙은행 역할을 하였다. 러시아도 1897년에 한러은행 설립을 시도하였으나 독립협회의 반대로 중지하였다.